[통일로 미래로] DMZ 속 자연…전쟁의 상처까지
입력 2025.05.24 (08:19)
수정 2025.05.24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덕에 자연 또한 온전히 보존되었는데요.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을 렌즈에 담아 온 사진가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세계를 돌며 분쟁과 경계의 현장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인데요.
그의 사진 속 비무장지대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의 인생과 사진을 통해 마주한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정미정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동해를 옆에 두고 북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분단의 경계가 선명한 강원도 고성.
고즈넉한 산 아래 길, 박종우 작가의 시선이 멈춘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박종우/사진가 : "(작가님 지금 어떤 촬영 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 대전차 장애물인데요.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물이에요.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치’라고 부르죠. 이런 ‘용치’가 서해, 백령도, 연평도 도서지방부터 동해안 끝까지 많은 곳에 남아있어요. 이런 곳을 찾아가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돌무더기 같지만, 용치는 적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6.25 전쟁의 상흔이기도 한데요.
[박종우/사진가 :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박 작가는 DMZ 일대를 꾸준히 촬영해 오며, 보이지 않던 분단의 풍경을 기록해왔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슬프다는 생각이 들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박종우 작가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민간인으로선 처음으로 촬영한 사진작가입니다.
긴 시간 렌즈를 통해 바라보며 기록해 온 DMZ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박 작가의 사진이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이곳엔 그가 기증한 작품 17점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DMZ를 촬영한 여타 사진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박단아/DMZ 박물관 학예사 : "인간미라든지 자연의 생명력을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MZ를 담아낸 박 작가의 작품을 하나씩 마주해 봅니다.
분단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사진들.
["(산수화 같아요.) 이거는 동양화 같은 풍경이죠. 안에 들어가면 도성의 흔적, 둔덕 이런 게 보이고요. 부서져 있는 집들의 흔적, 잔해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동해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낙타봉’.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전쟁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눈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북한이 만든 포진지예요. 포가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포를 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요한 자연의 풍경 같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박단아/DMZ박물관 학예연구사 : "무기들로 평화로운 풍경들을 조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깥 풍경과 내부 풍경의 대조가 인상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감시가 공존하는 땅, DMZ의 최동북단 감시초소 829 GP도 그중 하납니다.
[박종우/사진가 : "GP에서 보면 매일 금강산에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남측 지역에 처음 설치된 GP였기에, 9.19 군사합의 때도 파괴되지 않고, 2019년 문화재로 등록된 곳입니다.
[박종우/사진가 : "새들은 남과 북을 마음대로 오가는데, 군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제복을 입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처럼 박종우 작가의 사진 속에는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김도윤/경상북도 경주시 :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군인들 옷 위에 쌓여 있는 눈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해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진 앞에 발걸음 멈춘 채 자연스레 평화를 염원해 보는데요.
[김경준/경상북도 경주시 : "앞으로는 전쟁이 없어지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기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온 박 작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까지 이어진 히말라야산맥을 오가며 소수민족의 삶도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2009년엔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DMZ 내부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군에서 제공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찍은 거지요."]
그곳의 낯익고 평온했던 풍경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엄청난 군사기지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 보니까 한반도의 다른 곳과 똑같은 풍경이에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지척에서 지뢰가 발견될 만큼 수많은 위협이 도사렸지만, 기록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박종우/사진가 :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음입니다."]
철책 너머 전쟁의 아픔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는 잊혀진 생명과 일상도 조명해 왔는데요.
이제 그의 렌즈는 평화와 화합이 시작되는 그날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는 지금도 분단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윤화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여기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렇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서 여기서 늙었으니까. 89년 됐지."]
6·25 전쟁 전까지 고성군 전역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북한 땅이지. (북한 주민이셨어요?) 그렇지. 북한 주민이지. 북한 중학생이었지, 그때."]
고성 토박이라는 윤화춘 어르신을 따라, 전쟁의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윤화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이 지역에 바로 인민군 여단이 있었어. 여기 군부대가 있는 바람에 비행기 폭격을 더 맞았어. 나가면서 비행기 폭격 드르르 하다 가고 나오다가 드르르 나가고."]
200미터 길이의 합축교는 전쟁 이전과 이후 남과 북이 절반씩 건설한 다리인데요.
["이쪽으로는 북한이 놨고, 저쪽 반은 한국 공병대가 놨고."]
박종우 작가가 분단의 흔적을 하나씩 짚어가 봅니다.
["(이게 지금 기둥은 전부 북한이 세운 거죠?) 그렇죠."]
DMZ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작업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박종우 작가.
[박종우/사진가 :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분단국가 태생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DMZ 작업으로 인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연처럼 사람도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다리 위를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그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기를 박 작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덕에 자연 또한 온전히 보존되었는데요.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을 렌즈에 담아 온 사진가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세계를 돌며 분쟁과 경계의 현장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인데요.
그의 사진 속 비무장지대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의 인생과 사진을 통해 마주한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정미정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동해를 옆에 두고 북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분단의 경계가 선명한 강원도 고성.
고즈넉한 산 아래 길, 박종우 작가의 시선이 멈춘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박종우/사진가 : "(작가님 지금 어떤 촬영 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 대전차 장애물인데요.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물이에요.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치’라고 부르죠. 이런 ‘용치’가 서해, 백령도, 연평도 도서지방부터 동해안 끝까지 많은 곳에 남아있어요. 이런 곳을 찾아가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돌무더기 같지만, 용치는 적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6.25 전쟁의 상흔이기도 한데요.
[박종우/사진가 :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박 작가는 DMZ 일대를 꾸준히 촬영해 오며, 보이지 않던 분단의 풍경을 기록해왔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슬프다는 생각이 들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박종우 작가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민간인으로선 처음으로 촬영한 사진작가입니다.
긴 시간 렌즈를 통해 바라보며 기록해 온 DMZ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박 작가의 사진이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이곳엔 그가 기증한 작품 17점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DMZ를 촬영한 여타 사진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박단아/DMZ 박물관 학예사 : "인간미라든지 자연의 생명력을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MZ를 담아낸 박 작가의 작품을 하나씩 마주해 봅니다.
분단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사진들.
["(산수화 같아요.) 이거는 동양화 같은 풍경이죠. 안에 들어가면 도성의 흔적, 둔덕 이런 게 보이고요. 부서져 있는 집들의 흔적, 잔해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동해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낙타봉’.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전쟁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눈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북한이 만든 포진지예요. 포가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포를 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요한 자연의 풍경 같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박단아/DMZ박물관 학예연구사 : "무기들로 평화로운 풍경들을 조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깥 풍경과 내부 풍경의 대조가 인상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감시가 공존하는 땅, DMZ의 최동북단 감시초소 829 GP도 그중 하납니다.
[박종우/사진가 : "GP에서 보면 매일 금강산에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남측 지역에 처음 설치된 GP였기에, 9.19 군사합의 때도 파괴되지 않고, 2019년 문화재로 등록된 곳입니다.
[박종우/사진가 : "새들은 남과 북을 마음대로 오가는데, 군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제복을 입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처럼 박종우 작가의 사진 속에는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김도윤/경상북도 경주시 :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군인들 옷 위에 쌓여 있는 눈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해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진 앞에 발걸음 멈춘 채 자연스레 평화를 염원해 보는데요.
[김경준/경상북도 경주시 : "앞으로는 전쟁이 없어지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기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온 박 작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까지 이어진 히말라야산맥을 오가며 소수민족의 삶도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2009년엔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DMZ 내부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군에서 제공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찍은 거지요."]
그곳의 낯익고 평온했던 풍경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엄청난 군사기지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 보니까 한반도의 다른 곳과 똑같은 풍경이에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지척에서 지뢰가 발견될 만큼 수많은 위협이 도사렸지만, 기록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박종우/사진가 :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음입니다."]
철책 너머 전쟁의 아픔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는 잊혀진 생명과 일상도 조명해 왔는데요.
이제 그의 렌즈는 평화와 화합이 시작되는 그날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는 지금도 분단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윤화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여기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렇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서 여기서 늙었으니까. 89년 됐지."]
6·25 전쟁 전까지 고성군 전역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북한 땅이지. (북한 주민이셨어요?) 그렇지. 북한 주민이지. 북한 중학생이었지, 그때."]
고성 토박이라는 윤화춘 어르신을 따라, 전쟁의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윤화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이 지역에 바로 인민군 여단이 있었어. 여기 군부대가 있는 바람에 비행기 폭격을 더 맞았어. 나가면서 비행기 폭격 드르르 하다 가고 나오다가 드르르 나가고."]
200미터 길이의 합축교는 전쟁 이전과 이후 남과 북이 절반씩 건설한 다리인데요.
["이쪽으로는 북한이 놨고, 저쪽 반은 한국 공병대가 놨고."]
박종우 작가가 분단의 흔적을 하나씩 짚어가 봅니다.
["(이게 지금 기둥은 전부 북한이 세운 거죠?) 그렇죠."]
DMZ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작업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박종우 작가.
[박종우/사진가 :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분단국가 태생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DMZ 작업으로 인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연처럼 사람도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다리 위를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그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기를 박 작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일로 미래로] DMZ 속 자연…전쟁의 상처까지
-
- 입력 2025-05-24 08:19:10
- 수정2025-05-24 08:34:34

[앵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덕에 자연 또한 온전히 보존되었는데요.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을 렌즈에 담아 온 사진가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세계를 돌며 분쟁과 경계의 현장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인데요.
그의 사진 속 비무장지대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의 인생과 사진을 통해 마주한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정미정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동해를 옆에 두고 북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분단의 경계가 선명한 강원도 고성.
고즈넉한 산 아래 길, 박종우 작가의 시선이 멈춘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박종우/사진가 : "(작가님 지금 어떤 촬영 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 대전차 장애물인데요.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물이에요.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치’라고 부르죠. 이런 ‘용치’가 서해, 백령도, 연평도 도서지방부터 동해안 끝까지 많은 곳에 남아있어요. 이런 곳을 찾아가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돌무더기 같지만, 용치는 적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6.25 전쟁의 상흔이기도 한데요.
[박종우/사진가 :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박 작가는 DMZ 일대를 꾸준히 촬영해 오며, 보이지 않던 분단의 풍경을 기록해왔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슬프다는 생각이 들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박종우 작가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민간인으로선 처음으로 촬영한 사진작가입니다.
긴 시간 렌즈를 통해 바라보며 기록해 온 DMZ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박 작가의 사진이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이곳엔 그가 기증한 작품 17점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DMZ를 촬영한 여타 사진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박단아/DMZ 박물관 학예사 : "인간미라든지 자연의 생명력을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MZ를 담아낸 박 작가의 작품을 하나씩 마주해 봅니다.
분단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사진들.
["(산수화 같아요.) 이거는 동양화 같은 풍경이죠. 안에 들어가면 도성의 흔적, 둔덕 이런 게 보이고요. 부서져 있는 집들의 흔적, 잔해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동해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낙타봉’.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전쟁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눈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북한이 만든 포진지예요. 포가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포를 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요한 자연의 풍경 같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박단아/DMZ박물관 학예연구사 : "무기들로 평화로운 풍경들을 조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깥 풍경과 내부 풍경의 대조가 인상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감시가 공존하는 땅, DMZ의 최동북단 감시초소 829 GP도 그중 하납니다.
[박종우/사진가 : "GP에서 보면 매일 금강산에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남측 지역에 처음 설치된 GP였기에, 9.19 군사합의 때도 파괴되지 않고, 2019년 문화재로 등록된 곳입니다.
[박종우/사진가 : "새들은 남과 북을 마음대로 오가는데, 군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제복을 입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처럼 박종우 작가의 사진 속에는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김도윤/경상북도 경주시 :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군인들 옷 위에 쌓여 있는 눈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해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진 앞에 발걸음 멈춘 채 자연스레 평화를 염원해 보는데요.
[김경준/경상북도 경주시 : "앞으로는 전쟁이 없어지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기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온 박 작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까지 이어진 히말라야산맥을 오가며 소수민족의 삶도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2009년엔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DMZ 내부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군에서 제공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찍은 거지요."]
그곳의 낯익고 평온했던 풍경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엄청난 군사기지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 보니까 한반도의 다른 곳과 똑같은 풍경이에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지척에서 지뢰가 발견될 만큼 수많은 위협이 도사렸지만, 기록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박종우/사진가 :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음입니다."]
철책 너머 전쟁의 아픔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는 잊혀진 생명과 일상도 조명해 왔는데요.
이제 그의 렌즈는 평화와 화합이 시작되는 그날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는 지금도 분단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윤화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여기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렇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서 여기서 늙었으니까. 89년 됐지."]
6·25 전쟁 전까지 고성군 전역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북한 땅이지. (북한 주민이셨어요?) 그렇지. 북한 주민이지. 북한 중학생이었지, 그때."]
고성 토박이라는 윤화춘 어르신을 따라, 전쟁의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윤화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이 지역에 바로 인민군 여단이 있었어. 여기 군부대가 있는 바람에 비행기 폭격을 더 맞았어. 나가면서 비행기 폭격 드르르 하다 가고 나오다가 드르르 나가고."]
200미터 길이의 합축교는 전쟁 이전과 이후 남과 북이 절반씩 건설한 다리인데요.
["이쪽으로는 북한이 놨고, 저쪽 반은 한국 공병대가 놨고."]
박종우 작가가 분단의 흔적을 하나씩 짚어가 봅니다.
["(이게 지금 기둥은 전부 북한이 세운 거죠?) 그렇죠."]
DMZ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작업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박종우 작가.
[박종우/사진가 :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분단국가 태생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DMZ 작업으로 인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연처럼 사람도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다리 위를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그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기를 박 작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덕에 자연 또한 온전히 보존되었는데요.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을 렌즈에 담아 온 사진가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세계를 돌며 분쟁과 경계의 현장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인데요.
그의 사진 속 비무장지대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의 인생과 사진을 통해 마주한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정미정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리포트]
동해를 옆에 두고 북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분단의 경계가 선명한 강원도 고성.
고즈넉한 산 아래 길, 박종우 작가의 시선이 멈춘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박종우/사진가 : "(작가님 지금 어떤 촬영 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 대전차 장애물인데요.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물이에요.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치’라고 부르죠. 이런 ‘용치’가 서해, 백령도, 연평도 도서지방부터 동해안 끝까지 많은 곳에 남아있어요. 이런 곳을 찾아가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돌무더기 같지만, 용치는 적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6.25 전쟁의 상흔이기도 한데요.
[박종우/사진가 :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박 작가는 DMZ 일대를 꾸준히 촬영해 오며, 보이지 않던 분단의 풍경을 기록해왔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슬프다는 생각이 들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이런 게 있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박종우 작가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민간인으로선 처음으로 촬영한 사진작가입니다.
긴 시간 렌즈를 통해 바라보며 기록해 온 DMZ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박 작가의 사진이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이곳엔 그가 기증한 작품 17점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DMZ를 촬영한 여타 사진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박단아/DMZ 박물관 학예사 : "인간미라든지 자연의 생명력을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MZ를 담아낸 박 작가의 작품을 하나씩 마주해 봅니다.
분단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사진들.
["(산수화 같아요.) 이거는 동양화 같은 풍경이죠. 안에 들어가면 도성의 흔적, 둔덕 이런 게 보이고요. 부서져 있는 집들의 흔적, 잔해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동해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낙타봉’.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전쟁의 흔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눈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북한이 만든 포진지예요. 포가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포를 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요한 자연의 풍경 같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박단아/DMZ박물관 학예연구사 : "무기들로 평화로운 풍경들을 조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깥 풍경과 내부 풍경의 대조가 인상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감시가 공존하는 땅, DMZ의 최동북단 감시초소 829 GP도 그중 하납니다.
[박종우/사진가 : "GP에서 보면 매일 금강산에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남측 지역에 처음 설치된 GP였기에, 9.19 군사합의 때도 파괴되지 않고, 2019년 문화재로 등록된 곳입니다.
[박종우/사진가 : "새들은 남과 북을 마음대로 오가는데, 군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제복을 입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처럼 박종우 작가의 사진 속에는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김도윤/경상북도 경주시 :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군인들 옷 위에 쌓여 있는 눈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해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진 앞에 발걸음 멈춘 채 자연스레 평화를 염원해 보는데요.
[김경준/경상북도 경주시 : "앞으로는 전쟁이 없어지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기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온 박 작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얀마까지 이어진 히말라야산맥을 오가며 소수민족의 삶도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2009년엔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DMZ 내부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군에서 제공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찍은 거지요."]
그곳의 낯익고 평온했던 풍경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종우/사진가 : "엄청난 군사기지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무장 지대에 들어가 보니까 한반도의 다른 곳과 똑같은 풍경이에요.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지척에서 지뢰가 발견될 만큼 수많은 위협이 도사렸지만, 기록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박종우/사진가 :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시대를 기억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음입니다."]
철책 너머 전쟁의 아픔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는 잊혀진 생명과 일상도 조명해 왔는데요.
이제 그의 렌즈는 평화와 화합이 시작되는 그날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종우 작가는 지금도 분단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윤화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여기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렇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서 여기서 늙었으니까. 89년 됐지."]
6·25 전쟁 전까지 고성군 전역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어요.) 북한 땅이지. (북한 주민이셨어요?) 그렇지. 북한 주민이지. 북한 중학생이었지, 그때."]
고성 토박이라는 윤화춘 어르신을 따라, 전쟁의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윤화춘/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이 지역에 바로 인민군 여단이 있었어. 여기 군부대가 있는 바람에 비행기 폭격을 더 맞았어. 나가면서 비행기 폭격 드르르 하다 가고 나오다가 드르르 나가고."]
200미터 길이의 합축교는 전쟁 이전과 이후 남과 북이 절반씩 건설한 다리인데요.
["이쪽으로는 북한이 놨고, 저쪽 반은 한국 공병대가 놨고."]
박종우 작가가 분단의 흔적을 하나씩 짚어가 봅니다.
["(이게 지금 기둥은 전부 북한이 세운 거죠?) 그렇죠."]
DMZ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작업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박종우 작가.
[박종우/사진가 :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분단국가 태생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DMZ 작업으로 인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연처럼 사람도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다리 위를 남과 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그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기를 박 작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클로즈업 북한] 인공기 패션 열풍…애국 마케팅 일상화](https://news.kbs.co.kr/data/news/2025/05/24/20250524_3lFJb1.jpg)
![[북한 영상] 고원군 자연동굴](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snwindow/2025/05/24/50_826243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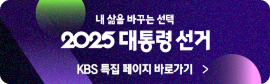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