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집값 3년째 하락…정부는 재테크로 ‘이걸’ 권한다 [특파원 리포트]
입력 2025.07.10 (08:23)
수정 2025.07.10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부동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넘게 하락 중입니다.
프랑스 부동산 플랫폼 MeilleursAgents에 따르면, 파리 주택 가격은 2021년 이후 13분기 연속 내리막입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파리는 2024년 2분기 기준 1㎡ 당 9,500유로(한화 1천 5백여만 원)로 전년 대비 5.5% 하락했고, 수도권 전체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도 마찬가지로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맞춰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프랑스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긴급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집을 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구조적이기 때문입니다.
■ 프랑스 DSR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최대 35%… 거래세·보유세도 부담
먼저 '빡센' 대출 규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한국은 '집값 대비 대출 허용 비율'인 LTV를 최대 70%까지, '연 소득 대비 전체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인 DSR을 40%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DSR을 최대 35%로 고정했고, 상환 기간도 2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무리해서 구매한 뒤, 세입자에게 바로 전세를 주고 은퇴 이후로 넘어가는 40년 이상의 원금 상환 기간 통지서를 받아 드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동산 보유와 취득 비용도 부담입니다.
한국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나지만, 프랑스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무겁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 비용은 전체 거래가의 평균 7~12% 수준에 달해 초기 진입 비용이 많이 들고, 보유세는 단일 재산세 형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도 부분 감면을 받으려면 최소 6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사고팔 때의 '진입과 이탈 비용'이 높아,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민간형' 공공임대 주택 비율 17%…주요 도시에 임대료 상한제
또 정부가 임대 시장에 강력히 개입합니다.
한국은 목돈을 받아 집을 임대할 수 있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로 '자가'와 '무자가'가 부동산 시장에 섞여 있지만, 프랑스는 매매 혹은 월세로 거주합니다. 대신, 공공임대(HLM :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시스템)가 활발합니다.
프랑스의 공공임대(HLM)는 국가가 직접 건물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건설 보조금과 장기 저리 융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주택 운영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민간 월세 시장의 급등을 막고, 저소득층의 도심 거주 기회를 보장하는데 프랑스 전체 임대의 약 17%를 이 공공주택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민간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도 도입됐습니다.
프랑스는 파리·리옹 등 주요 도시 1,000여 개를 '긴장된 주택 시장'으로 지정하고, '기준 임대료'를 정해뒀습니다. 이 기준 임대료의 20%를 초과하는 월세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위반 시 한국 돈으로 최대 1천5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전월세 상한제' 논의와 유사하지만, 프랑스에선 실제로 시행 중이고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 숙소 연 90일 제한…"실거주용 주택 공급 보호"
여기에, 프랑스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Airbnb 등 단기 공유 숙소 임대에 대해 '연 90일 상한'과 '등록 의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 대국'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공유 숙소로 내놓고 추가 부동산 소득을 거두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거주용 주택의 전환을 막기 위해 불법 운영 시 최대 10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기임대의 투자 매력을 낮추고, 실거주용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전국적 단기 임대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지자체 조례 수준에서만 등록 의무나 임대 기간 제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프랑스 재테크, 부동산 대신 정부 주도 금융 상품 활용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도대체 부동산 말고 어떤 재테크를 할까요?
보통 정부가 보장하는 세금 혜택형 금융상품을 활용합니다. Livret A(세금 없는 안전 저축 통장 : 3% 이자, 원금 보장), PEA(장기 주식 투자용 비과세 계좌), Assurance Vie(보험형 자산관리 상품 : 저축+투자+상속 절세를 통합) 등이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특히 Livret A는 국민의 80% 이상이 보유할 만큼 대중적이고, PEA는 장기 주식 투자의 세제 혜택을 위한 통로로 활용됩니다.
즉, 국가 지원을 통한 금융 자산 축적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셈인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식과 배당 등 금융 소득을 통한 재테크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랑스 집값 3년째 하락…정부는 재테크로 ‘이걸’ 권한다 [특파원 리포트]
-
- 입력 2025-07-10 08:23:12
- 수정2025-07-10 08:23:29

프랑스 부동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넘게 하락 중입니다.
프랑스 부동산 플랫폼 MeilleursAgents에 따르면, 파리 주택 가격은 2021년 이후 13분기 연속 내리막입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파리는 2024년 2분기 기준 1㎡ 당 9,500유로(한화 1천 5백여만 원)로 전년 대비 5.5% 하락했고, 수도권 전체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도 마찬가지로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맞춰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프랑스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긴급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집을 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구조적이기 때문입니다.
■ 프랑스 DSR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최대 35%… 거래세·보유세도 부담
먼저 '빡센' 대출 규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한국은 '집값 대비 대출 허용 비율'인 LTV를 최대 70%까지, '연 소득 대비 전체 빚 갚는 데 쓰는 돈의 비율'인 DSR을 40%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DSR을 최대 35%로 고정했고, 상환 기간도 2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무리해서 구매한 뒤, 세입자에게 바로 전세를 주고 은퇴 이후로 넘어가는 40년 이상의 원금 상환 기간 통지서를 받아 드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부동산 보유와 취득 비용도 부담입니다.
한국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나지만, 프랑스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무겁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 비용은 전체 거래가의 평균 7~12% 수준에 달해 초기 진입 비용이 많이 들고, 보유세는 단일 재산세 형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도 부분 감면을 받으려면 최소 6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사고팔 때의 '진입과 이탈 비용'이 높아,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민간형' 공공임대 주택 비율 17%…주요 도시에 임대료 상한제
또 정부가 임대 시장에 강력히 개입합니다.
한국은 목돈을 받아 집을 임대할 수 있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로 '자가'와 '무자가'가 부동산 시장에 섞여 있지만, 프랑스는 매매 혹은 월세로 거주합니다. 대신, 공공임대(HLM :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시스템)가 활발합니다.
프랑스의 공공임대(HLM)는 국가가 직접 건물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건설 보조금과 장기 저리 융자,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주택 운영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민간 월세 시장의 급등을 막고, 저소득층의 도심 거주 기회를 보장하는데 프랑스 전체 임대의 약 17%를 이 공공주택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민간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도 도입됐습니다.
프랑스는 파리·리옹 등 주요 도시 1,000여 개를 '긴장된 주택 시장'으로 지정하고, '기준 임대료'를 정해뒀습니다. 이 기준 임대료의 20%를 초과하는 월세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위반 시 한국 돈으로 최대 1천5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전월세 상한제' 논의와 유사하지만, 프랑스에선 실제로 시행 중이고 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 숙소 연 90일 제한…"실거주용 주택 공급 보호"
여기에, 프랑스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Airbnb 등 단기 공유 숙소 임대에 대해 '연 90일 상한'과 '등록 의무'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 대국'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공유 숙소로 내놓고 추가 부동산 소득을 거두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거주용 주택의 전환을 막기 위해 불법 운영 시 최대 10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기임대의 투자 매력을 낮추고, 실거주용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전국적 단기 임대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지자체 조례 수준에서만 등록 의무나 임대 기간 제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프랑스 재테크, 부동산 대신 정부 주도 금융 상품 활용
그럼, 프랑스 사람들은 도대체 부동산 말고 어떤 재테크를 할까요?
보통 정부가 보장하는 세금 혜택형 금융상품을 활용합니다. Livret A(세금 없는 안전 저축 통장 : 3% 이자, 원금 보장), PEA(장기 주식 투자용 비과세 계좌), Assurance Vie(보험형 자산관리 상품 : 저축+투자+상속 절세를 통합) 등이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특히 Livret A는 국민의 80% 이상이 보유할 만큼 대중적이고, PEA는 장기 주식 투자의 세제 혜택을 위한 통로로 활용됩니다.
즉, 국가 지원을 통한 금융 자산 축적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셈인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신 주식과 배당 등 금융 소득을 통한 재테크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이화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수인번호 3617’, 구치소 독방 수용…<br>1차 구속 때와 다른 점은?](/data/news/2025/07/10/20250710_Dkm7F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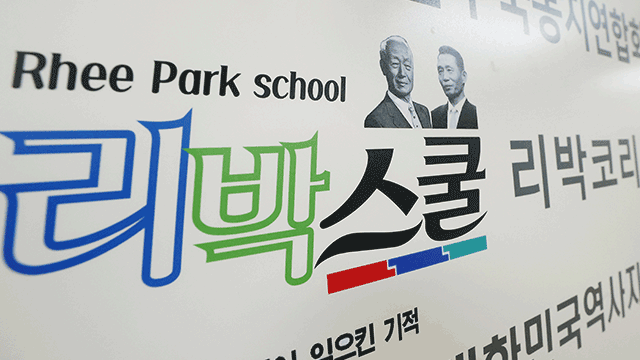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