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사람] 시간이 머무는 곳 ’간이역 사람들’
입력 2009.07.25 (21:48)
수정 2009.07.25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줬던 간이역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간이역이 속도의 시대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역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짙푸른 들녘이 끝없이 펼쳐지는 전북 익산의 만경 평야, 요란한 기적 소리가 아침 정적을 가릅니다.
철길 한 켠 세월의 흔적이 잔뜩 묻어나는 조그만 간이역엔 이제 기차도, 사람도 더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터뷰> 채해석(임피역 명예역장) :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그냥 학생들, 민간인들 할 것 없이 매달려서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와서는 학생도 손님도 없고 기차도 안서는 역이 되니까 제 마음도 참 아쉽습니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며,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됐던, 그래서 늘 숱한 삶의 애환으로 북적였던 간이역, 더디고 더딘 완행열차와 함께 느리지만, 여유있는 낭만을 연출했던 그곳이 이제 세월의 흐름과 속도의 시대에 떠밀려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고향 간이역을 지키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뿐, 하루 예닐곱 차례 잠시 머물다 가는 기차가 전부인 산골 간이역 대합실엔 오늘도 할아버지 혼자 읍내 오일장에 다녀오는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녹취> 장경문(경북 영주시 소천면) : "뭐 불편 할 것도 없어요, 몇분 기다리는데 뭐 불편할 게 있어요, 오면 태워 가지고 가는거지."
기차도, 사람도 모두가 떠난 텅 빈 간이역을 찾은 박해수 시인, 간이역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담겼던 추억과 낭만, 그리고 삶의 여유가 함께 잊혀지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박해수(시인) : "그리움과 낭만, 애환과 추억 그 모든 것들이 스며있고, 잠겨있는 곳이 바로 간이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곳들을 찾아서 시를 씁니다."
이른 아침 주부 임정녀씨가 간이역 대합실의 문을 엽니다.
이용자가 줄어 무인역이 된 한 간이역의 명예역장으로 나선 임씨,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진지한 열정속에 지나는 기차에 신호를 보내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인터뷰> 임정녀(용궁역 명예역장) : "잠시나마 이렇게 내려서 간이역도 둘러보고, 벤치에 앉아서 책도 보고, 간이역의 철길도 한 번 걸어보고...그래야지 나중에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겐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여전히 오늘의 삶이 이어지는 곳, 간이역.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오며 그 속도의 삶에 지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줬던 간이역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간이역이 속도의 시대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역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짙푸른 들녘이 끝없이 펼쳐지는 전북 익산의 만경 평야, 요란한 기적 소리가 아침 정적을 가릅니다.
철길 한 켠 세월의 흔적이 잔뜩 묻어나는 조그만 간이역엔 이제 기차도, 사람도 더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터뷰> 채해석(임피역 명예역장) :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그냥 학생들, 민간인들 할 것 없이 매달려서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와서는 학생도 손님도 없고 기차도 안서는 역이 되니까 제 마음도 참 아쉽습니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며,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됐던, 그래서 늘 숱한 삶의 애환으로 북적였던 간이역, 더디고 더딘 완행열차와 함께 느리지만, 여유있는 낭만을 연출했던 그곳이 이제 세월의 흐름과 속도의 시대에 떠밀려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고향 간이역을 지키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뿐, 하루 예닐곱 차례 잠시 머물다 가는 기차가 전부인 산골 간이역 대합실엔 오늘도 할아버지 혼자 읍내 오일장에 다녀오는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녹취> 장경문(경북 영주시 소천면) : "뭐 불편 할 것도 없어요, 몇분 기다리는데 뭐 불편할 게 있어요, 오면 태워 가지고 가는거지."
기차도, 사람도 모두가 떠난 텅 빈 간이역을 찾은 박해수 시인, 간이역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담겼던 추억과 낭만, 그리고 삶의 여유가 함께 잊혀지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박해수(시인) : "그리움과 낭만, 애환과 추억 그 모든 것들이 스며있고, 잠겨있는 곳이 바로 간이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곳들을 찾아서 시를 씁니다."
이른 아침 주부 임정녀씨가 간이역 대합실의 문을 엽니다.
이용자가 줄어 무인역이 된 한 간이역의 명예역장으로 나선 임씨,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진지한 열정속에 지나는 기차에 신호를 보내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인터뷰> 임정녀(용궁역 명예역장) : "잠시나마 이렇게 내려서 간이역도 둘러보고, 벤치에 앉아서 책도 보고, 간이역의 철길도 한 번 걸어보고...그래야지 나중에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겐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여전히 오늘의 삶이 이어지는 곳, 간이역.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오며 그 속도의 삶에 지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와 사람] 시간이 머무는 곳 ’간이역 사람들’
-
- 입력 2009-07-25 21:26:02
- 수정2009-07-25 21:56:13

<앵커 멘트>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줬던 간이역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간이역이 속도의 시대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역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성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짙푸른 들녘이 끝없이 펼쳐지는 전북 익산의 만경 평야, 요란한 기적 소리가 아침 정적을 가릅니다.
철길 한 켠 세월의 흔적이 잔뜩 묻어나는 조그만 간이역엔 이제 기차도, 사람도 더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터뷰> 채해석(임피역 명예역장) :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그냥 학생들, 민간인들 할 것 없이 매달려서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와서는 학생도 손님도 없고 기차도 안서는 역이 되니까 제 마음도 참 아쉽습니다.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며,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됐던, 그래서 늘 숱한 삶의 애환으로 북적였던 간이역, 더디고 더딘 완행열차와 함께 느리지만, 여유있는 낭만을 연출했던 그곳이 이제 세월의 흐름과 속도의 시대에 떠밀려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고향 간이역을 지키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뿐, 하루 예닐곱 차례 잠시 머물다 가는 기차가 전부인 산골 간이역 대합실엔 오늘도 할아버지 혼자 읍내 오일장에 다녀오는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녹취> 장경문(경북 영주시 소천면) : "뭐 불편 할 것도 없어요, 몇분 기다리는데 뭐 불편할 게 있어요, 오면 태워 가지고 가는거지."
기차도, 사람도 모두가 떠난 텅 빈 간이역을 찾은 박해수 시인, 간이역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담겼던 추억과 낭만, 그리고 삶의 여유가 함께 잊혀지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박해수(시인) : "그리움과 낭만, 애환과 추억 그 모든 것들이 스며있고, 잠겨있는 곳이 바로 간이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곳들을 찾아서 시를 씁니다."
이른 아침 주부 임정녀씨가 간이역 대합실의 문을 엽니다.
이용자가 줄어 무인역이 된 한 간이역의 명예역장으로 나선 임씨,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진지한 열정속에 지나는 기차에 신호를 보내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습니다.
<인터뷰> 임정녀(용궁역 명예역장) : "잠시나마 이렇게 내려서 간이역도 둘러보고, 벤치에 앉아서 책도 보고, 간이역의 철길도 한 번 걸어보고...그래야지 나중에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겐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여전히 오늘의 삶이 이어지는 곳, 간이역.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오며 그 속도의 삶에 지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
-

조성훈 기자 aufhebun@kbs.co.kr
조성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주요뉴스] 오스트리아, ‘北 호화 요트’ 조사 外](https://news.kbs.co.kr/newsimage2/200907/20090725/181651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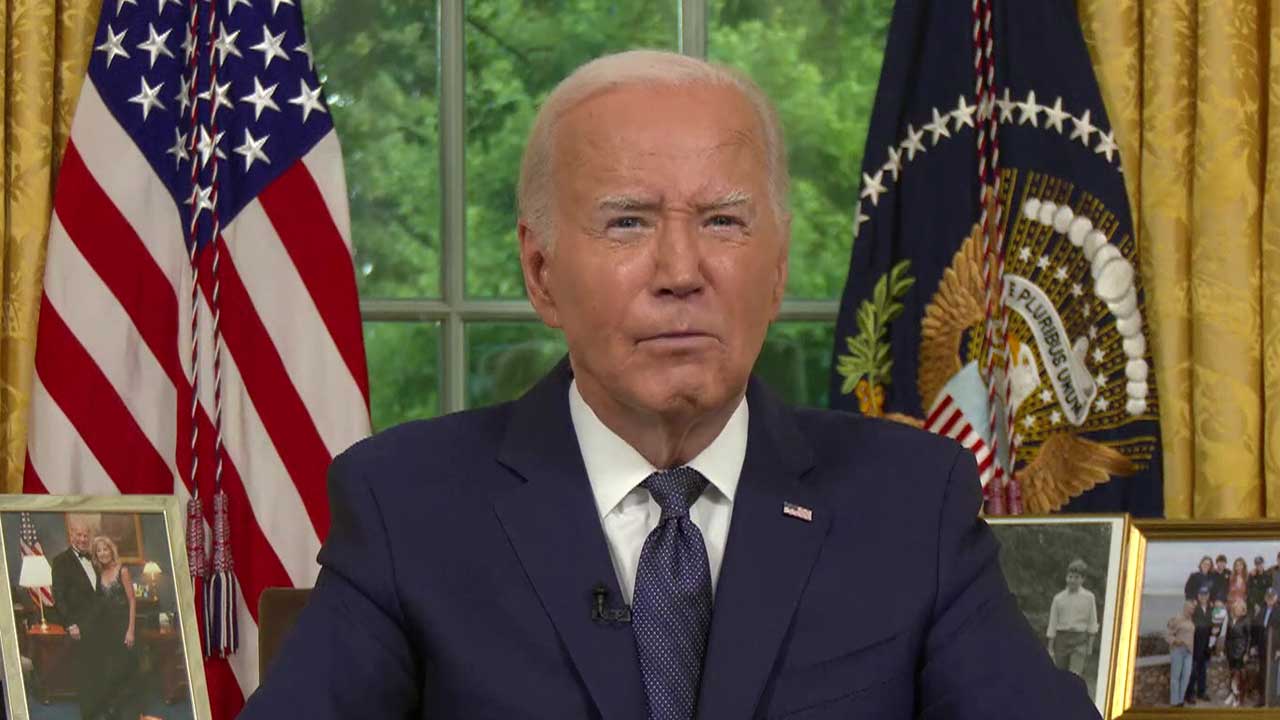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