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영화 70편을 튼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10년 사이에 50편을 찍었는데 부끄러운 과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년에 5편씩 했으니 얼마나 날치기로 막 찍었겠어요. 그땐 개봉해서 한 번 보고 다시는 본 적이 없는 필름들이에요. 이번에 내가 무슨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지 봐야 알겠어요."
한국이 낳은 영화 거장 임권택 감독은 최근 후반작업을 진행한 신작 ’달빛 길어올리기’를 빼면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부터 ’천년학’(2006)까지 100편의 영화를 남겼다. 한국영상자료원이 12일부터 10월3일까지 여는 ’임권택 감독 전작 展’에서는 100편 가운데 필름으로 남아있는 70편이 무료로 상영되며 특히 ’만다라’(1981)는 디지털 복원판이 처음 공개된다.
영상자료원은 이만희, 김기영, 유현목 등 작고한 감독들의 전작전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생존한 감독의 전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전을 앞두고 최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난 임권택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전부를 관객들에게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초기작에 대한 평가가 박했다.
"액션, 사극, 멜로, 코미디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주문이 오면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닥치는 대로 한 거죠. 시나리오 고쳐가면서요."
영화 1편을 완성하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 요즘 상황으로 보면 1년에 5편꼴로 찍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저도 거짓말 같은데 타이틀 보면 제가 찍었더라고요. 언제까지 한 영화를 끝내겠다고 예정하면 다음 작품은 언제 들어갈지 미리 정하죠. 그런데 스케줄이 엉키고 하면 뒤 작품과 겹치기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초기작 50편에 대해 "흥미로운 픽션을 꾸며서 흥행을 시키는 영화로 우리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면서 "그때는 좋은 작품을 찍어서 후세에 남기겠다는 야망은 없었다. 살기 힘든데 싸구려 감독으로서 생활의 방편으로 찍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런 작품이 그의 영화세계의 밑거름이 됐음은 당연하다. 임 감독도 "좋은 영화가 됐든 나쁜 영화가 됐든 필사적으로 정신없이 찍었다"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감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 같은 게 그 시대에 쌓인 게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임 감독은 호적에는 1936년생이지만 실제는 1934년생으로 올해 76세다. 1962년 젊은 나이인 26세에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했지만 그가 자신의 첫 작품으로 생각하는 영화는 따로 있다.
"나이 들면서 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내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내 인생을 소모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각성을 했죠. 거짓말 좀 그만하고 삶과 닿아있는 영화를 찍자는 생각을 했어요."
임 감독이 자신의 첫 영화로 꼽은 영화는 1973년작 ’잡초’다. 자신이 직접 제작까지 맡은 영화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한 여자가 해방과 6.25 전쟁을 지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찍어야 하는데 그런 재미없는 소재에 누가 돈을 댔겠어요. 제작자가 나서지 않아 직접 제작을 했어요. 흥행에서는 왕창 망했죠. 그래도 한 가지 큰 소득은 있었어요. 임아무개가 흥행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영화도 찍는 감독이구나 하는 인식을 영화계에 심어줬다는 거죠."
이번 전작전에서는 그의 초기작들도 대거 상영되지만 ’잡초’는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게도 그 영화는 볼 수 없다.
"내가 제작자면서도 필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개봉이 끝나면 관심이 없었던 땐데 안 그랬으면 챙겨놨을 거에요. 나로서는 영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었는데 그 소중한 작품을 잃어버렸으니…. 너무 오래전 얘긴데 지금도 그 영화 몇 군데는 생각나요."
’잡초’를 시작으로 그의 영화는 많이 바뀌었다. 미국영화를 답습하려 했던 그는 한국적인 영화를 찍는데 몰두했다.
임 감독은 "내 영화를 미국영화의 2,3류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미국영화를 따라간다는 건 가망이 없는 욕심이라는 걸 알았다"면서 "한국 사람의 삶과 문화적 개성, 우리의 수난사가 있는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영화의 가장 암흑기가 70년대라고 하는데 나는 그 시대를 잘 보냈다. 내가 찍은 영화가 상을 많이 타면 제작사는 외화를 수입할 수 있었으니 흥행은 안 돼도 영화를 찍으면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화의 때를 빼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 미국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너무 재미없는 영화가 됐다"면서 "체질 개선은 좋은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영화를 오래 한다는 건 말짱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작품성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걸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적인 개성을 충실히 담아내려 한 그의 영화는 ’만다라’(1981)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유수 영화제의 단골손님이 됐으며 ’취화선’(2002)으로는 칸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100편의 영화 가운데 그에게 소중한 작품은 무엇일까. 대표작이나 애착이 가는 작품을 얘기하지 않는 감독이나 배우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유를 많이 대지만 임 감독은 뜻밖에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찍었으면 자랑도 할 텐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자랑할만한 작품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제 작품은 시사 끝나면 그 뒤로 다시는 잘 안 봐요. 보고 있으면 열 받는 게 많아서죠. 왜 그때 저 수준으로 찍었는가 생각하면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만족할 영화는 못 찍고 죽을 거란 걸 알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활발하게 영화를 찍는 감독들은 주로 30~40대고 50대 이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70대 중반의 임 감독이 좋은 영화를 꾸준하게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더러는 내가 영화를 잘 만들어서 히트도 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됐어요. 관객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지 나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란 거죠. 저는 재수도 참 좋고 참으로 순탄하고 복 받은 영화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영화인생을 얘기하는 그의 표정에는 행복한 추억이 서린 듯했다. 노장 감독의 바람은 소박하다. "훈훈하고 재미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란다.
언제나 영화만을 생각하는 그는 별다른 취미도 없다고 한다. "우리 집사람 얘기론 내가 집에 있어도 혼은 떠돈다고 그래요."
한국이 낳은 영화 거장 임권택 감독은 최근 후반작업을 진행한 신작 ’달빛 길어올리기’를 빼면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부터 ’천년학’(2006)까지 100편의 영화를 남겼다. 한국영상자료원이 12일부터 10월3일까지 여는 ’임권택 감독 전작 展’에서는 100편 가운데 필름으로 남아있는 70편이 무료로 상영되며 특히 ’만다라’(1981)는 디지털 복원판이 처음 공개된다.
영상자료원은 이만희, 김기영, 유현목 등 작고한 감독들의 전작전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생존한 감독의 전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전을 앞두고 최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난 임권택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전부를 관객들에게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초기작에 대한 평가가 박했다.
"액션, 사극, 멜로, 코미디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주문이 오면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닥치는 대로 한 거죠. 시나리오 고쳐가면서요."
영화 1편을 완성하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 요즘 상황으로 보면 1년에 5편꼴로 찍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저도 거짓말 같은데 타이틀 보면 제가 찍었더라고요. 언제까지 한 영화를 끝내겠다고 예정하면 다음 작품은 언제 들어갈지 미리 정하죠. 그런데 스케줄이 엉키고 하면 뒤 작품과 겹치기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초기작 50편에 대해 "흥미로운 픽션을 꾸며서 흥행을 시키는 영화로 우리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면서 "그때는 좋은 작품을 찍어서 후세에 남기겠다는 야망은 없었다. 살기 힘든데 싸구려 감독으로서 생활의 방편으로 찍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런 작품이 그의 영화세계의 밑거름이 됐음은 당연하다. 임 감독도 "좋은 영화가 됐든 나쁜 영화가 됐든 필사적으로 정신없이 찍었다"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감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 같은 게 그 시대에 쌓인 게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임 감독은 호적에는 1936년생이지만 실제는 1934년생으로 올해 76세다. 1962년 젊은 나이인 26세에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했지만 그가 자신의 첫 작품으로 생각하는 영화는 따로 있다.
"나이 들면서 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내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내 인생을 소모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각성을 했죠. 거짓말 좀 그만하고 삶과 닿아있는 영화를 찍자는 생각을 했어요."
임 감독이 자신의 첫 영화로 꼽은 영화는 1973년작 ’잡초’다. 자신이 직접 제작까지 맡은 영화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한 여자가 해방과 6.25 전쟁을 지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찍어야 하는데 그런 재미없는 소재에 누가 돈을 댔겠어요. 제작자가 나서지 않아 직접 제작을 했어요. 흥행에서는 왕창 망했죠. 그래도 한 가지 큰 소득은 있었어요. 임아무개가 흥행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영화도 찍는 감독이구나 하는 인식을 영화계에 심어줬다는 거죠."
이번 전작전에서는 그의 초기작들도 대거 상영되지만 ’잡초’는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게도 그 영화는 볼 수 없다.
"내가 제작자면서도 필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개봉이 끝나면 관심이 없었던 땐데 안 그랬으면 챙겨놨을 거에요. 나로서는 영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었는데 그 소중한 작품을 잃어버렸으니…. 너무 오래전 얘긴데 지금도 그 영화 몇 군데는 생각나요."
’잡초’를 시작으로 그의 영화는 많이 바뀌었다. 미국영화를 답습하려 했던 그는 한국적인 영화를 찍는데 몰두했다.
임 감독은 "내 영화를 미국영화의 2,3류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미국영화를 따라간다는 건 가망이 없는 욕심이라는 걸 알았다"면서 "한국 사람의 삶과 문화적 개성, 우리의 수난사가 있는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영화의 가장 암흑기가 70년대라고 하는데 나는 그 시대를 잘 보냈다. 내가 찍은 영화가 상을 많이 타면 제작사는 외화를 수입할 수 있었으니 흥행은 안 돼도 영화를 찍으면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화의 때를 빼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 미국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너무 재미없는 영화가 됐다"면서 "체질 개선은 좋은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영화를 오래 한다는 건 말짱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작품성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걸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적인 개성을 충실히 담아내려 한 그의 영화는 ’만다라’(1981)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유수 영화제의 단골손님이 됐으며 ’취화선’(2002)으로는 칸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100편의 영화 가운데 그에게 소중한 작품은 무엇일까. 대표작이나 애착이 가는 작품을 얘기하지 않는 감독이나 배우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유를 많이 대지만 임 감독은 뜻밖에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찍었으면 자랑도 할 텐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자랑할만한 작품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제 작품은 시사 끝나면 그 뒤로 다시는 잘 안 봐요. 보고 있으면 열 받는 게 많아서죠. 왜 그때 저 수준으로 찍었는가 생각하면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만족할 영화는 못 찍고 죽을 거란 걸 알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활발하게 영화를 찍는 감독들은 주로 30~40대고 50대 이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70대 중반의 임 감독이 좋은 영화를 꾸준하게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더러는 내가 영화를 잘 만들어서 히트도 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됐어요. 관객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지 나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란 거죠. 저는 재수도 참 좋고 참으로 순탄하고 복 받은 영화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영화인생을 얘기하는 그의 표정에는 행복한 추억이 서린 듯했다. 노장 감독의 바람은 소박하다. "훈훈하고 재미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란다.
언제나 영화만을 생각하는 그는 별다른 취미도 없다고 한다. "우리 집사람 얘기론 내가 집에 있어도 혼은 떠돈다고 그래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권택 감독 “복 받은 영화인생 살았어요”
-
- 입력 2010-08-08 12:50:16

"제 영화 70편을 튼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10년 사이에 50편을 찍었는데 부끄러운 과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년에 5편씩 했으니 얼마나 날치기로 막 찍었겠어요. 그땐 개봉해서 한 번 보고 다시는 본 적이 없는 필름들이에요. 이번에 내가 무슨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지 봐야 알겠어요."
한국이 낳은 영화 거장 임권택 감독은 최근 후반작업을 진행한 신작 ’달빛 길어올리기’를 빼면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부터 ’천년학’(2006)까지 100편의 영화를 남겼다. 한국영상자료원이 12일부터 10월3일까지 여는 ’임권택 감독 전작 展’에서는 100편 가운데 필름으로 남아있는 70편이 무료로 상영되며 특히 ’만다라’(1981)는 디지털 복원판이 처음 공개된다.
영상자료원은 이만희, 김기영, 유현목 등 작고한 감독들의 전작전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생존한 감독의 전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전을 앞두고 최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난 임권택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전부를 관객들에게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초기작에 대한 평가가 박했다.
"액션, 사극, 멜로, 코미디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주문이 오면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닥치는 대로 한 거죠. 시나리오 고쳐가면서요."
영화 1편을 완성하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 요즘 상황으로 보면 1년에 5편꼴로 찍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저도 거짓말 같은데 타이틀 보면 제가 찍었더라고요. 언제까지 한 영화를 끝내겠다고 예정하면 다음 작품은 언제 들어갈지 미리 정하죠. 그런데 스케줄이 엉키고 하면 뒤 작품과 겹치기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초기작 50편에 대해 "흥미로운 픽션을 꾸며서 흥행을 시키는 영화로 우리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면서 "그때는 좋은 작품을 찍어서 후세에 남기겠다는 야망은 없었다. 살기 힘든데 싸구려 감독으로서 생활의 방편으로 찍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런 작품이 그의 영화세계의 밑거름이 됐음은 당연하다. 임 감독도 "좋은 영화가 됐든 나쁜 영화가 됐든 필사적으로 정신없이 찍었다"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감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 같은 게 그 시대에 쌓인 게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임 감독은 호적에는 1936년생이지만 실제는 1934년생으로 올해 76세다. 1962년 젊은 나이인 26세에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했지만 그가 자신의 첫 작품으로 생각하는 영화는 따로 있다.
"나이 들면서 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내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내 인생을 소모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각성을 했죠. 거짓말 좀 그만하고 삶과 닿아있는 영화를 찍자는 생각을 했어요."
임 감독이 자신의 첫 영화로 꼽은 영화는 1973년작 ’잡초’다. 자신이 직접 제작까지 맡은 영화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한 여자가 해방과 6.25 전쟁을 지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찍어야 하는데 그런 재미없는 소재에 누가 돈을 댔겠어요. 제작자가 나서지 않아 직접 제작을 했어요. 흥행에서는 왕창 망했죠. 그래도 한 가지 큰 소득은 있었어요. 임아무개가 흥행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영화도 찍는 감독이구나 하는 인식을 영화계에 심어줬다는 거죠."
이번 전작전에서는 그의 초기작들도 대거 상영되지만 ’잡초’는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게도 그 영화는 볼 수 없다.
"내가 제작자면서도 필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개봉이 끝나면 관심이 없었던 땐데 안 그랬으면 챙겨놨을 거에요. 나로서는 영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었는데 그 소중한 작품을 잃어버렸으니…. 너무 오래전 얘긴데 지금도 그 영화 몇 군데는 생각나요."
’잡초’를 시작으로 그의 영화는 많이 바뀌었다. 미국영화를 답습하려 했던 그는 한국적인 영화를 찍는데 몰두했다.
임 감독은 "내 영화를 미국영화의 2,3류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미국영화를 따라간다는 건 가망이 없는 욕심이라는 걸 알았다"면서 "한국 사람의 삶과 문화적 개성, 우리의 수난사가 있는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영화의 가장 암흑기가 70년대라고 하는데 나는 그 시대를 잘 보냈다. 내가 찍은 영화가 상을 많이 타면 제작사는 외화를 수입할 수 있었으니 흥행은 안 돼도 영화를 찍으면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화의 때를 빼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 미국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너무 재미없는 영화가 됐다"면서 "체질 개선은 좋은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영화를 오래 한다는 건 말짱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작품성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걸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적인 개성을 충실히 담아내려 한 그의 영화는 ’만다라’(1981)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유수 영화제의 단골손님이 됐으며 ’취화선’(2002)으로는 칸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100편의 영화 가운데 그에게 소중한 작품은 무엇일까. 대표작이나 애착이 가는 작품을 얘기하지 않는 감독이나 배우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유를 많이 대지만 임 감독은 뜻밖에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찍었으면 자랑도 할 텐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자랑할만한 작품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제 작품은 시사 끝나면 그 뒤로 다시는 잘 안 봐요. 보고 있으면 열 받는 게 많아서죠. 왜 그때 저 수준으로 찍었는가 생각하면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만족할 영화는 못 찍고 죽을 거란 걸 알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활발하게 영화를 찍는 감독들은 주로 30~40대고 50대 이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70대 중반의 임 감독이 좋은 영화를 꾸준하게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더러는 내가 영화를 잘 만들어서 히트도 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됐어요. 관객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지 나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란 거죠. 저는 재수도 참 좋고 참으로 순탄하고 복 받은 영화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영화인생을 얘기하는 그의 표정에는 행복한 추억이 서린 듯했다. 노장 감독의 바람은 소박하다. "훈훈하고 재미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란다.
언제나 영화만을 생각하는 그는 별다른 취미도 없다고 한다. "우리 집사람 얘기론 내가 집에 있어도 혼은 떠돈다고 그래요."
한국이 낳은 영화 거장 임권택 감독은 최근 후반작업을 진행한 신작 ’달빛 길어올리기’를 빼면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부터 ’천년학’(2006)까지 100편의 영화를 남겼다. 한국영상자료원이 12일부터 10월3일까지 여는 ’임권택 감독 전작 展’에서는 100편 가운데 필름으로 남아있는 70편이 무료로 상영되며 특히 ’만다라’(1981)는 디지털 복원판이 처음 공개된다.
영상자료원은 이만희, 김기영, 유현목 등 작고한 감독들의 전작전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생존한 감독의 전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전을 앞두고 최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난 임권택 감독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전부를 관객들에게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 쑥스러워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초기작에 대한 평가가 박했다.
"액션, 사극, 멜로, 코미디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주문이 오면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닥치는 대로 한 거죠. 시나리오 고쳐가면서요."
영화 1편을 완성하는데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 요즘 상황으로 보면 1년에 5편꼴로 찍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저도 거짓말 같은데 타이틀 보면 제가 찍었더라고요. 언제까지 한 영화를 끝내겠다고 예정하면 다음 작품은 언제 들어갈지 미리 정하죠. 그런데 스케줄이 엉키고 하면 뒤 작품과 겹치기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는 초기작 50편에 대해 "흥미로운 픽션을 꾸며서 흥행을 시키는 영화로 우리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면서 "그때는 좋은 작품을 찍어서 후세에 남기겠다는 야망은 없었다. 살기 힘든데 싸구려 감독으로서 생활의 방편으로 찍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런 작품이 그의 영화세계의 밑거름이 됐음은 당연하다. 임 감독도 "좋은 영화가 됐든 나쁜 영화가 됐든 필사적으로 정신없이 찍었다"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감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 같은 게 그 시대에 쌓인 게 아니겠나 싶다"고 했다.
임 감독은 호적에는 1936년생이지만 실제는 1934년생으로 올해 76세다. 1962년 젊은 나이인 26세에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했지만 그가 자신의 첫 작품으로 생각하는 영화는 따로 있다.
"나이 들면서 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내가 이런 영화를 찍으면서 내 인생을 소모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각성을 했죠. 거짓말 좀 그만하고 삶과 닿아있는 영화를 찍자는 생각을 했어요."
임 감독이 자신의 첫 영화로 꼽은 영화는 1973년작 ’잡초’다. 자신이 직접 제작까지 맡은 영화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한 여자가 해방과 6.25 전쟁을 지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찍어야 하는데 그런 재미없는 소재에 누가 돈을 댔겠어요. 제작자가 나서지 않아 직접 제작을 했어요. 흥행에서는 왕창 망했죠. 그래도 한 가지 큰 소득은 있었어요. 임아무개가 흥행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영화도 찍는 감독이구나 하는 인식을 영화계에 심어줬다는 거죠."
이번 전작전에서는 그의 초기작들도 대거 상영되지만 ’잡초’는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아쉽게도 그 영화는 볼 수 없다.
"내가 제작자면서도 필름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개봉이 끝나면 관심이 없었던 땐데 안 그랬으면 챙겨놨을 거에요. 나로서는 영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시작이었는데 그 소중한 작품을 잃어버렸으니…. 너무 오래전 얘긴데 지금도 그 영화 몇 군데는 생각나요."
’잡초’를 시작으로 그의 영화는 많이 바뀌었다. 미국영화를 답습하려 했던 그는 한국적인 영화를 찍는데 몰두했다.
임 감독은 "내 영화를 미국영화의 2,3류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미국영화를 따라간다는 건 가망이 없는 욕심이라는 걸 알았다"면서 "한국 사람의 삶과 문화적 개성, 우리의 수난사가 있는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영화의 가장 암흑기가 70년대라고 하는데 나는 그 시대를 잘 보냈다. 내가 찍은 영화가 상을 많이 타면 제작사는 외화를 수입할 수 있었으니 흥행은 안 돼도 영화를 찍으면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화의 때를 빼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 미국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너무 재미없는 영화가 됐다"면서 "체질 개선은 좋은데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영화를 오래 한다는 건 말짱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작품성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걸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적인 개성을 충실히 담아내려 한 그의 영화는 ’만다라’(1981)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유수 영화제의 단골손님이 됐으며 ’취화선’(2002)으로는 칸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다.
100편의 영화 가운데 그에게 소중한 작품은 무엇일까. 대표작이나 애착이 가는 작품을 얘기하지 않는 감독이나 배우들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유를 많이 대지만 임 감독은 뜻밖에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찍었으면 자랑도 할 텐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자랑할만한 작품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제 작품은 시사 끝나면 그 뒤로 다시는 잘 안 봐요. 보고 있으면 열 받는 게 많아서죠. 왜 그때 저 수준으로 찍었는가 생각하면 괴로워요. 죽을 때까지 만족할 영화는 못 찍고 죽을 거란 걸 알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활발하게 영화를 찍는 감독들은 주로 30~40대고 50대 이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70대 중반의 임 감독이 좋은 영화를 꾸준하게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더러는 내가 영화를 잘 만들어서 히트도 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됐어요. 관객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지 나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란 거죠. 저는 재수도 참 좋고 참으로 순탄하고 복 받은 영화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영화인생을 얘기하는 그의 표정에는 행복한 추억이 서린 듯했다. 노장 감독의 바람은 소박하다. "훈훈하고 재미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란다.
언제나 영화만을 생각하는 그는 별다른 취미도 없다고 한다. "우리 집사람 얘기론 내가 집에 있어도 혼은 떠돈다고 그래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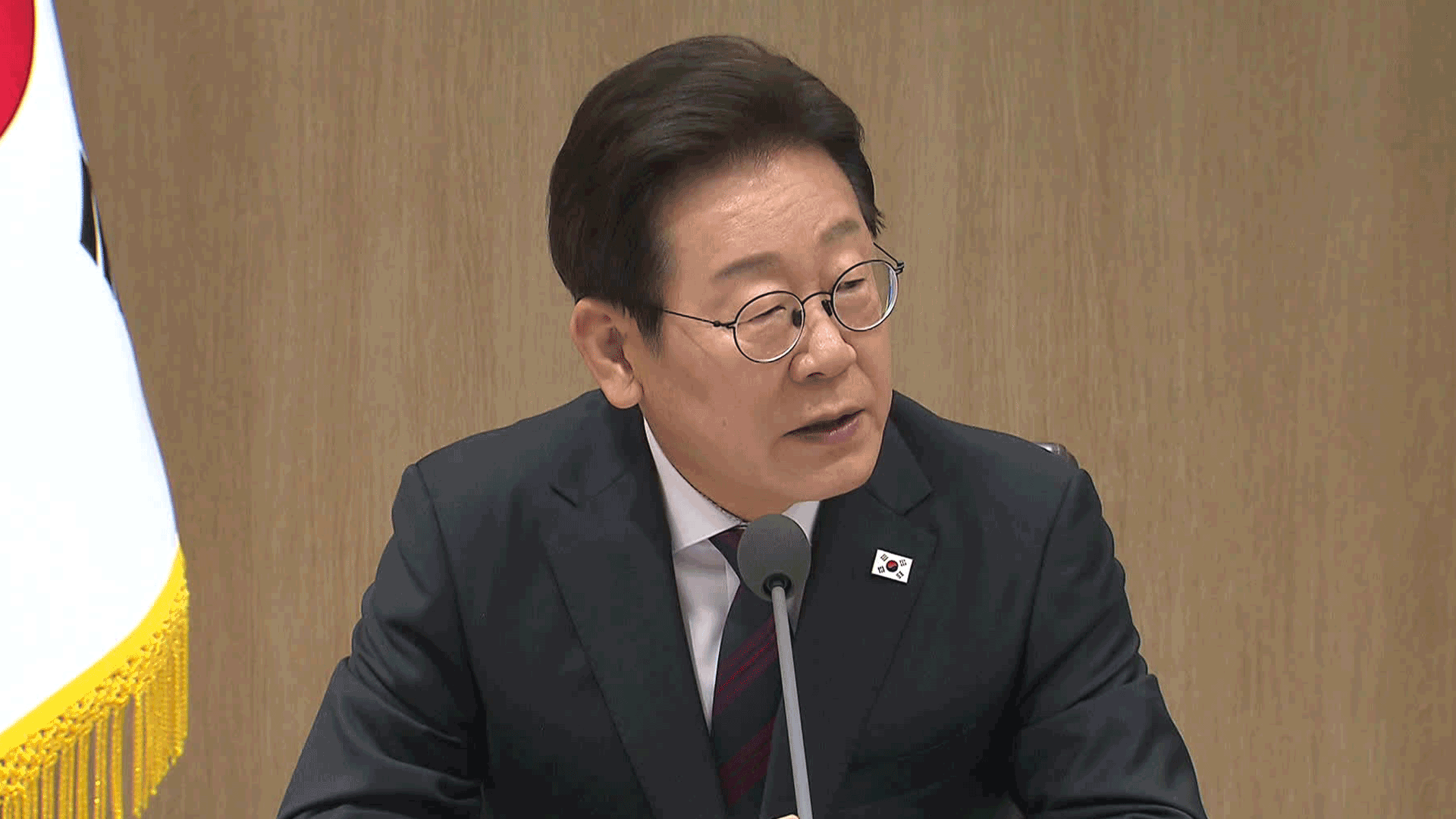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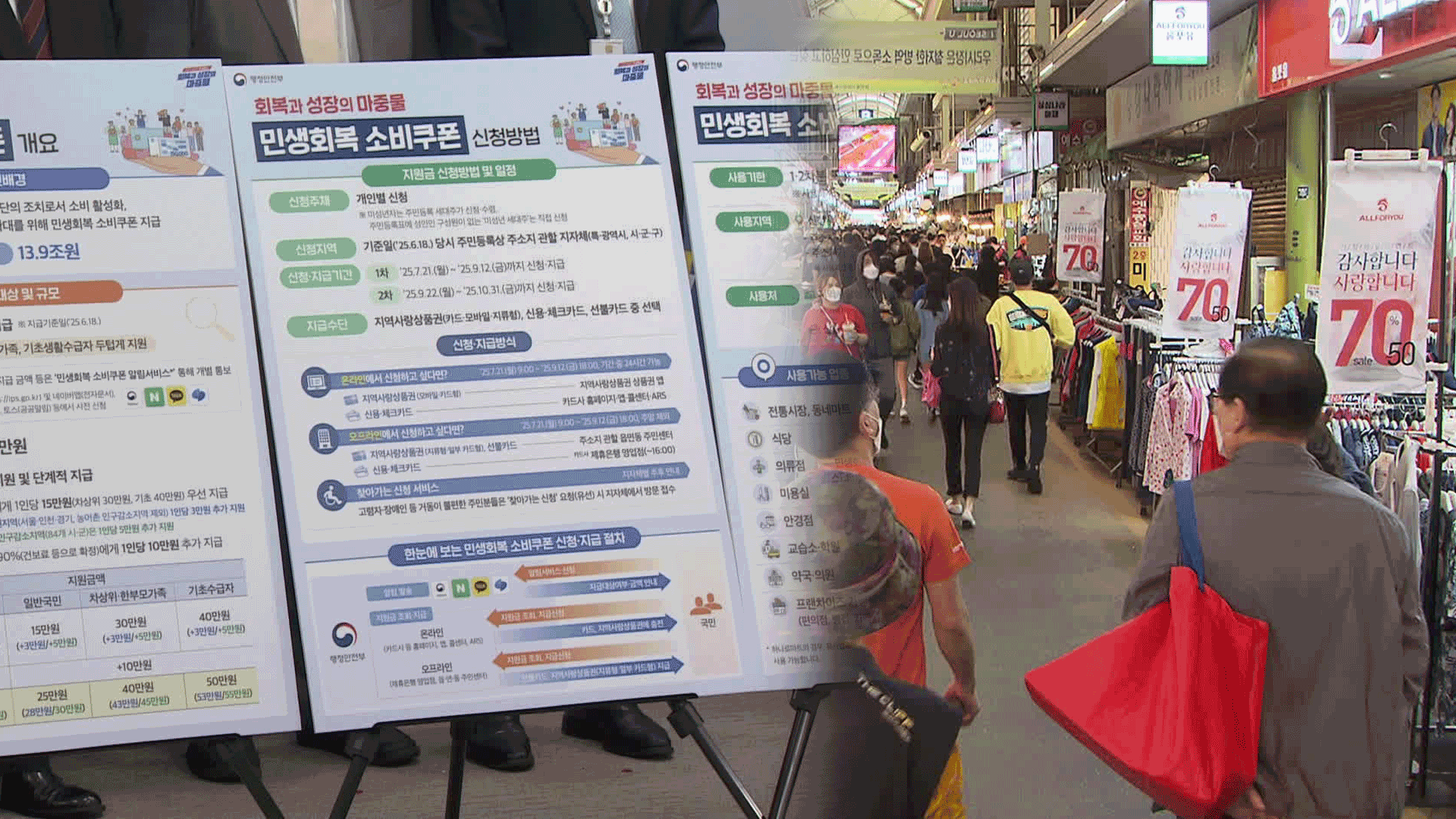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