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애 “내 음악은 호기심·우연·시대의 결과”
입력 2010.11.23 (20:14)
수정 2010.11.23 (2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지난해까지 진행한 라디오 방송은 처음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한 극기 훈련이었죠."
파란 점퍼 차림에 머리를 질끈 동여맨 한영애는 2003년 이후 언론 인터뷰가 드물었다는 말에 이렇게 에둘러 말했다.
최근 마포구 합정동의 한 지하 연습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그는 26-28일 대학로 극장 ’이다’에서 올릴 ’발라드 인(in) 한영애’ 공연 준비에 한창이었다.
화장기 없이 내추럴한 모습은 ’시크한’ 눈매가 뿜어내던 카리스마를 감춰줬다. 낮고 느린 음색도 ’소리의 마녀’란 별명이 주던 거리감을 한뼘 좁혔다.
1976년 이정선, 이주호, 김영미와 함께 혼성그룹 해바라기 1집으로 데뷔한 한영애는 1986년 솔로 1집 ’여울목’을 냈고 신촌블루스 객원 보컬로도 참여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포크와 블루스, 록과 테크노, 트로트까지 넘나들며 왕성한 음악 식탐을 보여줬다. 통기타 시절엔 ’한국의 멜라니 사프카’, 록을 선보일 땐 ’한국의 재니스 조플린’으로도 불렸다.
"제 음악의 장르가 다양했던 건 ’호기심 반, 우연 반, 시대 흐름 반’ 때문이죠. 가수이니 세상에 만들어진 리듬은 다 타보고 싶어요. 그저 그 때문이지,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는 건 글쓰는 분들이 편리하게 붙인 말이죠."
그럼에도 이번 공연 제목에는 ’발라드’라는 장르가 따라붙었다.
한영애는 "공연기획자의 아이디어였는데 세상에 좋은 발라드가 많고 가을이고 먼저 간 친구들이 생각나서 발라드 비중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누구 없소?’ ’불어오라 바람아’ ’코뿔소’ 등 새롭게 편곡한 자신의 대표곡을 비롯해 요절한 동료 유재하, 김현식,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를 들려준다.
한영애는 이들 동료에 대한 기억을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로 얘기했다.
"유재하는 목이 길고 굵어 슬퍼보였죠. 김현식은 방랑인, 자유인 같았고요. 이영훈은 고독해보였어요. 각기 개성이 다른 세 친구였죠. 구태여 제가 이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노래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음악인들이죠."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를 여는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가 제단(祭壇)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지금도 첫곡의 네소절이 지나야 그 떨림이 가라앉는다고.
그는 "자신감 결여 탓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 대한 책임감, 내 경험을 관객과 진실되게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그는 천성적으로 ’무대 체질’은 아니다. 중학교 시절 언니와 라디오에 심취해 기타를 쳐보자며 저금통을 뜯어 3천원으로 클래식 기타를 샀을 때도, 아버지가 소개해준 기타 선생님 앞에서 A코드와 C코드만 잡고 노래를 불렀을 때도 가수가 꿈은 아니었다.
여고 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숫기 없는 학생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애였는데 국군장병 위문 공연 때는 학교 대표로 노래했고, 합창경연 때는 지휘자로 뽑혔다"며 "대학 재수 시절 DJ가 있는 카페에 음악을 들으러 다녔는데 한번은 DJ의 부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후 심심하면 그곳에서 노래도 했다. 그때 신촌에 이상한 소리를 가진 애가 있다고 소문이 났다. 매니저란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다"고 웃었다.
그가 자신의 의지로 가수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한 건 솔로로 데뷔하면서부터다. 해바라기로 데뷔한 후 솔로 1집을 내기 전까지 그는 8년간 연극에 빠져있었다.
"해바라기 시절 록을 하고 싶은데 우린 통기타 그룹이었죠. 이때 창작극 제의가 들어왔는데 음악이 록이었어요. 연출가가 ’당신 같은 사람이 연극해야 한다’길래 신이 났죠. 맨발로 록을 노래하며 춤을 추니 연극에 푹 빠져버렸어요. 1977년 ’더치 맨’ 조연을 거쳐 1978년 ’영원한 디올라’ 때는 주인공까지 맡게 되자 연극 무대에 세뇌됐죠."
연극과 음악 중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그에게 길을 안내한 건 이정선이었다. "노래를 해야지. 노래할 사람이 왜 방황을 하나"라는 이정선의 말이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가수로 돌아온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음반은 ’누구 없소?’가 담긴 2집 ’바라본다’다. 1988년 발표한 2집은 프로듀서 송홍섭을 만나 작업했다.
그는 "2집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다는 건 8년가량 흘러 알았다"며 "1988-89년에는 카페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내 노래가 나왔다더라. 당시 ’젊음의 행진’을 통으로 출연했는데, 그 비디오가 카페마다 걸려있었다더라"고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한영애는 자신이 오랜 시간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건 희로애락을 아우른 삶에 대한 사랑, 애정 덕택이라고 했다. 또 세상에 단 한명의 관객이 비록 마지막에 자신일 될 때까지 무대에 오를 것이기에 지금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했다.
"서울예대 재학 시절부터 저를 본 서울예대 총장님을 얼마 전 뵀는데 ’TV에서 널 봤는데 너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아 신선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년수가 길면 뭘해요. 스스로 납득될 정도로 음악을 잘하진 못하는데요. 도대체 저는 언제쯤 다 발전해서 만개하는거죠?"
파란 점퍼 차림에 머리를 질끈 동여맨 한영애는 2003년 이후 언론 인터뷰가 드물었다는 말에 이렇게 에둘러 말했다.
최근 마포구 합정동의 한 지하 연습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그는 26-28일 대학로 극장 ’이다’에서 올릴 ’발라드 인(in) 한영애’ 공연 준비에 한창이었다.
화장기 없이 내추럴한 모습은 ’시크한’ 눈매가 뿜어내던 카리스마를 감춰줬다. 낮고 느린 음색도 ’소리의 마녀’란 별명이 주던 거리감을 한뼘 좁혔다.
1976년 이정선, 이주호, 김영미와 함께 혼성그룹 해바라기 1집으로 데뷔한 한영애는 1986년 솔로 1집 ’여울목’을 냈고 신촌블루스 객원 보컬로도 참여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포크와 블루스, 록과 테크노, 트로트까지 넘나들며 왕성한 음악 식탐을 보여줬다. 통기타 시절엔 ’한국의 멜라니 사프카’, 록을 선보일 땐 ’한국의 재니스 조플린’으로도 불렸다.
"제 음악의 장르가 다양했던 건 ’호기심 반, 우연 반, 시대 흐름 반’ 때문이죠. 가수이니 세상에 만들어진 리듬은 다 타보고 싶어요. 그저 그 때문이지,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는 건 글쓰는 분들이 편리하게 붙인 말이죠."
그럼에도 이번 공연 제목에는 ’발라드’라는 장르가 따라붙었다.
한영애는 "공연기획자의 아이디어였는데 세상에 좋은 발라드가 많고 가을이고 먼저 간 친구들이 생각나서 발라드 비중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누구 없소?’ ’불어오라 바람아’ ’코뿔소’ 등 새롭게 편곡한 자신의 대표곡을 비롯해 요절한 동료 유재하, 김현식,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를 들려준다.
한영애는 이들 동료에 대한 기억을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로 얘기했다.
"유재하는 목이 길고 굵어 슬퍼보였죠. 김현식은 방랑인, 자유인 같았고요. 이영훈은 고독해보였어요. 각기 개성이 다른 세 친구였죠. 구태여 제가 이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노래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음악인들이죠."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를 여는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가 제단(祭壇)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지금도 첫곡의 네소절이 지나야 그 떨림이 가라앉는다고.
그는 "자신감 결여 탓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 대한 책임감, 내 경험을 관객과 진실되게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그는 천성적으로 ’무대 체질’은 아니다. 중학교 시절 언니와 라디오에 심취해 기타를 쳐보자며 저금통을 뜯어 3천원으로 클래식 기타를 샀을 때도, 아버지가 소개해준 기타 선생님 앞에서 A코드와 C코드만 잡고 노래를 불렀을 때도 가수가 꿈은 아니었다.
여고 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숫기 없는 학생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애였는데 국군장병 위문 공연 때는 학교 대표로 노래했고, 합창경연 때는 지휘자로 뽑혔다"며 "대학 재수 시절 DJ가 있는 카페에 음악을 들으러 다녔는데 한번은 DJ의 부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후 심심하면 그곳에서 노래도 했다. 그때 신촌에 이상한 소리를 가진 애가 있다고 소문이 났다. 매니저란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다"고 웃었다.
그가 자신의 의지로 가수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한 건 솔로로 데뷔하면서부터다. 해바라기로 데뷔한 후 솔로 1집을 내기 전까지 그는 8년간 연극에 빠져있었다.
"해바라기 시절 록을 하고 싶은데 우린 통기타 그룹이었죠. 이때 창작극 제의가 들어왔는데 음악이 록이었어요. 연출가가 ’당신 같은 사람이 연극해야 한다’길래 신이 났죠. 맨발로 록을 노래하며 춤을 추니 연극에 푹 빠져버렸어요. 1977년 ’더치 맨’ 조연을 거쳐 1978년 ’영원한 디올라’ 때는 주인공까지 맡게 되자 연극 무대에 세뇌됐죠."
연극과 음악 중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그에게 길을 안내한 건 이정선이었다. "노래를 해야지. 노래할 사람이 왜 방황을 하나"라는 이정선의 말이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가수로 돌아온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음반은 ’누구 없소?’가 담긴 2집 ’바라본다’다. 1988년 발표한 2집은 프로듀서 송홍섭을 만나 작업했다.
그는 "2집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다는 건 8년가량 흘러 알았다"며 "1988-89년에는 카페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내 노래가 나왔다더라. 당시 ’젊음의 행진’을 통으로 출연했는데, 그 비디오가 카페마다 걸려있었다더라"고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한영애는 자신이 오랜 시간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건 희로애락을 아우른 삶에 대한 사랑, 애정 덕택이라고 했다. 또 세상에 단 한명의 관객이 비록 마지막에 자신일 될 때까지 무대에 오를 것이기에 지금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했다.
"서울예대 재학 시절부터 저를 본 서울예대 총장님을 얼마 전 뵀는데 ’TV에서 널 봤는데 너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아 신선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년수가 길면 뭘해요. 스스로 납득될 정도로 음악을 잘하진 못하는데요. 도대체 저는 언제쯤 다 발전해서 만개하는거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영애 “내 음악은 호기심·우연·시대의 결과”
-
- 입력 2010-11-23 20:14:12
- 수정2010-11-23 20:16:49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지난해까지 진행한 라디오 방송은 처음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한 극기 훈련이었죠."
파란 점퍼 차림에 머리를 질끈 동여맨 한영애는 2003년 이후 언론 인터뷰가 드물었다는 말에 이렇게 에둘러 말했다.
최근 마포구 합정동의 한 지하 연습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그는 26-28일 대학로 극장 ’이다’에서 올릴 ’발라드 인(in) 한영애’ 공연 준비에 한창이었다.
화장기 없이 내추럴한 모습은 ’시크한’ 눈매가 뿜어내던 카리스마를 감춰줬다. 낮고 느린 음색도 ’소리의 마녀’란 별명이 주던 거리감을 한뼘 좁혔다.
1976년 이정선, 이주호, 김영미와 함께 혼성그룹 해바라기 1집으로 데뷔한 한영애는 1986년 솔로 1집 ’여울목’을 냈고 신촌블루스 객원 보컬로도 참여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포크와 블루스, 록과 테크노, 트로트까지 넘나들며 왕성한 음악 식탐을 보여줬다. 통기타 시절엔 ’한국의 멜라니 사프카’, 록을 선보일 땐 ’한국의 재니스 조플린’으로도 불렸다.
"제 음악의 장르가 다양했던 건 ’호기심 반, 우연 반, 시대 흐름 반’ 때문이죠. 가수이니 세상에 만들어진 리듬은 다 타보고 싶어요. 그저 그 때문이지,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는 건 글쓰는 분들이 편리하게 붙인 말이죠."
그럼에도 이번 공연 제목에는 ’발라드’라는 장르가 따라붙었다.
한영애는 "공연기획자의 아이디어였는데 세상에 좋은 발라드가 많고 가을이고 먼저 간 친구들이 생각나서 발라드 비중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누구 없소?’ ’불어오라 바람아’ ’코뿔소’ 등 새롭게 편곡한 자신의 대표곡을 비롯해 요절한 동료 유재하, 김현식,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를 들려준다.
한영애는 이들 동료에 대한 기억을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로 얘기했다.
"유재하는 목이 길고 굵어 슬퍼보였죠. 김현식은 방랑인, 자유인 같았고요. 이영훈은 고독해보였어요. 각기 개성이 다른 세 친구였죠. 구태여 제가 이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노래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음악인들이죠."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를 여는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가 제단(祭壇)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지금도 첫곡의 네소절이 지나야 그 떨림이 가라앉는다고.
그는 "자신감 결여 탓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 대한 책임감, 내 경험을 관객과 진실되게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그는 천성적으로 ’무대 체질’은 아니다. 중학교 시절 언니와 라디오에 심취해 기타를 쳐보자며 저금통을 뜯어 3천원으로 클래식 기타를 샀을 때도, 아버지가 소개해준 기타 선생님 앞에서 A코드와 C코드만 잡고 노래를 불렀을 때도 가수가 꿈은 아니었다.
여고 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숫기 없는 학생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애였는데 국군장병 위문 공연 때는 학교 대표로 노래했고, 합창경연 때는 지휘자로 뽑혔다"며 "대학 재수 시절 DJ가 있는 카페에 음악을 들으러 다녔는데 한번은 DJ의 부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후 심심하면 그곳에서 노래도 했다. 그때 신촌에 이상한 소리를 가진 애가 있다고 소문이 났다. 매니저란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다"고 웃었다.
그가 자신의 의지로 가수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한 건 솔로로 데뷔하면서부터다. 해바라기로 데뷔한 후 솔로 1집을 내기 전까지 그는 8년간 연극에 빠져있었다.
"해바라기 시절 록을 하고 싶은데 우린 통기타 그룹이었죠. 이때 창작극 제의가 들어왔는데 음악이 록이었어요. 연출가가 ’당신 같은 사람이 연극해야 한다’길래 신이 났죠. 맨발로 록을 노래하며 춤을 추니 연극에 푹 빠져버렸어요. 1977년 ’더치 맨’ 조연을 거쳐 1978년 ’영원한 디올라’ 때는 주인공까지 맡게 되자 연극 무대에 세뇌됐죠."
연극과 음악 중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그에게 길을 안내한 건 이정선이었다. "노래를 해야지. 노래할 사람이 왜 방황을 하나"라는 이정선의 말이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가수로 돌아온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음반은 ’누구 없소?’가 담긴 2집 ’바라본다’다. 1988년 발표한 2집은 프로듀서 송홍섭을 만나 작업했다.
그는 "2집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다는 건 8년가량 흘러 알았다"며 "1988-89년에는 카페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내 노래가 나왔다더라. 당시 ’젊음의 행진’을 통으로 출연했는데, 그 비디오가 카페마다 걸려있었다더라"고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한영애는 자신이 오랜 시간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건 희로애락을 아우른 삶에 대한 사랑, 애정 덕택이라고 했다. 또 세상에 단 한명의 관객이 비록 마지막에 자신일 될 때까지 무대에 오를 것이기에 지금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했다.
"서울예대 재학 시절부터 저를 본 서울예대 총장님을 얼마 전 뵀는데 ’TV에서 널 봤는데 너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아 신선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년수가 길면 뭘해요. 스스로 납득될 정도로 음악을 잘하진 못하는데요. 도대체 저는 언제쯤 다 발전해서 만개하는거죠?"
파란 점퍼 차림에 머리를 질끈 동여맨 한영애는 2003년 이후 언론 인터뷰가 드물었다는 말에 이렇게 에둘러 말했다.
최근 마포구 합정동의 한 지하 연습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그는 26-28일 대학로 극장 ’이다’에서 올릴 ’발라드 인(in) 한영애’ 공연 준비에 한창이었다.
화장기 없이 내추럴한 모습은 ’시크한’ 눈매가 뿜어내던 카리스마를 감춰줬다. 낮고 느린 음색도 ’소리의 마녀’란 별명이 주던 거리감을 한뼘 좁혔다.
1976년 이정선, 이주호, 김영미와 함께 혼성그룹 해바라기 1집으로 데뷔한 한영애는 1986년 솔로 1집 ’여울목’을 냈고 신촌블루스 객원 보컬로도 참여했다. 그는 30여년 동안 포크와 블루스, 록과 테크노, 트로트까지 넘나들며 왕성한 음악 식탐을 보여줬다. 통기타 시절엔 ’한국의 멜라니 사프카’, 록을 선보일 땐 ’한국의 재니스 조플린’으로도 불렸다.
"제 음악의 장르가 다양했던 건 ’호기심 반, 우연 반, 시대 흐름 반’ 때문이죠. 가수이니 세상에 만들어진 리듬은 다 타보고 싶어요. 그저 그 때문이지, 여러 장르를 섭렵했다는 건 글쓰는 분들이 편리하게 붙인 말이죠."
그럼에도 이번 공연 제목에는 ’발라드’라는 장르가 따라붙었다.
한영애는 "공연기획자의 아이디어였는데 세상에 좋은 발라드가 많고 가을이고 먼저 간 친구들이 생각나서 발라드 비중이 늘어난 것 뿐"이라고 덤덤히 말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누구 없소?’ ’불어오라 바람아’ ’코뿔소’ 등 새롭게 편곡한 자신의 대표곡을 비롯해 요절한 동료 유재하, 김현식, 작곡가 이영훈의 노래를 들려준다.
한영애는 이들 동료에 대한 기억을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로 얘기했다.
"유재하는 목이 길고 굵어 슬퍼보였죠. 김현식은 방랑인, 자유인 같았고요. 이영훈은 고독해보였어요. 각기 개성이 다른 세 친구였죠. 구태여 제가 이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노래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음악인들이죠."
오랜만에 단독 콘서트를 여는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가 제단(祭壇)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지금도 첫곡의 네소절이 지나야 그 떨림이 가라앉는다고.
그는 "자신감 결여 탓이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 대한 책임감, 내 경험을 관객과 진실되게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그는 천성적으로 ’무대 체질’은 아니다. 중학교 시절 언니와 라디오에 심취해 기타를 쳐보자며 저금통을 뜯어 3천원으로 클래식 기타를 샀을 때도, 아버지가 소개해준 기타 선생님 앞에서 A코드와 C코드만 잡고 노래를 불렀을 때도 가수가 꿈은 아니었다.
여고 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숫기 없는 학생이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애였는데 국군장병 위문 공연 때는 학교 대표로 노래했고, 합창경연 때는 지휘자로 뽑혔다"며 "대학 재수 시절 DJ가 있는 카페에 음악을 들으러 다녔는데 한번은 DJ의 부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후 심심하면 그곳에서 노래도 했다. 그때 신촌에 이상한 소리를 가진 애가 있다고 소문이 났다. 매니저란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다"고 웃었다.
그가 자신의 의지로 가수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한 건 솔로로 데뷔하면서부터다. 해바라기로 데뷔한 후 솔로 1집을 내기 전까지 그는 8년간 연극에 빠져있었다.
"해바라기 시절 록을 하고 싶은데 우린 통기타 그룹이었죠. 이때 창작극 제의가 들어왔는데 음악이 록이었어요. 연출가가 ’당신 같은 사람이 연극해야 한다’길래 신이 났죠. 맨발로 록을 노래하며 춤을 추니 연극에 푹 빠져버렸어요. 1977년 ’더치 맨’ 조연을 거쳐 1978년 ’영원한 디올라’ 때는 주인공까지 맡게 되자 연극 무대에 세뇌됐죠."
연극과 음악 중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그에게 길을 안내한 건 이정선이었다. "노래를 해야지. 노래할 사람이 왜 방황을 하나"라는 이정선의 말이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가수로 돌아온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음반은 ’누구 없소?’가 담긴 2집 ’바라본다’다. 1988년 발표한 2집은 프로듀서 송홍섭을 만나 작업했다.
그는 "2집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다는 건 8년가량 흘러 알았다"며 "1988-89년에는 카페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내 노래가 나왔다더라. 당시 ’젊음의 행진’을 통으로 출연했는데, 그 비디오가 카페마다 걸려있었다더라"고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한영애는 자신이 오랜 시간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건 희로애락을 아우른 삶에 대한 사랑, 애정 덕택이라고 했다. 또 세상에 단 한명의 관객이 비록 마지막에 자신일 될 때까지 무대에 오를 것이기에 지금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했다.
"서울예대 재학 시절부터 저를 본 서울예대 총장님을 얼마 전 뵀는데 ’TV에서 널 봤는데 너는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많아 신선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년수가 길면 뭘해요. 스스로 납득될 정도로 음악을 잘하진 못하는데요. 도대체 저는 언제쯤 다 발전해서 만개하는거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김민석 총리,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농성장 방문](/data/news/2025/07/03/20250703_YUTdgQ.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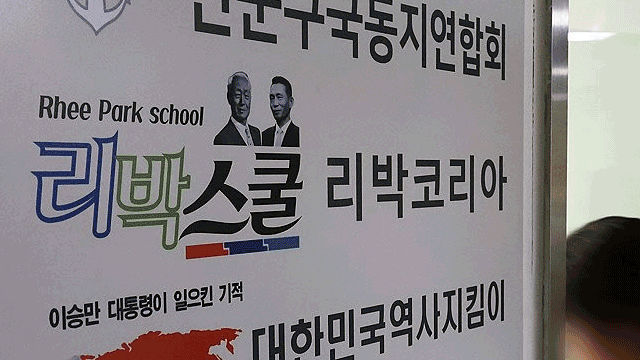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