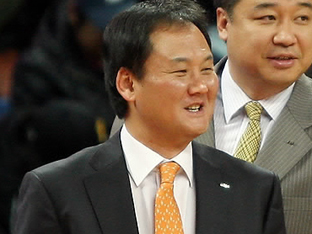
역대 최다승 363승…"잘릴 뻔한 위기도 있었죠"
’만수’ 유재학(48·모비스) 감독이 프로농구 15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26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74-58로 이긴 유재학 감독은 프로 통산 정규리그 363승을 기록해 신선우 전 SK 감독이 갖고 있던 종전 감독 최다승인 362승을 뛰어넘었다.
경복고와 연세대를 나온 유 감독은 실업 기아산업에서 뛰었으며 현역 시절 ’컴퓨터 가드’로 불리며 특유의 재치있는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일찌감치 지도자로 대성할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
’수가 만 가지’라는 뜻의 별명 ’만수’도 어쩌면 선수 때 이미 그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
1993년 모교인 연세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7년 전자랜드 농구단의 전신 대우 코치를 맡았고 1998-1999시즌부터 대우 감독으로 정식 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대우가 신세기, SK, 전자랜드로 주인이 바뀌는 동안 계속 사령탑을 맡았던 유 감독은 2004-2005시즌부터 모비스로 자리를 옮겨 8년째 이 팀을 지휘하고 있다.
363승(330패)은 693경기, 13년 15일 만에 세운 금자탑이다. 362승을 기록한 신선우 전 감독은 656경기째, 14년 1개월4일 만에 세운 것에 비하면 경기 수는 더 많지만 기간은 짧았다.
또 신 전 감독이 55세 때 362승을 달성한 것보다 7년 가까이 빠르게 363승 고지를 밟은 셈이다.
유 감독은 "오래 하다 보니 세워진 기록"이라며 "선수들에게 고맙고 구단과 임근배, 김재훈 코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최다승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4시즌을 쉬지 않고 오래 감독직을 맡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63승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승리를 꼽아달라는 말에 그는 "모비스로 옮긴 첫해에 7위를 했다. 그다음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을 했는데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되던 그날 경기를 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유 감독은 "또 2년 전 KT와 정규리그 우승 다툼을 할 때 창원에서 시즌 최종전을 치렀는데 졌더라면 우승을 넘겨줘야 했지만 결국 이겼던 기억도 난다"고 덧붙였다.
아쉬웠던 경기에 대해서는 "정규리그에서 우승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실패했던 것이 두 번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코치 시절을 합하면 프로 원년인 199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비결에 대해선 "특별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도 갖고 있는 선수들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실제 그는 모비스로 옮긴 뒤에 통합 우승을 두 번이나 차지했으나 대우, 신세기, SK, 전자랜드에서는 2003-2004시즌 4강 진출이 최고 성적일 만큼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맡았던 팀들은 대부분 중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잦았다. 특유의 조직력과 끈기로 팀을 조련해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이 ’장수 비결’이 된 셈이다.
정규리그 우승 4회로 전창진 KT 감독과 함께 최다를 기록 중인 유 감독이지만 성적이 나쁠 때도 없지 않았다.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8위에 그쳤고 2007-2008시즌 9위, 신세기 시절인 1999-2000시즌에는 최하위도 해봤다.
유 감독은 "그때 국내 선수진은 물론 외국인 선수도 제대로 뽑지 못했다"고 회상하며 "구단 실무선에서는 해임 분위기였는데 그때 잘렸으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다행히 고위층에서 기회를 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선수를 보는 눈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1라운드 맨 뒷순위인 10번에서 뽑은 함지훈을 국내 정상급 선수로 키워냈고 이번 시즌 쏠쏠한 활약을 펼치는 신인 김동량, 이지원 등도 10번, 11번에 가서야 뽑은 선수들이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를 묻자 유 감독은 "역시 (양)동근이와 (조)동현이가 생각난다"며 "전자랜드에서 함께 했던 동현이는 운동을 하지 못할 몸인데도 병원에서 나와 팀에 합류, 분위기를 올리려 애쓰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이날 경기부터 테렌스 레더를 영입한 유 감독은 "레더가 한국 무대 경험도 있고 카리스마를 갖춘 선수라 남은 시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목표에 대해 유 감독은 "몇 승을 하겠다는 것보다 건강이 허락되면 롱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감독도 얼마든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만수’ 유재학(48·모비스) 감독이 프로농구 15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26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74-58로 이긴 유재학 감독은 프로 통산 정규리그 363승을 기록해 신선우 전 SK 감독이 갖고 있던 종전 감독 최다승인 362승을 뛰어넘었다.
경복고와 연세대를 나온 유 감독은 실업 기아산업에서 뛰었으며 현역 시절 ’컴퓨터 가드’로 불리며 특유의 재치있는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일찌감치 지도자로 대성할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
’수가 만 가지’라는 뜻의 별명 ’만수’도 어쩌면 선수 때 이미 그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
1993년 모교인 연세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7년 전자랜드 농구단의 전신 대우 코치를 맡았고 1998-1999시즌부터 대우 감독으로 정식 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대우가 신세기, SK, 전자랜드로 주인이 바뀌는 동안 계속 사령탑을 맡았던 유 감독은 2004-2005시즌부터 모비스로 자리를 옮겨 8년째 이 팀을 지휘하고 있다.
363승(330패)은 693경기, 13년 15일 만에 세운 금자탑이다. 362승을 기록한 신선우 전 감독은 656경기째, 14년 1개월4일 만에 세운 것에 비하면 경기 수는 더 많지만 기간은 짧았다.
또 신 전 감독이 55세 때 362승을 달성한 것보다 7년 가까이 빠르게 363승 고지를 밟은 셈이다.
유 감독은 "오래 하다 보니 세워진 기록"이라며 "선수들에게 고맙고 구단과 임근배, 김재훈 코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최다승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4시즌을 쉬지 않고 오래 감독직을 맡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63승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승리를 꼽아달라는 말에 그는 "모비스로 옮긴 첫해에 7위를 했다. 그다음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을 했는데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되던 그날 경기를 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유 감독은 "또 2년 전 KT와 정규리그 우승 다툼을 할 때 창원에서 시즌 최종전을 치렀는데 졌더라면 우승을 넘겨줘야 했지만 결국 이겼던 기억도 난다"고 덧붙였다.
아쉬웠던 경기에 대해서는 "정규리그에서 우승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실패했던 것이 두 번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코치 시절을 합하면 프로 원년인 199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비결에 대해선 "특별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도 갖고 있는 선수들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실제 그는 모비스로 옮긴 뒤에 통합 우승을 두 번이나 차지했으나 대우, 신세기, SK, 전자랜드에서는 2003-2004시즌 4강 진출이 최고 성적일 만큼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맡았던 팀들은 대부분 중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잦았다. 특유의 조직력과 끈기로 팀을 조련해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이 ’장수 비결’이 된 셈이다.
정규리그 우승 4회로 전창진 KT 감독과 함께 최다를 기록 중인 유 감독이지만 성적이 나쁠 때도 없지 않았다.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8위에 그쳤고 2007-2008시즌 9위, 신세기 시절인 1999-2000시즌에는 최하위도 해봤다.
유 감독은 "그때 국내 선수진은 물론 외국인 선수도 제대로 뽑지 못했다"고 회상하며 "구단 실무선에서는 해임 분위기였는데 그때 잘렸으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다행히 고위층에서 기회를 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선수를 보는 눈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1라운드 맨 뒷순위인 10번에서 뽑은 함지훈을 국내 정상급 선수로 키워냈고 이번 시즌 쏠쏠한 활약을 펼치는 신인 김동량, 이지원 등도 10번, 11번에 가서야 뽑은 선수들이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를 묻자 유 감독은 "역시 (양)동근이와 (조)동현이가 생각난다"며 "전자랜드에서 함께 했던 동현이는 운동을 하지 못할 몸인데도 병원에서 나와 팀에 합류, 분위기를 올리려 애쓰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이날 경기부터 테렌스 레더를 영입한 유 감독은 "레더가 한국 무대 경험도 있고 카리스마를 갖춘 선수라 남은 시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목표에 대해 유 감독은 "몇 승을 하겠다는 것보다 건강이 허락되면 롱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감독도 얼마든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다 363승’ 유재학, “롱런 하고파”
-
- 입력 2011-11-27 07:4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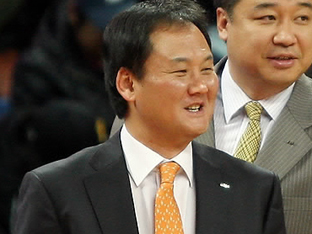
역대 최다승 363승…"잘릴 뻔한 위기도 있었죠"
’만수’ 유재학(48·모비스) 감독이 프로농구 15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26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74-58로 이긴 유재학 감독은 프로 통산 정규리그 363승을 기록해 신선우 전 SK 감독이 갖고 있던 종전 감독 최다승인 362승을 뛰어넘었다.
경복고와 연세대를 나온 유 감독은 실업 기아산업에서 뛰었으며 현역 시절 ’컴퓨터 가드’로 불리며 특유의 재치있는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일찌감치 지도자로 대성할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
’수가 만 가지’라는 뜻의 별명 ’만수’도 어쩌면 선수 때 이미 그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
1993년 모교인 연세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7년 전자랜드 농구단의 전신 대우 코치를 맡았고 1998-1999시즌부터 대우 감독으로 정식 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대우가 신세기, SK, 전자랜드로 주인이 바뀌는 동안 계속 사령탑을 맡았던 유 감독은 2004-2005시즌부터 모비스로 자리를 옮겨 8년째 이 팀을 지휘하고 있다.
363승(330패)은 693경기, 13년 15일 만에 세운 금자탑이다. 362승을 기록한 신선우 전 감독은 656경기째, 14년 1개월4일 만에 세운 것에 비하면 경기 수는 더 많지만 기간은 짧았다.
또 신 전 감독이 55세 때 362승을 달성한 것보다 7년 가까이 빠르게 363승 고지를 밟은 셈이다.
유 감독은 "오래 하다 보니 세워진 기록"이라며 "선수들에게 고맙고 구단과 임근배, 김재훈 코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최다승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4시즌을 쉬지 않고 오래 감독직을 맡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63승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승리를 꼽아달라는 말에 그는 "모비스로 옮긴 첫해에 7위를 했다. 그다음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을 했는데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되던 그날 경기를 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유 감독은 "또 2년 전 KT와 정규리그 우승 다툼을 할 때 창원에서 시즌 최종전을 치렀는데 졌더라면 우승을 넘겨줘야 했지만 결국 이겼던 기억도 난다"고 덧붙였다.
아쉬웠던 경기에 대해서는 "정규리그에서 우승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실패했던 것이 두 번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코치 시절을 합하면 프로 원년인 199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비결에 대해선 "특별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도 갖고 있는 선수들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실제 그는 모비스로 옮긴 뒤에 통합 우승을 두 번이나 차지했으나 대우, 신세기, SK, 전자랜드에서는 2003-2004시즌 4강 진출이 최고 성적일 만큼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맡았던 팀들은 대부분 중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잦았다. 특유의 조직력과 끈기로 팀을 조련해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이 ’장수 비결’이 된 셈이다.
정규리그 우승 4회로 전창진 KT 감독과 함께 최다를 기록 중인 유 감독이지만 성적이 나쁠 때도 없지 않았다.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8위에 그쳤고 2007-2008시즌 9위, 신세기 시절인 1999-2000시즌에는 최하위도 해봤다.
유 감독은 "그때 국내 선수진은 물론 외국인 선수도 제대로 뽑지 못했다"고 회상하며 "구단 실무선에서는 해임 분위기였는데 그때 잘렸으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다행히 고위층에서 기회를 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선수를 보는 눈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1라운드 맨 뒷순위인 10번에서 뽑은 함지훈을 국내 정상급 선수로 키워냈고 이번 시즌 쏠쏠한 활약을 펼치는 신인 김동량, 이지원 등도 10번, 11번에 가서야 뽑은 선수들이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를 묻자 유 감독은 "역시 (양)동근이와 (조)동현이가 생각난다"며 "전자랜드에서 함께 했던 동현이는 운동을 하지 못할 몸인데도 병원에서 나와 팀에 합류, 분위기를 올리려 애쓰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이날 경기부터 테렌스 레더를 영입한 유 감독은 "레더가 한국 무대 경험도 있고 카리스마를 갖춘 선수라 남은 시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목표에 대해 유 감독은 "몇 승을 하겠다는 것보다 건강이 허락되면 롱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감독도 얼마든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만수’ 유재학(48·모비스) 감독이 프로농구 15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26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74-58로 이긴 유재학 감독은 프로 통산 정규리그 363승을 기록해 신선우 전 SK 감독이 갖고 있던 종전 감독 최다승인 362승을 뛰어넘었다.
경복고와 연세대를 나온 유 감독은 실업 기아산업에서 뛰었으며 현역 시절 ’컴퓨터 가드’로 불리며 특유의 재치있는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일찌감치 지도자로 대성할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
’수가 만 가지’라는 뜻의 별명 ’만수’도 어쩌면 선수 때 이미 그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
1993년 모교인 연세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7년 전자랜드 농구단의 전신 대우 코치를 맡았고 1998-1999시즌부터 대우 감독으로 정식 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대우가 신세기, SK, 전자랜드로 주인이 바뀌는 동안 계속 사령탑을 맡았던 유 감독은 2004-2005시즌부터 모비스로 자리를 옮겨 8년째 이 팀을 지휘하고 있다.
363승(330패)은 693경기, 13년 15일 만에 세운 금자탑이다. 362승을 기록한 신선우 전 감독은 656경기째, 14년 1개월4일 만에 세운 것에 비하면 경기 수는 더 많지만 기간은 짧았다.
또 신 전 감독이 55세 때 362승을 달성한 것보다 7년 가까이 빠르게 363승 고지를 밟은 셈이다.
유 감독은 "오래 하다 보니 세워진 기록"이라며 "선수들에게 고맙고 구단과 임근배, 김재훈 코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최다승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4시즌을 쉬지 않고 오래 감독직을 맡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63승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승리를 꼽아달라는 말에 그는 "모비스로 옮긴 첫해에 7위를 했다. 그다음 시즌에 정규리그 우승을 했는데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되던 그날 경기를 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유 감독은 "또 2년 전 KT와 정규리그 우승 다툼을 할 때 창원에서 시즌 최종전을 치렀는데 졌더라면 우승을 넘겨줘야 했지만 결국 이겼던 기억도 난다"고 덧붙였다.
아쉬웠던 경기에 대해서는 "정규리그에서 우승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실패했던 것이 두 번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코치 시절을 합하면 프로 원년인 199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비결에 대해선 "특별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도 갖고 있는 선수들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실제 그는 모비스로 옮긴 뒤에 통합 우승을 두 번이나 차지했으나 대우, 신세기, SK, 전자랜드에서는 2003-2004시즌 4강 진출이 최고 성적일 만큼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 그가 맡았던 팀들은 대부분 중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잦았다. 특유의 조직력과 끈기로 팀을 조련해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이 ’장수 비결’이 된 셈이다.
정규리그 우승 4회로 전창진 KT 감독과 함께 최다를 기록 중인 유 감독이지만 성적이 나쁠 때도 없지 않았다.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8위에 그쳤고 2007-2008시즌 9위, 신세기 시절인 1999-2000시즌에는 최하위도 해봤다.
유 감독은 "그때 국내 선수진은 물론 외국인 선수도 제대로 뽑지 못했다"고 회상하며 "구단 실무선에서는 해임 분위기였는데 그때 잘렸으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다행히 고위층에서 기회를 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양"이라고 밝혔다.
선수를 보는 눈도 탁월하다는 평이다. 1라운드 맨 뒷순위인 10번에서 뽑은 함지훈을 국내 정상급 선수로 키워냈고 이번 시즌 쏠쏠한 활약을 펼치는 신인 김동량, 이지원 등도 10번, 11번에 가서야 뽑은 선수들이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를 묻자 유 감독은 "역시 (양)동근이와 (조)동현이가 생각난다"며 "전자랜드에서 함께 했던 동현이는 운동을 하지 못할 몸인데도 병원에서 나와 팀에 합류, 분위기를 올리려 애쓰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칭찬했다.
이날 경기부터 테렌스 레더를 영입한 유 감독은 "레더가 한국 무대 경험도 있고 카리스마를 갖춘 선수라 남은 시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목표에 대해 유 감독은 "몇 승을 하겠다는 것보다 건강이 허락되면 롱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감독도 얼마든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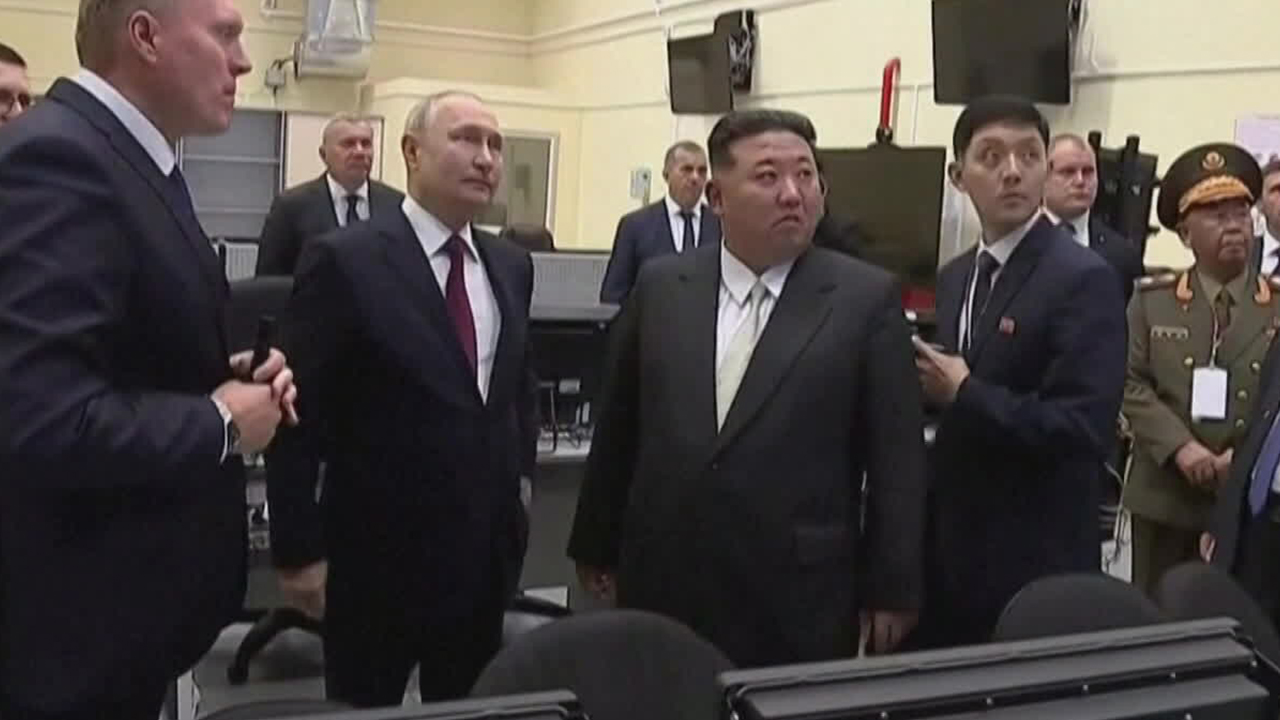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