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포착] ‘괴물 쥐’ 뉴트리아의 습격
입력 2013.06.11 (08:41)
수정 2013.06.11 (1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낙동강 괴물 쥐'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괴물 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포획 작업도 이뤄지곤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식지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태영 기자, 이 뉴트리아가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기자 멘트>
뉴트리아라는 이름에서 짐작하셨듯이 우리 토종은 아니구요, 약 30년 전 모피를 만들 목적으로 남미에서 수입했다가 우리 생태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피해는 커지는데 외래종이다보니 천적도 없어 정부에서는 뉴트리아 퇴치를 위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한 뒤 포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괴물 쥐 뉴트리아의 습격,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리포트>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부산의 한 마을.
최근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면서 곳곳에 피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망을 쳤는데 뉴트리아가 이 망을 물어뜯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먹었어요.“
줄기 채 농작물을 끊어먹은 흔적이 생생합니다.
잡식성이다보니 가리는 것도 없어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 뉴트리아.
특히 농번기인 여름에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이춘석(피해 농민) : “뜯고 먹고 전부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1985년 모피를 만들기 위해 남미에서 수입된 뉴트리아, 하지만 모피 값이 하락하자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 후 강의 지류를 따라 번식하며 서식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데요.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큰 강에서 하천가로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숲이 우거지면서 (뉴트리아가) 자꾸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하천 늪에도 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 농민들 중에는 아예 농사도 그만두고 뉴트리아 잡기에 나서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녹취> "저기 한 마리 있다."
바로 그 때 모습을 드러낸 뉴트리아.
먹이를 찾아 밭 한가운데까지 침입합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재빨리 포획에 성공합니다.
<녹취> "잡았다 잡았다"
덩치만 클 뿐 사납지는 않아 다행히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 이빨이 날카로워 잘못하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워낙에 뉴트리아의 수가 많다보니 마을 곳곳에 포획틀까지 설치했습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어제 (뉴트리아) 포획 틀을 설치를 했는데... 확인하고 있어요”
어제 밤 설치해 놓은 포획 틀에 잡힌 뉴트리아.
포획 틀이 꽉 찰만큼 몸집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족히 1미터는 되어 보이는 뉴트리아.
바닥에 내려놓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가 주인) : “제 생각에는 만 마리 이상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퇴치 안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뉴트리아 천국이 될 거예요“
번식력도 왕성해 1년에 4번,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뉴트리아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야행성인 뉴트리아가 더 활기를 띠는 시간.
농민들의 뉴트리아 사냥은 계속됩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손전등을 비추면 야간에 뉴트리아 눈이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납니다.”
바로 그 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입니다.
<녹취> “저기 있다. 저기 보이네”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 뉴트리아 한 마리.
조심스레 다가가 뜰채를 이용 잽싸게 잡아냅니다.
이 날 하루 잡은 뉴트리아만 다섯 마리.
이렇게 몇 마리라도 잡아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농민들의 피해가 덜 가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 마다 흐뭇합니다.”
최근 뉴트리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낙동강 유역을 넘어 경산까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1998년 람사르 조약에 의해 국제보호습지로 지정된 경남 우포늪.
우포늪 역시 뉴트리아의 잦은 출몰로 생태계 파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갖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곳곳에 굴까지 파놓은 뉴트리아, 뉴트리아의 이런 습성은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를 망가뜨려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늪지대다 보니 뉴트리아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덫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우포늪 지킴이) : “뉴트리아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딱 걸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뉴트리아도 영악해져 덫에 놓인 먹이만 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포늪 순찰 중에도 덫에 걸린 뉴트리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7년 째 우포늪 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주영학씨가 2005년부터 포획한 뉴트리아는 무려 600여 마리.
하지만 여전히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우포늪 지킴이) : “생태 교란시키지 못 먹는 것 없지 완전 잡식 동물인데 다 잡아야합니다. 안 그러면 생태 다 망가집니다.“
<인터뷰> 박재영(부산시청 환경행정과) : “현재 (뉴트리아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낙동강 하구 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함께 같은 기간을 정해서 일시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이용되고 버려졌던 뉴트리아.
30년이 지나 이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괴물 쥐가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낙동강 괴물 쥐'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괴물 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포획 작업도 이뤄지곤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식지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태영 기자, 이 뉴트리아가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기자 멘트>
뉴트리아라는 이름에서 짐작하셨듯이 우리 토종은 아니구요, 약 30년 전 모피를 만들 목적으로 남미에서 수입했다가 우리 생태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피해는 커지는데 외래종이다보니 천적도 없어 정부에서는 뉴트리아 퇴치를 위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한 뒤 포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괴물 쥐 뉴트리아의 습격,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리포트>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부산의 한 마을.
최근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면서 곳곳에 피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망을 쳤는데 뉴트리아가 이 망을 물어뜯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먹었어요.“
줄기 채 농작물을 끊어먹은 흔적이 생생합니다.
잡식성이다보니 가리는 것도 없어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 뉴트리아.
특히 농번기인 여름에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이춘석(피해 농민) : “뜯고 먹고 전부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1985년 모피를 만들기 위해 남미에서 수입된 뉴트리아, 하지만 모피 값이 하락하자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 후 강의 지류를 따라 번식하며 서식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데요.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큰 강에서 하천가로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숲이 우거지면서 (뉴트리아가) 자꾸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하천 늪에도 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 농민들 중에는 아예 농사도 그만두고 뉴트리아 잡기에 나서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녹취> "저기 한 마리 있다."
바로 그 때 모습을 드러낸 뉴트리아.
먹이를 찾아 밭 한가운데까지 침입합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재빨리 포획에 성공합니다.
<녹취> "잡았다 잡았다"
덩치만 클 뿐 사납지는 않아 다행히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 이빨이 날카로워 잘못하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워낙에 뉴트리아의 수가 많다보니 마을 곳곳에 포획틀까지 설치했습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어제 (뉴트리아) 포획 틀을 설치를 했는데... 확인하고 있어요”
어제 밤 설치해 놓은 포획 틀에 잡힌 뉴트리아.
포획 틀이 꽉 찰만큼 몸집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족히 1미터는 되어 보이는 뉴트리아.
바닥에 내려놓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가 주인) : “제 생각에는 만 마리 이상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퇴치 안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뉴트리아 천국이 될 거예요“
번식력도 왕성해 1년에 4번,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뉴트리아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야행성인 뉴트리아가 더 활기를 띠는 시간.
농민들의 뉴트리아 사냥은 계속됩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손전등을 비추면 야간에 뉴트리아 눈이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납니다.”
바로 그 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입니다.
<녹취> “저기 있다. 저기 보이네”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 뉴트리아 한 마리.
조심스레 다가가 뜰채를 이용 잽싸게 잡아냅니다.
이 날 하루 잡은 뉴트리아만 다섯 마리.
이렇게 몇 마리라도 잡아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농민들의 피해가 덜 가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 마다 흐뭇합니다.”
최근 뉴트리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낙동강 유역을 넘어 경산까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1998년 람사르 조약에 의해 국제보호습지로 지정된 경남 우포늪.
우포늪 역시 뉴트리아의 잦은 출몰로 생태계 파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갖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곳곳에 굴까지 파놓은 뉴트리아, 뉴트리아의 이런 습성은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를 망가뜨려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늪지대다 보니 뉴트리아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덫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우포늪 지킴이) : “뉴트리아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딱 걸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뉴트리아도 영악해져 덫에 놓인 먹이만 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포늪 순찰 중에도 덫에 걸린 뉴트리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7년 째 우포늪 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주영학씨가 2005년부터 포획한 뉴트리아는 무려 600여 마리.
하지만 여전히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우포늪 지킴이) : “생태 교란시키지 못 먹는 것 없지 완전 잡식 동물인데 다 잡아야합니다. 안 그러면 생태 다 망가집니다.“
<인터뷰> 박재영(부산시청 환경행정과) : “현재 (뉴트리아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낙동강 하구 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함께 같은 기간을 정해서 일시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이용되고 버려졌던 뉴트리아.
30년이 지나 이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괴물 쥐가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제포착] ‘괴물 쥐’ 뉴트리아의 습격
-
- 입력 2013-06-11 08:43:58
- 수정2013-06-11 10:19:52

<앵커 멘트>
요즘 '낙동강 괴물 쥐'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괴물 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포획 작업도 이뤄지곤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식지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태영 기자, 이 뉴트리아가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기자 멘트>
뉴트리아라는 이름에서 짐작하셨듯이 우리 토종은 아니구요, 약 30년 전 모피를 만들 목적으로 남미에서 수입했다가 우리 생태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피해는 커지는데 외래종이다보니 천적도 없어 정부에서는 뉴트리아 퇴치를 위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한 뒤 포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괴물 쥐 뉴트리아의 습격,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리포트>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부산의 한 마을.
최근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면서 곳곳에 피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망을 쳤는데 뉴트리아가 이 망을 물어뜯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먹었어요.“
줄기 채 농작물을 끊어먹은 흔적이 생생합니다.
잡식성이다보니 가리는 것도 없어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 뉴트리아.
특히 농번기인 여름에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이춘석(피해 농민) : “뜯고 먹고 전부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1985년 모피를 만들기 위해 남미에서 수입된 뉴트리아, 하지만 모피 값이 하락하자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 후 강의 지류를 따라 번식하며 서식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데요.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큰 강에서 하천가로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숲이 우거지면서 (뉴트리아가) 자꾸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하천 늪에도 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 농민들 중에는 아예 농사도 그만두고 뉴트리아 잡기에 나서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녹취> "저기 한 마리 있다."
바로 그 때 모습을 드러낸 뉴트리아.
먹이를 찾아 밭 한가운데까지 침입합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재빨리 포획에 성공합니다.
<녹취> "잡았다 잡았다"
덩치만 클 뿐 사납지는 않아 다행히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 이빨이 날카로워 잘못하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워낙에 뉴트리아의 수가 많다보니 마을 곳곳에 포획틀까지 설치했습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어제 (뉴트리아) 포획 틀을 설치를 했는데... 확인하고 있어요”
어제 밤 설치해 놓은 포획 틀에 잡힌 뉴트리아.
포획 틀이 꽉 찰만큼 몸집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족히 1미터는 되어 보이는 뉴트리아.
바닥에 내려놓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가 주인) : “제 생각에는 만 마리 이상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퇴치 안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뉴트리아 천국이 될 거예요“
번식력도 왕성해 1년에 4번,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뉴트리아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야행성인 뉴트리아가 더 활기를 띠는 시간.
농민들의 뉴트리아 사냥은 계속됩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손전등을 비추면 야간에 뉴트리아 눈이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납니다.”
바로 그 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입니다.
<녹취> “저기 있다. 저기 보이네”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 뉴트리아 한 마리.
조심스레 다가가 뜰채를 이용 잽싸게 잡아냅니다.
이 날 하루 잡은 뉴트리아만 다섯 마리.
이렇게 몇 마리라도 잡아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농민들의 피해가 덜 가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 마다 흐뭇합니다.”
최근 뉴트리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낙동강 유역을 넘어 경산까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1998년 람사르 조약에 의해 국제보호습지로 지정된 경남 우포늪.
우포늪 역시 뉴트리아의 잦은 출몰로 생태계 파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갖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곳곳에 굴까지 파놓은 뉴트리아, 뉴트리아의 이런 습성은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를 망가뜨려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늪지대다 보니 뉴트리아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덫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우포늪 지킴이) : “뉴트리아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딱 걸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뉴트리아도 영악해져 덫에 놓인 먹이만 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포늪 순찰 중에도 덫에 걸린 뉴트리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7년 째 우포늪 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주영학씨가 2005년부터 포획한 뉴트리아는 무려 600여 마리.
하지만 여전히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우포늪 지킴이) : “생태 교란시키지 못 먹는 것 없지 완전 잡식 동물인데 다 잡아야합니다. 안 그러면 생태 다 망가집니다.“
<인터뷰> 박재영(부산시청 환경행정과) : “현재 (뉴트리아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낙동강 하구 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함께 같은 기간을 정해서 일시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이용되고 버려졌던 뉴트리아.
30년이 지나 이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괴물 쥐가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낙동강 괴물 쥐'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괴물 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포획 작업도 이뤄지곤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식지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태영 기자, 이 뉴트리아가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기자 멘트>
뉴트리아라는 이름에서 짐작하셨듯이 우리 토종은 아니구요, 약 30년 전 모피를 만들 목적으로 남미에서 수입했다가 우리 생태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피해는 커지는데 외래종이다보니 천적도 없어 정부에서는 뉴트리아 퇴치를 위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한 뒤 포상금까지 내걸었는데요.
괴물 쥐 뉴트리아의 습격,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리포트>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부산의 한 마을.
최근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하면서 곳곳에 피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망을 쳤는데 뉴트리아가 이 망을 물어뜯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먹었어요.“
줄기 채 농작물을 끊어먹은 흔적이 생생합니다.
잡식성이다보니 가리는 것도 없어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 뉴트리아.
특히 농번기인 여름에는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이춘석(피해 농민) : “뜯고 먹고 전부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1985년 모피를 만들기 위해 남미에서 수입된 뉴트리아, 하지만 모피 값이 하락하자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 후 강의 지류를 따라 번식하며 서식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데요.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큰 강에서 하천가로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숲이 우거지면서 (뉴트리아가) 자꾸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하천 늪에도 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 농민들 중에는 아예 농사도 그만두고 뉴트리아 잡기에 나서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녹취> "저기 한 마리 있다."
바로 그 때 모습을 드러낸 뉴트리아.
먹이를 찾아 밭 한가운데까지 침입합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재빨리 포획에 성공합니다.
<녹취> "잡았다 잡았다"
덩치만 클 뿐 사납지는 않아 다행히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 이빨이 날카로워 잘못하면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워낙에 뉴트리아의 수가 많다보니 마을 곳곳에 포획틀까지 설치했습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어제 (뉴트리아) 포획 틀을 설치를 했는데... 확인하고 있어요”
어제 밤 설치해 놓은 포획 틀에 잡힌 뉴트리아.
포획 틀이 꽉 찰만큼 몸집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족히 1미터는 되어 보이는 뉴트리아.
바닥에 내려놓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가 주인) : “제 생각에는 만 마리 이상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퇴치 안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뉴트리아 천국이 될 거예요“
번식력도 왕성해 1년에 4번, 5마리에서 10마리까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뉴트리아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야행성인 뉴트리아가 더 활기를 띠는 시간.
농민들의 뉴트리아 사냥은 계속됩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손전등을 비추면 야간에 뉴트리아 눈이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납니다.”
바로 그 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입니다.
<녹취> “저기 있다. 저기 보이네”
물 속에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는 뉴트리아 한 마리.
조심스레 다가가 뜰채를 이용 잽싸게 잡아냅니다.
이 날 하루 잡은 뉴트리아만 다섯 마리.
이렇게 몇 마리라도 잡아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인터뷰> 전용홍(피해 농민) : “농민들의 피해가 덜 가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 마다 흐뭇합니다.”
최근 뉴트리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낙동강 유역을 넘어 경산까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1998년 람사르 조약에 의해 국제보호습지로 지정된 경남 우포늪.
우포늪 역시 뉴트리아의 잦은 출몰로 생태계 파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갖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곳곳에 굴까지 파놓은 뉴트리아, 뉴트리아의 이런 습성은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를 망가뜨려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늪지대다 보니 뉴트리아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덫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우포늪 지킴이) : “뉴트리아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딱 걸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뉴트리아도 영악해져 덫에 놓인 먹이만 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포늪 순찰 중에도 덫에 걸린 뉴트리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7년 째 우포늪 지킴이로 일하고 있는 주영학씨가 2005년부터 포획한 뉴트리아는 무려 600여 마리.
하지만 여전히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학(우포늪 지킴이) : “생태 교란시키지 못 먹는 것 없지 완전 잡식 동물인데 다 잡아야합니다. 안 그러면 생태 다 망가집니다.“
<인터뷰> 박재영(부산시청 환경행정과) : “현재 (뉴트리아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낙동강 하구 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함께 같은 기간을 정해서 일시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이용되고 버려졌던 뉴트리아.
30년이 지나 이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괴물 쥐가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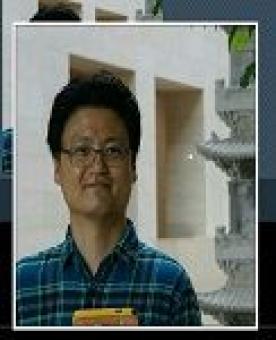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노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뉴스 따라잡기] ‘매의 눈’과 ‘기지’로 성폭행범 검거](https://news.kbs.co.kr/data/news/2013/06/11/2673156_110.jpg)

![[속보] 경기 연천군에서 규모 3.3 지진](/attach/image/2025/03/23/20250323_8Sjy5d.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