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충→수요관리’ 에너지정책 방향 바꾼다
입력 2013.08.18 (13:04)
수정 2013.08.18 (14: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은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여건상 공급 확충이 더는 쉽지 않을뿐더러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가 갈수록 폭증하는 수요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깔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두 축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꾀하고 절약한 전력을 사고파는 수요자원 시장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ESS와 EMS 설치 비용 부담이 커 산업계에서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얼마나 '경제성'을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다소비 구조, 패러다임 변화로 돌파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골격은 수요를 따라가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늘고 여기에 발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였다.
'2012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00년 4천100만kW이던 최대 전력소비는 2012년 7천598만kW로 65.6% 증가했고 그에 맞춰 발전시설용량도 4천845만kW에서 8천180만kW로 68.6% 확충됐다. 설비용량이 수요를 간신히 충족시키는 모양새다.
2000∼2010년 우리나라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미국(0.7%), 독일(0.6%), 일본(0.2%), 영국(-0.1%)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9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도 8천980kWh로 OECD 평균인 8천12kWh를 훨씬 웃돈다. 산업·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이미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대전력수요가 연평균 3.5%씩 증가해 2027년에는 1억2천674만kW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7천598만kW) 대비 66.8%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공급력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소한 국토 면적에 발전소를 세울만한 부지는 거의 바닥이 났고 그나마 있는 땅마저 지역 주민의 반발로 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주민 간 갈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15년간 화력발전설비 1천580만kW를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제반 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결국 정부도 체계적인 수요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 외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설비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정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전력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에게 절전 참여를 호소하는 임기응변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관리를 시스템화하자는 것"이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핵심…최대-경부하 차이 극대화
리튬이온 2차전지를 활용하는 ESS는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심야시간대 전력을 저장한 뒤 요금이 가장 비싼 피크시간대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다.
문제는 비용이다. 경기도 기흥 사옥에 1MW급 ESS를 실증 운용 중인 삼성SDI의 경우 ESS·EMS 구축에 총 16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이 설비로 연간 절약되는 전기요금이 1억2천7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12∼13년이 지나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ESS 시스템의 효용은 인정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도입을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가 경제성을 갖추려면 투자비 회수 기간을 6∼7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치 비용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업계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차를 극대화해 비용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면 피크시간대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ESS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는 10월에 있을 전력요금개편의 초점을 피크시간대 요금 조정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산업체에서의 ESS 보급을 확산하려면 피크시간 요금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피크시간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중견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력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에 ESS·EMS 도입의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센터장은 "수요자원시장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잘 조정·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여건상 공급 확충이 더는 쉽지 않을뿐더러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가 갈수록 폭증하는 수요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깔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두 축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꾀하고 절약한 전력을 사고파는 수요자원 시장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ESS와 EMS 설치 비용 부담이 커 산업계에서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얼마나 '경제성'을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다소비 구조, 패러다임 변화로 돌파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골격은 수요를 따라가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늘고 여기에 발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였다.
'2012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00년 4천100만kW이던 최대 전력소비는 2012년 7천598만kW로 65.6% 증가했고 그에 맞춰 발전시설용량도 4천845만kW에서 8천180만kW로 68.6% 확충됐다. 설비용량이 수요를 간신히 충족시키는 모양새다.
2000∼2010년 우리나라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미국(0.7%), 독일(0.6%), 일본(0.2%), 영국(-0.1%)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9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도 8천980kWh로 OECD 평균인 8천12kWh를 훨씬 웃돈다. 산업·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이미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대전력수요가 연평균 3.5%씩 증가해 2027년에는 1억2천674만kW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7천598만kW) 대비 66.8%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공급력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소한 국토 면적에 발전소를 세울만한 부지는 거의 바닥이 났고 그나마 있는 땅마저 지역 주민의 반발로 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주민 간 갈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15년간 화력발전설비 1천580만kW를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제반 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결국 정부도 체계적인 수요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 외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설비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정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전력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에게 절전 참여를 호소하는 임기응변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관리를 시스템화하자는 것"이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핵심…최대-경부하 차이 극대화
리튬이온 2차전지를 활용하는 ESS는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심야시간대 전력을 저장한 뒤 요금이 가장 비싼 피크시간대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다.
문제는 비용이다. 경기도 기흥 사옥에 1MW급 ESS를 실증 운용 중인 삼성SDI의 경우 ESS·EMS 구축에 총 16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이 설비로 연간 절약되는 전기요금이 1억2천7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12∼13년이 지나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ESS 시스템의 효용은 인정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도입을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가 경제성을 갖추려면 투자비 회수 기간을 6∼7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치 비용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업계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차를 극대화해 비용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면 피크시간대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ESS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는 10월에 있을 전력요금개편의 초점을 피크시간대 요금 조정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산업체에서의 ESS 보급을 확산하려면 피크시간 요금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피크시간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중견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력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에 ESS·EMS 도입의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센터장은 "수요자원시장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잘 조정·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급확충→수요관리’ 에너지정책 방향 바꾼다
-
- 입력 2013-08-18 13:04:41
- 수정2013-08-18 14:50:05
정부가 18일 발표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은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여건상 공급 확충이 더는 쉽지 않을뿐더러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가 갈수록 폭증하는 수요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깔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두 축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꾀하고 절약한 전력을 사고파는 수요자원 시장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ESS와 EMS 설치 비용 부담이 커 산업계에서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얼마나 '경제성'을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다소비 구조, 패러다임 변화로 돌파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골격은 수요를 따라가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늘고 여기에 발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였다.
'2012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00년 4천100만kW이던 최대 전력소비는 2012년 7천598만kW로 65.6% 증가했고 그에 맞춰 발전시설용량도 4천845만kW에서 8천180만kW로 68.6% 확충됐다. 설비용량이 수요를 간신히 충족시키는 모양새다.
2000∼2010년 우리나라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미국(0.7%), 독일(0.6%), 일본(0.2%), 영국(-0.1%)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9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도 8천980kWh로 OECD 평균인 8천12kWh를 훨씬 웃돈다. 산업·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이미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대전력수요가 연평균 3.5%씩 증가해 2027년에는 1억2천674만kW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7천598만kW) 대비 66.8%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공급력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소한 국토 면적에 발전소를 세울만한 부지는 거의 바닥이 났고 그나마 있는 땅마저 지역 주민의 반발로 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주민 간 갈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15년간 화력발전설비 1천580만kW를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제반 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결국 정부도 체계적인 수요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 외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설비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정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전력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에게 절전 참여를 호소하는 임기응변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관리를 시스템화하자는 것"이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핵심…최대-경부하 차이 극대화
리튬이온 2차전지를 활용하는 ESS는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심야시간대 전력을 저장한 뒤 요금이 가장 비싼 피크시간대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다.
문제는 비용이다. 경기도 기흥 사옥에 1MW급 ESS를 실증 운용 중인 삼성SDI의 경우 ESS·EMS 구축에 총 16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이 설비로 연간 절약되는 전기요금이 1억2천7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12∼13년이 지나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ESS 시스템의 효용은 인정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도입을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가 경제성을 갖추려면 투자비 회수 기간을 6∼7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치 비용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업계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차를 극대화해 비용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면 피크시간대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ESS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는 10월에 있을 전력요금개편의 초점을 피크시간대 요금 조정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산업체에서의 ESS 보급을 확산하려면 피크시간 요금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피크시간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중견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력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에 ESS·EMS 도입의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센터장은 "수요자원시장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잘 조정·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여건상 공급 확충이 더는 쉽지 않을뿐더러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가 갈수록 폭증하는 수요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깔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두 축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꾀하고 절약한 전력을 사고파는 수요자원 시장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ESS와 EMS 설치 비용 부담이 커 산업계에서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얼마나 '경제성'을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다소비 구조, 패러다임 변화로 돌파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골격은 수요를 따라가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늘고 여기에 발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듯 보였다.
'2012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00년 4천100만kW이던 최대 전력소비는 2012년 7천598만kW로 65.6% 증가했고 그에 맞춰 발전시설용량도 4천845만kW에서 8천180만kW로 68.6% 확충됐다. 설비용량이 수요를 간신히 충족시키는 모양새다.
2000∼2010년 우리나라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0%)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미국(0.7%), 독일(0.6%), 일본(0.2%), 영국(-0.1%)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9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도 8천980kWh로 OECD 평균인 8천12kWh를 훨씬 웃돈다. 산업·가정 등 모든 부문에서 이미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대전력수요가 연평균 3.5%씩 증가해 2027년에는 1억2천674만kW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7천598만kW) 대비 66.8%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공급력 확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소한 국토 면적에 발전소를 세울만한 부지는 거의 바닥이 났고 그나마 있는 땅마저 지역 주민의 반발로 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정부-주민 간 갈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15년간 화력발전설비 1천580만kW를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제반 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결국 정부도 체계적인 수요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 외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볼 수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기존에 있는 설비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정책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전력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에게 절전 참여를 호소하는 임기응변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관리를 시스템화하자는 것"이라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핵심…최대-경부하 차이 극대화
리튬이온 2차전지를 활용하는 ESS는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심야시간대 전력을 저장한 뒤 요금이 가장 비싼 피크시간대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다.
문제는 비용이다. 경기도 기흥 사옥에 1MW급 ESS를 실증 운용 중인 삼성SDI의 경우 ESS·EMS 구축에 총 16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이 설비로 연간 절약되는 전기요금이 1억2천7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12∼13년이 지나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ESS 시스템의 효용은 인정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도입을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가 경제성을 갖추려면 투자비 회수 기간을 6∼7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치 비용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업계에서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차를 극대화해 비용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면 피크시간대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ESS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는 10월에 있을 전력요금개편의 초점을 피크시간대 요금 조정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산업체에서의 ESS 보급을 확산하려면 피크시간 요금에 변화를 줘야 한다"며 피크시간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중견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력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에 ESS·EMS 도입의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면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센터장은 "수요자원시장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잘 조정·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전력난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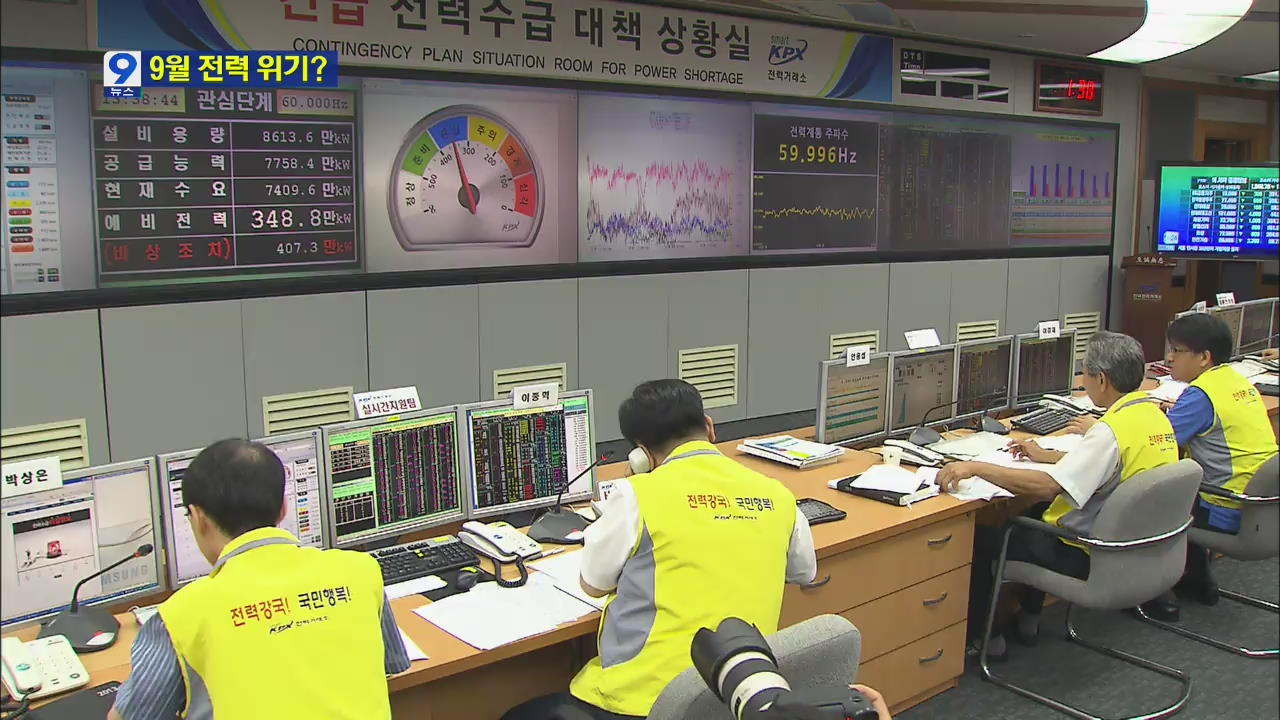


![[앵커&리포트] 원전 비리 여파…겨울 전력대란 우려](/data/news/2013/08/21/2711347_70.jpg)

![[제보] 충남에 시간당 100㎜ <br>물 폭탄…비 피해 잇따라](/data/fckeditor/vod/2025/07/17/305901752740988696.png)

![[단독] “김건희 집사가 투자 검토 요청”…180억 투자사들 소환 임박](/data/news/2025/07/16/20250716_uOGzrO.pn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