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재활용 안 돼 버려지는 자원 2조 원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의 날인데요.
우리 나라의 자원 재활용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 종이팩은 1년에 6만 5천여 톤이 생산되지만 이 가운데 2/3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생 나무 85만 그루가 매년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김성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주택가, 골목에 쌓인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니 빈 깡통과 우유팩 등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분리해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녹취> 박태선(환경미화원) : "이거는 재활용 되는 거고요. 요것도 재활용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들이죠."
분리 배출을 한 경우에도 깡통과 병 등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수거 업체는 배출물을 선별장에 모아놓고 다시 분류 작업을 해야합니다.
<인터뷰> 임재완(재활용품 수거업체 사장) : "모든것을 인원에 의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빈병을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바로 거절합니다.
<녹취> 편의점 직원(음성변조) : "처음에는 우리가 받았는데...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놔요?"
슈퍼마켓도 사정은 마찬가지.
<녹취> 슈퍼마켓 주인(음성변조) : "큰 돈 안 되니까 그냥 고물상 장사 아저씨 드리세요."
맥주병 50원, 소주병은 40원을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은 약 42%.
재활용되지 못한 채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자원은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는 하루 평균 만 5천톤의 생활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20여년 동안 매일 땅에 묻히다보니까 축구장 2천 8백개 크기의 이 넓은 매립지가 이제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묻혀버리는 쓰레기 가운데 무려 70%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페트병은 합성섬유인 폴리에틸렌이 주요 원료입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 폴리에틸렌을 다시 추출하면 생활용품은 물론 운동복과 청바지까지 만들수 있습니다.
건전지는 철과 아연, 이산화망간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폐건전지를 잘게 부순 다음, 자석을 이용해 금속을 추출하면 거의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국내 재활용 산업은 1조 7천억원 규모로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분리 수거가 잘 돼 원재료를 계속 공급해줘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 설비 용량의 1/3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리 배출과 수거가 잘 안되는 걸까요?
우선 빈병 회수 사례에서 보듯 분리 배출을 잘해도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자원이라보다는 쓰레기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독일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두둑한 가방을 들고 슈퍼마켓에 들른 시민들,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빈병을 자동으로 분리해 수거하는 기계입니다.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등을 함께 넣어도 재활용 목적에 맞게 병을 종류별로 구분해 냅니다.
독일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수퍼마켓 관계자 : "스캔 형식으로 기계에서 자동으로 병들이 구분됩니다. "
사람들이 빈병을 모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판트라고 불리는 보증금 제도 때문입니다.
상품 구매가에는 병당 400원 가까운 보증금이 포함돼 있는데, 소비자는 병을 반납해야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여자 : "물 값만 치면 280원인데 병 보증금이 370원이나 되잖아요."
<인터뷰> 남자 : "보증금 유치 제도가 없다면 아마 공병을 모아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반 주택이나 대형 빌딩 할 것 없이 갖추고 있는 분리 수거 콘테이너도 독일 자원 재활용의 상징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두 소비자들이 내는데, 배출물을 구분하지 않고 버린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합니다.
2011년 기준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69%.
높은 재활용률은 독일의 관련 산업 규모가우리돈으로 100조 원을 훌쩍 넘는 원동력이 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뉴스] 재활용 안 돼 버려지는 자원 2조 원
-
- 입력 2013-09-06 21:31:26
- 수정2013-09-06 22:21:21

오늘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의 날인데요.
우리 나라의 자원 재활용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 종이팩은 1년에 6만 5천여 톤이 생산되지만 이 가운데 2/3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생 나무 85만 그루가 매년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김성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주택가, 골목에 쌓인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니 빈 깡통과 우유팩 등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분리해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녹취> 박태선(환경미화원) : "이거는 재활용 되는 거고요. 요것도 재활용 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들이죠."
분리 배출을 한 경우에도 깡통과 병 등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수거 업체는 배출물을 선별장에 모아놓고 다시 분류 작업을 해야합니다.
<인터뷰> 임재완(재활용품 수거업체 사장) : "모든것을 인원에 의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빈병을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바로 거절합니다.
<녹취> 편의점 직원(음성변조) : "처음에는 우리가 받았는데...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놔요?"
슈퍼마켓도 사정은 마찬가지.
<녹취> 슈퍼마켓 주인(음성변조) : "큰 돈 안 되니까 그냥 고물상 장사 아저씨 드리세요."
맥주병 50원, 소주병은 40원을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놨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양은 약 42%.
재활용되지 못한 채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는 자원은 연간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는 하루 평균 만 5천톤의 생활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20여년 동안 매일 땅에 묻히다보니까 축구장 2천 8백개 크기의 이 넓은 매립지가 이제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묻혀버리는 쓰레기 가운데 무려 70%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페트병은 합성섬유인 폴리에틸렌이 주요 원료입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 폴리에틸렌을 다시 추출하면 생활용품은 물론 운동복과 청바지까지 만들수 있습니다.
건전지는 철과 아연, 이산화망간 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폐건전지를 잘게 부순 다음, 자석을 이용해 금속을 추출하면 거의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국내 재활용 산업은 1조 7천억원 규모로 EU 국가들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분리 수거가 잘 돼 원재료를 계속 공급해줘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 설비 용량의 1/3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리 배출과 수거가 잘 안되는 걸까요?
우선 빈병 회수 사례에서 보듯 분리 배출을 잘해도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자원이라보다는 쓰레기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독일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두둑한 가방을 들고 슈퍼마켓에 들른 시민들,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빈병을 자동으로 분리해 수거하는 기계입니다.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등을 함께 넣어도 재활용 목적에 맞게 병을 종류별로 구분해 냅니다.
독일 어디를 가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수퍼마켓 관계자 : "스캔 형식으로 기계에서 자동으로 병들이 구분됩니다. "
사람들이 빈병을 모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판트라고 불리는 보증금 제도 때문입니다.
상품 구매가에는 병당 400원 가까운 보증금이 포함돼 있는데, 소비자는 병을 반납해야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여자 : "물 값만 치면 280원인데 병 보증금이 370원이나 되잖아요."
<인터뷰> 남자 : "보증금 유치 제도가 없다면 아마 공병을 모아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반 주택이나 대형 빌딩 할 것 없이 갖추고 있는 분리 수거 콘테이너도 독일 자원 재활용의 상징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두 소비자들이 내는데, 배출물을 구분하지 않고 버린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합니다.
2011년 기준 독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69%.
높은 재활용률은 독일의 관련 산업 규모가우리돈으로 100조 원을 훌쩍 넘는 원동력이 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김성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이영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앵커&리포트] 카지노 딜러 뽑는데 ‘관광공사’ 직원 자녀 채용](https://news.kbs.co.kr/data/news/2013/09/06/2720030_190.jpg)
![[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 통과…<br>국민의힘 퇴장·민주당 단독 처리](/data/layer/904/2025/07/20250704_YazNaR.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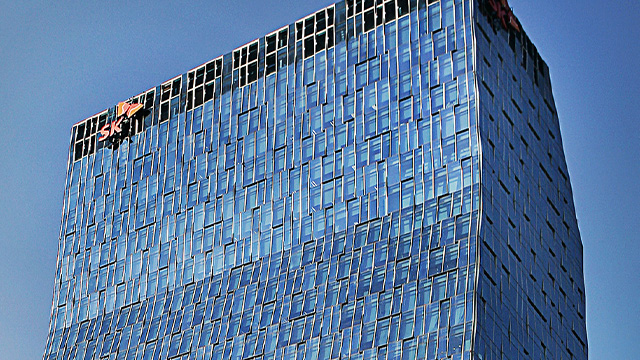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