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고시원과 쪽방 전전…25만 가구의 비애!
입력 2013.12.09 (16:35)
수정 2013.12.09 (16: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박민규의 소설집 <카스테라>에 나오는 ‘갑을고시원 체류기’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집에 얹혀 살다 눈칫밥을 견디지 못한 주인공은 결국 고시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고시원? 여긴 고시공부 하는 데잖아? 차에서 내린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역시 걱정이 들긴 마찬가지였지만 내심 고시생이라 우기면 되겠지 정도의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미 그 무렵부터 세상의 고시원들이 여인숙의 대용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걱정도 팔자였던 것이다. 변화의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무튼 1991년은 일용직 노무자들이나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고시원을 숙소로 쓰기 시작한 무렵이자 그런 고시원에서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이 남아 있던 마지막 시기였다. (박민규 단편집 <카스테라> 中 ‘갑을고시원 체류기’)
박민규는 고시원이라는 보통명사의 의미가 ‘고시생이 공부하는 곳’에서 ‘경제적 하층민의 주거지’로 변화되는 1990년 대 초, 시대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jpg)
이런 고시원과 함께 경제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관, 쪽방 같은 곳입니다. 이처럼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주택 거주 가구’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비주택 거주 가구’의 수가 2005년 5만 6천가구에서 2010년 12만 9천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한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비주택 거주 가구의 수는 25만 6천가구에 이릅니다. (이 수치가 나온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배경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고시원이든 여관이든 1~2평 정도 되는 공간에 주방은 물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설적인 건 주거 상황이 열악해질수록 평당 임대료가‘정상적인’ 주택보다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한 달 월세가 30~40만 원인 고시원과 여관의 평당 임대료가 고급아파트의 대명사격인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구의 평균 월 수입은 100만 원.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다보면 결국 현재 주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단체와 함께 이런 비주택 주거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12월6일 9시뉴스)에 나왔던 윤혜진(가명) 씨는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지난 주 보증금 400만 원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 400만 원 짜리 방이 좋아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월세 37만 원을 아낄 수가 있고,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있어 삶의 질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반론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대체 어디까지 국가가,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건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권(住居權)’입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3항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헌법상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로 의(衣)식(食)주(住)를 듭니다. 저렴한 가격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인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입을 게 없어 헐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여전히 결식아동이 존재하고 한 끼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지만, 그래도 사정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이어트에 목 맨 현실, 그리고 이제는 ‘비만’이 부의 상징이 아니라 가난의 상징이 되버린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6년 국회 심상정 의원실에서 ‘판잣집과 움막, 동굴에 11만 명이 산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동(洞)은 전체 가구의 27%가 판잣집과 비닐집, 움막에 산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손낙구 著 <부동산 계급사회> 中)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자기 집에 사는 비율’, 즉 자가 거주율이 1970년만 해도 72%나 됐습니다. 세입자로 살고 있는 비율은 26%였구요. 그런데 2005년 조사를 보면 자가 비율이 56%로 떨어지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비율은 41%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 35년간 한국 경제는 세계사적으로 유래 없는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도 엄청나게 지었고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셋 중 어떤 일을 떠올린다 해도 간신히, 간신히, 안간힘을 다해 할 수 있었다는 생각 뿐이다. 과연 인생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힘들었고 그나마 나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 역시나 간신히 나는 작은 임대아파트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입주를 하던 날 나는 울었다. 아마 당신이라도 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갑을고시원 체류기의 주인공은 다행히 고시원을 탈출했습니다. ‘해피엔딩’인 셈이죠. 현실에서 고시원과 여관, 쪽방에 살고 있는 25만 가구의 미래도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고시원과 쪽방 전전…25만 가구의 비애!
-
- 입력 2013-12-09 16:35:29
- 수정2013-12-09 16:46:00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박민규의 소설집 <카스테라>에 나오는 ‘갑을고시원 체류기’라는 단편소설인데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집에 얹혀 살다 눈칫밥을 견디지 못한 주인공은 결국 고시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고시원? 여긴 고시공부 하는 데잖아? 차에서 내린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 역시 걱정이 들긴 마찬가지였지만 내심 고시생이라 우기면 되겠지 정도의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미 그 무렵부터 세상의 고시원들이 여인숙의 대용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걱정도 팔자였던 것이다. 변화의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무튼 1991년은 일용직 노무자들이나 유흥업소의 종업원들이 고시원을 숙소로 쓰기 시작한 무렵이자 그런 고시원에서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이 남아 있던 마지막 시기였다. (박민규 단편집 <카스테라> 中 ‘갑을고시원 체류기’)
박민규는 고시원이라는 보통명사의 의미가 ‘고시생이 공부하는 곳’에서 ‘경제적 하층민의 주거지’로 변화되는 1990년 대 초, 시대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jpg)
이런 고시원과 함께 경제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관, 쪽방 같은 곳입니다. 이처럼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주택 거주 가구’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비주택 거주 가구’의 수가 2005년 5만 6천가구에서 2010년 12만 9천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한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비주택 거주 가구의 수는 25만 6천가구에 이릅니다. (이 수치가 나온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배경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고시원이든 여관이든 1~2평 정도 되는 공간에 주방은 물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설적인 건 주거 상황이 열악해질수록 평당 임대료가‘정상적인’ 주택보다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한 달 월세가 30~40만 원인 고시원과 여관의 평당 임대료가 고급아파트의 대명사격인 타워팰리스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구의 평균 월 수입은 100만 원.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다보면 결국 현재 주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단체와 함께 이런 비주택 주거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12월6일 9시뉴스)에 나왔던 윤혜진(가명) 씨는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지난 주 보증금 400만 원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 400만 원 짜리 방이 좋아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월세 37만 원을 아낄 수가 있고,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있어 삶의 질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반론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대체 어디까지 국가가,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건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권(住居權)’입니다. 우리 헌법 제35조 3항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헌법상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로 의(衣)식(食)주(住)를 듭니다. 저렴한 가격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인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입을 게 없어 헐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여전히 결식아동이 존재하고 한 끼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있지만, 그래도 사정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이어트에 목 맨 현실, 그리고 이제는 ‘비만’이 부의 상징이 아니라 가난의 상징이 되버린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6년 국회 심상정 의원실에서 ‘판잣집과 움막, 동굴에 11만 명이 산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동(洞)은 전체 가구의 27%가 판잣집과 비닐집, 움막에 산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손낙구 著 <부동산 계급사회> 中)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자기 집에 사는 비율’, 즉 자가 거주율이 1970년만 해도 72%나 됐습니다. 세입자로 살고 있는 비율은 26%였구요. 그런데 2005년 조사를 보면 자가 비율이 56%로 떨어지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비율은 41%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 35년간 한국 경제는 세계사적으로 유래 없는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도 엄청나게 지었고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셋 중 어떤 일을 떠올린다 해도 간신히, 간신히, 안간힘을 다해 할 수 있었다는 생각 뿐이다. 과연 인생은 고시를 패스하는 것보다 힘들었고 그나마 나는 운이 좋았다는 생각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 역시나 간신히 나는 작은 임대아파트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입주를 하던 날 나는 울었다. 아마 당신이라도 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갑을고시원 체류기의 주인공은 다행히 고시원을 탈출했습니다. ‘해피엔딩’인 셈이죠. 현실에서 고시원과 여관, 쪽방에 살고 있는 25만 가구의 미래도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요?
-
-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이철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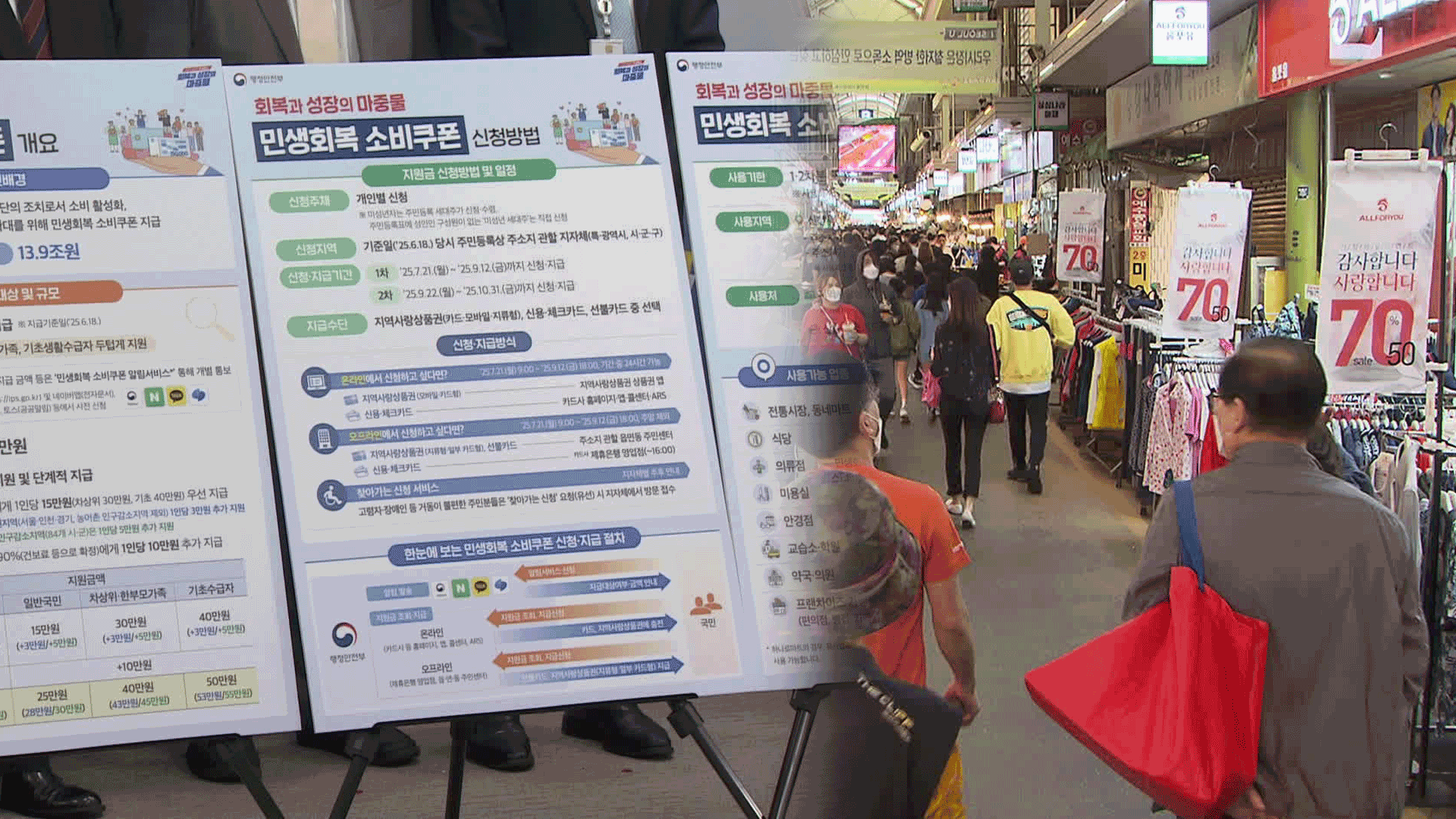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