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아이티 대지진 4년, 그 현장 (2월 15일 방송)
입력 2014.02.13 (18:24)
수정 2014.02.14 (1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0만 명의 사망자와 150만 명의 이재민을 낳은 아이티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다. 그간 있어 왔던 국제사회와 아이티 정부의 노력에도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는 여전히 집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1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임시 수용소에서 낮에는 질병과 무더위, 밤에는 추위와 범죄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특파원이 아이티 대지진의 현장을 다시 찾았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도심 한복판의 대형 성당은 외벽이 모조리 무너졌고 뼈대만 남았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운 모습은 4년 전 지진 당시 모습 그대로다. 어디를 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새로 짓기는커녕 철거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지진피해 주민들의 삶은 처참하다. 실업률이 70%를 웃돌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부서진 건물의 콘크리트 더미에서 발라낸 철근을 내다 팔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 교통망의 확충도 요원해 사람은 물론 물자 수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열악한 의료 시설과 위생환경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아이티에 주둔한 유엔군이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콜레라로 지난해까지 7천5백 명이 숨졌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티 재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4년 전 국제 사회는 아이티에 모두 14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들어온 구호 기금은 절반에 불과했다. 아이티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진 당시의 약속대로 원조를 이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아이티 정부가 국제사회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흙탕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민 재활 움직임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로 자활을 돕는 것이 아이티 재건의 출발이라는 취지로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아이티 북부의 농촌도시 카라콜에 자리한 한국의 제조업체는 최근 2년간 2,500명의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다. 자녀들을 위한 학교까지 지어주면서 자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집시, 유럽의 2류 시민
담당 : 이영석 순회특파원
순례자라는 뜻의 ‘로마’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유랑민족 ‘집시.’ 우리에게는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자유인 이미지로 더 친숙하다. 집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유럽 전역에 1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하지만 집시는 유럽 내 최빈곤 소수 민족. 경제난을 겪는 유럽 각국에서 집시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프랑스는 사상 최대인 2만 명의 집시를 추방했다. 특파원이 ‘집시의 삶’을 불가리아에서 현지 취재했다.
집시는 유럽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게으름뱅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편견은 이들에게 씌워진 오래된 굴레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도심에서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집시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생을 포기한 듯 노숙자로 살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로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반 집시 움직임이 커지면서 자신의 출신을 숨기는 집시들도 늘고 있다.
불가리아 중부 농촌에는 집시 6천 명이 살고 있는 집시 정착촌이 있다. 집시들은 사회에 흡수, 동화되기 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향에 정착해 살 수 있는 집시들은 많지 않다. 취재진이 만난 벌목공 흐리스토 씨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다 배타적이기까지 한 집시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루 꼬박 8시간씩 힘들게 나무를 베어내며 버는 돈은 한 달에 우리 돈 20만 원 남짓. 번듯하게 자식을 키우고 싶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허드렛일에 종사하며 사회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집시들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자신들을 보호할 국가나 정부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타민족과의 동화도 거부한 탓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집시들은 유럽을 휩쓴 경제난까지 겹쳐 2류 시민으로 전락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텨가는 생활은 30년 전, 50년 전과 비교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천 년 전 인도 북부에서 유랑을 시작해 유럽으로 건너온 집시. 중세엔 마녀사냥을 당했고, 2차 대전 때는 나치의 집단 학살 대상이 됐다. 끊임없는 차별과 박해 속에서 이들은 오늘도 자유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도심 한복판의 대형 성당은 외벽이 모조리 무너졌고 뼈대만 남았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운 모습은 4년 전 지진 당시 모습 그대로다. 어디를 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새로 짓기는커녕 철거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지진피해 주민들의 삶은 처참하다. 실업률이 70%를 웃돌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부서진 건물의 콘크리트 더미에서 발라낸 철근을 내다 팔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 교통망의 확충도 요원해 사람은 물론 물자 수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열악한 의료 시설과 위생환경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아이티에 주둔한 유엔군이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콜레라로 지난해까지 7천5백 명이 숨졌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티 재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4년 전 국제 사회는 아이티에 모두 14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들어온 구호 기금은 절반에 불과했다. 아이티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진 당시의 약속대로 원조를 이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아이티 정부가 국제사회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흙탕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민 재활 움직임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로 자활을 돕는 것이 아이티 재건의 출발이라는 취지로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아이티 북부의 농촌도시 카라콜에 자리한 한국의 제조업체는 최근 2년간 2,500명의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다. 자녀들을 위한 학교까지 지어주면서 자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집시, 유럽의 2류 시민
담당 : 이영석 순회특파원
순례자라는 뜻의 ‘로마’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유랑민족 ‘집시.’ 우리에게는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자유인 이미지로 더 친숙하다. 집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유럽 전역에 1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하지만 집시는 유럽 내 최빈곤 소수 민족. 경제난을 겪는 유럽 각국에서 집시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프랑스는 사상 최대인 2만 명의 집시를 추방했다. 특파원이 ‘집시의 삶’을 불가리아에서 현지 취재했다.
집시는 유럽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게으름뱅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편견은 이들에게 씌워진 오래된 굴레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도심에서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집시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생을 포기한 듯 노숙자로 살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로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반 집시 움직임이 커지면서 자신의 출신을 숨기는 집시들도 늘고 있다.
불가리아 중부 농촌에는 집시 6천 명이 살고 있는 집시 정착촌이 있다. 집시들은 사회에 흡수, 동화되기 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향에 정착해 살 수 있는 집시들은 많지 않다. 취재진이 만난 벌목공 흐리스토 씨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다 배타적이기까지 한 집시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루 꼬박 8시간씩 힘들게 나무를 베어내며 버는 돈은 한 달에 우리 돈 20만 원 남짓. 번듯하게 자식을 키우고 싶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허드렛일에 종사하며 사회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집시들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자신들을 보호할 국가나 정부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타민족과의 동화도 거부한 탓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집시들은 유럽을 휩쓴 경제난까지 겹쳐 2류 시민으로 전락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텨가는 생활은 30년 전, 50년 전과 비교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천 년 전 인도 북부에서 유랑을 시작해 유럽으로 건너온 집시. 중세엔 마녀사냥을 당했고, 2차 대전 때는 나치의 집단 학살 대상이 됐다. 끊임없는 차별과 박해 속에서 이들은 오늘도 자유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리보기] 아이티 대지진 4년, 그 현장 (2월 15일 방송)
-
- 입력 2014-02-13 18:24:58
- 수정2014-02-14 15:13:31

30만 명의 사망자와 150만 명의 이재민을 낳은 아이티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다. 그간 있어 왔던 국제사회와 아이티 정부의 노력에도 피해 복구는 더디기만 하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는 여전히 집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1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임시 수용소에서 낮에는 질병과 무더위, 밤에는 추위와 범죄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특파원이 아이티 대지진의 현장을 다시 찾았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도심 한복판의 대형 성당은 외벽이 모조리 무너졌고 뼈대만 남았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운 모습은 4년 전 지진 당시 모습 그대로다. 어디를 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새로 짓기는커녕 철거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지진피해 주민들의 삶은 처참하다. 실업률이 70%를 웃돌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부서진 건물의 콘크리트 더미에서 발라낸 철근을 내다 팔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 교통망의 확충도 요원해 사람은 물론 물자 수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열악한 의료 시설과 위생환경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아이티에 주둔한 유엔군이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콜레라로 지난해까지 7천5백 명이 숨졌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티 재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4년 전 국제 사회는 아이티에 모두 14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들어온 구호 기금은 절반에 불과했다. 아이티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진 당시의 약속대로 원조를 이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아이티 정부가 국제사회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흙탕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민 재활 움직임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로 자활을 돕는 것이 아이티 재건의 출발이라는 취지로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아이티 북부의 농촌도시 카라콜에 자리한 한국의 제조업체는 최근 2년간 2,500명의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다. 자녀들을 위한 학교까지 지어주면서 자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집시, 유럽의 2류 시민
담당 : 이영석 순회특파원
순례자라는 뜻의 ‘로마’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유랑민족 ‘집시.’ 우리에게는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자유인 이미지로 더 친숙하다. 집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유럽 전역에 1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하지만 집시는 유럽 내 최빈곤 소수 민족. 경제난을 겪는 유럽 각국에서 집시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프랑스는 사상 최대인 2만 명의 집시를 추방했다. 특파원이 ‘집시의 삶’을 불가리아에서 현지 취재했다.
집시는 유럽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게으름뱅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편견은 이들에게 씌워진 오래된 굴레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도심에서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집시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생을 포기한 듯 노숙자로 살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로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반 집시 움직임이 커지면서 자신의 출신을 숨기는 집시들도 늘고 있다.
불가리아 중부 농촌에는 집시 6천 명이 살고 있는 집시 정착촌이 있다. 집시들은 사회에 흡수, 동화되기 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향에 정착해 살 수 있는 집시들은 많지 않다. 취재진이 만난 벌목공 흐리스토 씨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다 배타적이기까지 한 집시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루 꼬박 8시간씩 힘들게 나무를 베어내며 버는 돈은 한 달에 우리 돈 20만 원 남짓. 번듯하게 자식을 키우고 싶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허드렛일에 종사하며 사회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집시들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자신들을 보호할 국가나 정부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타민족과의 동화도 거부한 탓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집시들은 유럽을 휩쓴 경제난까지 겹쳐 2류 시민으로 전락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텨가는 생활은 30년 전, 50년 전과 비교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천 년 전 인도 북부에서 유랑을 시작해 유럽으로 건너온 집시. 중세엔 마녀사냥을 당했고, 2차 대전 때는 나치의 집단 학살 대상이 됐다. 끊임없는 차별과 박해 속에서 이들은 오늘도 자유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도심 한복판의 대형 성당은 외벽이 모조리 무너졌고 뼈대만 남았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운 모습은 4년 전 지진 당시 모습 그대로다. 어디를 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무너지고 부서진 건물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새로 짓기는커녕 철거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지진피해 주민들의 삶은 처참하다. 실업률이 70%를 웃돌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부서진 건물의 콘크리트 더미에서 발라낸 철근을 내다 팔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 교통망의 확충도 요원해 사람은 물론 물자 수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열악한 의료 시설과 위생환경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아이티에 주둔한 유엔군이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콜레라로 지난해까지 7천5백 명이 숨졌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티 재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다. 4년 전 국제 사회는 아이티에 모두 140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들어온 구호 기금은 절반에 불과했다. 아이티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진 당시의 약속대로 원조를 이행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아이티 정부가 국제사회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흙탕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주민 재활 움직임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로 자활을 돕는 것이 아이티 재건의 출발이라는 취지로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아이티 북부의 농촌도시 카라콜에 자리한 한국의 제조업체는 최근 2년간 2,500명의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다. 자녀들을 위한 학교까지 지어주면서 자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집시, 유럽의 2류 시민
담당 : 이영석 순회특파원
순례자라는 뜻의 ‘로마’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유랑민족 ‘집시.’ 우리에게는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자유인 이미지로 더 친숙하다. 집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유럽 전역에 1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하지만 집시는 유럽 내 최빈곤 소수 민족. 경제난을 겪는 유럽 각국에서 집시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프랑스는 사상 최대인 2만 명의 집시를 추방했다. 특파원이 ‘집시의 삶’을 불가리아에서 현지 취재했다.
집시는 유럽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게으름뱅이, 범죄의 온상’이라는 편견은 이들에게 씌워진 오래된 굴레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도심에서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집시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생을 포기한 듯 노숙자로 살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로 연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반 집시 움직임이 커지면서 자신의 출신을 숨기는 집시들도 늘고 있다.
불가리아 중부 농촌에는 집시 6천 명이 살고 있는 집시 정착촌이 있다. 집시들은 사회에 흡수, 동화되기 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풍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향에 정착해 살 수 있는 집시들은 많지 않다. 취재진이 만난 벌목공 흐리스토 씨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다 배타적이기까지 한 집시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루 꼬박 8시간씩 힘들게 나무를 베어내며 버는 돈은 한 달에 우리 돈 20만 원 남짓. 번듯하게 자식을 키우고 싶지만 먹고 살기도 빠듯한 돈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허드렛일에 종사하며 사회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집시들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자신들을 보호할 국가나 정부를 구성하지도 못하고 타민족과의 동화도 거부한 탓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집시들은 유럽을 휩쓴 경제난까지 겹쳐 2류 시민으로 전락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텨가는 생활은 30년 전, 50년 전과 비교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천 년 전 인도 북부에서 유랑을 시작해 유럽으로 건너온 집시. 중세엔 마녀사냥을 당했고, 2차 대전 때는 나치의 집단 학살 대상이 됐다. 끊임없는 차별과 박해 속에서 이들은 오늘도 자유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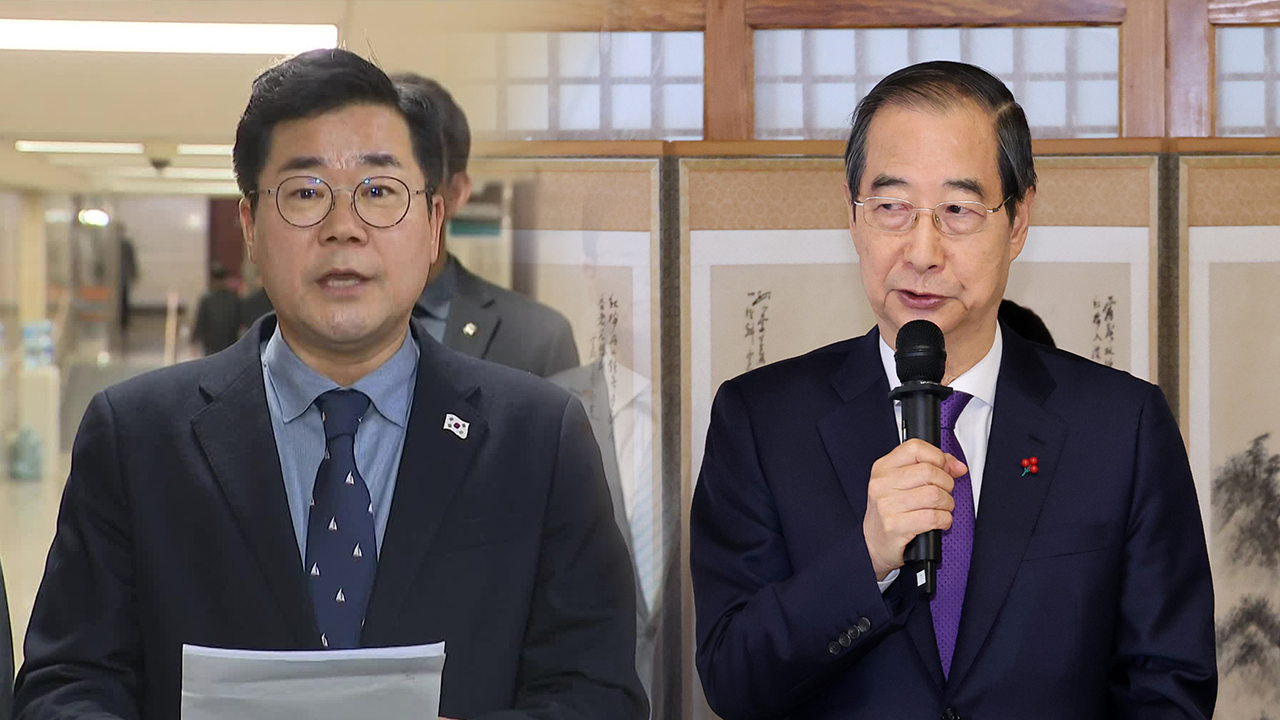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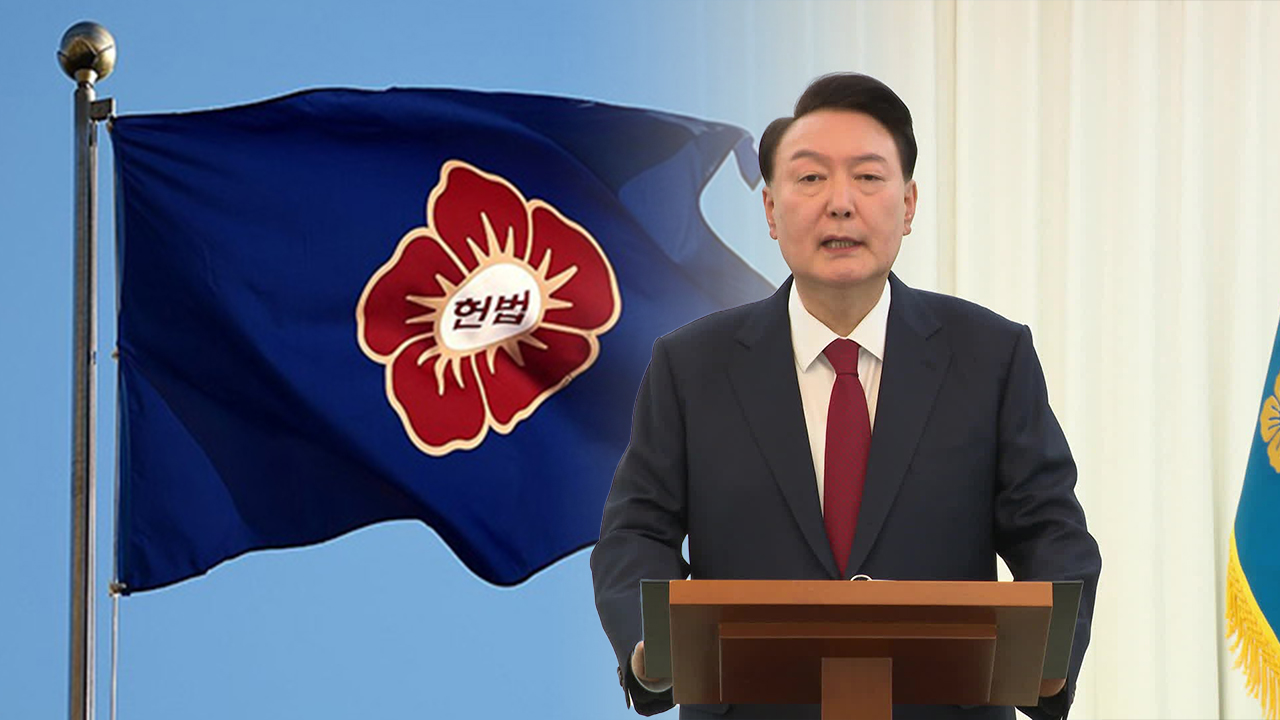
![[단독] “국방정보본부장도 <br>‘계엄’ 논의 때 배석”…공수처 진술 확보](/data/layer/904/2024/12/20241226_FJUqup.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