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10명 사망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트리아지’ 작동했다면?
입력 2014.02.21 (11:37)
수정 2014.02.21 (14: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명의 사망자 등 1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인명 피해를 더 줄일 수는 없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당시 상황을 취재팀이 면밀히 분석해봤다.
우선, 리조트 붕괴사고 직후 현장으로 접근하는 하나뿐인 진입로가 마비됐다. 현지 소방대 증언에 의하면 구급차 58대, 여기에 기중기 등 중장비까지 소방 장비만 100여 대, 언론사 취재차량까지 밀려든 탓이라고 한다. 현장 지휘소 격인 응급의료소가 마련된 것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인 밤 11시 40분이다. 그 사이 전체 부상자의 절반이 넘는 70여 명이 부상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없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스쿱앤 런(scoop & run)이라고 한다. 일단 환자를 싣고 달린다는 뜻이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최선이란 개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환자가 한꺼번에 밀려든 병원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 40명이 넘는 환자가 침대가 10개뿐인 응급실에 몰려들기도 했다. 만약 중환자라도 섞여있다면 치료가 늦어지면서 추가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환자가 몰린 병원엔 골절 환자도 몇 명 안 됐고 대부분은 머리 부분이 일부 찢어진 수준의 환자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병원 처치에서 큰 문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몰릴 경우 중환에 대한 응급처치를 놓칠 수 있는 우려는 여전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형 재난과 사건 사고를 찾아봤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코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사고 때는 180여 명 부상에 3명 사망, 그보다 앞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도 같은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 수는 훨씬 많았지만 사망자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었다. 물론 재난과 사고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대형 재난 사고에 사망자 수가 더 적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면 아무리 뛰어난 응급체계도 소용없다. 문제는 부상자다.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는 생명과 직결된다. 한두 명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냥 실어서 가장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는 스쿱앤 런은 효과적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난 현장 주변 의료자원은 한정돼있는 상황. 수백 명의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무조건 빨리 보낸다면 응급실은 경증과 중증 환자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jpg)
미국에선 재난으로 대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트리아지(Triage)'가 현장에서 작동한다. '트리아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 부상에 따라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부상 종류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환자 분류는 수분에서 수시간 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긴급부터 응급, 비응급, 사망으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부상자를 분류해 각각 빨강, 노랑, 초록, 검은색 표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이송을 결정한다. 이 트리아지 시스템은 대량 환자 발생을 전제로 사망률을 낮추는 개념이다. 부상자를 여러 병원으로 분산 치료하고,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를 골라내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보내면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 미국에선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 현장에서 즉각적인 트리아지를 적용해, 적합한 8~9개 병원으로 분산 치료를 했고,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jpg)
물론 우리나라도 매뉴얼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대응체계를 보면, 대량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가 설치되고 '트리아지'가 작동하는데, 이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에선 응급의료소 설치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답은 간단하다. 현장 응급의료소가 최초 구조대만큼 빨리 도착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인으로 구성된 팀이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긴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무엇이 최선일까? 결국 최초 구조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를 하면서 부상자 '트리아지'를 해줘야 한다. 최초 구조팀이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환자가 한 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이송할 병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재난시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재난 현장에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보다 값질 수 있도록 이제라도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국이 우선 최초 구조팀부터 '트리아지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리조트 붕괴사고 직후 현장으로 접근하는 하나뿐인 진입로가 마비됐다. 현지 소방대 증언에 의하면 구급차 58대, 여기에 기중기 등 중장비까지 소방 장비만 100여 대, 언론사 취재차량까지 밀려든 탓이라고 한다. 현장 지휘소 격인 응급의료소가 마련된 것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인 밤 11시 40분이다. 그 사이 전체 부상자의 절반이 넘는 70여 명이 부상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없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스쿱앤 런(scoop & run)이라고 한다. 일단 환자를 싣고 달린다는 뜻이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최선이란 개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환자가 한꺼번에 밀려든 병원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 40명이 넘는 환자가 침대가 10개뿐인 응급실에 몰려들기도 했다. 만약 중환자라도 섞여있다면 치료가 늦어지면서 추가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환자가 몰린 병원엔 골절 환자도 몇 명 안 됐고 대부분은 머리 부분이 일부 찢어진 수준의 환자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병원 처치에서 큰 문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몰릴 경우 중환에 대한 응급처치를 놓칠 수 있는 우려는 여전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형 재난과 사건 사고를 찾아봤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코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사고 때는 180여 명 부상에 3명 사망, 그보다 앞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도 같은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 수는 훨씬 많았지만 사망자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었다. 물론 재난과 사고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대형 재난 사고에 사망자 수가 더 적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면 아무리 뛰어난 응급체계도 소용없다. 문제는 부상자다.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는 생명과 직결된다. 한두 명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냥 실어서 가장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는 스쿱앤 런은 효과적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난 현장 주변 의료자원은 한정돼있는 상황. 수백 명의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무조건 빨리 보낸다면 응급실은 경증과 중증 환자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jpg)
미국에선 재난으로 대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트리아지(Triage)'가 현장에서 작동한다. '트리아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 부상에 따라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부상 종류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환자 분류는 수분에서 수시간 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긴급부터 응급, 비응급, 사망으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부상자를 분류해 각각 빨강, 노랑, 초록, 검은색 표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이송을 결정한다. 이 트리아지 시스템은 대량 환자 발생을 전제로 사망률을 낮추는 개념이다. 부상자를 여러 병원으로 분산 치료하고,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를 골라내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보내면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 미국에선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 현장에서 즉각적인 트리아지를 적용해, 적합한 8~9개 병원으로 분산 치료를 했고,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jpg)
물론 우리나라도 매뉴얼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대응체계를 보면, 대량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가 설치되고 '트리아지'가 작동하는데, 이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에선 응급의료소 설치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답은 간단하다. 현장 응급의료소가 최초 구조대만큼 빨리 도착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인으로 구성된 팀이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긴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무엇이 최선일까? 결국 최초 구조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를 하면서 부상자 '트리아지'를 해줘야 한다. 최초 구조팀이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환자가 한 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이송할 병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재난시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재난 현장에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보다 값질 수 있도록 이제라도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국이 우선 최초 구조팀부터 '트리아지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10명 사망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트리아지’ 작동했다면?
-
- 입력 2014-02-21 11:37:56
- 수정2014-02-21 14:04:45

10명의 사망자 등 1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인명 피해를 더 줄일 수는 없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당시 상황을 취재팀이 면밀히 분석해봤다.
우선, 리조트 붕괴사고 직후 현장으로 접근하는 하나뿐인 진입로가 마비됐다. 현지 소방대 증언에 의하면 구급차 58대, 여기에 기중기 등 중장비까지 소방 장비만 100여 대, 언론사 취재차량까지 밀려든 탓이라고 한다. 현장 지휘소 격인 응급의료소가 마련된 것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인 밤 11시 40분이다. 그 사이 전체 부상자의 절반이 넘는 70여 명이 부상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없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스쿱앤 런(scoop & run)이라고 한다. 일단 환자를 싣고 달린다는 뜻이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최선이란 개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환자가 한꺼번에 밀려든 병원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 40명이 넘는 환자가 침대가 10개뿐인 응급실에 몰려들기도 했다. 만약 중환자라도 섞여있다면 치료가 늦어지면서 추가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환자가 몰린 병원엔 골절 환자도 몇 명 안 됐고 대부분은 머리 부분이 일부 찢어진 수준의 환자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병원 처치에서 큰 문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몰릴 경우 중환에 대한 응급처치를 놓칠 수 있는 우려는 여전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형 재난과 사건 사고를 찾아봤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코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사고 때는 180여 명 부상에 3명 사망, 그보다 앞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도 같은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 수는 훨씬 많았지만 사망자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었다. 물론 재난과 사고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대형 재난 사고에 사망자 수가 더 적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면 아무리 뛰어난 응급체계도 소용없다. 문제는 부상자다.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는 생명과 직결된다. 한두 명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냥 실어서 가장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는 스쿱앤 런은 효과적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난 현장 주변 의료자원은 한정돼있는 상황. 수백 명의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무조건 빨리 보낸다면 응급실은 경증과 중증 환자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jpg)
미국에선 재난으로 대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트리아지(Triage)'가 현장에서 작동한다. '트리아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 부상에 따라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부상 종류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환자 분류는 수분에서 수시간 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긴급부터 응급, 비응급, 사망으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부상자를 분류해 각각 빨강, 노랑, 초록, 검은색 표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이송을 결정한다. 이 트리아지 시스템은 대량 환자 발생을 전제로 사망률을 낮추는 개념이다. 부상자를 여러 병원으로 분산 치료하고,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를 골라내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보내면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 미국에선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 현장에서 즉각적인 트리아지를 적용해, 적합한 8~9개 병원으로 분산 치료를 했고,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jpg)
물론 우리나라도 매뉴얼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대응체계를 보면, 대량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가 설치되고 '트리아지'가 작동하는데, 이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에선 응급의료소 설치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답은 간단하다. 현장 응급의료소가 최초 구조대만큼 빨리 도착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인으로 구성된 팀이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긴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무엇이 최선일까? 결국 최초 구조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를 하면서 부상자 '트리아지'를 해줘야 한다. 최초 구조팀이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환자가 한 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이송할 병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재난시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재난 현장에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보다 값질 수 있도록 이제라도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국이 우선 최초 구조팀부터 '트리아지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리조트 붕괴사고 직후 현장으로 접근하는 하나뿐인 진입로가 마비됐다. 현지 소방대 증언에 의하면 구급차 58대, 여기에 기중기 등 중장비까지 소방 장비만 100여 대, 언론사 취재차량까지 밀려든 탓이라고 한다. 현장 지휘소 격인 응급의료소가 마련된 것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인 밤 11시 40분이다. 그 사이 전체 부상자의 절반이 넘는 70여 명이 부상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없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스쿱앤 런(scoop & run)이라고 한다. 일단 환자를 싣고 달린다는 뜻이다.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최선이란 개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환자가 한꺼번에 밀려든 병원에선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 40명이 넘는 환자가 침대가 10개뿐인 응급실에 몰려들기도 했다. 만약 중환자라도 섞여있다면 치료가 늦어지면서 추가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환자가 몰린 병원엔 골절 환자도 몇 명 안 됐고 대부분은 머리 부분이 일부 찢어진 수준의 환자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병원 처치에서 큰 문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환자가 몰릴 경우 중환에 대한 응급처치를 놓칠 수 있는 우려는 여전한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형 재난과 사건 사고를 찾아봤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코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사고 때는 180여 명 부상에 3명 사망, 그보다 앞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도 같은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 수는 훨씬 많았지만 사망자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었다. 물론 재난과 사고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대형 재난 사고에 사망자 수가 더 적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면 아무리 뛰어난 응급체계도 소용없다. 문제는 부상자다.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는 생명과 직결된다. 한두 명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냥 실어서 가장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는 스쿱앤 런은 효과적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난 현장 주변 의료자원은 한정돼있는 상황. 수백 명의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무조건 빨리 보낸다면 응급실은 경증과 중증 환자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jpg)
미국에선 재난으로 대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트리아지(Triage)'가 현장에서 작동한다. '트리아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 부상에 따라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부상 종류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환자 분류는 수분에서 수시간 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긴급부터 응급, 비응급, 사망으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선 최대한 신속하게 부상자를 분류해 각각 빨강, 노랑, 초록, 검은색 표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이송을 결정한다. 이 트리아지 시스템은 대량 환자 발생을 전제로 사망률을 낮추는 개념이다. 부상자를 여러 병원으로 분산 치료하고,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를 골라내 수술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 보내면 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 미국에선 아시아나 항공 착륙 사고나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때 현장에서 즉각적인 트리아지를 적용해, 적합한 8~9개 병원으로 분산 치료를 했고,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jpg)
물론 우리나라도 매뉴얼은 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대응체계를 보면, 대량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가 설치되고 '트리아지'가 작동하는데, 이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에선 응급의료소 설치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답은 간단하다. 현장 응급의료소가 최초 구조대만큼 빨리 도착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인으로 구성된 팀이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긴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무엇이 최선일까? 결국 최초 구조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를 하면서 부상자 '트리아지'를 해줘야 한다. 최초 구조팀이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환자가 한 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이송할 병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재난시 사망률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재난 현장에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보다 값질 수 있도록 이제라도 효율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국이 우선 최초 구조팀부터 '트리아지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

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박광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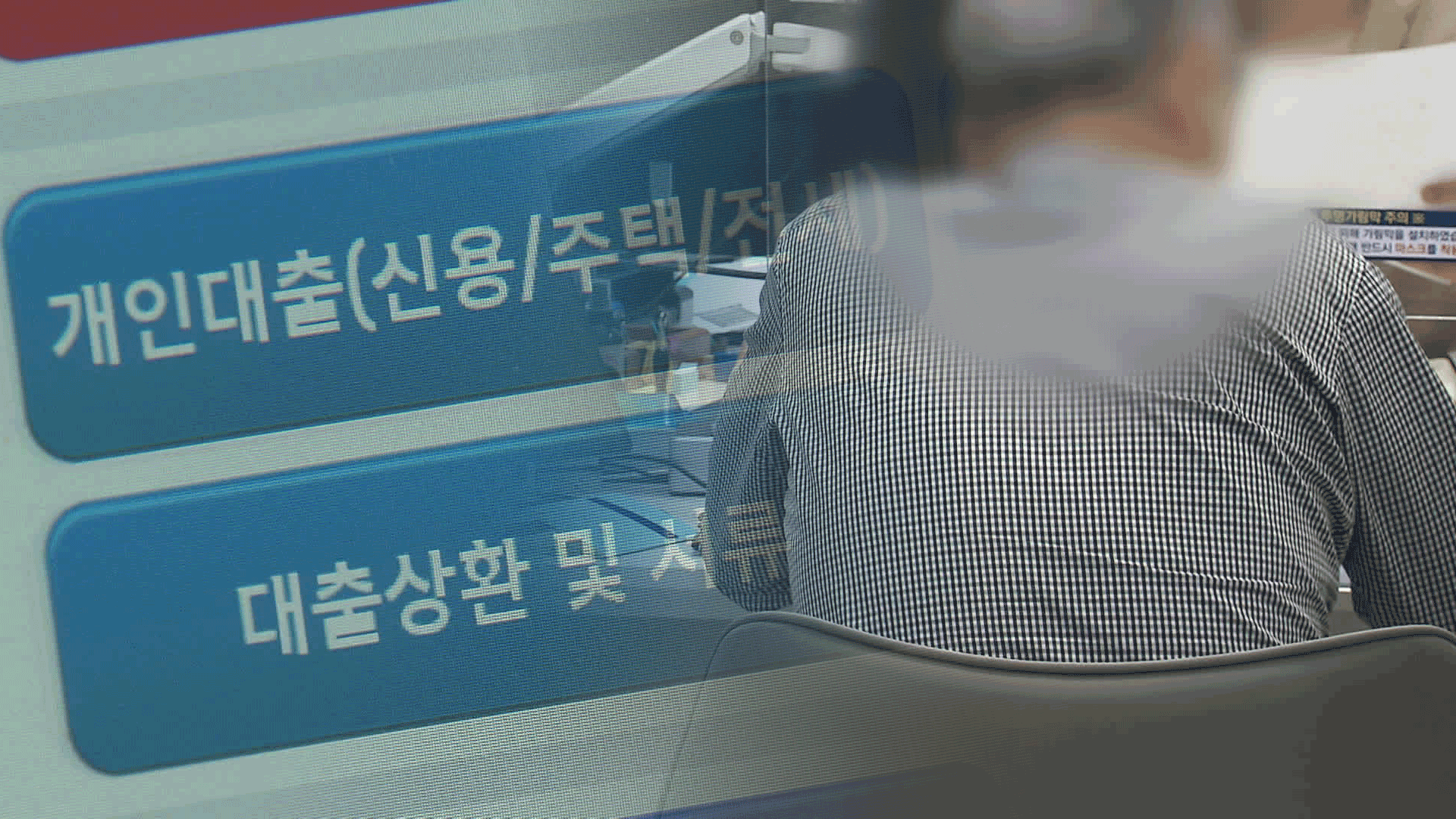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