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2020년 우주강국 진입을 꿈꾸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 마치 거짓말처럼, 세계 우주산업 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전 세계로 긴급 타전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SPACE X)가 세계 최초로 민간 로켓 발사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완공은 2016년. 건설비만 무려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이다. 스페이스 X는 그동안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발사대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
스페이스 X는 세계 우주산업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2012년, 로켓 개발에 뛰어든 지 불과 10년 만에 팰컨 9(FALCON 9)이라는 발사체를 독자 개발해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사실 우주 선진국들은 처음엔 스페이스 X의 야심을 비웃었다. 민간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로 로켓을 만들겠다고? 게다가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기까지 하겠다고? 그러나 설마는 사실로, 조롱은 탄식으로 바뀌었다.
.jpg)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되는 로켓의 주 엔진의 추력은 213톤이다. 우주왕복선엔 이 엔진 세 개를 탑재하니까 전체 추력은 640톤 정도다. 그러나 200톤이 넘는 이 엔진 하나 가격이 무려 360억 원. 우주왕복선 하나에 실리는 엔진 가격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스페이스 X는 이런 방식으론 승산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200톤이 넘는 덩치 큰 엔진 대신 68톤짜리 작은 엔진을 만든 뒤 여러 개를 묶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팰컨 9 로켓은 68톤 엔진 9개를 묶어 600톤이 조금 넘는 추진력을 낸다. 엔진 크기만 작아졌을 뿐 우주왕복선과 맞먹는 추력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왕복선의 평균 발사 비용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우주왕복선 사업이 한창이던 2005년 나사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50억 달러가 오로지 우주왕복선에만 투입됐다. 결국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실패한 나사는 2011년 7월 9일 아틀란티스를 끝으로 우주왕복선 사업에서 손을 뗐다.
.jpg)
그렇다고 나사가 우주계획 자체를 접은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달이든 화성이든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로켓, 즉 발사체가 필요했다. 여기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등장한다. 나사의 예상을 비웃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 개발에 성공한 스페이스 X는 곧바로 나사와 계약을 맺는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주 화물 운송, 쉽게 말해 우주 택배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이 계약은 스페이스 X를 단숨에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나사는 안타레스라는 로켓을 자체 개발한 오비털 사이언스라는 또 다른 민간기업과도 19억 달러 규모의 우주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우주 화물 운송은 국가의 우주개발에서 떨어져 나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편입됐다.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 택배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은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로켓만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실어 보낼 수 없다. 로켓의 역할은 우주공간에 뭔가를 올려주는 데 국한된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그 ‘뭔가’를 또 만들었다. 드래건(DRAGON)이란 이름의 이 우주선 역시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다. 2012년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한 드래건이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스페이스 X는 로켓뿐 아니라 우주선까지 확보했다.
외부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유명한 미국 LA의 스페이스 X 본사를 찾아 국내 언론 최초로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스페이스 X의 영업 담당 전무 톰 오시네로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핵심은 단순성(simplicity)입니다.”
.jpg)
스페이스 X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스페이스 X가 공개한 일명 메뚜기(GRASSHOPPER) 로켓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로켓은 보통 한 번 발사되면 그대로 버려진다. 스페이스 X는 비싼 로켓을 한 번만 쏘고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메뚜기 로켓이다.
개념은 이렇다. 로켓이 올라가서 위성이든 우주선이든 우주로 보내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자! 메뚜기 로켓을 통해 스페이스 X는 놀랍게도 로켓의 재사용성(reusability)을 실험하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이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로 나타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스페이스 X라는 민간기업의 눈부신 성장과 도전은 분명 국가 차원에서 발사체 개발에 나선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가 202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II) 역시 발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페이스 X가 선택한 전략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jpg)
스페이스 X의 성공 비결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가격 경쟁력’이다. 우리가 2조 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했을 때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일단 우리 위성을 쏘는 게 부담이다. 우리조차 부담이 되면 다른 나라도 굳이 비싼 우리 발사체에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위성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게 된다. 발사 비용이 더 싼 다른 나라 로켓을 찾아갈 게 뻔하다. 현재 우주에 위성을 올려주는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한 나라는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정도다. 일본도 로켓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개발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바람에 상업 발사 시장 진출에 결국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10분의 1 가격’을 공언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주인공이 바로 스페이스 X다. 결국 요는 가격 경쟁력인 셈이다. 싸게 만들어서 싸게 쏘아야 돈이 된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우주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했다.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력 확보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jpg)
그렇다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계획을 취재하면서 많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켓 기술은 이미 스페이스 X 같은 민간기업도 로켓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돼 있다. 우주왕복선 급의 복잡한 대형 엔진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엔진을 만든다면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관건은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그리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주개발을 국력 과시용 일회성 이벤트로 이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스페이스 X의 성공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0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게 대한민국 우주개발 계획이다.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에 성공해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다. 물론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주강국의 길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 마치 거짓말처럼, 세계 우주산업 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전 세계로 긴급 타전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SPACE X)가 세계 최초로 민간 로켓 발사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완공은 2016년. 건설비만 무려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이다. 스페이스 X는 그동안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발사대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
스페이스 X는 세계 우주산업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2012년, 로켓 개발에 뛰어든 지 불과 10년 만에 팰컨 9(FALCON 9)이라는 발사체를 독자 개발해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사실 우주 선진국들은 처음엔 스페이스 X의 야심을 비웃었다. 민간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로 로켓을 만들겠다고? 게다가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기까지 하겠다고? 그러나 설마는 사실로, 조롱은 탄식으로 바뀌었다.
.jpg)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되는 로켓의 주 엔진의 추력은 213톤이다. 우주왕복선엔 이 엔진 세 개를 탑재하니까 전체 추력은 640톤 정도다. 그러나 200톤이 넘는 이 엔진 하나 가격이 무려 360억 원. 우주왕복선 하나에 실리는 엔진 가격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스페이스 X는 이런 방식으론 승산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200톤이 넘는 덩치 큰 엔진 대신 68톤짜리 작은 엔진을 만든 뒤 여러 개를 묶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팰컨 9 로켓은 68톤 엔진 9개를 묶어 600톤이 조금 넘는 추진력을 낸다. 엔진 크기만 작아졌을 뿐 우주왕복선과 맞먹는 추력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왕복선의 평균 발사 비용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우주왕복선 사업이 한창이던 2005년 나사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50억 달러가 오로지 우주왕복선에만 투입됐다. 결국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실패한 나사는 2011년 7월 9일 아틀란티스를 끝으로 우주왕복선 사업에서 손을 뗐다.
.jpg)
그렇다고 나사가 우주계획 자체를 접은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달이든 화성이든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로켓, 즉 발사체가 필요했다. 여기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등장한다. 나사의 예상을 비웃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 개발에 성공한 스페이스 X는 곧바로 나사와 계약을 맺는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주 화물 운송, 쉽게 말해 우주 택배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이 계약은 스페이스 X를 단숨에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나사는 안타레스라는 로켓을 자체 개발한 오비털 사이언스라는 또 다른 민간기업과도 19억 달러 규모의 우주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우주 화물 운송은 국가의 우주개발에서 떨어져 나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편입됐다.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 택배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은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로켓만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실어 보낼 수 없다. 로켓의 역할은 우주공간에 뭔가를 올려주는 데 국한된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그 ‘뭔가’를 또 만들었다. 드래건(DRAGON)이란 이름의 이 우주선 역시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다. 2012년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한 드래건이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스페이스 X는 로켓뿐 아니라 우주선까지 확보했다.
외부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유명한 미국 LA의 스페이스 X 본사를 찾아 국내 언론 최초로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스페이스 X의 영업 담당 전무 톰 오시네로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핵심은 단순성(simplicity)입니다.”
.jpg)
스페이스 X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스페이스 X가 공개한 일명 메뚜기(GRASSHOPPER) 로켓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로켓은 보통 한 번 발사되면 그대로 버려진다. 스페이스 X는 비싼 로켓을 한 번만 쏘고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메뚜기 로켓이다.
개념은 이렇다. 로켓이 올라가서 위성이든 우주선이든 우주로 보내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자! 메뚜기 로켓을 통해 스페이스 X는 놀랍게도 로켓의 재사용성(reusability)을 실험하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이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로 나타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스페이스 X라는 민간기업의 눈부신 성장과 도전은 분명 국가 차원에서 발사체 개발에 나선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가 202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II) 역시 발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페이스 X가 선택한 전략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jpg)
스페이스 X의 성공 비결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가격 경쟁력’이다. 우리가 2조 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했을 때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일단 우리 위성을 쏘는 게 부담이다. 우리조차 부담이 되면 다른 나라도 굳이 비싼 우리 발사체에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위성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게 된다. 발사 비용이 더 싼 다른 나라 로켓을 찾아갈 게 뻔하다. 현재 우주에 위성을 올려주는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한 나라는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정도다. 일본도 로켓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개발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바람에 상업 발사 시장 진출에 결국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10분의 1 가격’을 공언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주인공이 바로 스페이스 X다. 결국 요는 가격 경쟁력인 셈이다. 싸게 만들어서 싸게 쏘아야 돈이 된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우주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했다.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력 확보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jpg)
그렇다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계획을 취재하면서 많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켓 기술은 이미 스페이스 X 같은 민간기업도 로켓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돼 있다. 우주왕복선 급의 복잡한 대형 엔진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엔진을 만든다면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관건은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그리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주개발을 국력 과시용 일회성 이벤트로 이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스페이스 X의 성공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0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게 대한민국 우주개발 계획이다.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에 성공해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다. 물론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주강국의 길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민간 우주기업의 성공 비결은?
-
- 입력 2014-08-07 09:22:12

대한민국, 2020년 우주강국 진입을 꿈꾸다
방송이 나간 다음날, 마치 거짓말처럼, 세계 우주산업 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전 세계로 긴급 타전됐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SPACE X)가 세계 최초로 민간 로켓 발사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완공은 2016년. 건설비만 무려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이다. 스페이스 X는 그동안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발사대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
스페이스 X는 세계 우주산업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2012년, 로켓 개발에 뛰어든 지 불과 10년 만에 팰컨 9(FALCON 9)이라는 발사체를 독자 개발해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사실 우주 선진국들은 처음엔 스페이스 X의 야심을 비웃었다. 민간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로 로켓을 만들겠다고? 게다가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기까지 하겠다고? 그러나 설마는 사실로, 조롱은 탄식으로 바뀌었다.
.jpg)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되는 로켓의 주 엔진의 추력은 213톤이다. 우주왕복선엔 이 엔진 세 개를 탑재하니까 전체 추력은 640톤 정도다. 그러나 200톤이 넘는 이 엔진 하나 가격이 무려 360억 원. 우주왕복선 하나에 실리는 엔진 가격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스페이스 X는 이런 방식으론 승산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200톤이 넘는 덩치 큰 엔진 대신 68톤짜리 작은 엔진을 만든 뒤 여러 개를 묶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팰컨 9 로켓은 68톤 엔진 9개를 묶어 600톤이 조금 넘는 추진력을 낸다. 엔진 크기만 작아졌을 뿐 우주왕복선과 맞먹는 추력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왕복선의 평균 발사 비용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우주왕복선 사업이 한창이던 2005년 나사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50억 달러가 오로지 우주왕복선에만 투입됐다. 결국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실패한 나사는 2011년 7월 9일 아틀란티스를 끝으로 우주왕복선 사업에서 손을 뗐다.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되는 로켓의 주 엔진의 추력은 213톤이다. 우주왕복선엔 이 엔진 세 개를 탑재하니까 전체 추력은 640톤 정도다. 그러나 200톤이 넘는 이 엔진 하나 가격이 무려 360억 원. 우주왕복선 하나에 실리는 엔진 가격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스페이스 X는 이런 방식으론 승산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200톤이 넘는 덩치 큰 엔진 대신 68톤짜리 작은 엔진을 만든 뒤 여러 개를 묶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팰컨 9 로켓은 68톤 엔진 9개를 묶어 600톤이 조금 넘는 추진력을 낸다. 엔진 크기만 작아졌을 뿐 우주왕복선과 맞먹는 추력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왕복선의 평균 발사 비용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우주왕복선 사업이 한창이던 2005년 나사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50억 달러가 오로지 우주왕복선에만 투입됐다. 결국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실패한 나사는 2011년 7월 9일 아틀란티스를 끝으로 우주왕복선 사업에서 손을 뗐다.
.jpg) 그렇다고 나사가 우주계획 자체를 접은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달이든 화성이든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로켓, 즉 발사체가 필요했다. 여기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등장한다. 나사의 예상을 비웃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 개발에 성공한 스페이스 X는 곧바로 나사와 계약을 맺는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주 화물 운송, 쉽게 말해 우주 택배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이 계약은 스페이스 X를 단숨에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나사는 안타레스라는 로켓을 자체 개발한 오비털 사이언스라는 또 다른 민간기업과도 19억 달러 규모의 우주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우주 화물 운송은 국가의 우주개발에서 떨어져 나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편입됐다.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 택배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은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로켓만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실어 보낼 수 없다. 로켓의 역할은 우주공간에 뭔가를 올려주는 데 국한된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그 ‘뭔가’를 또 만들었다. 드래건(DRAGON)이란 이름의 이 우주선 역시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다. 2012년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한 드래건이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스페이스 X는 로켓뿐 아니라 우주선까지 확보했다.
외부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유명한 미국 LA의 스페이스 X 본사를 찾아 국내 언론 최초로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스페이스 X의 영업 담당 전무 톰 오시네로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핵심은 단순성(simplicity)입니다.”
그렇다고 나사가 우주계획 자체를 접은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달이든 화성이든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로켓, 즉 발사체가 필요했다. 여기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등장한다. 나사의 예상을 비웃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 개발에 성공한 스페이스 X는 곧바로 나사와 계약을 맺는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주 화물 운송, 쉽게 말해 우주 택배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이 계약은 스페이스 X를 단숨에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나사는 안타레스라는 로켓을 자체 개발한 오비털 사이언스라는 또 다른 민간기업과도 19억 달러 규모의 우주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우주 화물 운송은 국가의 우주개발에서 떨어져 나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편입됐다.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 택배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은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로켓만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실어 보낼 수 없다. 로켓의 역할은 우주공간에 뭔가를 올려주는 데 국한된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그 ‘뭔가’를 또 만들었다. 드래건(DRAGON)이란 이름의 이 우주선 역시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다. 2012년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한 드래건이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스페이스 X는 로켓뿐 아니라 우주선까지 확보했다.
외부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유명한 미국 LA의 스페이스 X 본사를 찾아 국내 언론 최초로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스페이스 X의 영업 담당 전무 톰 오시네로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핵심은 단순성(simplicity)입니다.”
.jpg) 스페이스 X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스페이스 X가 공개한 일명 메뚜기(GRASSHOPPER) 로켓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로켓은 보통 한 번 발사되면 그대로 버려진다. 스페이스 X는 비싼 로켓을 한 번만 쏘고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메뚜기 로켓이다.
개념은 이렇다. 로켓이 올라가서 위성이든 우주선이든 우주로 보내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자! 메뚜기 로켓을 통해 스페이스 X는 놀랍게도 로켓의 재사용성(reusability)을 실험하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이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로 나타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스페이스 X라는 민간기업의 눈부신 성장과 도전은 분명 국가 차원에서 발사체 개발에 나선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가 202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II) 역시 발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페이스 X가 선택한 전략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스페이스 X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스페이스 X가 공개한 일명 메뚜기(GRASSHOPPER) 로켓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로켓은 보통 한 번 발사되면 그대로 버려진다. 스페이스 X는 비싼 로켓을 한 번만 쏘고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메뚜기 로켓이다.
개념은 이렇다. 로켓이 올라가서 위성이든 우주선이든 우주로 보내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자! 메뚜기 로켓을 통해 스페이스 X는 놀랍게도 로켓의 재사용성(reusability)을 실험하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이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로 나타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스페이스 X라는 민간기업의 눈부신 성장과 도전은 분명 국가 차원에서 발사체 개발에 나선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가 202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II) 역시 발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페이스 X가 선택한 전략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jpg) 스페이스 X의 성공 비결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가격 경쟁력’이다. 우리가 2조 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했을 때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일단 우리 위성을 쏘는 게 부담이다. 우리조차 부담이 되면 다른 나라도 굳이 비싼 우리 발사체에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위성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게 된다. 발사 비용이 더 싼 다른 나라 로켓을 찾아갈 게 뻔하다. 현재 우주에 위성을 올려주는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한 나라는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정도다. 일본도 로켓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개발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바람에 상업 발사 시장 진출에 결국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10분의 1 가격’을 공언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주인공이 바로 스페이스 X다. 결국 요는 가격 경쟁력인 셈이다. 싸게 만들어서 싸게 쏘아야 돈이 된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우주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했다.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력 확보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스페이스 X의 성공 비결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가격 경쟁력’이다. 우리가 2조 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했을 때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일단 우리 위성을 쏘는 게 부담이다. 우리조차 부담이 되면 다른 나라도 굳이 비싼 우리 발사체에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위성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게 된다. 발사 비용이 더 싼 다른 나라 로켓을 찾아갈 게 뻔하다. 현재 우주에 위성을 올려주는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한 나라는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정도다. 일본도 로켓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개발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바람에 상업 발사 시장 진출에 결국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10분의 1 가격’을 공언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주인공이 바로 스페이스 X다. 결국 요는 가격 경쟁력인 셈이다. 싸게 만들어서 싸게 쏘아야 돈이 된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우주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했다.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력 확보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jpg) 그렇다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계획을 취재하면서 많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켓 기술은 이미 스페이스 X 같은 민간기업도 로켓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돼 있다. 우주왕복선 급의 복잡한 대형 엔진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엔진을 만든다면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관건은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그리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주개발을 국력 과시용 일회성 이벤트로 이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스페이스 X의 성공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0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게 대한민국 우주개발 계획이다.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에 성공해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다. 물론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주강국의 길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계획을 취재하면서 많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켓 기술은 이미 스페이스 X 같은 민간기업도 로켓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돼 있다. 우주왕복선 급의 복잡한 대형 엔진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엔진을 만든다면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관건은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그리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주개발을 국력 과시용 일회성 이벤트로 이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스페이스 X의 성공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0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게 대한민국 우주개발 계획이다.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에 성공해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다. 물론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주강국의 길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jpg)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되는 로켓의 주 엔진의 추력은 213톤이다. 우주왕복선엔 이 엔진 세 개를 탑재하니까 전체 추력은 640톤 정도다. 그러나 200톤이 넘는 이 엔진 하나 가격이 무려 360억 원. 우주왕복선 하나에 실리는 엔진 가격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스페이스 X는 이런 방식으론 승산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200톤이 넘는 덩치 큰 엔진 대신 68톤짜리 작은 엔진을 만든 뒤 여러 개를 묶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팰컨 9 로켓은 68톤 엔진 9개를 묶어 600톤이 조금 넘는 추진력을 낸다. 엔진 크기만 작아졌을 뿐 우주왕복선과 맞먹는 추력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왕복선의 평균 발사 비용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우주왕복선 사업이 한창이던 2005년 나사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50억 달러가 오로지 우주왕복선에만 투입됐다. 결국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실패한 나사는 2011년 7월 9일 아틀란티스를 끝으로 우주왕복선 사업에서 손을 뗐다.
미국의 우주왕복선에 사용되는 로켓의 주 엔진의 추력은 213톤이다. 우주왕복선엔 이 엔진 세 개를 탑재하니까 전체 추력은 640톤 정도다. 그러나 200톤이 넘는 이 엔진 하나 가격이 무려 360억 원. 우주왕복선 하나에 실리는 엔진 가격만 1000억 원이 넘는다.
스페이스 X는 이런 방식으론 승산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200톤이 넘는 덩치 큰 엔진 대신 68톤짜리 작은 엔진을 만든 뒤 여러 개를 묶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팰컨 9 로켓은 68톤 엔진 9개를 묶어 600톤이 조금 넘는 추진력을 낸다. 엔진 크기만 작아졌을 뿐 우주왕복선과 맞먹는 추력을 확보한 것이다. 우주왕복선의 평균 발사 비용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우주왕복선 사업이 한창이던 2005년 나사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50억 달러가 오로지 우주왕복선에만 투입됐다. 결국 발사 비용을 줄이는 데 실패한 나사는 2011년 7월 9일 아틀란티스를 끝으로 우주왕복선 사업에서 손을 뗐다.
.jpg) 그렇다고 나사가 우주계획 자체를 접은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달이든 화성이든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로켓, 즉 발사체가 필요했다. 여기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등장한다. 나사의 예상을 비웃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 개발에 성공한 스페이스 X는 곧바로 나사와 계약을 맺는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주 화물 운송, 쉽게 말해 우주 택배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이 계약은 스페이스 X를 단숨에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나사는 안타레스라는 로켓을 자체 개발한 오비털 사이언스라는 또 다른 민간기업과도 19억 달러 규모의 우주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우주 화물 운송은 국가의 우주개발에서 떨어져 나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편입됐다.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 택배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은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로켓만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실어 보낼 수 없다. 로켓의 역할은 우주공간에 뭔가를 올려주는 데 국한된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그 ‘뭔가’를 또 만들었다. 드래건(DRAGON)이란 이름의 이 우주선 역시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다. 2012년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한 드래건이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스페이스 X는 로켓뿐 아니라 우주선까지 확보했다.
외부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유명한 미국 LA의 스페이스 X 본사를 찾아 국내 언론 최초로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스페이스 X의 영업 담당 전무 톰 오시네로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핵심은 단순성(simplicity)입니다.”
그렇다고 나사가 우주계획 자체를 접은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달이든 화성이든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로켓, 즉 발사체가 필요했다. 여기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등장한다. 나사의 예상을 비웃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 개발에 성공한 스페이스 X는 곧바로 나사와 계약을 맺는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주 화물 운송, 쉽게 말해 우주 택배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계약 규모는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 수준이다. 이 계약은 스페이스 X를 단숨에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나사는 안타레스라는 로켓을 자체 개발한 오비털 사이언스라는 또 다른 민간기업과도 19억 달러 규모의 우주 화물운송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우주 화물 운송은 국가의 우주개발에서 떨어져 나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에 편입됐다. 민간 우주기업이 우주 택배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은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로켓만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실어 보낼 수 없다. 로켓의 역할은 우주공간에 뭔가를 올려주는 데 국한된다. 그래서 스페이스 X는 그 ‘뭔가’를 또 만들었다. 드래건(DRAGON)이란 이름의 이 우주선 역시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다. 2012년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한 드래건이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스페이스 X는 로켓뿐 아니라 우주선까지 확보했다.
외부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유명한 미국 LA의 스페이스 X 본사를 찾아 국내 언론 최초로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스페이스 X의 영업 담당 전무 톰 오시네로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핵심은 단순성(simplicity)입니다.”
.jpg) 스페이스 X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스페이스 X가 공개한 일명 메뚜기(GRASSHOPPER) 로켓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로켓은 보통 한 번 발사되면 그대로 버려진다. 스페이스 X는 비싼 로켓을 한 번만 쏘고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메뚜기 로켓이다.
개념은 이렇다. 로켓이 올라가서 위성이든 우주선이든 우주로 보내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자! 메뚜기 로켓을 통해 스페이스 X는 놀랍게도 로켓의 재사용성(reusability)을 실험하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이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로 나타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스페이스 X라는 민간기업의 눈부신 성장과 도전은 분명 국가 차원에서 발사체 개발에 나선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가 202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II) 역시 발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페이스 X가 선택한 전략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스페이스 X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스페이스 X가 공개한 일명 메뚜기(GRASSHOPPER) 로켓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로켓은 보통 한 번 발사되면 그대로 버려진다. 스페이스 X는 비싼 로켓을 한 번만 쏘고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메뚜기 로켓이다.
개념은 이렇다. 로켓이 올라가서 위성이든 우주선이든 우주로 보내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만들자! 메뚜기 로켓을 통해 스페이스 X는 놀랍게도 로켓의 재사용성(reusability)을 실험하고 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이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현실로 나타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스페이스 X라는 민간기업의 눈부신 성장과 도전은 분명 국가 차원에서 발사체 개발에 나선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가 202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II) 역시 발사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스페이스 X가 선택한 전략과 여러모로 흡사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jpg) 스페이스 X의 성공 비결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가격 경쟁력’이다. 우리가 2조 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했을 때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일단 우리 위성을 쏘는 게 부담이다. 우리조차 부담이 되면 다른 나라도 굳이 비싼 우리 발사체에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위성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게 된다. 발사 비용이 더 싼 다른 나라 로켓을 찾아갈 게 뻔하다. 현재 우주에 위성을 올려주는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한 나라는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정도다. 일본도 로켓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개발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바람에 상업 발사 시장 진출에 결국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10분의 1 가격’을 공언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주인공이 바로 스페이스 X다. 결국 요는 가격 경쟁력인 셈이다. 싸게 만들어서 싸게 쏘아야 돈이 된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우주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했다.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력 확보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스페이스 X의 성공 비결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가격 경쟁력’이다. 우리가 2조 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여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했을 때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면 일단 우리 위성을 쏘는 게 부담이다. 우리조차 부담이 되면 다른 나라도 굳이 비싼 우리 발사체에 돈을 주고 자기 나라 위성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게 된다. 발사 비용이 더 싼 다른 나라 로켓을 찾아갈 게 뻔하다. 현재 우주에 위성을 올려주는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한 나라는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 정도다. 일본도 로켓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개발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바람에 상업 발사 시장 진출에 결국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10분의 1 가격’을 공언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주인공이 바로 스페이스 X다. 결국 요는 가격 경쟁력인 셈이다. 싸게 만들어서 싸게 쏘아야 돈이 된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우주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했다. “예술품이 아닌 공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격 경쟁력 확보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jpg) 그렇다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계획을 취재하면서 많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켓 기술은 이미 스페이스 X 같은 민간기업도 로켓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돼 있다. 우주왕복선 급의 복잡한 대형 엔진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엔진을 만든다면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관건은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그리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주개발을 국력 과시용 일회성 이벤트로 이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스페이스 X의 성공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0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게 대한민국 우주개발 계획이다.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에 성공해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다. 물론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주강국의 길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 한국형발사체 개발과 달 탐사 계획을 취재하면서 많은 전문가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켓 기술은 이미 스페이스 X 같은 민간기업도 로켓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다 공개돼 있다. 우주왕복선 급의 복잡한 대형 엔진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엔진을 만든다면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관건은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 그리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주개발을 국력 과시용 일회성 이벤트로 이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스페이스 X의 성공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2020년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를 통해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게 대한민국 우주개발 계획이다. 우리 발사체로 달 탐사에 성공해 세계 상업 발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다. 물론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주강국의 길은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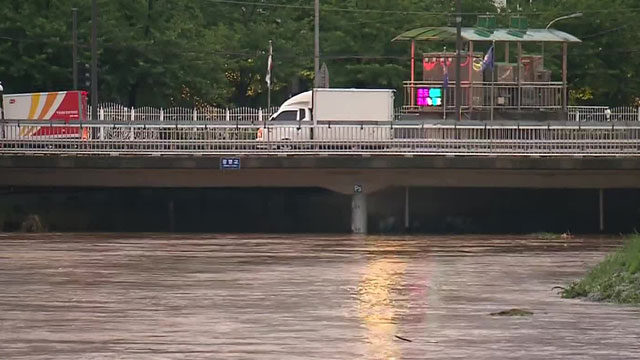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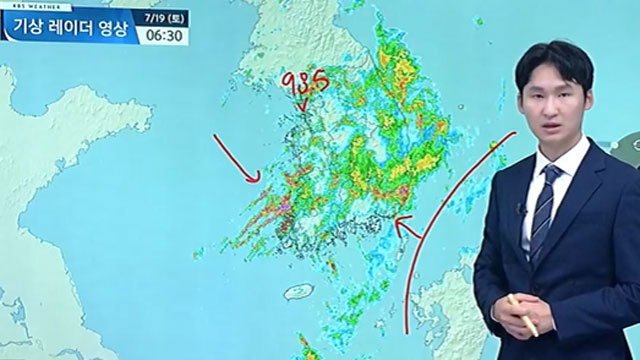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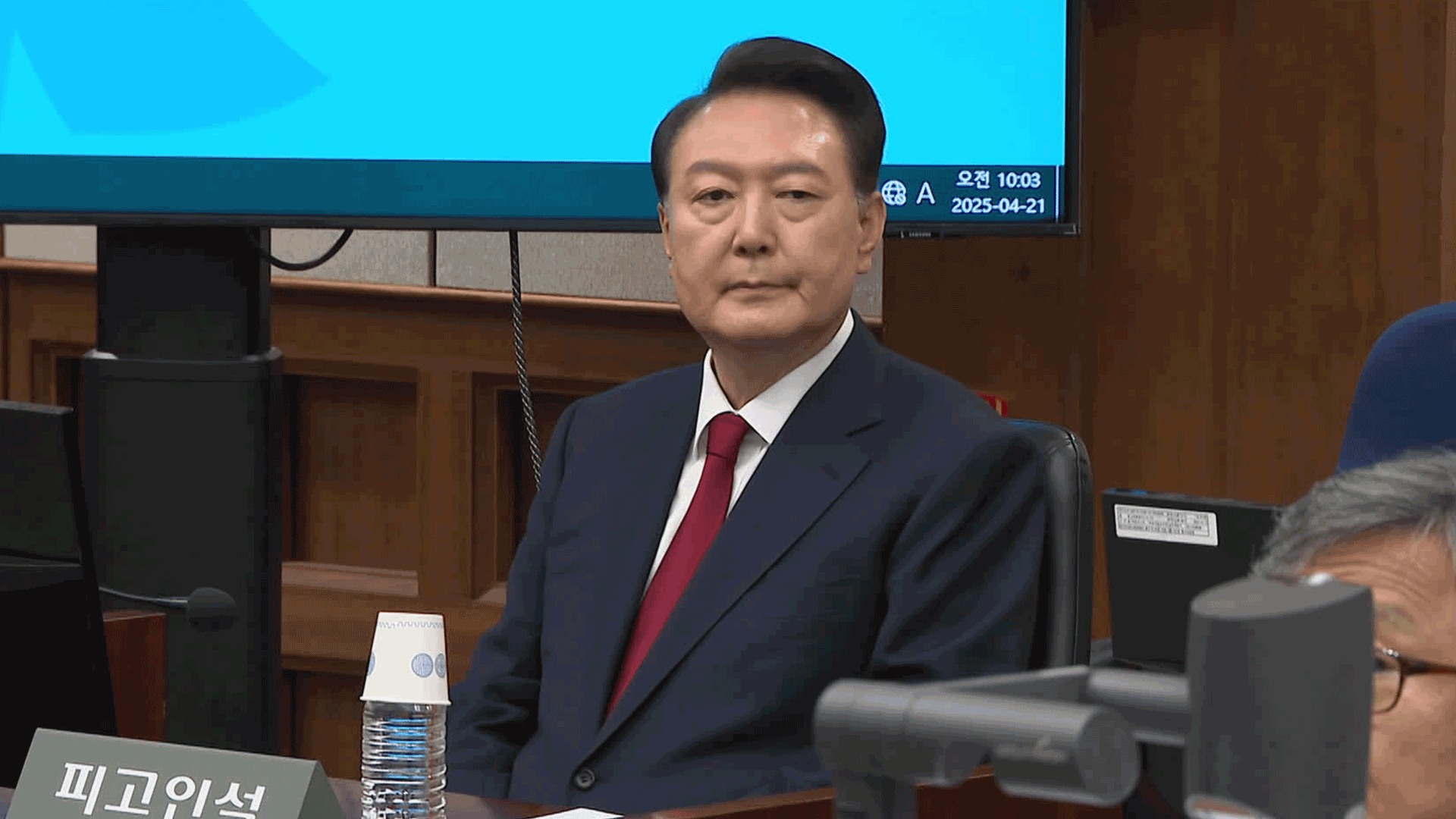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