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연승’ 추일승 감독, 오리온스 우승 가능?
입력 2014.10.28 (09:03)
수정 2014.10.28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의 개막 후 8연승을 이끄는 추일승(51) 감독의 리더십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추일승 감독은 2003-2004시즌 부산 코리아텐더(현 부산 KT) 지휘봉을 잡으면서 프로 감독으로 데뷔했고 1999년부터는 상무 감독을 맡았던 베테랑 지도자다.
그런 추 감독의 지도력이 새삼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코트의 신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온화한 성품의 덕장으로 이번 시즌 오리온스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프로농구 감독'하면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만큼 거친 이미지가 두드러지기 마련이지만 추 감독은 웬만해서는 특유의 중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추 감독이 화를 낼 정도면 이건 좀 심한 것'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돌 정도다.
2014-2015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리온스의 강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팀의 주축 선수인 김동욱이 무릎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이 불투명했고 최진수는 입대했다. 또 비교적 준수한 기량을 갖춘 외국인 선수 리온 윌리엄스, 앤서니 리처드슨을 버리고 새로 뽑은 트로이 길렌워터, 찰스 가르시아의 기량에도 의문 부호가 붙었다.
선수단 전체 연봉은 17억7천만원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다. 샐러리캡 소진율이 76.96%밖에 되지 않는다. 5개 팀은 20억원을 훌쩍 넘겼다.
흔히 '오리온스 선수단을 둘로 나눠 팀을 따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개막 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출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실상 몸값이 곧 기량을 의미하는 프로 세계에서 오리온스는 객관적으로 오히려 약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올해 신인 이승현이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단결력이 좋은 팀"이라고 수시로 감탄할 정도로 선수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번 시즌 프로농구 코트를 강타하고 있다.
물론 이승현과 길렌워터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의 역할이 큰 부분도 있지만 추 감독의 지도력을 빼놓고서는 올해 오리온스의 돌풍을 논하기는 어렵다.
추 감독은 이번 시즌 팀이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 "손에 익은 농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가 말한 '손에 익은 농구'는 부산 KTF(현 부산 KT) 감독 시절에 구사하던 이른바 '포워드 농구'를 말한다.
'포워드 농구'란 키 190㎝를 넘고 내외곽을 겸비한 포워드들을 동시에 출전시키며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번 시즌 오리온스는 이승현과 장재석, 허일영, 김도수에 길렌워터까지 높이와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들로 재미를 보고 있다.
추 감독은 KTF 지휘봉을 잡고 있던 2006-2007시즌에도 조성민, 송영진, 이한권, 김도수, 애런 맥기, 필립 리치 등 이번 시즌 오리온스와 비슷한 선수 구성으로 팀을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시켰다.
그는 "골밑에서 주로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미국 스타일이라면 포워드 농구는 유럽 스타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외국인 선수 선발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는 평을 듣는 지도자다.
이번 시즌 길렌워터를 2라운드에서 뽑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추 감독은 "미국과 유럽의 외국 지도자들과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기 영상과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 지도자들을 통해 듣는다"며 "고비에 집중력,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우선해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뽑은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성공작으로 자평하는 선수는 2006-2007시즌의 리치이다.
그가 밝힌 자신의 농구 철학은 '함께 하는 농구'다.
엔트리 12명을 가능하면 고루 뛰게 하며 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농구 팬들은 그런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 농구'라고 하고 그래서 '추일성 수령'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추 감독도 "팬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웃었다.
추 감독은 KTF 시절에도 첫해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4년 만에 팀을 결승전에 올려놨고 오리온스에서도 첫해 부진을 딛고 4년째인 올해 다시 한 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팀 전체를 조금씩 끌어올리느라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그는 KTF와 오리온스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해 보였다. 조금씩 우직하게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황소'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인 것 같다.
추일승 감독은 2003-2004시즌 부산 코리아텐더(현 부산 KT) 지휘봉을 잡으면서 프로 감독으로 데뷔했고 1999년부터는 상무 감독을 맡았던 베테랑 지도자다.
그런 추 감독의 지도력이 새삼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코트의 신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온화한 성품의 덕장으로 이번 시즌 오리온스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프로농구 감독'하면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만큼 거친 이미지가 두드러지기 마련이지만 추 감독은 웬만해서는 특유의 중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추 감독이 화를 낼 정도면 이건 좀 심한 것'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돌 정도다.
2014-2015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리온스의 강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팀의 주축 선수인 김동욱이 무릎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이 불투명했고 최진수는 입대했다. 또 비교적 준수한 기량을 갖춘 외국인 선수 리온 윌리엄스, 앤서니 리처드슨을 버리고 새로 뽑은 트로이 길렌워터, 찰스 가르시아의 기량에도 의문 부호가 붙었다.
선수단 전체 연봉은 17억7천만원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다. 샐러리캡 소진율이 76.96%밖에 되지 않는다. 5개 팀은 20억원을 훌쩍 넘겼다.
흔히 '오리온스 선수단을 둘로 나눠 팀을 따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개막 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출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실상 몸값이 곧 기량을 의미하는 프로 세계에서 오리온스는 객관적으로 오히려 약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올해 신인 이승현이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단결력이 좋은 팀"이라고 수시로 감탄할 정도로 선수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번 시즌 프로농구 코트를 강타하고 있다.
물론 이승현과 길렌워터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의 역할이 큰 부분도 있지만 추 감독의 지도력을 빼놓고서는 올해 오리온스의 돌풍을 논하기는 어렵다.
추 감독은 이번 시즌 팀이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 "손에 익은 농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가 말한 '손에 익은 농구'는 부산 KTF(현 부산 KT) 감독 시절에 구사하던 이른바 '포워드 농구'를 말한다.
'포워드 농구'란 키 190㎝를 넘고 내외곽을 겸비한 포워드들을 동시에 출전시키며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번 시즌 오리온스는 이승현과 장재석, 허일영, 김도수에 길렌워터까지 높이와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들로 재미를 보고 있다.
추 감독은 KTF 지휘봉을 잡고 있던 2006-2007시즌에도 조성민, 송영진, 이한권, 김도수, 애런 맥기, 필립 리치 등 이번 시즌 오리온스와 비슷한 선수 구성으로 팀을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시켰다.
그는 "골밑에서 주로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미국 스타일이라면 포워드 농구는 유럽 스타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외국인 선수 선발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는 평을 듣는 지도자다.
이번 시즌 길렌워터를 2라운드에서 뽑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추 감독은 "미국과 유럽의 외국 지도자들과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기 영상과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 지도자들을 통해 듣는다"며 "고비에 집중력,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우선해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뽑은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성공작으로 자평하는 선수는 2006-2007시즌의 리치이다.
그가 밝힌 자신의 농구 철학은 '함께 하는 농구'다.
엔트리 12명을 가능하면 고루 뛰게 하며 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농구 팬들은 그런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 농구'라고 하고 그래서 '추일성 수령'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추 감독도 "팬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웃었다.
추 감독은 KTF 시절에도 첫해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4년 만에 팀을 결승전에 올려놨고 오리온스에서도 첫해 부진을 딛고 4년째인 올해 다시 한 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팀 전체를 조금씩 끌어올리느라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그는 KTF와 오리온스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해 보였다. 조금씩 우직하게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황소'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인 것 같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연승’ 추일승 감독, 오리온스 우승 가능?
-
- 입력 2014-10-28 09:03:08
- 수정2014-10-28 11:23:36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의 개막 후 8연승을 이끄는 추일승(51) 감독의 리더십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추일승 감독은 2003-2004시즌 부산 코리아텐더(현 부산 KT) 지휘봉을 잡으면서 프로 감독으로 데뷔했고 1999년부터는 상무 감독을 맡았던 베테랑 지도자다.
그런 추 감독의 지도력이 새삼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코트의 신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온화한 성품의 덕장으로 이번 시즌 오리온스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프로농구 감독'하면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만큼 거친 이미지가 두드러지기 마련이지만 추 감독은 웬만해서는 특유의 중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추 감독이 화를 낼 정도면 이건 좀 심한 것'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돌 정도다.
2014-2015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리온스의 강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팀의 주축 선수인 김동욱이 무릎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이 불투명했고 최진수는 입대했다. 또 비교적 준수한 기량을 갖춘 외국인 선수 리온 윌리엄스, 앤서니 리처드슨을 버리고 새로 뽑은 트로이 길렌워터, 찰스 가르시아의 기량에도 의문 부호가 붙었다.
선수단 전체 연봉은 17억7천만원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다. 샐러리캡 소진율이 76.96%밖에 되지 않는다. 5개 팀은 20억원을 훌쩍 넘겼다.
흔히 '오리온스 선수단을 둘로 나눠 팀을 따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개막 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출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실상 몸값이 곧 기량을 의미하는 프로 세계에서 오리온스는 객관적으로 오히려 약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올해 신인 이승현이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단결력이 좋은 팀"이라고 수시로 감탄할 정도로 선수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번 시즌 프로농구 코트를 강타하고 있다.
물론 이승현과 길렌워터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의 역할이 큰 부분도 있지만 추 감독의 지도력을 빼놓고서는 올해 오리온스의 돌풍을 논하기는 어렵다.
추 감독은 이번 시즌 팀이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 "손에 익은 농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가 말한 '손에 익은 농구'는 부산 KTF(현 부산 KT) 감독 시절에 구사하던 이른바 '포워드 농구'를 말한다.
'포워드 농구'란 키 190㎝를 넘고 내외곽을 겸비한 포워드들을 동시에 출전시키며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번 시즌 오리온스는 이승현과 장재석, 허일영, 김도수에 길렌워터까지 높이와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들로 재미를 보고 있다.
추 감독은 KTF 지휘봉을 잡고 있던 2006-2007시즌에도 조성민, 송영진, 이한권, 김도수, 애런 맥기, 필립 리치 등 이번 시즌 오리온스와 비슷한 선수 구성으로 팀을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시켰다.
그는 "골밑에서 주로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미국 스타일이라면 포워드 농구는 유럽 스타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외국인 선수 선발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는 평을 듣는 지도자다.
이번 시즌 길렌워터를 2라운드에서 뽑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추 감독은 "미국과 유럽의 외국 지도자들과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기 영상과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 지도자들을 통해 듣는다"며 "고비에 집중력,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우선해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뽑은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성공작으로 자평하는 선수는 2006-2007시즌의 리치이다.
그가 밝힌 자신의 농구 철학은 '함께 하는 농구'다.
엔트리 12명을 가능하면 고루 뛰게 하며 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농구 팬들은 그런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 농구'라고 하고 그래서 '추일성 수령'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추 감독도 "팬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웃었다.
추 감독은 KTF 시절에도 첫해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4년 만에 팀을 결승전에 올려놨고 오리온스에서도 첫해 부진을 딛고 4년째인 올해 다시 한 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팀 전체를 조금씩 끌어올리느라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그는 KTF와 오리온스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해 보였다. 조금씩 우직하게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황소'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인 것 같다.
추일승 감독은 2003-2004시즌 부산 코리아텐더(현 부산 KT) 지휘봉을 잡으면서 프로 감독으로 데뷔했고 1999년부터는 상무 감독을 맡았던 베테랑 지도자다.
그런 추 감독의 지도력이 새삼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코트의 신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온화한 성품의 덕장으로 이번 시즌 오리온스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프로농구 감독'하면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먼저 떠오를 만큼 거친 이미지가 두드러지기 마련이지만 추 감독은 웬만해서는 특유의 중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추 감독이 화를 낼 정도면 이건 좀 심한 것'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돌 정도다.
2014-2015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리온스의 강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팀의 주축 선수인 김동욱이 무릎 부상 등의 이유로 출전이 불투명했고 최진수는 입대했다. 또 비교적 준수한 기량을 갖춘 외국인 선수 리온 윌리엄스, 앤서니 리처드슨을 버리고 새로 뽑은 트로이 길렌워터, 찰스 가르시아의 기량에도 의문 부호가 붙었다.
선수단 전체 연봉은 17억7천만원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다. 샐러리캡 소진율이 76.96%밖에 되지 않는다. 5개 팀은 20억원을 훌쩍 넘겼다.
흔히 '오리온스 선수단을 둘로 나눠 팀을 따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개막 후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출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사실상 몸값이 곧 기량을 의미하는 프로 세계에서 오리온스는 객관적으로 오히려 약팀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올해 신인 이승현이 기자회견장에서 "정말 단결력이 좋은 팀"이라고 수시로 감탄할 정도로 선수단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번 시즌 프로농구 코트를 강타하고 있다.
물론 이승현과 길렌워터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의 역할이 큰 부분도 있지만 추 감독의 지도력을 빼놓고서는 올해 오리온스의 돌풍을 논하기는 어렵다.
추 감독은 이번 시즌 팀이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 "손에 익은 농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가 말한 '손에 익은 농구'는 부산 KTF(현 부산 KT) 감독 시절에 구사하던 이른바 '포워드 농구'를 말한다.
'포워드 농구'란 키 190㎝를 넘고 내외곽을 겸비한 포워드들을 동시에 출전시키며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번 시즌 오리온스는 이승현과 장재석, 허일영, 김도수에 길렌워터까지 높이와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들로 재미를 보고 있다.
추 감독은 KTF 지휘봉을 잡고 있던 2006-2007시즌에도 조성민, 송영진, 이한권, 김도수, 애런 맥기, 필립 리치 등 이번 시즌 오리온스와 비슷한 선수 구성으로 팀을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시켰다.
그는 "골밑에서 주로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미국 스타일이라면 포워드 농구는 유럽 스타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외국인 선수 선발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는 평을 듣는 지도자다.
이번 시즌 길렌워터를 2라운드에서 뽑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추 감독은 "미국과 유럽의 외국 지도자들과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기 영상과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 지도자들을 통해 듣는다"며 "고비에 집중력,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우선해서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뽑은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성공작으로 자평하는 선수는 2006-2007시즌의 리치이다.
그가 밝힌 자신의 농구 철학은 '함께 하는 농구'다.
엔트리 12명을 가능하면 고루 뛰게 하며 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농구 팬들은 그런 그를 가리켜 '공산주의 농구'라고 하고 그래서 '추일성 수령'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추 감독도 "팬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웃었다.
추 감독은 KTF 시절에도 첫해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4년 만에 팀을 결승전에 올려놨고 오리온스에서도 첫해 부진을 딛고 4년째인 올해 다시 한 번 맹위를 떨치고 있다.
팀 전체를 조금씩 끌어올리느라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그는 KTF와 오리온스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해 보였다. 조금씩 우직하게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황소'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인 것 같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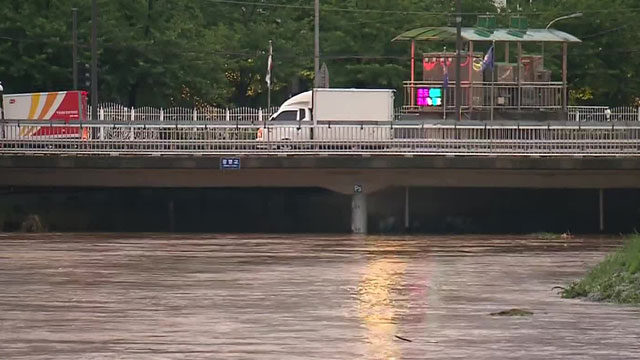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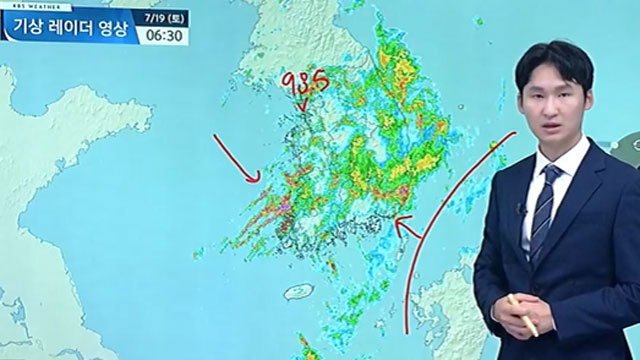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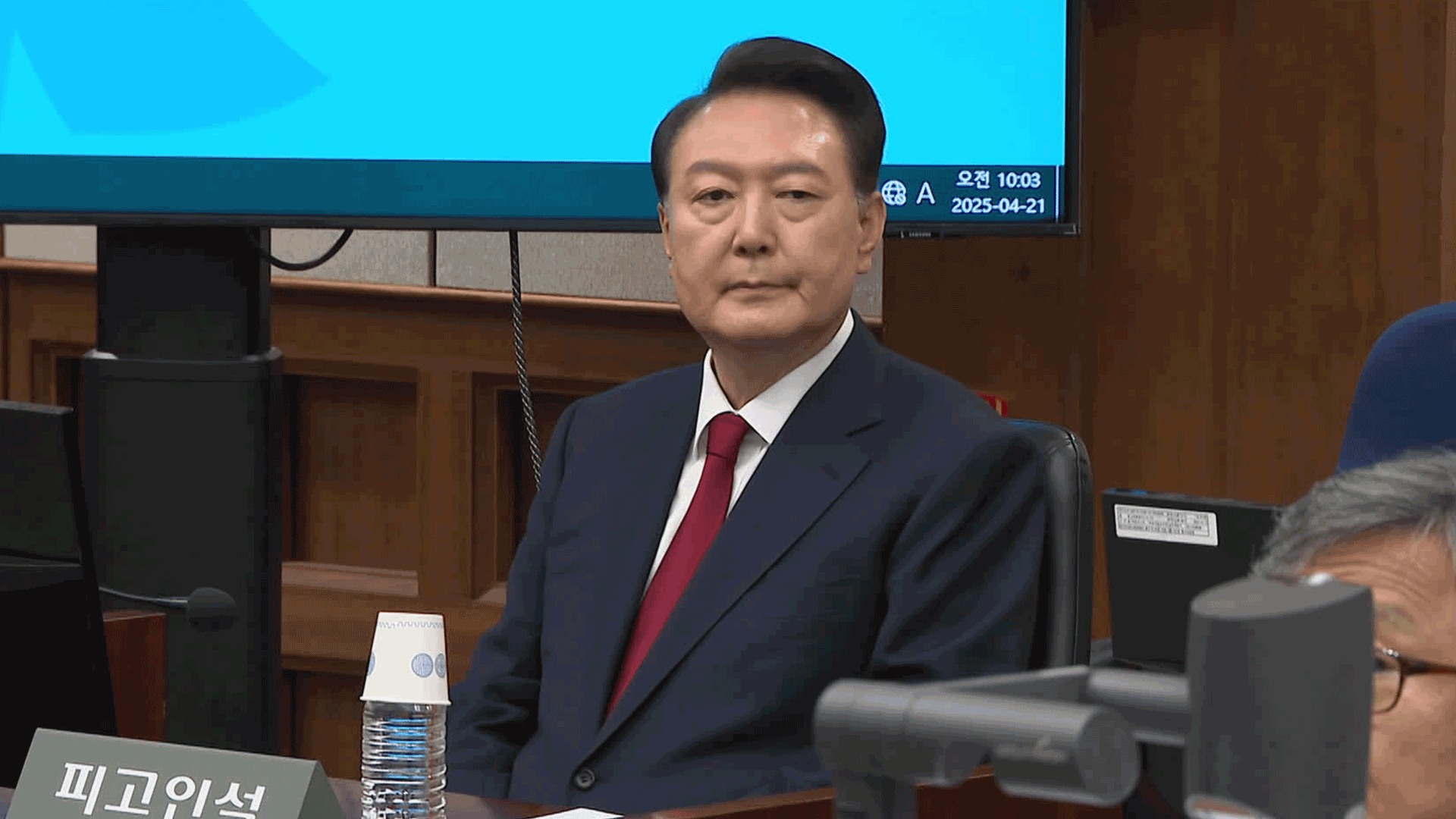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