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감시 피해 중국 ‘대포폰’ 인기
입력 2014.10.30 (23:20)
수정 2014.10.31 (0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에서 넘어 온 대포폰이 인기입니다.
북한 당국의 방해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위치 추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만강과 인접한 북한 회령의 한 산골 마을,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접시 모양의 대형 안테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선 접경 너머 중국 쪽과 통화를 못하도록 교란 전파를 쏘는 시설입니다.
<녹취> 북-중 접경지역 주민 : "전화를 치지(걸지)못하게, 신호를 반대로, 그 반대 신호(방해 전파)를 조선(북한)에서 쏘는거죠."
하지만 이런 방해 전파도 주민들의 통화를 막지는 못합니다.
실제 중국의 접경지역에선 북한 내부 주민들과 통화하는 장면이 쉽게 목격됩니다.
<녹취> 중국 휴대전화 밀거래업자 : "응, 알았다 알았다, 한국 사람들 왔다. (북한에 물건을) 주문해야 가져와요."
주민들이 중국 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로, 방해 전파 구역을 벗어나 몰래 통화하는 겁니다.
<녹취> 북-중 접경지역 주민 : "(북한 쪽에선)전화를 쳐도(걸어도)산꼭대기 올라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갖고 온 옷을 (뒤집어)쓰고 전화를 해요."
밀거래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건네지는 중국 휴대전화는 신원 확인이 안되는 이른바 대포폰들입니다.
북한 당국의 위치 추적은 물론 감청도 피할 수 있는 새 상품도 등장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중국 휴대전화 밀거래업자 : "북한에 중국의 통로(이동 통신)가 3개 있어요. (가장 보안이 잘 되는 제품은) 한족 말로 '뗀신'(중국 통신사)이에요."
여기에 임시 번호를 쓰는 선불식 유심카드가 거래되는 등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에서 넘어 온 대포폰이 인기입니다.
북한 당국의 방해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위치 추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만강과 인접한 북한 회령의 한 산골 마을,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접시 모양의 대형 안테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선 접경 너머 중국 쪽과 통화를 못하도록 교란 전파를 쏘는 시설입니다.
<녹취> 북-중 접경지역 주민 : "전화를 치지(걸지)못하게, 신호를 반대로, 그 반대 신호(방해 전파)를 조선(북한)에서 쏘는거죠."
하지만 이런 방해 전파도 주민들의 통화를 막지는 못합니다.
실제 중국의 접경지역에선 북한 내부 주민들과 통화하는 장면이 쉽게 목격됩니다.
<녹취> 중국 휴대전화 밀거래업자 : "응, 알았다 알았다, 한국 사람들 왔다. (북한에 물건을) 주문해야 가져와요."
주민들이 중국 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로, 방해 전파 구역을 벗어나 몰래 통화하는 겁니다.
<녹취> 북-중 접경지역 주민 : "(북한 쪽에선)전화를 쳐도(걸어도)산꼭대기 올라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갖고 온 옷을 (뒤집어)쓰고 전화를 해요."
밀거래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건네지는 중국 휴대전화는 신원 확인이 안되는 이른바 대포폰들입니다.
북한 당국의 위치 추적은 물론 감청도 피할 수 있는 새 상품도 등장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중국 휴대전화 밀거래업자 : "북한에 중국의 통로(이동 통신)가 3개 있어요. (가장 보안이 잘 되는 제품은) 한족 말로 '뗀신'(중국 통신사)이에요."
여기에 임시 번호를 쓰는 선불식 유심카드가 거래되는 등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북, 감시 피해 중국 ‘대포폰’ 인기
-
- 입력 2014-10-30 23:32:02
- 수정2014-10-31 00:19:14

<앵커 멘트>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에서 넘어 온 대포폰이 인기입니다.
북한 당국의 방해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위치 추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만강과 인접한 북한 회령의 한 산골 마을,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접시 모양의 대형 안테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선 접경 너머 중국 쪽과 통화를 못하도록 교란 전파를 쏘는 시설입니다.
<녹취> 북-중 접경지역 주민 : "전화를 치지(걸지)못하게, 신호를 반대로, 그 반대 신호(방해 전파)를 조선(북한)에서 쏘는거죠."
하지만 이런 방해 전파도 주민들의 통화를 막지는 못합니다.
실제 중국의 접경지역에선 북한 내부 주민들과 통화하는 장면이 쉽게 목격됩니다.
<녹취> 중국 휴대전화 밀거래업자 : "응, 알았다 알았다, 한국 사람들 왔다. (북한에 물건을) 주문해야 가져와요."
주민들이 중국 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로, 방해 전파 구역을 벗어나 몰래 통화하는 겁니다.
<녹취> 북-중 접경지역 주민 : "(북한 쪽에선)전화를 쳐도(걸어도)산꼭대기 올라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갖고 온 옷을 (뒤집어)쓰고 전화를 해요."
밀거래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건네지는 중국 휴대전화는 신원 확인이 안되는 이른바 대포폰들입니다.
북한 당국의 위치 추적은 물론 감청도 피할 수 있는 새 상품도 등장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중국 휴대전화 밀거래업자 : "북한에 중국의 통로(이동 통신)가 3개 있어요. (가장 보안이 잘 되는 제품은) 한족 말로 '뗀신'(중국 통신사)이에요."
여기에 임시 번호를 쓰는 선불식 유심카드가 거래되는 등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에서 넘어 온 대포폰이 인기입니다.
북한 당국의 방해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위치 추적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만강과 인접한 북한 회령의 한 산골 마을,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접시 모양의 대형 안테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선 접경 너머 중국 쪽과 통화를 못하도록 교란 전파를 쏘는 시설입니다.
<녹취> 북-중 접경지역 주민 : "전화를 치지(걸지)못하게, 신호를 반대로, 그 반대 신호(방해 전파)를 조선(북한)에서 쏘는거죠."
하지만 이런 방해 전파도 주민들의 통화를 막지는 못합니다.
실제 중국의 접경지역에선 북한 내부 주민들과 통화하는 장면이 쉽게 목격됩니다.
<녹취> 중국 휴대전화 밀거래업자 : "응, 알았다 알았다, 한국 사람들 왔다. (북한에 물건을) 주문해야 가져와요."
주민들이 중국 통신사에 가입한 휴대전화로, 방해 전파 구역을 벗어나 몰래 통화하는 겁니다.
<녹취> 북-중 접경지역 주민 : "(북한 쪽에선)전화를 쳐도(걸어도)산꼭대기 올라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갖고 온 옷을 (뒤집어)쓰고 전화를 해요."
밀거래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건네지는 중국 휴대전화는 신원 확인이 안되는 이른바 대포폰들입니다.
북한 당국의 위치 추적은 물론 감청도 피할 수 있는 새 상품도 등장해 팔리고 있습니다.
<녹취> 중국 휴대전화 밀거래업자 : "북한에 중국의 통로(이동 통신)가 3개 있어요. (가장 보안이 잘 되는 제품은) 한족 말로 '뗀신'(중국 통신사)이에요."
여기에 임시 번호를 쓰는 선불식 유심카드가 거래되는 등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
-

최성민 기자 soojin4@kbs.co.kr
최성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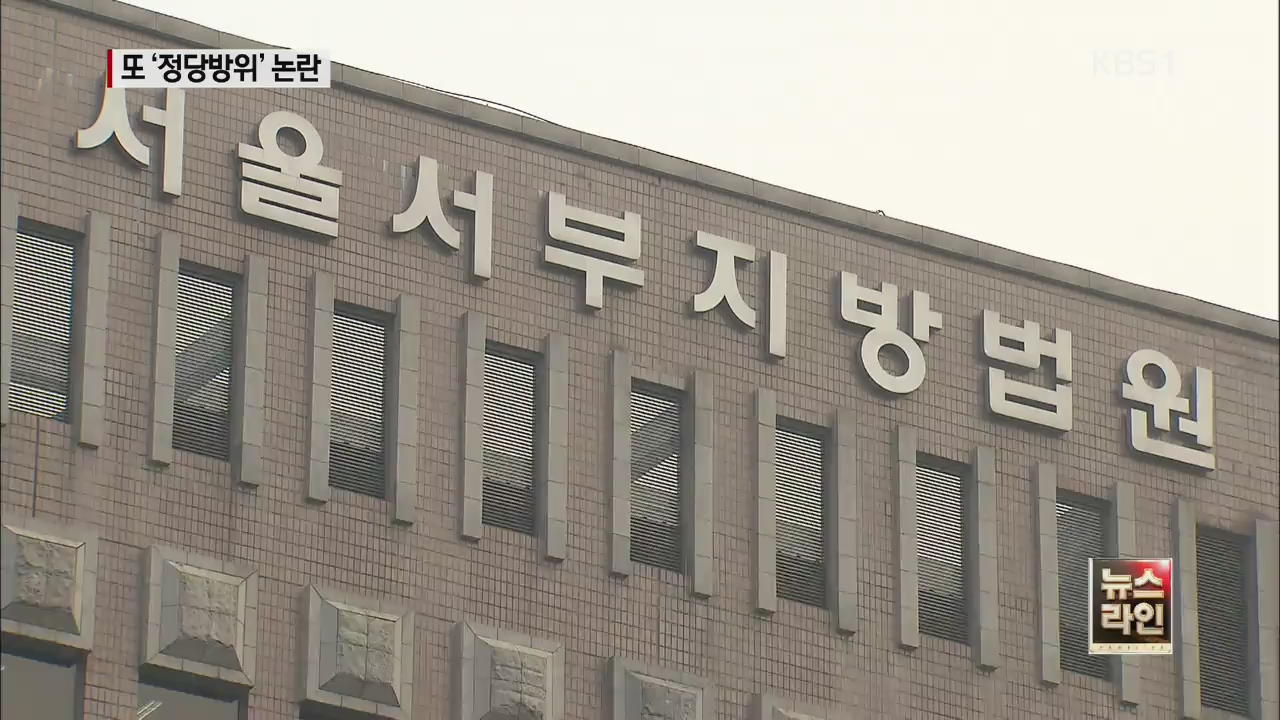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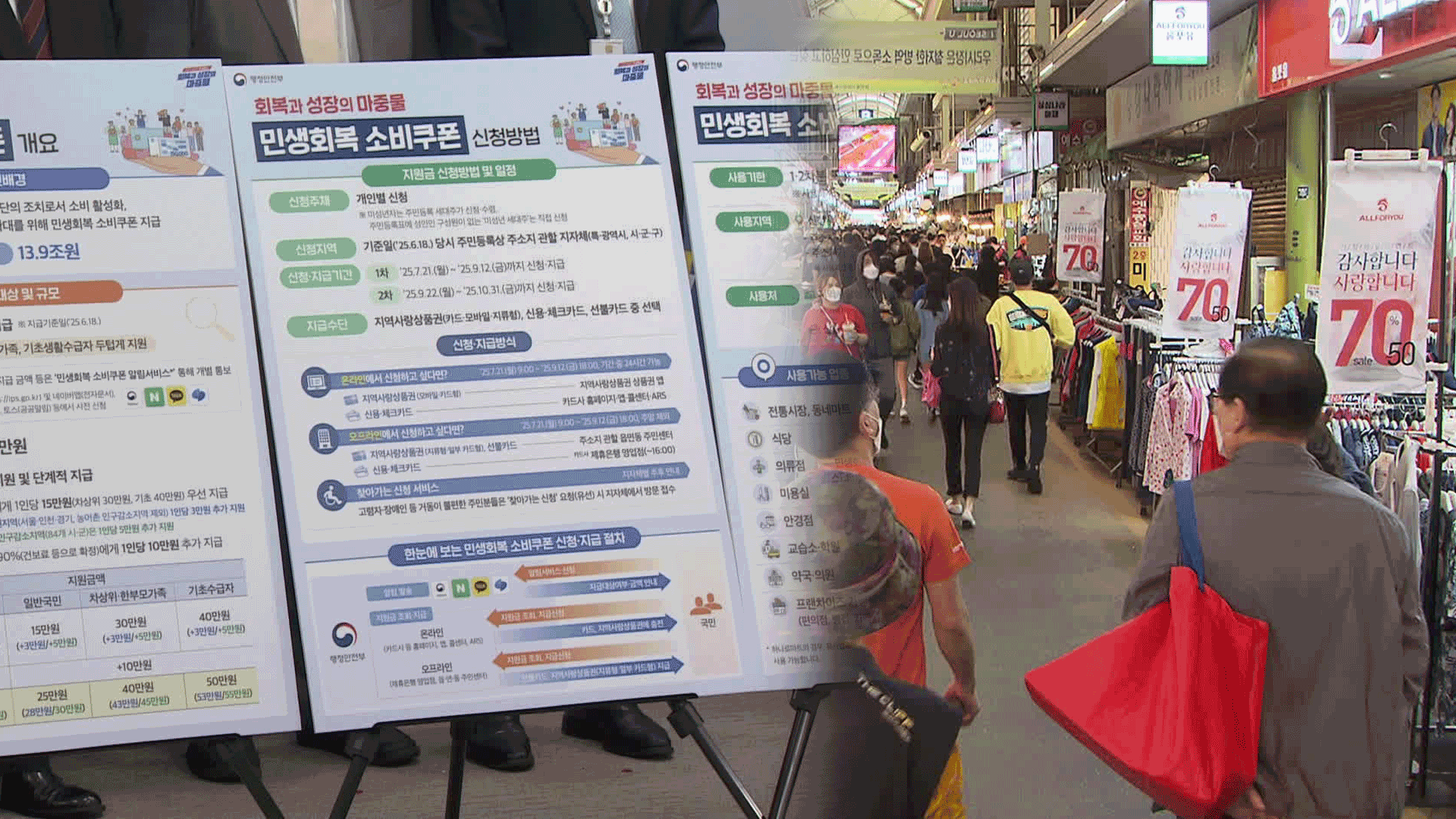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