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전기차의 천국, 노르웨이 비결은? (12월 13일 방송)
입력 2014.12.11 (17:34)
수정 2014.12.11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천국, 노르웨이 비결은?
담당 : 정지환 특파원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로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노르웨이는 이미 ‘전기차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은 걸음마 수준이다. 파격적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를 선도하는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를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다.
어디를 가도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의 노르웨이. 베르겐 시내를 다니다 보면 EL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눈에 띈다. ‘탄소 배출 제로’ 친환경 전기차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는 택시만큼 흔한 존재다. 이제는 새 차를 사는 사람 중 13% 정도가 전기차를 살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4만 대, 내년엔 5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인구 5백만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 있다. 우선 전기 충전료가 공짜다. 휘발유 1리터에 2,800원이나 하는 노르웨이에서 기름값이 안 든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는 물론, 페리 이용료 역시 무료이고, 전기차를 사면 2천만 원 이상의 세금도 면제해 준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까지 특별히 허용해주고 있다. 세계 6위의 산유국 노르웨이가 전기차에 몰두하는 이유는 깨끗한 노르웨이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이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11개 자동차회사의 25개 전기차종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뒤늦게 가세한 기아차 쏘울도 지난달 500대를 완판한 데 이어 2015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주차와 충전 등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 전기차를 타도 큰 불편이 없다는 점도 전기차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전기차는 에너지 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노르웨이는 연간 4천억 원을 전기차 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지원이 전기차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는 또 전기차 업계를 자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 되고 있다.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 소멸 위기
담당 : 복창현 특파원
사막에서 태어나 낙타와 염소 등 가축들과 함께 유목 생활을 해오며 사막을 호령했던 중동의 원주민 베두인족. 이들에게 사막은 생활 터전이자 자유로운 삶 그 자체다. 베두인족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꿋꿋이 지켜왔지만 최근 이들의 생활 터전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삶의 모습도 크게 바뀌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처럼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 북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60km 떨어진 와디 럼 사막. 서울의 2배가 넘는 면적에 붉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 베두인 백여 가구가 흩어져 살고 있다. 와디 럼 사막의 베두인 수는 10년 전보다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2011년 와디 럼이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뒤 요르단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베두인 이주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말 중동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이후 최근 시리아와 이집트, 이스라엘 등 요르단 주변 국가들의 정정불안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공예품 제조 등 관광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베두인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요르단 정부가 베두인 가정에 주는 보조금은 한 달에 35디나르, 우리 돈 5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강우량이 줄어들면서 유목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 고향이 관광지로 흡수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베두인들은 줄잡아 만여 명, 대부분 관광지 주변에서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르단 정부가 이주 정책으로 마련한 베두인 보호구역에는 베두인 2천여 명이 살고 있지만 주택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 상하수도 시설도 아직 없다. 와디 럼 사막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페트라의 동굴들도 베두인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이곳 역시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베두인은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새 정착지 마을에는 3백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변변한 생계 수단이 없어 생활고에 직면한 베두인들의 또 다른 걱정은 자녀 교육 문제다. 문맹률이 30%가 넘는 베두인 어린이들의 현실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막의 주인을 자처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온 원주민 베두인족은 이름뿐인 보호 구역에서 근근이 생활하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당 : 정지환 특파원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로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노르웨이는 이미 ‘전기차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은 걸음마 수준이다. 파격적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를 선도하는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를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다.
어디를 가도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의 노르웨이. 베르겐 시내를 다니다 보면 EL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눈에 띈다. ‘탄소 배출 제로’ 친환경 전기차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는 택시만큼 흔한 존재다. 이제는 새 차를 사는 사람 중 13% 정도가 전기차를 살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4만 대, 내년엔 5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인구 5백만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 있다. 우선 전기 충전료가 공짜다. 휘발유 1리터에 2,800원이나 하는 노르웨이에서 기름값이 안 든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는 물론, 페리 이용료 역시 무료이고, 전기차를 사면 2천만 원 이상의 세금도 면제해 준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까지 특별히 허용해주고 있다. 세계 6위의 산유국 노르웨이가 전기차에 몰두하는 이유는 깨끗한 노르웨이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이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11개 자동차회사의 25개 전기차종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뒤늦게 가세한 기아차 쏘울도 지난달 500대를 완판한 데 이어 2015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주차와 충전 등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 전기차를 타도 큰 불편이 없다는 점도 전기차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전기차는 에너지 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노르웨이는 연간 4천억 원을 전기차 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지원이 전기차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는 또 전기차 업계를 자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 되고 있다.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 소멸 위기
담당 : 복창현 특파원
사막에서 태어나 낙타와 염소 등 가축들과 함께 유목 생활을 해오며 사막을 호령했던 중동의 원주민 베두인족. 이들에게 사막은 생활 터전이자 자유로운 삶 그 자체다. 베두인족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꿋꿋이 지켜왔지만 최근 이들의 생활 터전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삶의 모습도 크게 바뀌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처럼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 북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60km 떨어진 와디 럼 사막. 서울의 2배가 넘는 면적에 붉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 베두인 백여 가구가 흩어져 살고 있다. 와디 럼 사막의 베두인 수는 10년 전보다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2011년 와디 럼이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뒤 요르단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베두인 이주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말 중동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이후 최근 시리아와 이집트, 이스라엘 등 요르단 주변 국가들의 정정불안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공예품 제조 등 관광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베두인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요르단 정부가 베두인 가정에 주는 보조금은 한 달에 35디나르, 우리 돈 5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강우량이 줄어들면서 유목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 고향이 관광지로 흡수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베두인들은 줄잡아 만여 명, 대부분 관광지 주변에서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르단 정부가 이주 정책으로 마련한 베두인 보호구역에는 베두인 2천여 명이 살고 있지만 주택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 상하수도 시설도 아직 없다. 와디 럼 사막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페트라의 동굴들도 베두인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이곳 역시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베두인은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새 정착지 마을에는 3백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변변한 생계 수단이 없어 생활고에 직면한 베두인들의 또 다른 걱정은 자녀 교육 문제다. 문맹률이 30%가 넘는 베두인 어린이들의 현실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막의 주인을 자처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온 원주민 베두인족은 이름뿐인 보호 구역에서 근근이 생활하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리보기] 전기차의 천국, 노르웨이 비결은? (12월 13일 방송)
-
- 입력 2014-12-11 17:34:17
- 수정2014-12-11 18:28:29

전기차의 천국, 노르웨이 비결은?
담당 : 정지환 특파원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로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노르웨이는 이미 ‘전기차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은 걸음마 수준이다. 파격적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를 선도하는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를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다.
어디를 가도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의 노르웨이. 베르겐 시내를 다니다 보면 EL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눈에 띈다. ‘탄소 배출 제로’ 친환경 전기차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는 택시만큼 흔한 존재다. 이제는 새 차를 사는 사람 중 13% 정도가 전기차를 살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4만 대, 내년엔 5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인구 5백만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 있다. 우선 전기 충전료가 공짜다. 휘발유 1리터에 2,800원이나 하는 노르웨이에서 기름값이 안 든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는 물론, 페리 이용료 역시 무료이고, 전기차를 사면 2천만 원 이상의 세금도 면제해 준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까지 특별히 허용해주고 있다. 세계 6위의 산유국 노르웨이가 전기차에 몰두하는 이유는 깨끗한 노르웨이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이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11개 자동차회사의 25개 전기차종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뒤늦게 가세한 기아차 쏘울도 지난달 500대를 완판한 데 이어 2015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주차와 충전 등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 전기차를 타도 큰 불편이 없다는 점도 전기차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전기차는 에너지 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노르웨이는 연간 4천억 원을 전기차 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지원이 전기차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는 또 전기차 업계를 자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 되고 있다.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 소멸 위기
담당 : 복창현 특파원
사막에서 태어나 낙타와 염소 등 가축들과 함께 유목 생활을 해오며 사막을 호령했던 중동의 원주민 베두인족. 이들에게 사막은 생활 터전이자 자유로운 삶 그 자체다. 베두인족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꿋꿋이 지켜왔지만 최근 이들의 생활 터전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삶의 모습도 크게 바뀌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처럼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 북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60km 떨어진 와디 럼 사막. 서울의 2배가 넘는 면적에 붉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 베두인 백여 가구가 흩어져 살고 있다. 와디 럼 사막의 베두인 수는 10년 전보다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2011년 와디 럼이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뒤 요르단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베두인 이주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말 중동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이후 최근 시리아와 이집트, 이스라엘 등 요르단 주변 국가들의 정정불안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공예품 제조 등 관광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베두인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요르단 정부가 베두인 가정에 주는 보조금은 한 달에 35디나르, 우리 돈 5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강우량이 줄어들면서 유목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 고향이 관광지로 흡수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베두인들은 줄잡아 만여 명, 대부분 관광지 주변에서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르단 정부가 이주 정책으로 마련한 베두인 보호구역에는 베두인 2천여 명이 살고 있지만 주택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 상하수도 시설도 아직 없다. 와디 럼 사막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페트라의 동굴들도 베두인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이곳 역시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베두인은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새 정착지 마을에는 3백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변변한 생계 수단이 없어 생활고에 직면한 베두인들의 또 다른 걱정은 자녀 교육 문제다. 문맹률이 30%가 넘는 베두인 어린이들의 현실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막의 주인을 자처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온 원주민 베두인족은 이름뿐인 보호 구역에서 근근이 생활하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당 : 정지환 특파원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로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노르웨이는 이미 ‘전기차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은 걸음마 수준이다. 파격적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를 선도하는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를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다.
어디를 가도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환경의 노르웨이. 베르겐 시내를 다니다 보면 EL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눈에 띈다. ‘탄소 배출 제로’ 친환경 전기차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는 택시만큼 흔한 존재다. 이제는 새 차를 사는 사람 중 13% 정도가 전기차를 살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4만 대, 내년엔 5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인구 5백만의 작은 나라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 있다. 우선 전기 충전료가 공짜다. 휘발유 1리터에 2,800원이나 하는 노르웨이에서 기름값이 안 든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는 물론, 페리 이용료 역시 무료이고, 전기차를 사면 2천만 원 이상의 세금도 면제해 준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까지 특별히 허용해주고 있다. 세계 6위의 산유국 노르웨이가 전기차에 몰두하는 이유는 깨끗한 노르웨이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이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노르웨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11개 자동차회사의 25개 전기차종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뒤늦게 가세한 기아차 쏘울도 지난달 500대를 완판한 데 이어 2015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주차와 충전 등 기반 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 전기차를 타도 큰 불편이 없다는 점도 전기차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전기차는 에너지 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노르웨이는 연간 4천억 원을 전기차 지원에 쏟아붓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지원이 전기차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는 또 전기차 업계를 자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 되고 있다.
사막의 유목민 베두인, 소멸 위기
담당 : 복창현 특파원
사막에서 태어나 낙타와 염소 등 가축들과 함께 유목 생활을 해오며 사막을 호령했던 중동의 원주민 베두인족. 이들에게 사막은 생활 터전이자 자유로운 삶 그 자체다. 베두인족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꿋꿋이 지켜왔지만 최근 이들의 생활 터전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삶의 모습도 크게 바뀌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처럼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 북부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60km 떨어진 와디 럼 사막. 서울의 2배가 넘는 면적에 붉은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 베두인 백여 가구가 흩어져 살고 있다. 와디 럼 사막의 베두인 수는 10년 전보다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2011년 와디 럼이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된 뒤 요르단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베두인 이주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말 중동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이후 최근 시리아와 이집트, 이스라엘 등 요르단 주변 국가들의 정정불안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공예품 제조 등 관광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베두인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요르단 정부가 베두인 가정에 주는 보조금은 한 달에 35디나르, 우리 돈 5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강우량이 줄어들면서 유목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다. 고향이 관광지로 흡수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베두인들은 줄잡아 만여 명, 대부분 관광지 주변에서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르단 정부가 이주 정책으로 마련한 베두인 보호구역에는 베두인 2천여 명이 살고 있지만 주택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 상하수도 시설도 아직 없다. 와디 럼 사막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페트라의 동굴들도 베두인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이곳 역시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베두인은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새 정착지 마을에는 3백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변변한 생계 수단이 없어 생활고에 직면한 베두인들의 또 다른 걱정은 자녀 교육 문제다. 문맹률이 30%가 넘는 베두인 어린이들의 현실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막의 주인을 자처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온 원주민 베두인족은 이름뿐인 보호 구역에서 근근이 생활하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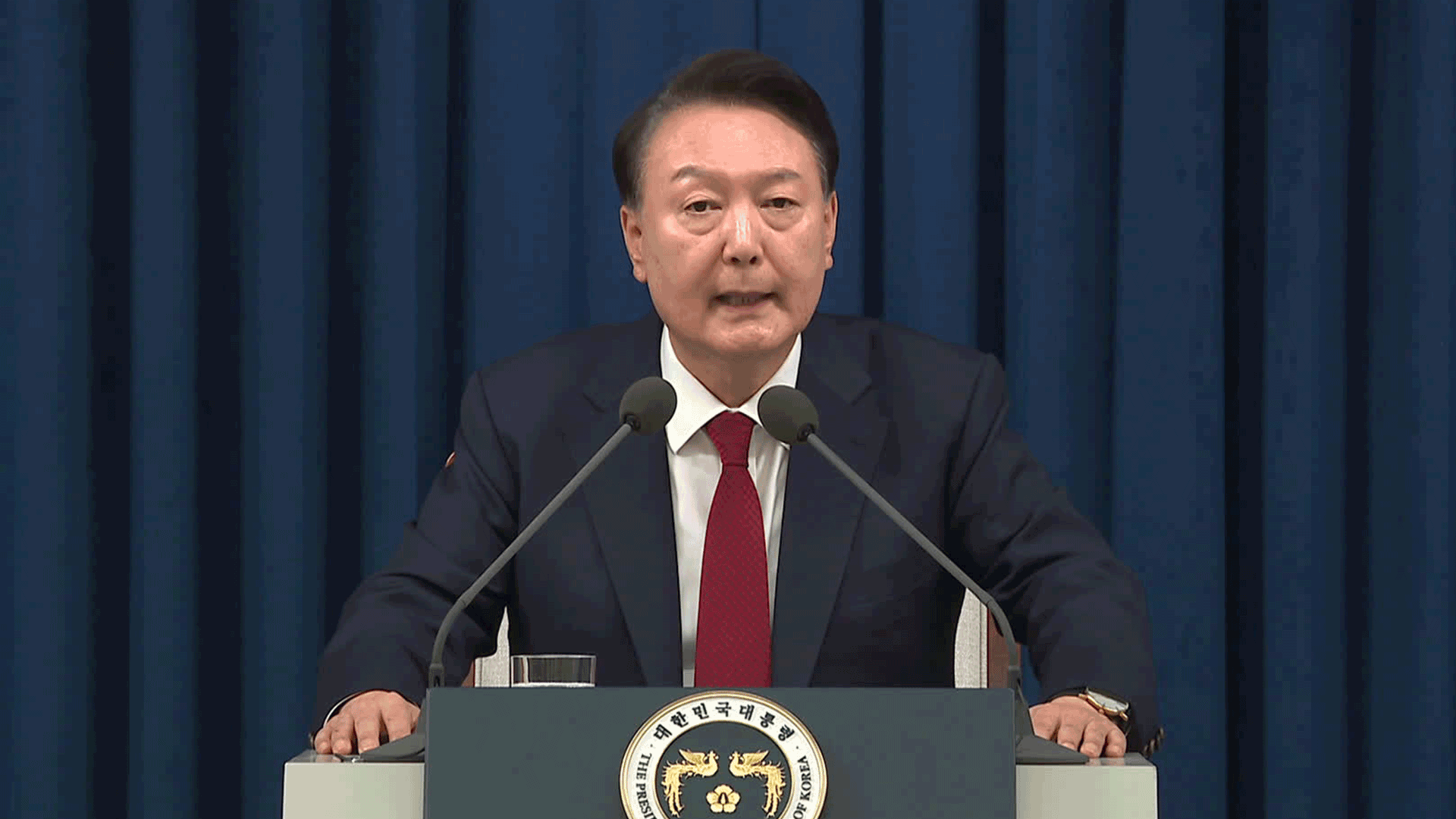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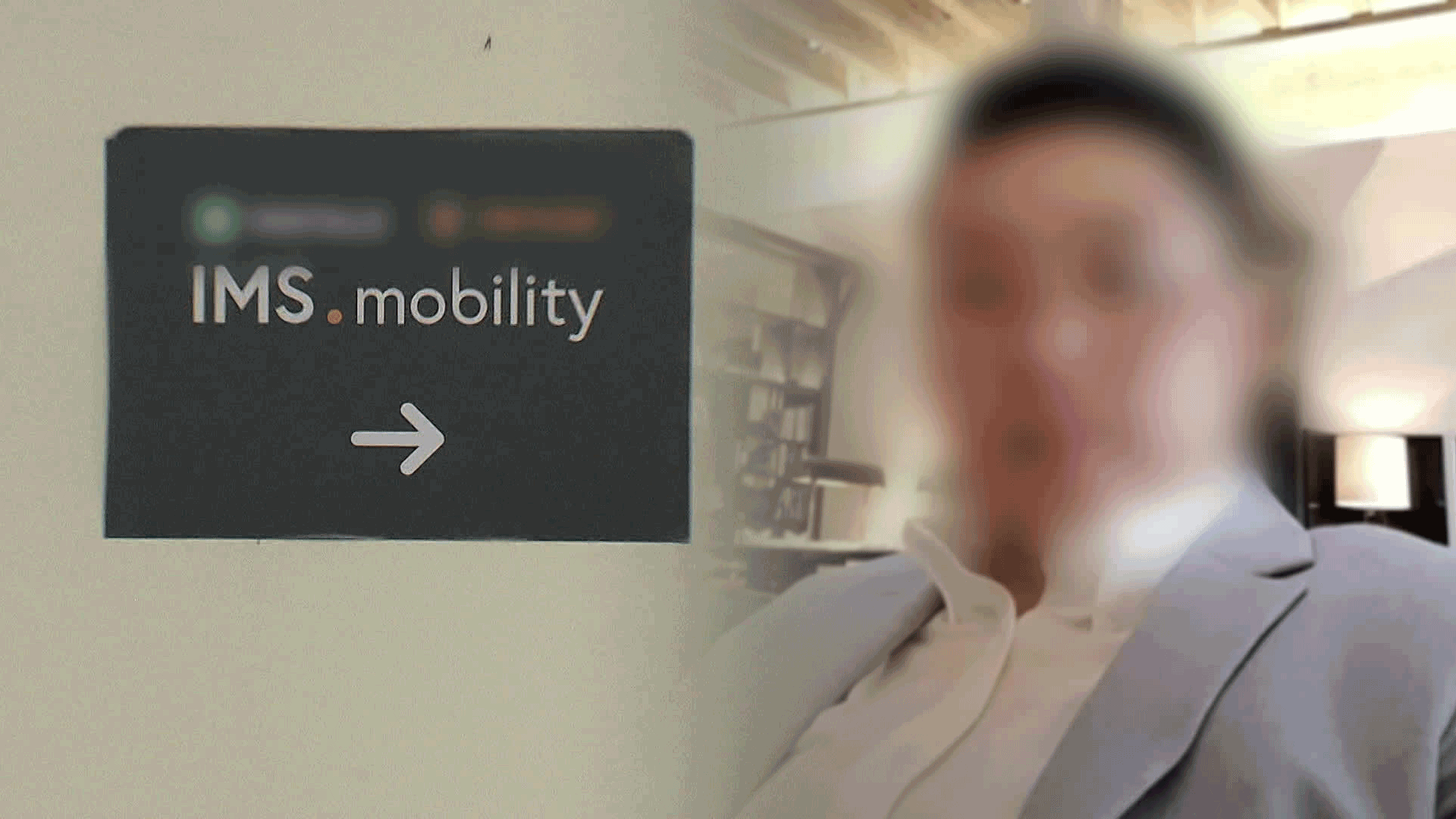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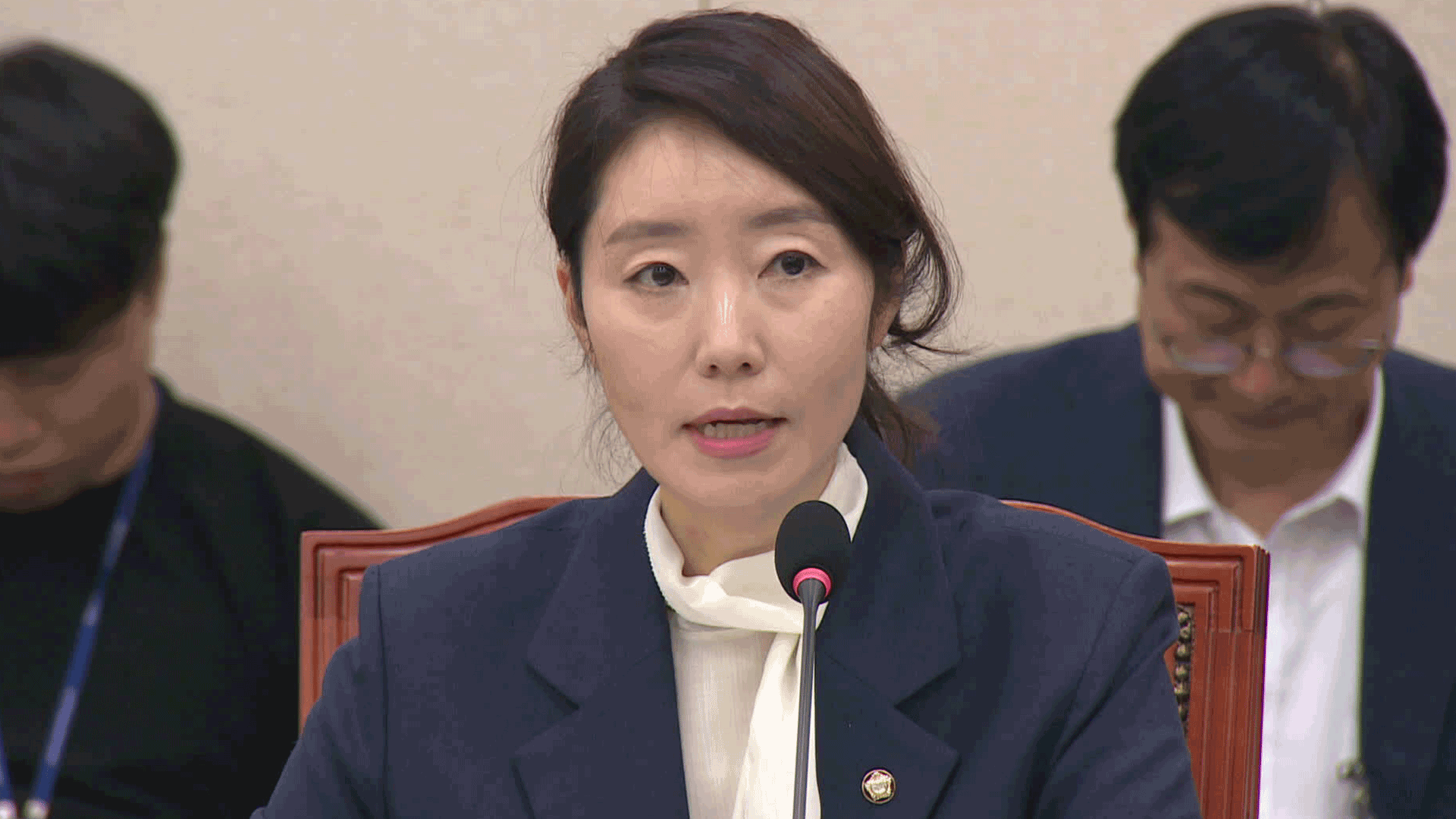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