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피해 소송구제 어려워…3년간 승소율 ‘제로’
입력 2014.12.21 (06:18)
수정 2014.12.21 (0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Pharming)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본인의 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그나마 2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화해권고는 결정이유가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아 그 구체적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 신고해서 관련계좌를 지급정지해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은행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은행 등 금융사의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자금융사기 패소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012년 3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그가 불러준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자신의 계좌에서 1천300만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으로 순식간에 2천2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A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은행의 책임을 면책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B씨의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은행책임을 인정한 파밍사기의 첫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 5월 2심에서 결정이 뒤집힌 사례다.
B씨는 '인터넷 보안유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함께 적혀있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2천만원이 빠져나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사기꾼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며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 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은행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행위를 위조로 보기 어렵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노출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은행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 1심을 뒤집었다.
대포통장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한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의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계좌주가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매년 수백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만 법원의 결정과 다르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월평균 3천건 내외가 새로 개설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은 작년 월평균 397건(피해액 46억원)에서 올해 588건(피해액 76억원)으로 급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본인의 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그나마 2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화해권고는 결정이유가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아 그 구체적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 신고해서 관련계좌를 지급정지해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은행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은행 등 금융사의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자금융사기 패소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012년 3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그가 불러준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자신의 계좌에서 1천300만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으로 순식간에 2천2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A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은행의 책임을 면책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B씨의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은행책임을 인정한 파밍사기의 첫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 5월 2심에서 결정이 뒤집힌 사례다.
B씨는 '인터넷 보안유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함께 적혀있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2천만원이 빠져나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사기꾼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며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 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은행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행위를 위조로 보기 어렵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노출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은행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 1심을 뒤집었다.
대포통장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한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의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계좌주가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매년 수백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만 법원의 결정과 다르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월평균 3천건 내외가 새로 개설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은 작년 월평균 397건(피해액 46억원)에서 올해 588건(피해액 76억원)으로 급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금융사기 피해 소송구제 어려워…3년간 승소율 ‘제로’
-
- 입력 2014-12-21 06:18:54
- 수정2014-12-21 09:51:20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Pharming)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본인의 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그나마 2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화해권고는 결정이유가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아 그 구체적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 신고해서 관련계좌를 지급정지해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은행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은행 등 금융사의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자금융사기 패소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012년 3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그가 불러준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자신의 계좌에서 1천300만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으로 순식간에 2천2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A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은행의 책임을 면책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B씨의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은행책임을 인정한 파밍사기의 첫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 5월 2심에서 결정이 뒤집힌 사례다.
B씨는 '인터넷 보안유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함께 적혀있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2천만원이 빠져나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사기꾼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며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 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은행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행위를 위조로 보기 어렵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노출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은행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 1심을 뒤집었다.
대포통장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한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의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계좌주가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매년 수백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만 법원의 결정과 다르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월평균 3천건 내외가 새로 개설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은 작년 월평균 397건(피해액 46억원)에서 올해 588건(피해액 76억원)으로 급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본인의 과실이 사건의 중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그나마 2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화해권고는 결정이유가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아 그 구체적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 신고해서 관련계좌를 지급정지해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은행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은행 등 금융사의 잘못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자금융사기 패소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2012년 3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그가 불러준 대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예금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자신의 계좌에서 1천300만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으로 순식간에 2천2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A씨는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은행의 책임을 면책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B씨의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은행책임을 인정한 파밍사기의 첫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 5월 2심에서 결정이 뒤집힌 사례다.
B씨는 '인터넷 보안유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함께 적혀있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2천만원이 빠져나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사기꾼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해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위조'에 포함된다며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 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은행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행위를 위조로 보기 어렵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노출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며 은행측은 책임이 없다고 판결, 1심을 뒤집었다.
대포통장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한다.
법원이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70%의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실제 확인한 결과 계좌주가 주로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매년 수백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만 법원의 결정과 다르게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조정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당국의 각종 대책에도 월평균 3천건 내외가 새로 개설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은 작년 월평균 397건(피해액 46억원)에서 올해 588건(피해액 76억원)으로 급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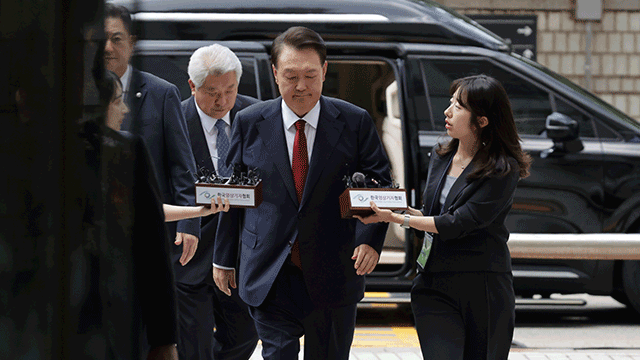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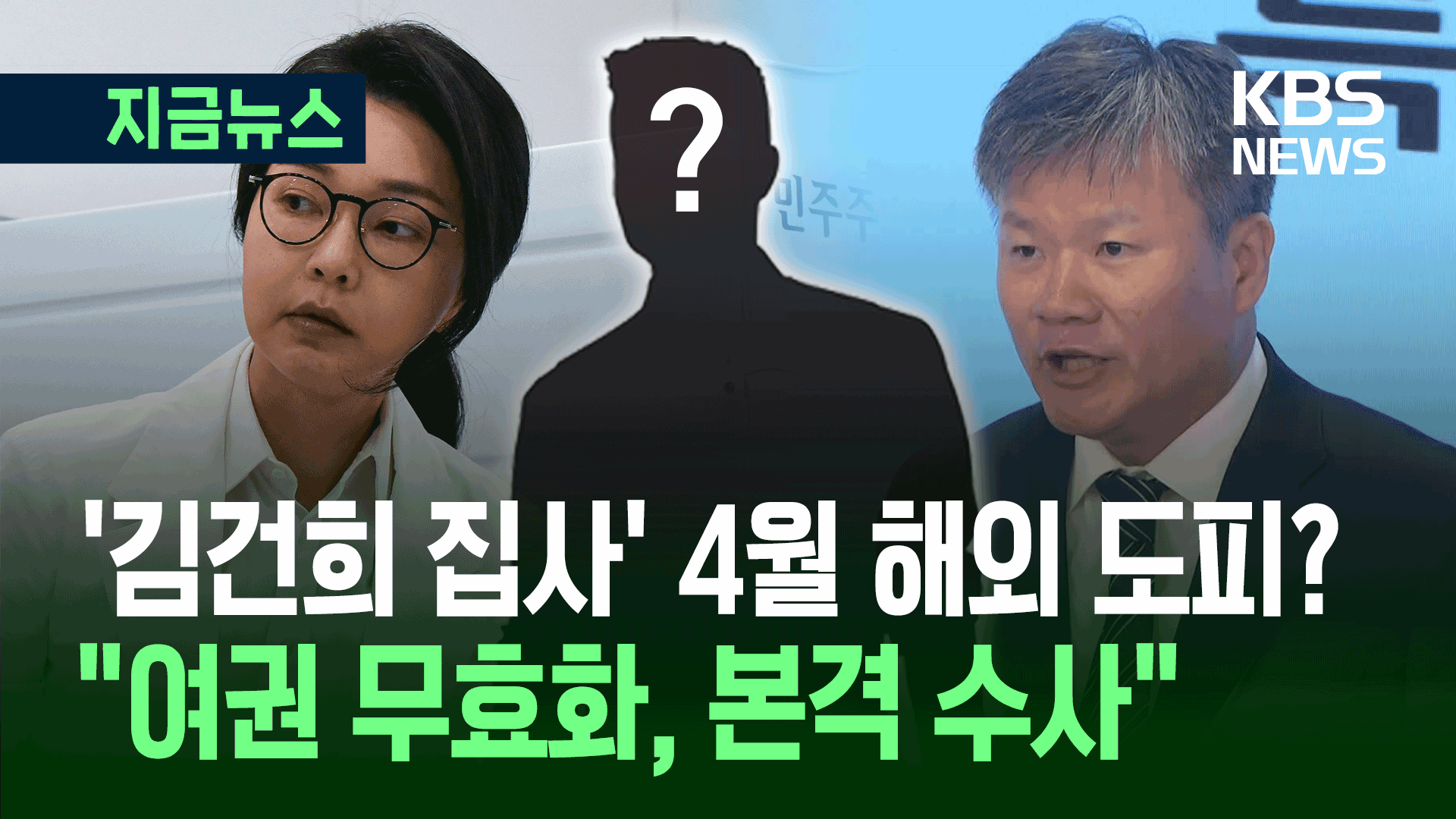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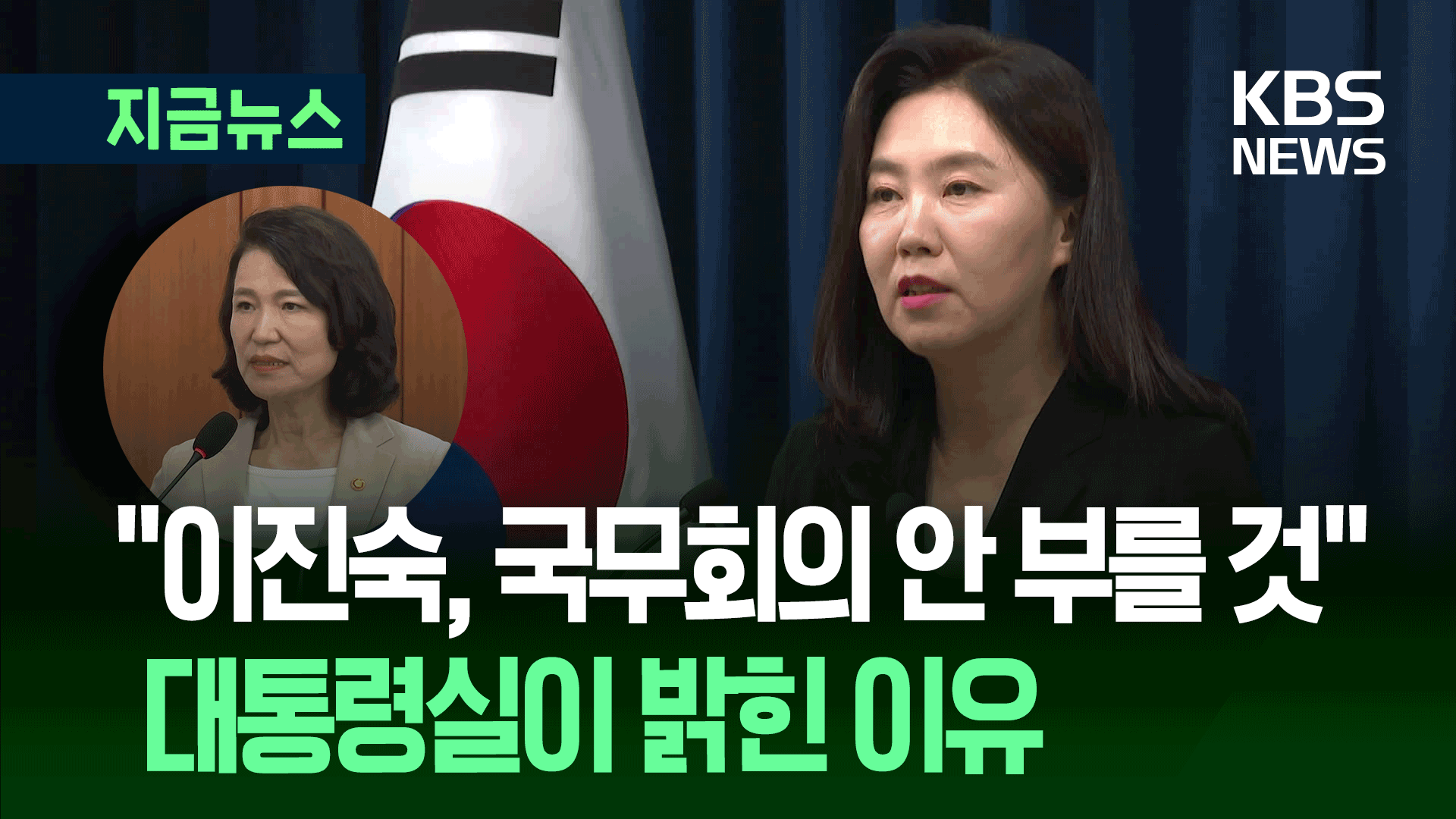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