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거짓 옛정’ 팔아 보이스피싱…동창이 뭐길래?
입력 2015.05.21 (14:35)
수정 2015.05.21 (15: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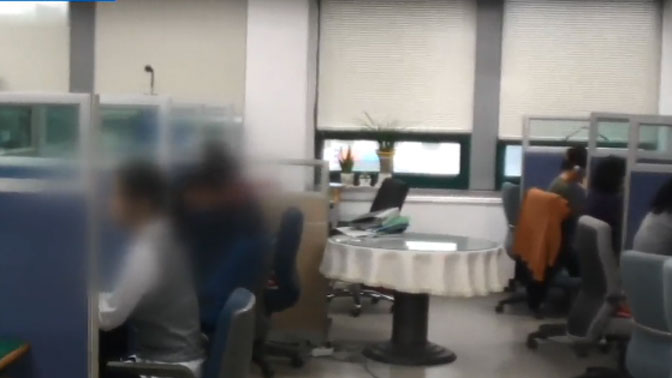
111억이나?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하고 가장 처음 든 생각입니다. 통상적인 사례에 비해 피해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피해자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건 사실이지만 총합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속은 피해자가 송금을 하고난 직후에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경찰 등에 신고를 하게 되고 동일 조직에 의한 피해가 이처럼 커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 점이 특이했습니다. 뭔가 그들만의 성공수법이 있을 것만 같다...
■ 동창이 뭐길래?
그 키워드는 ‘정情’이었습니다. ‘동창’란 한국적 정서를 이용한 겁니다. 범행 장소는 경기도의 한 콜센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콜센터입니다. 두 개 층에서 40여 명의 여성 전화상담원들이 동시에 전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보통 콜센터에선 전화가 연결되면 ‘안녕하세요 000 고객님 맞으시죠?’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머뭇머뭇거리는 말투로 ‘혹시... 00초등학교 000맞니?’라며 말문을 엽니다. ‘아, 나 00인데 기억나니? 00랑도 친했고 너랑도 00에 함께 갔었지’하고 말을 이어가죠. ‘남편 사업이 실패해서... 잡지사에서 잡지를 팔고 있어...’ 혹은 ‘우리 애가 이번에 전자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실적을 올려야한다네...’라고 사기 행각을 위한 본론으로 향해도 피해자는 이제 전화를 끊을 수 가 없습니다. 수십년 만에 연락된 동창에게, 그것도 딱한 처지에 있는 여성 동창에게 ‘매정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jpg)
■ ‘거짓 동창’ 프리미엄으로 고액 판매
네, 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이들은 주간지 1년 정기구독권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팔았습니다. 1년 정기구독권은 13만 9천 원이지만 이들은 19만 8천 원에 팔았습니다. 동창 프리미엄을 얹은 거지요. 블랙박스는 10만 원 안팎이었지만 39만 원대에 팔았습니다. 동창이라면, 어려운 동창이 도와달라는데 비싸다고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한 50대 남성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만에 동창이 연락을 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 이름도 다 꿰고 지금 뭐하는지도 알더라구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송금을 하고 잊습니다. 수십만 원, 그리 큰 돈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매주 배달되는 주간지를 보며, 혹은 차 앞유리에 달린 블랙박스를 보며 '내가 좋은 일을 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영업은 8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40여 명 콜센터 직원은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수화기를 들고 수없이 많은 학교, 무수히 많은 누군가의 동창이 되어 수만 부의 잡지와 수만 개의 블랙박스를 팔았습니다.
■ 8년 동안 8만 명 이상 당했다
8년 동안 속은 사람이 무려 8만 5천 명입니다. 어림잡아 일년에 만 명, 하루에 30명 꼴입니다.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또다른 성공비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은 ‘50대 남성'을 공략하는 ‘여직원’을 그 비결로 꼽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전화판매 콜센터였다는군요. 하지만 실적이 안나오자‘동창’ 수법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시작 6개월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상담원도 전원 ‘여자’로 교체했습니다. 남자 상담원 실적보다 여자 상담원 실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에 약하고 경제력이 있는 연령대로 범행대상을 좁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게 ‘50대 남성’이라고 말합니다. 8만 5천 명 가운데 98%가 50대 남성이었다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센터는 더 나아갑니다. 서울, 수도권 보다는 군 단위를 공략합니다. 역시 ‘정情’의 논리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취재를 하다 이들의 수법에 무릎을 치며 탄복하게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마련입니다. 8만 5천 명 가운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영 없었던 건 아닌가 봅니다. 그들의 사기행각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결국 막을 내리고 그 수법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물 잡지나 블랙박스가 안 간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이스피싱이냐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금융사기로 정의내릴 수 있으므로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0대 남성이 98%이긴 하지만 꼭 50대 남성만 당하진 않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저희 사무실의 한 동료기자가 말하더군요. 몇 년 전 학교 선배라고 전화가 와서 화면에 나온 바로 저 잡지를 사주었다구요. 역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얘기였죠. 그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연관 기사]
☞ “동창인데 도와줘”…100억 원대 잡지 구독 사기
■ 동창이 뭐길래?
그 키워드는 ‘정情’이었습니다. ‘동창’란 한국적 정서를 이용한 겁니다. 범행 장소는 경기도의 한 콜센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콜센터입니다. 두 개 층에서 40여 명의 여성 전화상담원들이 동시에 전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보통 콜센터에선 전화가 연결되면 ‘안녕하세요 000 고객님 맞으시죠?’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머뭇머뭇거리는 말투로 ‘혹시... 00초등학교 000맞니?’라며 말문을 엽니다. ‘아, 나 00인데 기억나니? 00랑도 친했고 너랑도 00에 함께 갔었지’하고 말을 이어가죠. ‘남편 사업이 실패해서... 잡지사에서 잡지를 팔고 있어...’ 혹은 ‘우리 애가 이번에 전자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실적을 올려야한다네...’라고 사기 행각을 위한 본론으로 향해도 피해자는 이제 전화를 끊을 수 가 없습니다. 수십년 만에 연락된 동창에게, 그것도 딱한 처지에 있는 여성 동창에게 ‘매정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jpg)
■ ‘거짓 동창’ 프리미엄으로 고액 판매
네, 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이들은 주간지 1년 정기구독권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팔았습니다. 1년 정기구독권은 13만 9천 원이지만 이들은 19만 8천 원에 팔았습니다. 동창 프리미엄을 얹은 거지요. 블랙박스는 10만 원 안팎이었지만 39만 원대에 팔았습니다. 동창이라면, 어려운 동창이 도와달라는데 비싸다고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한 50대 남성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만에 동창이 연락을 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 이름도 다 꿰고 지금 뭐하는지도 알더라구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송금을 하고 잊습니다. 수십만 원, 그리 큰 돈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매주 배달되는 주간지를 보며, 혹은 차 앞유리에 달린 블랙박스를 보며 '내가 좋은 일을 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영업은 8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40여 명 콜센터 직원은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수화기를 들고 수없이 많은 학교, 무수히 많은 누군가의 동창이 되어 수만 부의 잡지와 수만 개의 블랙박스를 팔았습니다.
■ 8년 동안 8만 명 이상 당했다
8년 동안 속은 사람이 무려 8만 5천 명입니다. 어림잡아 일년에 만 명, 하루에 30명 꼴입니다.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또다른 성공비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은 ‘50대 남성'을 공략하는 ‘여직원’을 그 비결로 꼽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전화판매 콜센터였다는군요. 하지만 실적이 안나오자‘동창’ 수법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시작 6개월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상담원도 전원 ‘여자’로 교체했습니다. 남자 상담원 실적보다 여자 상담원 실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에 약하고 경제력이 있는 연령대로 범행대상을 좁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게 ‘50대 남성’이라고 말합니다. 8만 5천 명 가운데 98%가 50대 남성이었다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센터는 더 나아갑니다. 서울, 수도권 보다는 군 단위를 공략합니다. 역시 ‘정情’의 논리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취재를 하다 이들의 수법에 무릎을 치며 탄복하게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마련입니다. 8만 5천 명 가운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영 없었던 건 아닌가 봅니다. 그들의 사기행각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결국 막을 내리고 그 수법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물 잡지나 블랙박스가 안 간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이스피싱이냐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금융사기로 정의내릴 수 있으므로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0대 남성이 98%이긴 하지만 꼭 50대 남성만 당하진 않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저희 사무실의 한 동료기자가 말하더군요. 몇 년 전 학교 선배라고 전화가 와서 화면에 나온 바로 저 잡지를 사주었다구요. 역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얘기였죠. 그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연관 기사]
☞ “동창인데 도와줘”…100억 원대 잡지 구독 사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거짓 옛정’ 팔아 보이스피싱…동창이 뭐길래?
-
- 입력 2015-05-21 14:35:47
- 수정2015-05-21 15:1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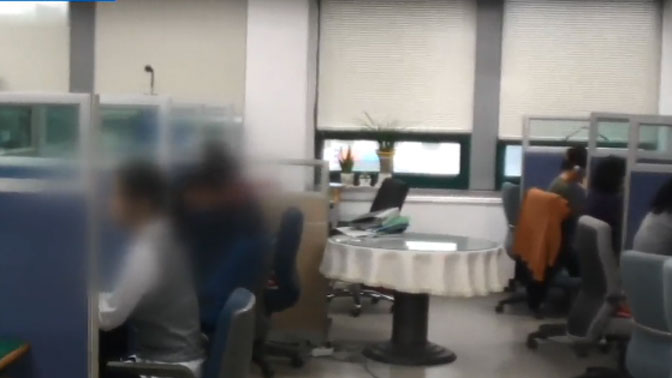
111억이나?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하고 가장 처음 든 생각입니다. 통상적인 사례에 비해 피해액수가 너무 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피해자 개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건 사실이지만 총합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속은 피해자가 송금을 하고난 직후에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경찰 등에 신고를 하게 되고 동일 조직에 의한 피해가 이처럼 커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 점이 특이했습니다. 뭔가 그들만의 성공수법이 있을 것만 같다...
■ 동창이 뭐길래?
그 키워드는 ‘정情’이었습니다. ‘동창’란 한국적 정서를 이용한 겁니다. 범행 장소는 경기도의 한 콜센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콜센터입니다. 두 개 층에서 40여 명의 여성 전화상담원들이 동시에 전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보통 콜센터에선 전화가 연결되면 ‘안녕하세요 000 고객님 맞으시죠?’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머뭇머뭇거리는 말투로 ‘혹시... 00초등학교 000맞니?’라며 말문을 엽니다. ‘아, 나 00인데 기억나니? 00랑도 친했고 너랑도 00에 함께 갔었지’하고 말을 이어가죠. ‘남편 사업이 실패해서... 잡지사에서 잡지를 팔고 있어...’ 혹은 ‘우리 애가 이번에 전자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실적을 올려야한다네...’라고 사기 행각을 위한 본론으로 향해도 피해자는 이제 전화를 끊을 수 가 없습니다. 수십년 만에 연락된 동창에게, 그것도 딱한 처지에 있는 여성 동창에게 ‘매정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jpg)
■ ‘거짓 동창’ 프리미엄으로 고액 판매
네, 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이들은 주간지 1년 정기구독권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팔았습니다. 1년 정기구독권은 13만 9천 원이지만 이들은 19만 8천 원에 팔았습니다. 동창 프리미엄을 얹은 거지요. 블랙박스는 10만 원 안팎이었지만 39만 원대에 팔았습니다. 동창이라면, 어려운 동창이 도와달라는데 비싸다고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한 50대 남성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만에 동창이 연락을 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 이름도 다 꿰고 지금 뭐하는지도 알더라구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송금을 하고 잊습니다. 수십만 원, 그리 큰 돈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매주 배달되는 주간지를 보며, 혹은 차 앞유리에 달린 블랙박스를 보며 '내가 좋은 일을 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영업은 8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40여 명 콜센터 직원은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수화기를 들고 수없이 많은 학교, 무수히 많은 누군가의 동창이 되어 수만 부의 잡지와 수만 개의 블랙박스를 팔았습니다.
■ 8년 동안 8만 명 이상 당했다
8년 동안 속은 사람이 무려 8만 5천 명입니다. 어림잡아 일년에 만 명, 하루에 30명 꼴입니다.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또다른 성공비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은 ‘50대 남성'을 공략하는 ‘여직원’을 그 비결로 꼽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전화판매 콜센터였다는군요. 하지만 실적이 안나오자‘동창’ 수법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시작 6개월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상담원도 전원 ‘여자’로 교체했습니다. 남자 상담원 실적보다 여자 상담원 실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에 약하고 경제력이 있는 연령대로 범행대상을 좁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게 ‘50대 남성’이라고 말합니다. 8만 5천 명 가운데 98%가 50대 남성이었다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센터는 더 나아갑니다. 서울, 수도권 보다는 군 단위를 공략합니다. 역시 ‘정情’의 논리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취재를 하다 이들의 수법에 무릎을 치며 탄복하게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마련입니다. 8만 5천 명 가운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영 없었던 건 아닌가 봅니다. 그들의 사기행각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결국 막을 내리고 그 수법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물 잡지나 블랙박스가 안 간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이스피싱이냐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금융사기로 정의내릴 수 있으므로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0대 남성이 98%이긴 하지만 꼭 50대 남성만 당하진 않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저희 사무실의 한 동료기자가 말하더군요. 몇 년 전 학교 선배라고 전화가 와서 화면에 나온 바로 저 잡지를 사주었다구요. 역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얘기였죠. 그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연관 기사]
☞ “동창인데 도와줘”…100억 원대 잡지 구독 사기
■ 동창이 뭐길래?
그 키워드는 ‘정情’이었습니다. ‘동창’란 한국적 정서를 이용한 겁니다. 범행 장소는 경기도의 한 콜센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콜센터입니다. 두 개 층에서 40여 명의 여성 전화상담원들이 동시에 전국으로 전화를 겁니다. 보통 콜센터에선 전화가 연결되면 ‘안녕하세요 000 고객님 맞으시죠?’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머뭇머뭇거리는 말투로 ‘혹시... 00초등학교 000맞니?’라며 말문을 엽니다. ‘아, 나 00인데 기억나니? 00랑도 친했고 너랑도 00에 함께 갔었지’하고 말을 이어가죠. ‘남편 사업이 실패해서... 잡지사에서 잡지를 팔고 있어...’ 혹은 ‘우리 애가 이번에 전자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실적을 올려야한다네...’라고 사기 행각을 위한 본론으로 향해도 피해자는 이제 전화를 끊을 수 가 없습니다. 수십년 만에 연락된 동창에게, 그것도 딱한 처지에 있는 여성 동창에게 ‘매정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jpg)
■ ‘거짓 동창’ 프리미엄으로 고액 판매
네, 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이들은 주간지 1년 정기구독권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팔았습니다. 1년 정기구독권은 13만 9천 원이지만 이들은 19만 8천 원에 팔았습니다. 동창 프리미엄을 얹은 거지요. 블랙박스는 10만 원 안팎이었지만 39만 원대에 팔았습니다. 동창이라면, 어려운 동창이 도와달라는데 비싸다고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한 50대 남성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40년 만에 동창이 연락을 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 이름도 다 꿰고 지금 뭐하는지도 알더라구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송금을 하고 잊습니다. 수십만 원, 그리 큰 돈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매주 배달되는 주간지를 보며, 혹은 차 앞유리에 달린 블랙박스를 보며 '내가 좋은 일을 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영업은 8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40여 명 콜센터 직원은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수화기를 들고 수없이 많은 학교, 무수히 많은 누군가의 동창이 되어 수만 부의 잡지와 수만 개의 블랙박스를 팔았습니다.
■ 8년 동안 8만 명 이상 당했다
8년 동안 속은 사람이 무려 8만 5천 명입니다. 어림잡아 일년에 만 명, 하루에 30명 꼴입니다.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또다른 성공비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은 ‘50대 남성'을 공략하는 ‘여직원’을 그 비결로 꼽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전화판매 콜센터였다는군요. 하지만 실적이 안나오자‘동창’ 수법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시작 6개월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상담원도 전원 ‘여자’로 교체했습니다. 남자 상담원 실적보다 여자 상담원 실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에 약하고 경제력이 있는 연령대로 범행대상을 좁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게 ‘50대 남성’이라고 말합니다. 8만 5천 명 가운데 98%가 50대 남성이었다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센터는 더 나아갑니다. 서울, 수도권 보다는 군 단위를 공략합니다. 역시 ‘정情’의 논리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취재를 하다 이들의 수법에 무릎을 치며 탄복하게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마련입니다. 8만 5천 명 가운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영 없었던 건 아닌가 봅니다. 그들의 사기행각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결국 막을 내리고 그 수법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실물 잡지나 블랙박스가 안 간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보이스피싱이냐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금융사기로 정의내릴 수 있으므로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0대 남성이 98%이긴 하지만 꼭 50대 남성만 당하진 않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저희 사무실의 한 동료기자가 말하더군요. 몇 년 전 학교 선배라고 전화가 와서 화면에 나온 바로 저 잡지를 사주었다구요. 역시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얘기였죠. 그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연관 기사]
☞ “동창인데 도와줘”…100억 원대 잡지 구독 사기
-
-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서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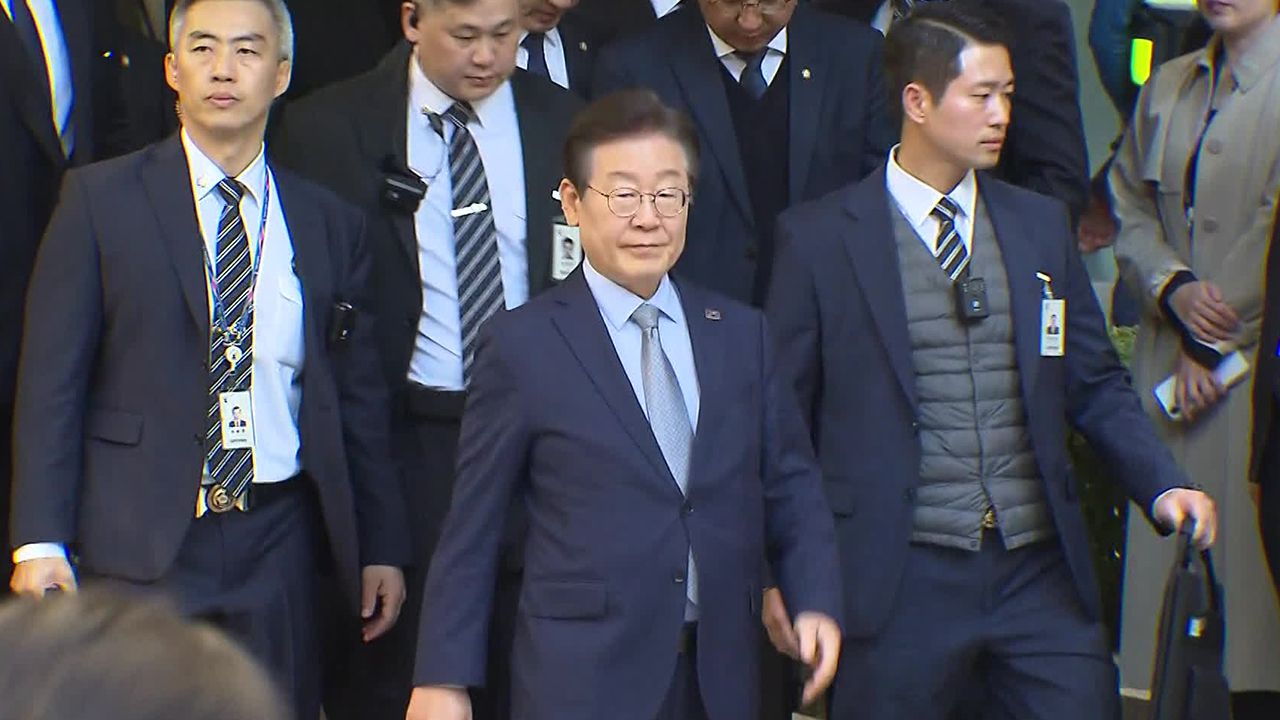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