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질퍽’ 천안야구장 혈세 낭비 논란
입력 2015.07.21 (16:38)
수정 2015.07.21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과 학생들을 위해 지었다는 천안야구장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맞은편 국도 1호선 옆 13만5천여㎡ 부지에 정규 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했다.
야산 일부를 깎아내 그라운드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37억원.
엘리트스포츠가 아닌 생활체육 혹은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실속 위주로' 경기장을 조성한 만큼 맨땅에 화장실과 펜스 등만 설치했다.
시는 당시 84개 사회인야구단 3천여명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야구장이 구설에 오른 것은 엉뚱하게도 토지보상금만 540억원에 이르고, 부지를 선정한 뒤 주변 녹지가 주거단지로 바뀌어 땅값이 급등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야구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비만 오면 논바닥으로 변하는' '돈 먹는 하마 야구장' 등의 비난이 뒤늦게 급속히 퍼져 나갔고 일부 TV매체도 심층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2004년 11월 부지를 선정, 4년 뒤인 2008년 "1천200억원을 들여 국제규모 야구장을 짓겠다"며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자 시 예산만으로 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사업비는 780억원. 2009년 심사를 마친 뒤 이듬해 5월 토지 보상에 들어갔으나 땅값이 폭등해 2003년 ㎡당 3만6천700원하던 야구장부지 땅값은 2008년 공시지가로 25만4천원이 됐다.
실제 보상가는 ㎡당 40만~45만원으로, 계획 당시 공시지가의 10배를 넘겼다.
야구장 부지와 맞닿은 녹지를 주거·상업 예정지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꾼 게 한몫했고 결국 토지보상금이 총 540억원에 이르렀다.
시는 ㎡당 55만원 안팎 하는 땅을 130만원에 매입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땅 주인은 모두 25명으로 1명당 평균 보상비는 21억6000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문제는 5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 가운데 A씨와 B씨 가족이 무려 340억원 가량을 독차지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 시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인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사업'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시청 인근에 10만㎡ 시유지가 있다. 이를 활용했다면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은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야구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 결정했다. 축구장과 배드민턴장까지 지어 복합 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21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맞은편 국도 1호선 옆 13만5천여㎡ 부지에 정규 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했다.
야산 일부를 깎아내 그라운드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37억원.
엘리트스포츠가 아닌 생활체육 혹은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실속 위주로' 경기장을 조성한 만큼 맨땅에 화장실과 펜스 등만 설치했다.
시는 당시 84개 사회인야구단 3천여명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야구장이 구설에 오른 것은 엉뚱하게도 토지보상금만 540억원에 이르고, 부지를 선정한 뒤 주변 녹지가 주거단지로 바뀌어 땅값이 급등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야구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비만 오면 논바닥으로 변하는' '돈 먹는 하마 야구장' 등의 비난이 뒤늦게 급속히 퍼져 나갔고 일부 TV매체도 심층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2004년 11월 부지를 선정, 4년 뒤인 2008년 "1천200억원을 들여 국제규모 야구장을 짓겠다"며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자 시 예산만으로 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사업비는 780억원. 2009년 심사를 마친 뒤 이듬해 5월 토지 보상에 들어갔으나 땅값이 폭등해 2003년 ㎡당 3만6천700원하던 야구장부지 땅값은 2008년 공시지가로 25만4천원이 됐다.
실제 보상가는 ㎡당 40만~45만원으로, 계획 당시 공시지가의 10배를 넘겼다.
야구장 부지와 맞닿은 녹지를 주거·상업 예정지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꾼 게 한몫했고 결국 토지보상금이 총 540억원에 이르렀다.
시는 ㎡당 55만원 안팎 하는 땅을 130만원에 매입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땅 주인은 모두 25명으로 1명당 평균 보상비는 21억6000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문제는 5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 가운데 A씨와 B씨 가족이 무려 340억원 가량을 독차지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 시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인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사업'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시청 인근에 10만㎡ 시유지가 있다. 이를 활용했다면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은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야구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 결정했다. 축구장과 배드민턴장까지 지어 복합 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만 오면 질퍽’ 천안야구장 혈세 낭비 논란
-
- 입력 2015-07-21 16:38:15
- 수정2015-07-21 16:38:52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과 학생들을 위해 지었다는 천안야구장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맞은편 국도 1호선 옆 13만5천여㎡ 부지에 정규 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했다.
야산 일부를 깎아내 그라운드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37억원.
엘리트스포츠가 아닌 생활체육 혹은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실속 위주로' 경기장을 조성한 만큼 맨땅에 화장실과 펜스 등만 설치했다.
시는 당시 84개 사회인야구단 3천여명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야구장이 구설에 오른 것은 엉뚱하게도 토지보상금만 540억원에 이르고, 부지를 선정한 뒤 주변 녹지가 주거단지로 바뀌어 땅값이 급등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야구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비만 오면 논바닥으로 변하는' '돈 먹는 하마 야구장' 등의 비난이 뒤늦게 급속히 퍼져 나갔고 일부 TV매체도 심층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2004년 11월 부지를 선정, 4년 뒤인 2008년 "1천200억원을 들여 국제규모 야구장을 짓겠다"며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자 시 예산만으로 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사업비는 780억원. 2009년 심사를 마친 뒤 이듬해 5월 토지 보상에 들어갔으나 땅값이 폭등해 2003년 ㎡당 3만6천700원하던 야구장부지 땅값은 2008년 공시지가로 25만4천원이 됐다.
실제 보상가는 ㎡당 40만~45만원으로, 계획 당시 공시지가의 10배를 넘겼다.
야구장 부지와 맞닿은 녹지를 주거·상업 예정지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꾼 게 한몫했고 결국 토지보상금이 총 540억원에 이르렀다.
시는 ㎡당 55만원 안팎 하는 땅을 130만원에 매입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땅 주인은 모두 25명으로 1명당 평균 보상비는 21억6000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문제는 5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 가운데 A씨와 B씨 가족이 무려 340억원 가량을 독차지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 시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인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사업'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시청 인근에 10만㎡ 시유지가 있다. 이를 활용했다면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은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야구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 결정했다. 축구장과 배드민턴장까지 지어 복합 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21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맞은편 국도 1호선 옆 13만5천여㎡ 부지에 정규 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 등 모두 5면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했다.
야산 일부를 깎아내 그라운드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약 37억원.
엘리트스포츠가 아닌 생활체육 혹은 학생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실속 위주로' 경기장을 조성한 만큼 맨땅에 화장실과 펜스 등만 설치했다.
시는 당시 84개 사회인야구단 3천여명과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야구장이 구설에 오른 것은 엉뚱하게도 토지보상금만 540억원에 이르고, 부지를 선정한 뒤 주변 녹지가 주거단지로 바뀌어 땅값이 급등하면서부터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야구동호인들을 중심으로 '비만 오면 논바닥으로 변하는' '돈 먹는 하마 야구장' 등의 비난이 뒤늦게 급속히 퍼져 나갔고 일부 TV매체도 심층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2004년 11월 부지를 선정, 4년 뒤인 2008년 "1천200억원을 들여 국제규모 야구장을 짓겠다"며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자 시 예산만으로 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사업비는 780억원. 2009년 심사를 마친 뒤 이듬해 5월 토지 보상에 들어갔으나 땅값이 폭등해 2003년 ㎡당 3만6천700원하던 야구장부지 땅값은 2008년 공시지가로 25만4천원이 됐다.
실제 보상가는 ㎡당 40만~45만원으로, 계획 당시 공시지가의 10배를 넘겼다.
야구장 부지와 맞닿은 녹지를 주거·상업 예정지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꾼 게 한몫했고 결국 토지보상금이 총 540억원에 이르렀다.
시는 ㎡당 55만원 안팎 하는 땅을 130만원에 매입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땅 주인은 모두 25명으로 1명당 평균 보상비는 21억6000만원이나 됐다.
그러나 문제는 5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보상비 가운데 A씨와 B씨 가족이 무려 340억원 가량을 독차지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 시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는 특정인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사업'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시청 인근에 10만㎡ 시유지가 있다. 이를 활용했다면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은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야구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라 결정했다. 축구장과 배드민턴장까지 지어 복합 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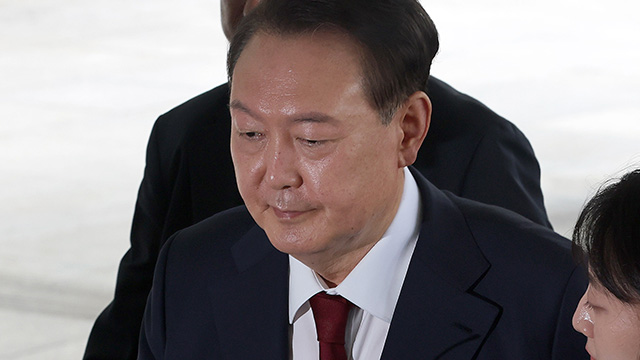
![[속보]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 표현 적절치 않아…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이뤄야”](/data/layer/904/2025/07/20250701_86evyp.pn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