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오르고 있지만, 정작 국내 민간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중국과 일본을 앞섰다며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빚이 늘고, 국제신용기관의 평가도 박해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기기관인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등급이 부여된 국내 38개 대기업 신용등급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BBB+(투자등급 10단계 중 8번째)였던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평균값이 지난달 말에는 BBB-(10번째)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에 두 단계나 떨어져 투기등급(BB+ 이하)문턱까지 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기준으로 2007년 7월 A-단계로 A등급을 레벨을 회복한 이후 지금까지 3단계나 상승했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모두 한국을 일본보다 한 등급 높게 부여했다.
국가는 잘 나가는데 막상 민간업체들의 경영은 부진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선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 탓도 있다. 외환위기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이다.
◆ 10단계나 떨어졌던 한국 국가신용등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급전직하했다.
S&P의 경우 1995년 5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올린 뒤 이후 외환위기의 징조가 보이던 97년 10월 24일 A+로 내렸고, 이해 12월 22일에는 B+까지 내렸다. 불과 몇 달사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10단계나 끌어내린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국가 신용등급이 급락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을 정상화를 길을 밟는 반면,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데다 차입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S&P에 따르면 국내 자산총액 상위 150개 기업의 매출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0년 7.4%에서 지난해 3.9%로 하락했다.
◆ 급증하고 있는 기업 부채
이처럼 영업이 부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순차입금은 크게 증가했다. 자산총액 150개 기업(삼성전자, 현대차 제외)의 순차입금은 2010년에는 249조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말에는 356조원으로 43% 급증했다.
현재 등급도 등급이지만 앞으로 더 신용등급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신용평가기관들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급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부여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다. 헌데, S&P는 국내 기업에 대해 3개 기업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7개 회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KT(A-), SK이노베이션(BBB), 에쓰오일(BBB), GS칼텍스(BBB-) 등 7개사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표 3개 기업의 합산 매출이 2008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크게 둔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 기업의 약진은 우리 기업 부진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경우 매출과 이익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기업은 2013년부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S&P의 분석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엔저라는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고, 중국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과 비슷한 상품을 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S&P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 팀장인 킴 엥탄은 “중국, 일본 기업과 대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한국 수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고, 한국내 고령화 역시 한국의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된 삼천리의 신화
이번에 S&P가 한국에 대해 신용등급을 한 단계로 올려 AA-등급을 매기면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의 AA-단계를 비로소 회복했다.
회복은 했지만 시간은 무려 18년이 걸렸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민간 우량회사들의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을 앞서는 일이 과거 몇년간 있었다.
심지어 2006년 무디스는 삼천리라는 중견 에너지 업체에 대해 A2라는 신용등급을 부여해 당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A3)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매겼다. 당시만해도 이 회사는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소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며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jpg)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 삼천리 그룹이 보유한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전경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신용등급은 그 나라의 금융회사, 기업 같은 민간 회사 신용등급의 상한선(ceiling)으로 작용하는 게 보통이다. 2012년 9월 S&P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올리자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신용등급도 같이 상승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거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라가면 우리나라 민간회사들이 발행한 외화채권의 가산금리가 10~20bp(1bp=0.01%)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올 6월말 기준 총외채가 4206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가 신용등급 상승으로 연간 약 4000만~8000만 달러의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국제신용평기기관인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등급이 부여된 국내 38개 대기업 신용등급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BBB+(투자등급 10단계 중 8번째)였던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평균값이 지난달 말에는 BBB-(10번째)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에 두 단계나 떨어져 투기등급(BB+ 이하)문턱까지 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기준으로 2007년 7월 A-단계로 A등급을 레벨을 회복한 이후 지금까지 3단계나 상승했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모두 한국을 일본보다 한 등급 높게 부여했다.
국가는 잘 나가는데 막상 민간업체들의 경영은 부진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선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 탓도 있다. 외환위기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이다.
◆ 10단계나 떨어졌던 한국 국가신용등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급전직하했다.
S&P의 경우 1995년 5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올린 뒤 이후 외환위기의 징조가 보이던 97년 10월 24일 A+로 내렸고, 이해 12월 22일에는 B+까지 내렸다. 불과 몇 달사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10단계나 끌어내린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국가 신용등급이 급락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을 정상화를 길을 밟는 반면,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데다 차입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S&P에 따르면 국내 자산총액 상위 150개 기업의 매출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0년 7.4%에서 지난해 3.9%로 하락했다.
◆ 급증하고 있는 기업 부채
이처럼 영업이 부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순차입금은 크게 증가했다. 자산총액 150개 기업(삼성전자, 현대차 제외)의 순차입금은 2010년에는 249조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말에는 356조원으로 43% 급증했다.
현재 등급도 등급이지만 앞으로 더 신용등급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신용평가기관들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급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부여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다. 헌데, S&P는 국내 기업에 대해 3개 기업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7개 회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KT(A-), SK이노베이션(BBB), 에쓰오일(BBB), GS칼텍스(BBB-) 등 7개사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표 3개 기업의 합산 매출이 2008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크게 둔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 기업의 약진은 우리 기업 부진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경우 매출과 이익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기업은 2013년부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S&P의 분석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엔저라는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고, 중국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과 비슷한 상품을 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S&P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 팀장인 킴 엥탄은 “중국, 일본 기업과 대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한국 수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고, 한국내 고령화 역시 한국의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된 삼천리의 신화
이번에 S&P가 한국에 대해 신용등급을 한 단계로 올려 AA-등급을 매기면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의 AA-단계를 비로소 회복했다.
회복은 했지만 시간은 무려 18년이 걸렸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민간 우량회사들의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을 앞서는 일이 과거 몇년간 있었다.
심지어 2006년 무디스는 삼천리라는 중견 에너지 업체에 대해 A2라는 신용등급을 부여해 당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A3)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매겼다. 당시만해도 이 회사는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소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며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jpg)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삼천리 그룹이 보유한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전경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신용등급은 그 나라의 금융회사, 기업 같은 민간 회사 신용등급의 상한선(ceiling)으로 작용하는 게 보통이다. 2012년 9월 S&P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올리자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신용등급도 같이 상승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거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라가면 우리나라 민간회사들이 발행한 외화채권의 가산금리가 10~20bp(1bp=0.01%)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올 6월말 기준 총외채가 4206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가 신용등급 상승으로 연간 약 4000만~8000만 달러의 이자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보다 신용등급 높았던 ‘삼천리’ 신화…지금은?
-
- 입력 2015-09-29 15:01:37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오르고 있지만, 정작 국내 민간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중국과 일본을 앞섰다며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빚이 늘고, 국제신용기관의 평가도 박해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기기관인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등급이 부여된 국내 38개 대기업 신용등급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BBB+(투자등급 10단계 중 8번째)였던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평균값이 지난달 말에는 BBB-(10번째)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에 두 단계나 떨어져 투기등급(BB+ 이하)문턱까지 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기준으로 2007년 7월 A-단계로 A등급을 레벨을 회복한 이후 지금까지 3단계나 상승했다. 무디스와 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은 모두 한국을 일본보다 한 등급 높게 부여했다.
국가는 잘 나가는데 막상 민간업체들의 경영은 부진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선 외환위기라는 특수 상황 탓도 있다. 외환위기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이다.
◆ 10단계나 떨어졌던 한국 국가신용등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급전직하했다.
S&P의 경우 1995년 5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올린 뒤 이후 외환위기의 징조가 보이던 97년 10월 24일 A+로 내렸고, 이해 12월 22일에는 B+까지 내렸다. 불과 몇 달사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10단계나 끌어내린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국가 신용등급이 급락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을 정상화를 길을 밟는 반면,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데다 차입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S&P에 따르면 국내 자산총액 상위 150개 기업의 매출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0년 7.4%에서 지난해 3.9%로 하락했다.
◆ 급증하고 있는 기업 부채
이처럼 영업이 부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순차입금은 크게 증가했다. 자산총액 150개 기업(삼성전자, 현대차 제외)의 순차입금은 2010년에는 249조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말에는 356조원으로 43% 급증했다.
현재 등급도 등급이지만 앞으로 더 신용등급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신용평가기관들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급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부여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한다. 헌데, S&P는 국내 기업에 대해 3개 기업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 7개 회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KT(A-), SK이노베이션(BBB), 에쓰오일(BBB), GS칼텍스(BBB-) 등 7개사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대표 3개 기업의 합산 매출이 2008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크게 둔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 기업의 약진은 우리 기업 부진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경우 매출과 이익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 기업은 2013년부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S&P의 분석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엔저라는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고, 중국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과 비슷한 상품을 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S&P 아태지역 정부 신용평가 팀장인 킴 엥탄은 “중국, 일본 기업과 대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전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한국 수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고, 한국내 고령화 역시 한국의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된 삼천리의 신화
이번에 S&P가 한국에 대해 신용등급을 한 단계로 올려 AA-등급을 매기면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의 AA-단계를 비로소 회복했다.
회복은 했지만 시간은 무려 18년이 걸렸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텔레콤 같은 민간 우량회사들의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을 앞서는 일이 과거 몇년간 있었다.
심지어 2006년 무디스는 삼천리라는 중견 에너지 업체에 대해 A2라는 신용등급을 부여해 당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A3)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매겼다. 당시만해도 이 회사는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소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며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jpg) ▲ 삼천리 그룹이 보유한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전경
▲ 삼천리 그룹이 보유한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전경
.jpg) ▲ 삼천리 그룹이 보유한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전경
▲ 삼천리 그룹이 보유한 안산 복합 화력발전소 전경-
-

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윤창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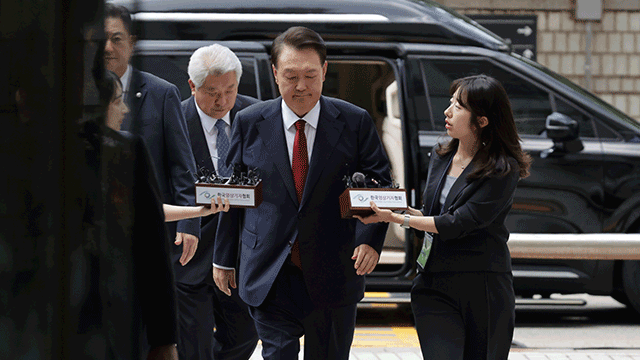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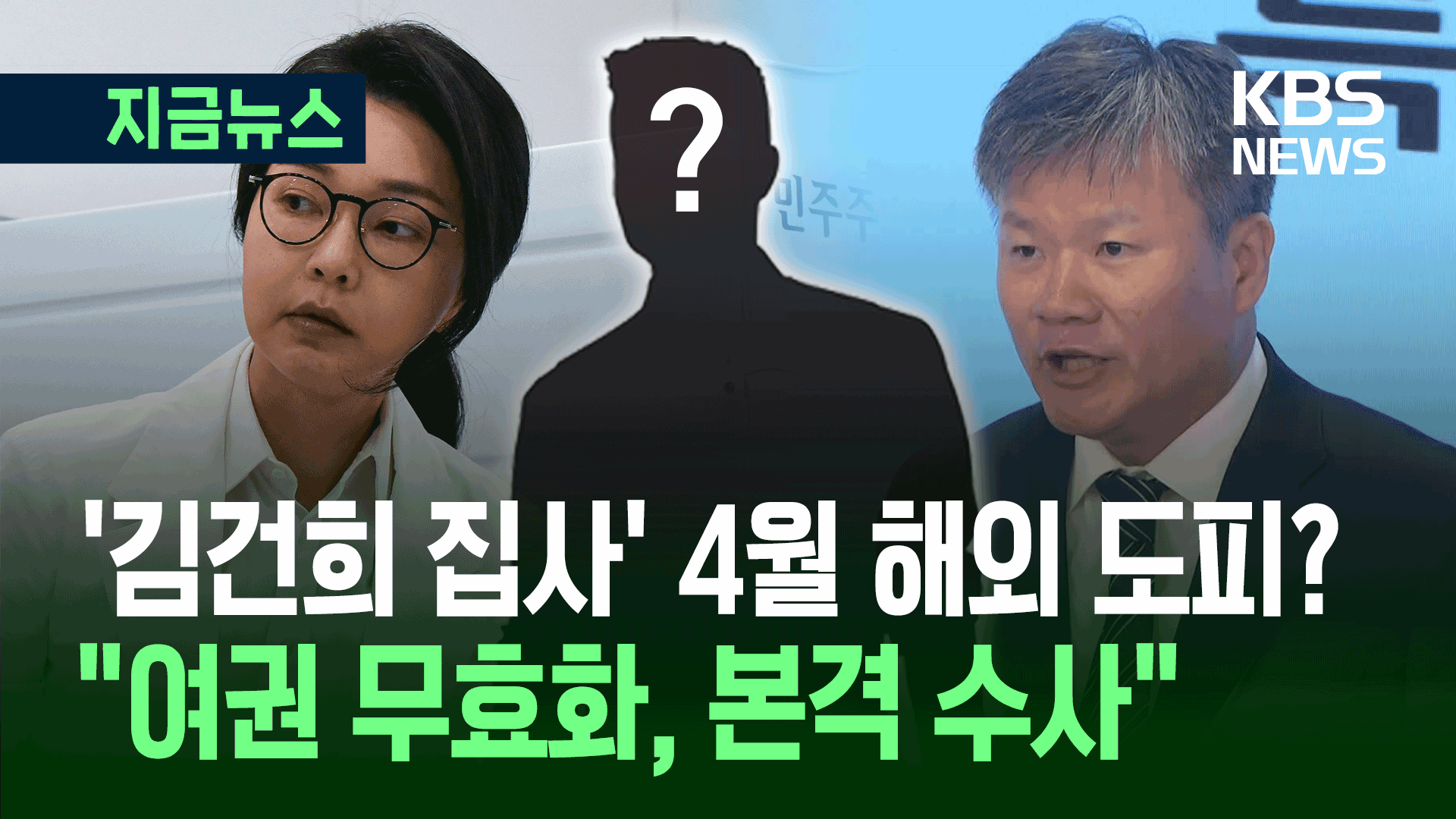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