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기사] 여성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입력 2015.10.04 (17:32)
수정 2015.10.04 (1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프라나 인식 등 우리의 현실, 과연 그동안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집중 보도한 서울신문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서울신문(7월6일) : ‘암탉을 울게 하라, 나라가 살아난다’
다소 파격적인 이 제목은 서울신문이 최근 석 달 동안 잇따라 내보낸 <女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기획 시리즈의 일부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죠.저 출산, 고령화도 해결을 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워킹 맘인 거죠.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 분들이 일을 하고 워킹 맘들이 일자리에 나서서 나아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안 되면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녹취> 서울신문(5월11일) : OECD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경고한다.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취재 중에 마주친 현실 속의 취업 여성들은 임신, 육아 문제로 인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녹취> 서울신문(5월18일) : “경기도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여직원은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축하 인사 대신 “회사를 계속 다닐 거면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은 것이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중소나 중견기업은 실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면 너 언제까지 회사 나올래? 라고 묻는 경우가 실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 기업만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 나가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취업 여성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혼 여성 가운데 직장을 떠나는 경력 단절 여성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절실하다.
<녹취> 서울신문(6월 29일) : “요즘 덴마크에서는 아빠들의 육아 모임이 유행이다. 자녀가 있는 아빠들은 8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내 대신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바로 이 점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단지 여성을 보는 눈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대낮에 유모차를 끌고 가면 저 사람 직장에서 좀 능력을 평가 받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저렇게 육아휴직을 해도 돌아갈 직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남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사례 위주의 심층 취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의식 전환을 촉구한 점, 미디어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가정과 노동 현장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공론화했으며 해외 취재를 통해 해결책을 고민하는 등 기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기존 시각과는 다르게 고령화 저 출산 시대의 대안차원에서 여성인력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도 신선했습니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여자가 나서야 경제가 삽니다. 워킹 맘의 문제를 나한테 불편함이나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서 나한테 일을 더 많이 떠넘기는 그런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생각을 바꿔보면 내 여동생, 내 아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아이의 문제이고요. 그렇게 바꿔주세요.”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프라나 인식 등 우리의 현실, 과연 그동안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집중 보도한 서울신문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서울신문(7월6일) : ‘암탉을 울게 하라, 나라가 살아난다’
다소 파격적인 이 제목은 서울신문이 최근 석 달 동안 잇따라 내보낸 <女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기획 시리즈의 일부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죠.저 출산, 고령화도 해결을 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워킹 맘인 거죠.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 분들이 일을 하고 워킹 맘들이 일자리에 나서서 나아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안 되면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녹취> 서울신문(5월11일) : OECD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경고한다.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취재 중에 마주친 현실 속의 취업 여성들은 임신, 육아 문제로 인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녹취> 서울신문(5월18일) : “경기도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여직원은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축하 인사 대신 “회사를 계속 다닐 거면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은 것이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중소나 중견기업은 실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면 너 언제까지 회사 나올래? 라고 묻는 경우가 실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 기업만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 나가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취업 여성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혼 여성 가운데 직장을 떠나는 경력 단절 여성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절실하다.
<녹취> 서울신문(6월 29일) : “요즘 덴마크에서는 아빠들의 육아 모임이 유행이다. 자녀가 있는 아빠들은 8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내 대신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바로 이 점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단지 여성을 보는 눈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대낮에 유모차를 끌고 가면 저 사람 직장에서 좀 능력을 평가 받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저렇게 육아휴직을 해도 돌아갈 직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남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사례 위주의 심층 취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의식 전환을 촉구한 점, 미디어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가정과 노동 현장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공론화했으며 해외 취재를 통해 해결책을 고민하는 등 기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기존 시각과는 다르게 고령화 저 출산 시대의 대안차원에서 여성인력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도 신선했습니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여자가 나서야 경제가 삽니다. 워킹 맘의 문제를 나한테 불편함이나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서 나한테 일을 더 많이 떠넘기는 그런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생각을 바꿔보면 내 여동생, 내 아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아이의 문제이고요. 그렇게 바꿔주세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목 이기사] 여성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
- 입력 2015-10-04 17:44:38
- 수정2015-10-04 17:52:50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프라나 인식 등 우리의 현실, 과연 그동안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집중 보도한 서울신문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서울신문(7월6일) : ‘암탉을 울게 하라, 나라가 살아난다’
다소 파격적인 이 제목은 서울신문이 최근 석 달 동안 잇따라 내보낸 <女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기획 시리즈의 일부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죠.저 출산, 고령화도 해결을 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워킹 맘인 거죠.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 분들이 일을 하고 워킹 맘들이 일자리에 나서서 나아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안 되면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녹취> 서울신문(5월11일) : OECD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경고한다.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취재 중에 마주친 현실 속의 취업 여성들은 임신, 육아 문제로 인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녹취> 서울신문(5월18일) : “경기도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여직원은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축하 인사 대신 “회사를 계속 다닐 거면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은 것이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중소나 중견기업은 실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면 너 언제까지 회사 나올래? 라고 묻는 경우가 실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 기업만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 나가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취업 여성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혼 여성 가운데 직장을 떠나는 경력 단절 여성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절실하다.
<녹취> 서울신문(6월 29일) : “요즘 덴마크에서는 아빠들의 육아 모임이 유행이다. 자녀가 있는 아빠들은 8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내 대신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바로 이 점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단지 여성을 보는 눈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대낮에 유모차를 끌고 가면 저 사람 직장에서 좀 능력을 평가 받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저렇게 육아휴직을 해도 돌아갈 직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남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사례 위주의 심층 취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의식 전환을 촉구한 점, 미디어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가정과 노동 현장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공론화했으며 해외 취재를 통해 해결책을 고민하는 등 기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기존 시각과는 다르게 고령화 저 출산 시대의 대안차원에서 여성인력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도 신선했습니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여자가 나서야 경제가 삽니다. 워킹 맘의 문제를 나한테 불편함이나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서 나한테 일을 더 많이 떠넘기는 그런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생각을 바꿔보면 내 여동생, 내 아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아이의 문제이고요. 그렇게 바꿔주세요.”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프라나 인식 등 우리의 현실, 과연 그동안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집중 보도한 서울신문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서울신문(7월6일) : ‘암탉을 울게 하라, 나라가 살아난다’
다소 파격적인 이 제목은 서울신문이 최근 석 달 동안 잇따라 내보낸 <女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기획 시리즈의 일부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죠.저 출산, 고령화도 해결을 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워킹 맘인 거죠.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 분들이 일을 하고 워킹 맘들이 일자리에 나서서 나아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가 안 되면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녹취> 서울신문(5월11일) : OECD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경고한다.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취재 중에 마주친 현실 속의 취업 여성들은 임신, 육아 문제로 인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녹취> 서울신문(5월18일) : “경기도의 한 제조업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여직원은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축하 인사 대신 “회사를 계속 다닐 거면 관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받은 것이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중소나 중견기업은 실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게 되면 너 언제까지 회사 나올래? 라고 묻는 경우가 실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 기업만 잘못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풀어 나가주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취업 여성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예산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혼 여성 가운데 직장을 떠나는 경력 단절 여성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절실하다.
<녹취> 서울신문(6월 29일) : “요즘 덴마크에서는 아빠들의 육아 모임이 유행이다. 자녀가 있는 아빠들은 80%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내 대신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바로 이 점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단지 여성을 보는 눈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대낮에 유모차를 끌고 가면 저 사람 직장에서 좀 능력을 평가 받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저렇게 육아휴직을 해도 돌아갈 직장이 보장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남성이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사례 위주의 심층 취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의식 전환을 촉구한 점, 미디어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홍성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가정과 노동 현장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공론화했으며 해외 취재를 통해 해결책을 고민하는 등 기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기존 시각과는 다르게 고령화 저 출산 시대의 대안차원에서 여성인력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도 신선했습니다.”
<인터뷰> 전경하(서울신문 기자) :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여자가 나서야 경제가 삽니다. 워킹 맘의 문제를 나한테 불편함이나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서 나한테 일을 더 많이 떠넘기는 그런 존재로만 보지 마세요. 생각을 바꿔보면 내 여동생, 내 아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아이의 문제이고요. 그렇게 바꿔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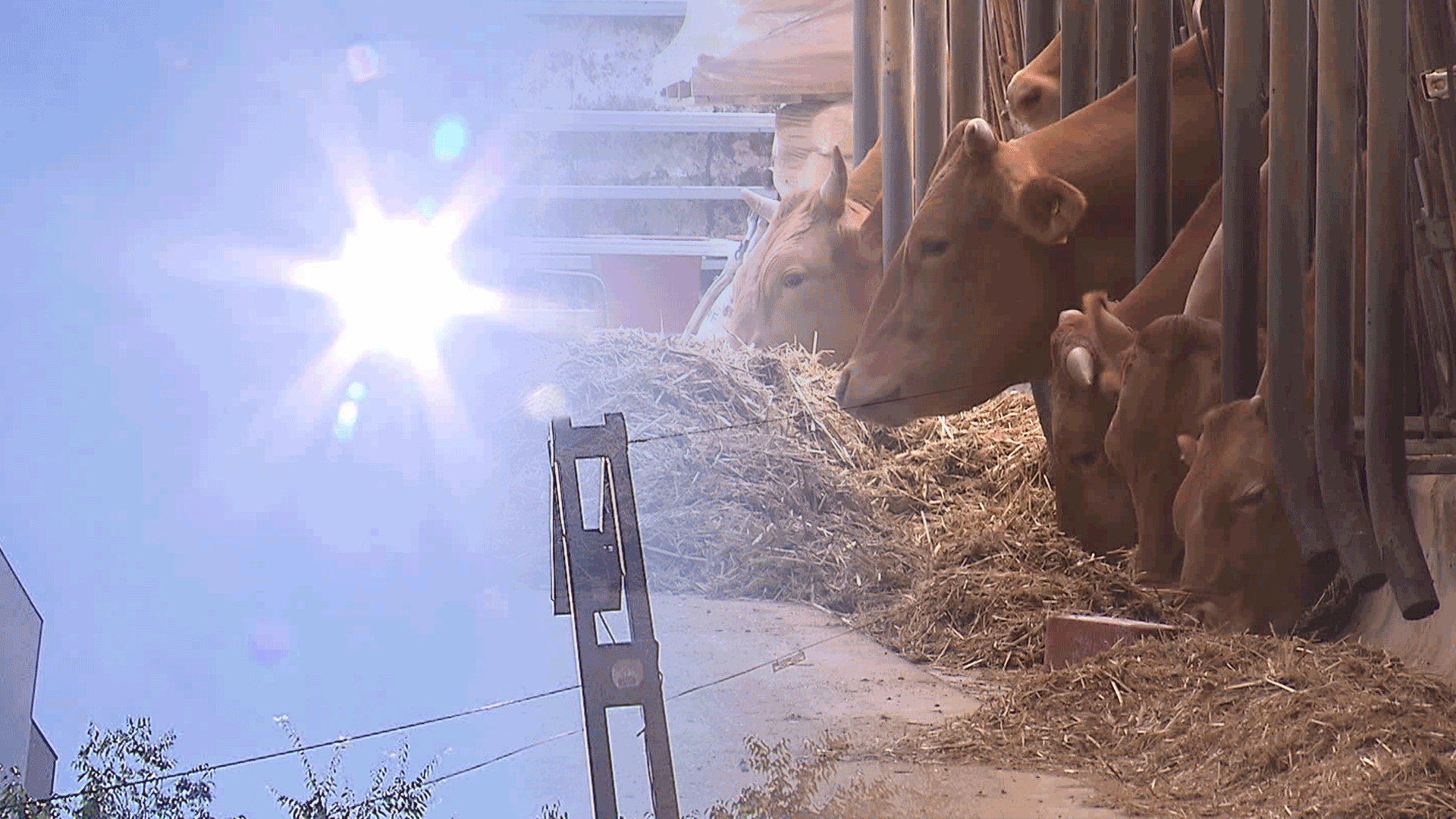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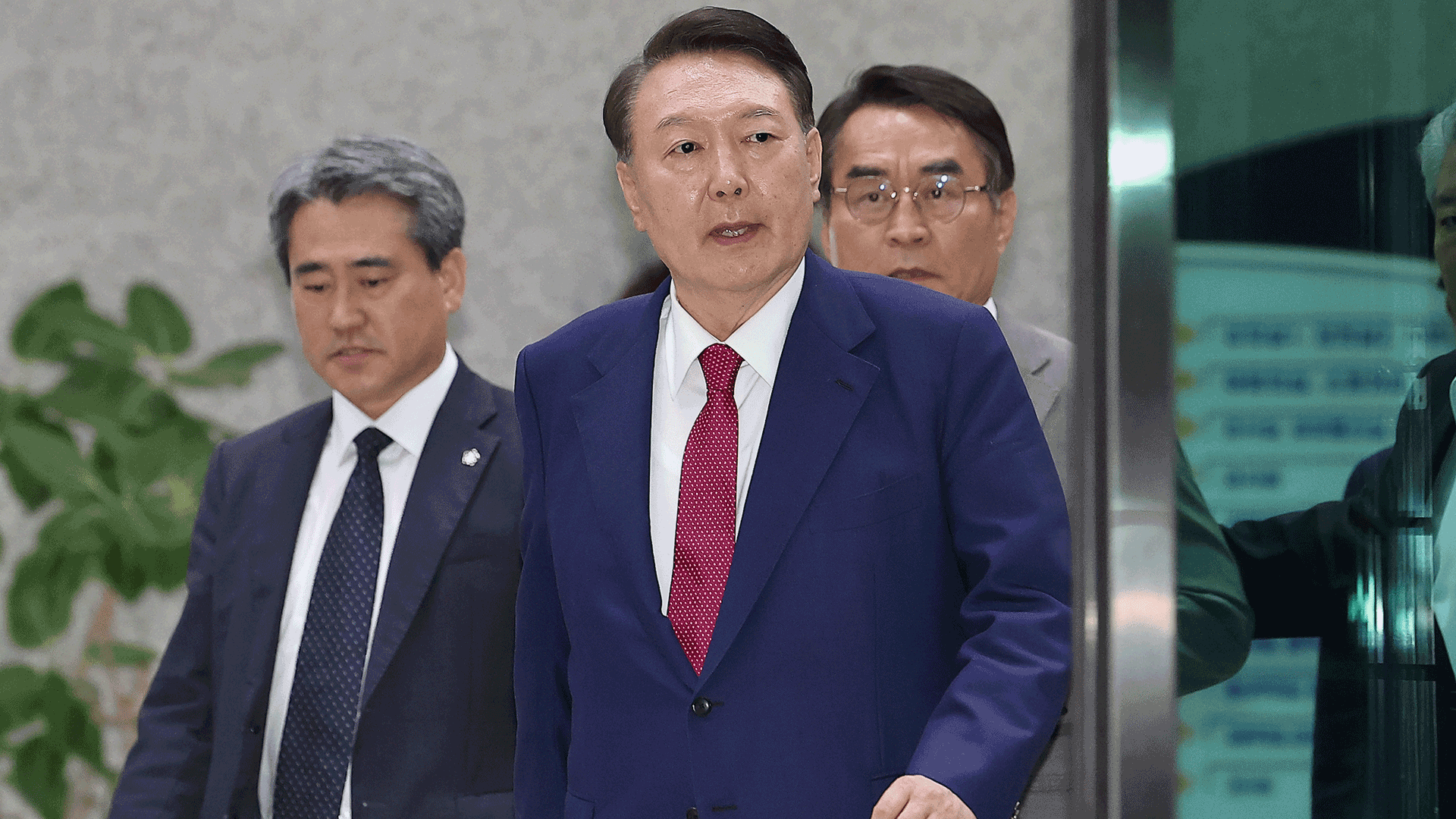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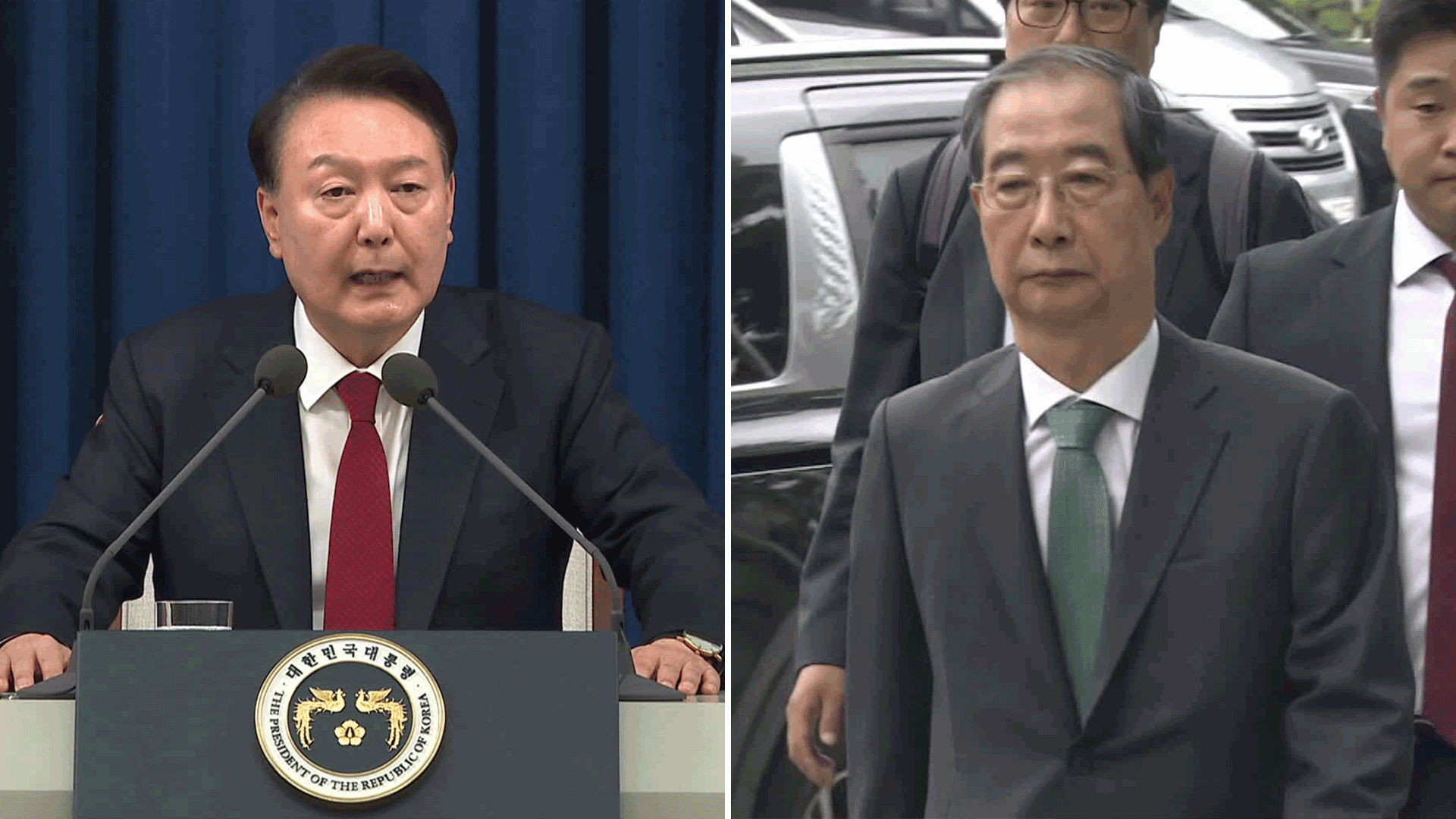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