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인 1997년. 야후는 구글을 인수할 기회가 있었다. 모회사인 알파벳 시가총액(615조원)이 세계 1위인 그 구글 말이다. 인수 제안가는 단돈(?) 1조원이었다.
야후를 만든 스탠포드대 출신 제리 양은 고심 끝에 인수를 포기했다. 야후는 인터넷을 호령하는 공룡이었고, 구글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스타트업이었다. 구글은 '공룡 야후'가 언제든 먹어치울 수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랬던 야후가 매각을 앞두고 있다. 야후는 18일(현지 시각)까지 검색·뉴스·이메일 등 인터넷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하고, 매각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 때 전 세계 인터넷 산업을 쥐락펴락했던 야후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매각가는 80억달러(9조2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야후의 인터넷 부문 매각은, 끊임없는 실적 부진에 시달린 결과다. 야후는 지난해 4분기 12억7000만달러(약 1조5500억원) 매출을 거뒀지만, 순손실은 44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야후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야후는 전체 직원 15%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공룡을 자처했던 야후는 어쩌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하는 신세가 됐을까.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당대의 경쟁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구글은 검색과 메일을 주 무기로 점유율을 높였고, 페이스북은 2000년대 후반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주도했다. 야후는 자신들의 근간인 검색 시장을 구글에 내주며 맥을 못 췄다.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도 패착으로 꼽힌다. 구글 같은 경쟁사는 '모바일 온리(mobile only)'를 외치며 새로운 시장에 주력했지만, 야후는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야후라고 가만히 침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회생을 위한 몸부림을 쳤는데, 대표적인 게 2013년 영입한 구글 출신 마리사 메이어 최고경영자(CEO)다.
구글 창업 멤버인 메이어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엄친딸'로 불린다. 스탠퍼드대 졸업 후 줄곧 구글에서 일했는데, 구글 검색, 지메일, 구글 뉴스, 구글 맵스 등을 제작했다.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구글에서 온 메이어는 모바일이 앞으로 IT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리란 걸 알았다. 그녀는 야후 CEO 취임 직후부터 모바일을 강조했고, 모바일 스타트업 20여개를 1년 만에 차례로 인수하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미 시장 주도권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실리콘밸리 엄친딸'도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
그래도 한때 인터넷 공룡이었던 회사다. 200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CEO 스티브 발머가 "야후를 446억 달러(약 42조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리 양은 제안을 거절했고, 지금은 매각가가 8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년 전 야후가 인수를 고민했던 구글도 이번 야후 인수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년 만에 매각자와 인수자가 뒤바뀐 셈이다. 20년 전 구글을 거부한 그 결정을 제리 양은 후회하고 있을까? 팔려가는 야후를 보며 IT 시장의 빠른 변화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업체는 도태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야후를 만든 스탠포드대 출신 제리 양은 고심 끝에 인수를 포기했다. 야후는 인터넷을 호령하는 공룡이었고, 구글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스타트업이었다. 구글은 '공룡 야후'가 언제든 먹어치울 수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랬던 야후가 매각을 앞두고 있다. 야후는 18일(현지 시각)까지 검색·뉴스·이메일 등 인터넷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하고, 매각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 때 전 세계 인터넷 산업을 쥐락펴락했던 야후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매각가는 80억달러(9조2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야후의 인터넷 부문 매각은, 끊임없는 실적 부진에 시달린 결과다. 야후는 지난해 4분기 12억7000만달러(약 1조5500억원) 매출을 거뒀지만, 순손실은 44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야후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야후는 전체 직원 15%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공룡을 자처했던 야후는 어쩌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하는 신세가 됐을까.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당대의 경쟁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구글은 검색과 메일을 주 무기로 점유율을 높였고, 페이스북은 2000년대 후반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주도했다. 야후는 자신들의 근간인 검색 시장을 구글에 내주며 맥을 못 췄다.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도 패착으로 꼽힌다. 구글 같은 경쟁사는 '모바일 온리(mobile only)'를 외치며 새로운 시장에 주력했지만, 야후는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야후라고 가만히 침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회생을 위한 몸부림을 쳤는데, 대표적인 게 2013년 영입한 구글 출신 마리사 메이어 최고경영자(CEO)다.
구글 창업 멤버인 메이어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엄친딸'로 불린다. 스탠퍼드대 졸업 후 줄곧 구글에서 일했는데, 구글 검색, 지메일, 구글 뉴스, 구글 맵스 등을 제작했다.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구글에서 온 메이어는 모바일이 앞으로 IT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리란 걸 알았다. 그녀는 야후 CEO 취임 직후부터 모바일을 강조했고, 모바일 스타트업 20여개를 1년 만에 차례로 인수하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미 시장 주도권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실리콘밸리 엄친딸'도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
그래도 한때 인터넷 공룡이었던 회사다. 200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CEO 스티브 발머가 "야후를 446억 달러(약 42조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리 양은 제안을 거절했고, 지금은 매각가가 8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년 전 야후가 인수를 고민했던 구글도 이번 야후 인수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년 만에 매각자와 인수자가 뒤바뀐 셈이다. 20년 전 구글을 거부한 그 결정을 제리 양은 후회하고 있을까? 팔려가는 야후를 보며 IT 시장의 빠른 변화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업체는 도태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글 인수 기회 놓친 야후의 몰락
-
- 입력 2016-04-19 11:54:03

20년 전인 1997년. 야후는 구글을 인수할 기회가 있었다. 모회사인 알파벳 시가총액(615조원)이 세계 1위인 그 구글 말이다. 인수 제안가는 단돈(?) 1조원이었다.
야후를 만든 스탠포드대 출신 제리 양은 고심 끝에 인수를 포기했다. 야후는 인터넷을 호령하는 공룡이었고, 구글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스타트업이었다. 구글은 '공룡 야후'가 언제든 먹어치울 수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랬던 야후가 매각을 앞두고 있다. 야후는 18일(현지 시각)까지 검색·뉴스·이메일 등 인터넷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하고, 매각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 때 전 세계 인터넷 산업을 쥐락펴락했던 야후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매각가는 80억달러(9조2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야후의 인터넷 부문 매각은, 끊임없는 실적 부진에 시달린 결과다. 야후는 지난해 4분기 12억7000만달러(약 1조5500억원) 매출을 거뒀지만, 순손실은 44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야후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야후는 전체 직원 15%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공룡을 자처했던 야후는 어쩌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하는 신세가 됐을까.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당대의 경쟁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구글은 검색과 메일을 주 무기로 점유율을 높였고, 페이스북은 2000년대 후반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주도했다. 야후는 자신들의 근간인 검색 시장을 구글에 내주며 맥을 못 췄다.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도 패착으로 꼽힌다. 구글 같은 경쟁사는 '모바일 온리(mobile only)'를 외치며 새로운 시장에 주력했지만, 야후는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야후라고 가만히 침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회생을 위한 몸부림을 쳤는데, 대표적인 게 2013년 영입한 구글 출신 마리사 메이어 최고경영자(CEO)다.
구글 창업 멤버인 메이어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엄친딸'로 불린다. 스탠퍼드대 졸업 후 줄곧 구글에서 일했는데, 구글 검색, 지메일, 구글 뉴스, 구글 맵스 등을 제작했다.

구글에서 온 메이어는 모바일이 앞으로 IT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리란 걸 알았다. 그녀는 야후 CEO 취임 직후부터 모바일을 강조했고, 모바일 스타트업 20여개를 1년 만에 차례로 인수하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미 시장 주도권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실리콘밸리 엄친딸'도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
그래도 한때 인터넷 공룡이었던 회사다. 200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CEO 스티브 발머가 "야후를 446억 달러(약 42조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리 양은 제안을 거절했고, 지금은 매각가가 8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년 전 야후가 인수를 고민했던 구글도 이번 야후 인수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년 만에 매각자와 인수자가 뒤바뀐 셈이다. 20년 전 구글을 거부한 그 결정을 제리 양은 후회하고 있을까? 팔려가는 야후를 보며 IT 시장의 빠른 변화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업체는 도태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야후를 만든 스탠포드대 출신 제리 양은 고심 끝에 인수를 포기했다. 야후는 인터넷을 호령하는 공룡이었고, 구글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스타트업이었다. 구글은 '공룡 야후'가 언제든 먹어치울 수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랬던 야후가 매각을 앞두고 있다. 야후는 18일(현지 시각)까지 검색·뉴스·이메일 등 인터넷 핵심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하고, 매각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 때 전 세계 인터넷 산업을 쥐락펴락했던 야후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매각가는 80억달러(9조2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야후의 인터넷 부문 매각은, 끊임없는 실적 부진에 시달린 결과다. 야후는 지난해 4분기 12억7000만달러(약 1조5500억원) 매출을 거뒀지만, 순손실은 44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야후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야후는 전체 직원 15%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공룡을 자처했던 야후는 어쩌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하는 신세가 됐을까.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이라는 당대의 경쟁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 구글은 검색과 메일을 주 무기로 점유율을 높였고, 페이스북은 2000년대 후반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주도했다. 야후는 자신들의 근간인 검색 시장을 구글에 내주며 맥을 못 췄다.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점도 패착으로 꼽힌다. 구글 같은 경쟁사는 '모바일 온리(mobile only)'를 외치며 새로운 시장에 주력했지만, 야후는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야후라고 가만히 침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회생을 위한 몸부림을 쳤는데, 대표적인 게 2013년 영입한 구글 출신 마리사 메이어 최고경영자(CEO)다.
구글 창업 멤버인 메이어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엄친딸'로 불린다. 스탠퍼드대 졸업 후 줄곧 구글에서 일했는데, 구글 검색, 지메일, 구글 뉴스, 구글 맵스 등을 제작했다.

구글에서 온 메이어는 모바일이 앞으로 IT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리란 걸 알았다. 그녀는 야후 CEO 취임 직후부터 모바일을 강조했고, 모바일 스타트업 20여개를 1년 만에 차례로 인수하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미 시장 주도권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실리콘밸리 엄친딸'도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
그래도 한때 인터넷 공룡이었던 회사다. 200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CEO 스티브 발머가 "야후를 446억 달러(약 42조원)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리 양은 제안을 거절했고, 지금은 매각가가 8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년 전 야후가 인수를 고민했던 구글도 이번 야후 인수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0년 만에 매각자와 인수자가 뒤바뀐 셈이다. 20년 전 구글을 거부한 그 결정을 제리 양은 후회하고 있을까? 팔려가는 야후를 보며 IT 시장의 빠른 변화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업체는 도태된다는 점을 알게 된다.
-
-

이승종 기자 argo@kbs.co.kr
이승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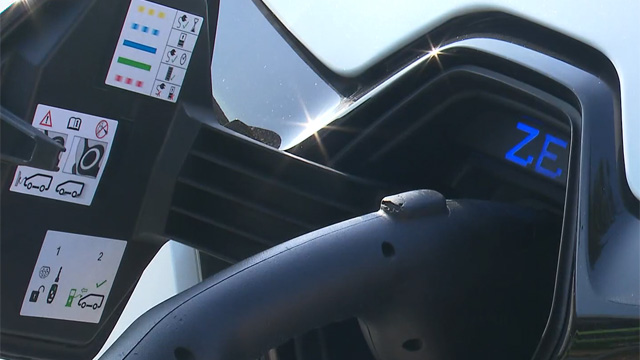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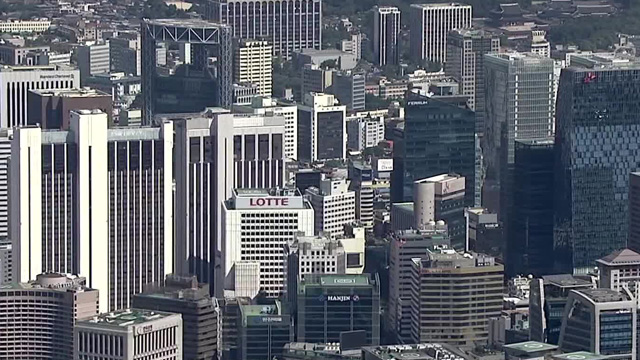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