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찌 달고 성폭행’…재범 증가
입력 2016.10.05 (08:17)
수정 2016.10.05 (0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전자발찌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 부터입니다.
성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자 등을 상대로 출소 후 최대 30년까지 차야 하는데요.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접근할 수 없거나, 들어가선 안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범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재범율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작 발찌 착용자들의 재범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전자발찌의 효과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데요.
먼저 일부러 전자발찌를 고장내거나 끊어버리면 최고 7년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 원 벌금을 내야하는데도 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 처벌은 그에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60%가 1년이하였고, 법원의 선고는 80% 이상이 징역 10월에 그쳤습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와 관련된 비상 출동 현황을 보면 최근들어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소위 강력범이다보니 여러 명의 관리 인력이 한 명을 상대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숙련된 인력 문제 외에도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으로선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에 있는 지는 알 수 있어도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다 튼튼한 발찌를 만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큰소리가 나거나, 착용자의 맥박과 혈압 등 생체 정보와 음주 여부 등을 파악해 범죄 직전의 흥분 상태인 지를 판단하고 관계 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교육,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 부터입니다.
성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자 등을 상대로 출소 후 최대 30년까지 차야 하는데요.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접근할 수 없거나, 들어가선 안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범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재범율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작 발찌 착용자들의 재범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전자발찌의 효과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데요.
먼저 일부러 전자발찌를 고장내거나 끊어버리면 최고 7년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 원 벌금을 내야하는데도 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 처벌은 그에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60%가 1년이하였고, 법원의 선고는 80% 이상이 징역 10월에 그쳤습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와 관련된 비상 출동 현황을 보면 최근들어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소위 강력범이다보니 여러 명의 관리 인력이 한 명을 상대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숙련된 인력 문제 외에도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으로선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에 있는 지는 알 수 있어도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다 튼튼한 발찌를 만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큰소리가 나거나, 착용자의 맥박과 혈압 등 생체 정보와 음주 여부 등을 파악해 범죄 직전의 흥분 상태인 지를 판단하고 관계 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교육,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발찌 달고 성폭행’…재범 증가
-
- 입력 2016-10-05 08:18:26
- 수정2016-10-05 09:29:46

<기자 멘트>
전자발찌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 부터입니다.
성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자 등을 상대로 출소 후 최대 30년까지 차야 하는데요.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접근할 수 없거나, 들어가선 안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범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재범율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작 발찌 착용자들의 재범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전자발찌의 효과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데요.
먼저 일부러 전자발찌를 고장내거나 끊어버리면 최고 7년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 원 벌금을 내야하는데도 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 처벌은 그에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60%가 1년이하였고, 법원의 선고는 80% 이상이 징역 10월에 그쳤습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와 관련된 비상 출동 현황을 보면 최근들어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소위 강력범이다보니 여러 명의 관리 인력이 한 명을 상대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숙련된 인력 문제 외에도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으로선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에 있는 지는 알 수 있어도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다 튼튼한 발찌를 만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큰소리가 나거나, 착용자의 맥박과 혈압 등 생체 정보와 음주 여부 등을 파악해 범죄 직전의 흥분 상태인 지를 판단하고 관계 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교육,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 부터입니다.
성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자 등을 상대로 출소 후 최대 30년까지 차야 하는데요.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접근할 수 없거나, 들어가선 안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범의 경우, 제도 도입 후 재범율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작 발찌 착용자들의 재범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아파트를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 모 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겁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 장소가 접근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지난 2008년 0.5%정도에 그쳤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2%로 4배 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추적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16배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전자감시 대상자의 경우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관찰관 1명당 18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교화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합니다.
<인터뷰>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전자감독은 24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심리적 통제만 해야하고, 그 나머지 역할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 착용자의 심장박동과 맥박 수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범죄 징후를 포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전자발찌의 효과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한데요.
먼저 일부러 전자발찌를 고장내거나 끊어버리면 최고 7년 징역형을 받거나 2천만 원 벌금을 내야하는데도 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 처벌은 그에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60%가 1년이하였고, 법원의 선고는 80% 이상이 징역 10월에 그쳤습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와 관련된 비상 출동 현황을 보면 최근들어 3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소위 강력범이다보니 여러 명의 관리 인력이 한 명을 상대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숙련된 인력 문제 외에도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금으로선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에 있는 지는 알 수 있어도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다 튼튼한 발찌를 만들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큰소리가 나거나, 착용자의 맥박과 혈압 등 생체 정보와 음주 여부 등을 파악해 범죄 직전의 흥분 상태인 지를 판단하고 관계 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발찌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교육, 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박경호 기자의 기사 모음 -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황경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핫 클릭] 알렉 볼드윈이 연기한 트럼프](https://news.kbs.co.kr/data/news/2016/10/05/3355773_100.jpg)
![[단독] “윤석열·김용현 등 공모해 군사상 이익 해쳐”<br>…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 적용](/data/layer/904/2025/07/20250714_3VTJV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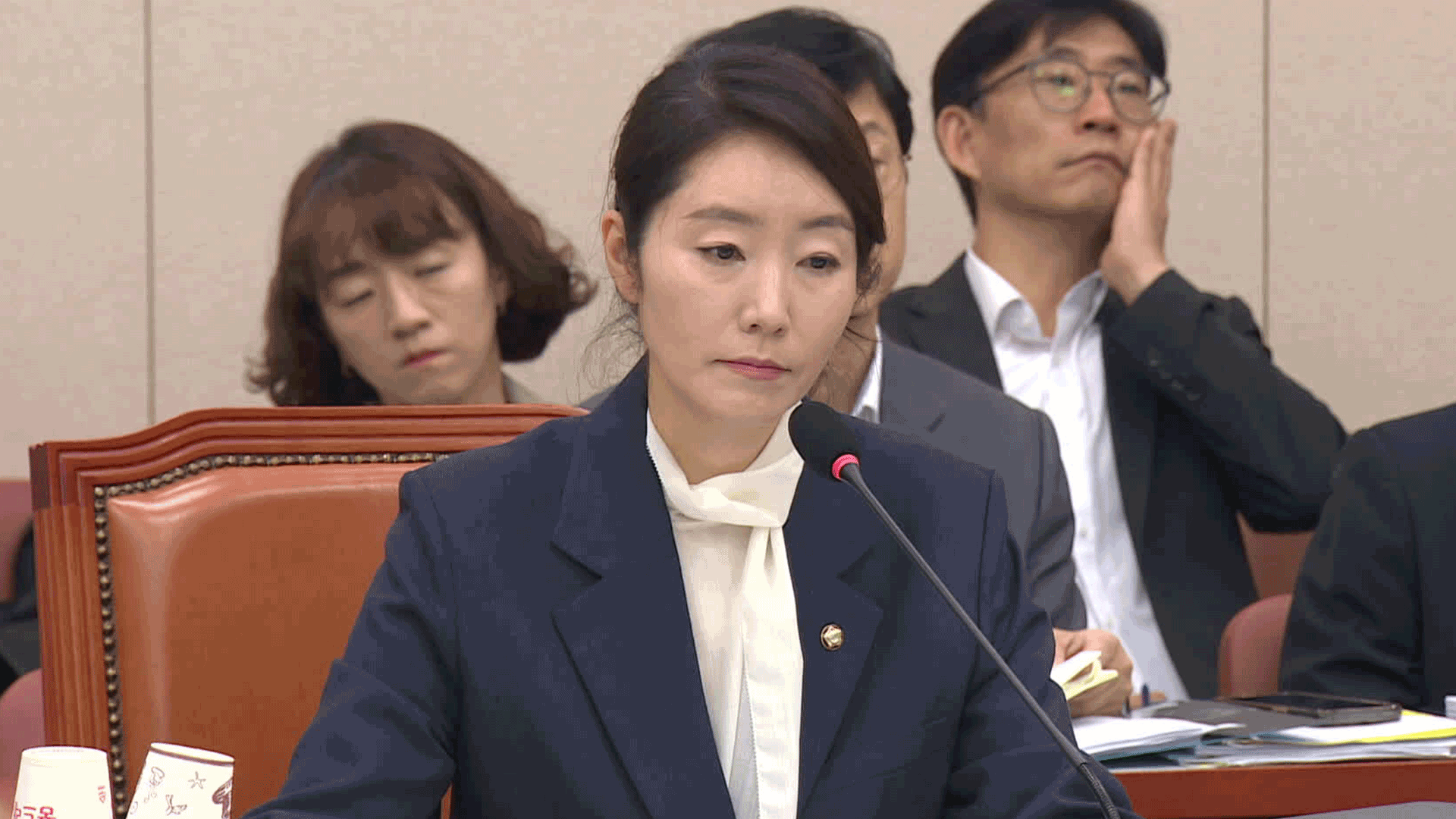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