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미래로] 평화와 생명을 찾아서…DMZ 사진 기록
입력 2016.11.05 (08:19)
수정 2016.11.05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흔히 DMZ라 부르는 비무장지대는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생명의 땅이 되고 있죠?
네. 한편으론 일반인이 가기 힘든 금단의 땅이기도 한데요.
그런 DMZ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분이 계시다고요?
네, 최병관 사진작가 이야기인데요.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는 그 곳을 동서로 세 번이나 횡단하면서 10만 번 넘게 셔터를 눌렀다고 합니다.
DMZ의 생생한 모습, 벌써 보고싶네요.
그 현장으로 홍은지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 안에 위치한 도라산 역.
역사 앞에 얼마 전 임시 갤러리가 세워졌습니다.
관광차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던 홍은수 씨.
<녹취> 홍은수(관람객) : "이거 고생 나도 많이 했는데..."
최전방 수색대에 복무하던 추억에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합니다.
<인터뷰> 홍은수(관람객) : "(영하) 40도에 육박하니까 추워서 벌벌 떨죠. 추워서 잠이 와서 잠을 깨기 위해서 깡통을 흔들고 그랬어요."
전시된 50여 점의 사진은 남과 북을 가르는 금단의 땅, DMZ의 모습들입니다.
끊어진 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다리, 총탄을 맞고 멈춰선 뒤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기차, 나무가 우거진 남쪽과는 달리 잡풀만 무성한 철조망 너머 북쪽 땅...
사진을 통해 DMZ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터뷰> 홍진환(관람객) : "북한의 헐벗은 산야를 보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 박옥분(관람객) : "여기 와서 DMZ 사진전을 보니까요, 분단 현실이 안타깝네요. 얼른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한민족 끼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진작가는 이 dmz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휴전선 서쪽에서 동쪽까지 248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2년 동안 세 번이나 횡단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넓게 펼쳐진 갯벌, 연안에 솟아 오른 갈대숲과 붉은 칠면초가 장관을 이룹니다.
불어오는 찬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한 장면이라도 놓칠 세라 셔터를 누르는 이 사람이 바로 ‘DMZ 사진작가’로 불리는 최병관 씨입니다.
이곳 소래 포구에서 태어난 그는 개발로 인해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아름답게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 가지고 이 소중함을 알려서 덜 훼손되게 만드느냐... 그건 이제 사진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사람이 키우는 꽃보다 생명력이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뻐요."
30여 년 동안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사진으로 담아온 그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DMZ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한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엔본부에서 전시를 했던 포스터죠."
그의 작업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필름들,그 중 DMZ 사진은 무려 10만장에 이릅니다.
1995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사진집을 제작했던 것이 인연이 돼 DMZ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요.
1997년부터 2년 동안 DMZ 전 구간을 누비며 위험을 무릅쓰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어딜 가나 북한군이 항상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뢰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뭐 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고... 유서를 써서 내가 이번 작업을 하다가 죽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국가나 육군본부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걸 써서 보냈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일, 과연 무엇을 카메라에 담았을까요?
비무장지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450일 동안 만난 최전방의 병사들!
허리까지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들의 애환에서 부터,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슬픔.
전쟁의 상흔 위에 다시 움트는 생명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생태의 보고인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는데요.
녹슨 철모 틈으로 가냘프게 피어난 들꽃.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난 이걸 보면서 국군이 죽어서 다시 들꽃으로 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젊은 병사가 피어보지도 못한 채 총탄을 맞고 쓰러져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 생각을 하면서 찍은 거거든... 적의 총탄을 맞고 막 쓰러져서 신음소리 같은 게 막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최병관 작가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지 않는 날이면, 이곳 도라산 역에 들르곤 하는데요.
DMZ 못지않게,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인 도라산 역, 플랫폼에 들어서면 북녘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철로가 펼쳐지는데요.
최병관 작가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이 경의선 철로 연결 공사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다는 그.
눈앞의 철로를 따라 평양행 기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그 날이 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평화를 염원하는 사진전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도 이 전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진전도 하고 싶고..."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DMZ 사진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진 한 점 한 점이 웅변합니다.
무엇보다 폐허가 된 비극의 땅에서도 철모를 뚫고 야생화가 피어나듯 통일의 그날 또한 반드시 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흔히 DMZ라 부르는 비무장지대는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생명의 땅이 되고 있죠?
네. 한편으론 일반인이 가기 힘든 금단의 땅이기도 한데요.
그런 DMZ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분이 계시다고요?
네, 최병관 사진작가 이야기인데요.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는 그 곳을 동서로 세 번이나 횡단하면서 10만 번 넘게 셔터를 눌렀다고 합니다.
DMZ의 생생한 모습, 벌써 보고싶네요.
그 현장으로 홍은지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 안에 위치한 도라산 역.
역사 앞에 얼마 전 임시 갤러리가 세워졌습니다.
관광차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던 홍은수 씨.
<녹취> 홍은수(관람객) : "이거 고생 나도 많이 했는데..."
최전방 수색대에 복무하던 추억에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합니다.
<인터뷰> 홍은수(관람객) : "(영하) 40도에 육박하니까 추워서 벌벌 떨죠. 추워서 잠이 와서 잠을 깨기 위해서 깡통을 흔들고 그랬어요."
전시된 50여 점의 사진은 남과 북을 가르는 금단의 땅, DMZ의 모습들입니다.
끊어진 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다리, 총탄을 맞고 멈춰선 뒤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기차, 나무가 우거진 남쪽과는 달리 잡풀만 무성한 철조망 너머 북쪽 땅...
사진을 통해 DMZ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터뷰> 홍진환(관람객) : "북한의 헐벗은 산야를 보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 박옥분(관람객) : "여기 와서 DMZ 사진전을 보니까요, 분단 현실이 안타깝네요. 얼른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한민족 끼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진작가는 이 dmz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휴전선 서쪽에서 동쪽까지 248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2년 동안 세 번이나 횡단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넓게 펼쳐진 갯벌, 연안에 솟아 오른 갈대숲과 붉은 칠면초가 장관을 이룹니다.
불어오는 찬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한 장면이라도 놓칠 세라 셔터를 누르는 이 사람이 바로 ‘DMZ 사진작가’로 불리는 최병관 씨입니다.
이곳 소래 포구에서 태어난 그는 개발로 인해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아름답게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 가지고 이 소중함을 알려서 덜 훼손되게 만드느냐... 그건 이제 사진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사람이 키우는 꽃보다 생명력이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뻐요."
30여 년 동안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사진으로 담아온 그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DMZ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한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엔본부에서 전시를 했던 포스터죠."
그의 작업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필름들,그 중 DMZ 사진은 무려 10만장에 이릅니다.
1995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사진집을 제작했던 것이 인연이 돼 DMZ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요.
1997년부터 2년 동안 DMZ 전 구간을 누비며 위험을 무릅쓰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어딜 가나 북한군이 항상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뢰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뭐 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고... 유서를 써서 내가 이번 작업을 하다가 죽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국가나 육군본부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걸 써서 보냈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일, 과연 무엇을 카메라에 담았을까요?
비무장지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450일 동안 만난 최전방의 병사들!
허리까지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들의 애환에서 부터,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슬픔.
전쟁의 상흔 위에 다시 움트는 생명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생태의 보고인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는데요.
녹슨 철모 틈으로 가냘프게 피어난 들꽃.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난 이걸 보면서 국군이 죽어서 다시 들꽃으로 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젊은 병사가 피어보지도 못한 채 총탄을 맞고 쓰러져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 생각을 하면서 찍은 거거든... 적의 총탄을 맞고 막 쓰러져서 신음소리 같은 게 막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최병관 작가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지 않는 날이면, 이곳 도라산 역에 들르곤 하는데요.
DMZ 못지않게,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인 도라산 역, 플랫폼에 들어서면 북녘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철로가 펼쳐지는데요.
최병관 작가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이 경의선 철로 연결 공사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다는 그.
눈앞의 철로를 따라 평양행 기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그 날이 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평화를 염원하는 사진전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도 이 전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진전도 하고 싶고..."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DMZ 사진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진 한 점 한 점이 웅변합니다.
무엇보다 폐허가 된 비극의 땅에서도 철모를 뚫고 야생화가 피어나듯 통일의 그날 또한 반드시 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일로 미래로] 평화와 생명을 찾아서…DMZ 사진 기록
-
- 입력 2016-11-05 08:29:32
- 수정2016-11-05 08:38:12

<앵커 멘트>
흔히 DMZ라 부르는 비무장지대는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생명의 땅이 되고 있죠?
네. 한편으론 일반인이 가기 힘든 금단의 땅이기도 한데요.
그런 DMZ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분이 계시다고요?
네, 최병관 사진작가 이야기인데요.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는 그 곳을 동서로 세 번이나 횡단하면서 10만 번 넘게 셔터를 눌렀다고 합니다.
DMZ의 생생한 모습, 벌써 보고싶네요.
그 현장으로 홍은지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 안에 위치한 도라산 역.
역사 앞에 얼마 전 임시 갤러리가 세워졌습니다.
관광차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던 홍은수 씨.
<녹취> 홍은수(관람객) : "이거 고생 나도 많이 했는데..."
최전방 수색대에 복무하던 추억에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합니다.
<인터뷰> 홍은수(관람객) : "(영하) 40도에 육박하니까 추워서 벌벌 떨죠. 추워서 잠이 와서 잠을 깨기 위해서 깡통을 흔들고 그랬어요."
전시된 50여 점의 사진은 남과 북을 가르는 금단의 땅, DMZ의 모습들입니다.
끊어진 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다리, 총탄을 맞고 멈춰선 뒤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기차, 나무가 우거진 남쪽과는 달리 잡풀만 무성한 철조망 너머 북쪽 땅...
사진을 통해 DMZ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터뷰> 홍진환(관람객) : "북한의 헐벗은 산야를 보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 박옥분(관람객) : "여기 와서 DMZ 사진전을 보니까요, 분단 현실이 안타깝네요. 얼른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한민족 끼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진작가는 이 dmz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휴전선 서쪽에서 동쪽까지 248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2년 동안 세 번이나 횡단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넓게 펼쳐진 갯벌, 연안에 솟아 오른 갈대숲과 붉은 칠면초가 장관을 이룹니다.
불어오는 찬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한 장면이라도 놓칠 세라 셔터를 누르는 이 사람이 바로 ‘DMZ 사진작가’로 불리는 최병관 씨입니다.
이곳 소래 포구에서 태어난 그는 개발로 인해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아름답게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 가지고 이 소중함을 알려서 덜 훼손되게 만드느냐... 그건 이제 사진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사람이 키우는 꽃보다 생명력이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뻐요."
30여 년 동안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사진으로 담아온 그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DMZ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한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엔본부에서 전시를 했던 포스터죠."
그의 작업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필름들,그 중 DMZ 사진은 무려 10만장에 이릅니다.
1995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사진집을 제작했던 것이 인연이 돼 DMZ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요.
1997년부터 2년 동안 DMZ 전 구간을 누비며 위험을 무릅쓰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어딜 가나 북한군이 항상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뢰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뭐 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고... 유서를 써서 내가 이번 작업을 하다가 죽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국가나 육군본부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걸 써서 보냈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일, 과연 무엇을 카메라에 담았을까요?
비무장지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450일 동안 만난 최전방의 병사들!
허리까지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들의 애환에서 부터,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슬픔.
전쟁의 상흔 위에 다시 움트는 생명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생태의 보고인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는데요.
녹슨 철모 틈으로 가냘프게 피어난 들꽃.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난 이걸 보면서 국군이 죽어서 다시 들꽃으로 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젊은 병사가 피어보지도 못한 채 총탄을 맞고 쓰러져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 생각을 하면서 찍은 거거든... 적의 총탄을 맞고 막 쓰러져서 신음소리 같은 게 막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최병관 작가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지 않는 날이면, 이곳 도라산 역에 들르곤 하는데요.
DMZ 못지않게,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인 도라산 역, 플랫폼에 들어서면 북녘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철로가 펼쳐지는데요.
최병관 작가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이 경의선 철로 연결 공사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다는 그.
눈앞의 철로를 따라 평양행 기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그 날이 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평화를 염원하는 사진전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도 이 전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진전도 하고 싶고..."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DMZ 사진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진 한 점 한 점이 웅변합니다.
무엇보다 폐허가 된 비극의 땅에서도 철모를 뚫고 야생화가 피어나듯 통일의 그날 또한 반드시 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흔히 DMZ라 부르는 비무장지대는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생명의 땅이 되고 있죠?
네. 한편으론 일반인이 가기 힘든 금단의 땅이기도 한데요.
그런 DMZ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분이 계시다고요?
네, 최병관 사진작가 이야기인데요.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는 그 곳을 동서로 세 번이나 횡단하면서 10만 번 넘게 셔터를 눌렀다고 합니다.
DMZ의 생생한 모습, 벌써 보고싶네요.
그 현장으로 홍은지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 민통선 안에 위치한 도라산 역.
역사 앞에 얼마 전 임시 갤러리가 세워졌습니다.
관광차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던 홍은수 씨.
<녹취> 홍은수(관람객) : "이거 고생 나도 많이 했는데..."
최전방 수색대에 복무하던 추억에 좀처럼 발을 떼지 못합니다.
<인터뷰> 홍은수(관람객) : "(영하) 40도에 육박하니까 추워서 벌벌 떨죠. 추워서 잠이 와서 잠을 깨기 위해서 깡통을 흔들고 그랬어요."
전시된 50여 점의 사진은 남과 북을 가르는 금단의 땅, DMZ의 모습들입니다.
끊어진 채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다리, 총탄을 맞고 멈춰선 뒤 다시는 달리지 못하게 된 기차, 나무가 우거진 남쪽과는 달리 잡풀만 무성한 철조망 너머 북쪽 땅...
사진을 통해 DMZ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터뷰> 홍진환(관람객) : "북한의 헐벗은 산야를 보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 박옥분(관람객) : "여기 와서 DMZ 사진전을 보니까요, 분단 현실이 안타깝네요. 얼른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한민족 끼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진작가는 이 dmz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휴전선 서쪽에서 동쪽까지 248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2년 동안 세 번이나 횡단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넓게 펼쳐진 갯벌, 연안에 솟아 오른 갈대숲과 붉은 칠면초가 장관을 이룹니다.
불어오는 찬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한 장면이라도 놓칠 세라 셔터를 누르는 이 사람이 바로 ‘DMZ 사진작가’로 불리는 최병관 씨입니다.
이곳 소래 포구에서 태어난 그는 개발로 인해 변해가는 고향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아름답게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 가지고 이 소중함을 알려서 덜 훼손되게 만드느냐... 그건 이제 사진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사람이 키우는 꽃보다 생명력이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뻐요."
30여 년 동안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사진으로 담아온 그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DMZ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한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엔본부에서 전시를 했던 포스터죠."
그의 작업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 필름들,그 중 DMZ 사진은 무려 10만장에 이릅니다.
1995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사진집을 제작했던 것이 인연이 돼 DMZ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요.
1997년부터 2년 동안 DMZ 전 구간을 누비며 위험을 무릅쓰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어딜 가나 북한군이 항상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뢰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뭐 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고... 유서를 써서 내가 이번 작업을 하다가 죽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국가나 육군본부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걸 써서 보냈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일, 과연 무엇을 카메라에 담았을까요?
비무장지대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450일 동안 만난 최전방의 병사들!
허리까지 쌓인 눈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들의 애환에서 부터,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슬픔.
전쟁의 상흔 위에 다시 움트는 생명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생태의 보고인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는데요.
녹슨 철모 틈으로 가냘프게 피어난 들꽃.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난 이걸 보면서 국군이 죽어서 다시 들꽃으로 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젊은 병사가 피어보지도 못한 채 총탄을 맞고 쓰러져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 생각을 하면서 찍은 거거든... 적의 총탄을 맞고 막 쓰러져서 신음소리 같은 게 막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최병관 작가는 사진을 찍으러 나가지 않는 날이면, 이곳 도라산 역에 들르곤 하는데요.
DMZ 못지않게,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인 도라산 역, 플랫폼에 들어서면 북녘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철로가 펼쳐지는데요.
최병관 작가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이 경의선 철로 연결 공사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다는 그.
눈앞의 철로를 따라 평양행 기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그 날이 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관(사진작가) : "평화를 염원하는 사진전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도 이 전시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진전도 하고 싶고..."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DMZ 사진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진 한 점 한 점이 웅변합니다.
무엇보다 폐허가 된 비극의 땅에서도 철모를 뚫고 야생화가 피어나듯 통일의 그날 또한 반드시 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클로즈업 북한] 병원 대신 장마당으로…北 무상 의료 실상은?](https://news.kbs.co.kr/data/news/2016/11/05/3373061_30.jpg)
![[북한영상] 北 무용 ‘단숨에’](https://news.kbs.co.kr/data/news/2016/11/05/3373063_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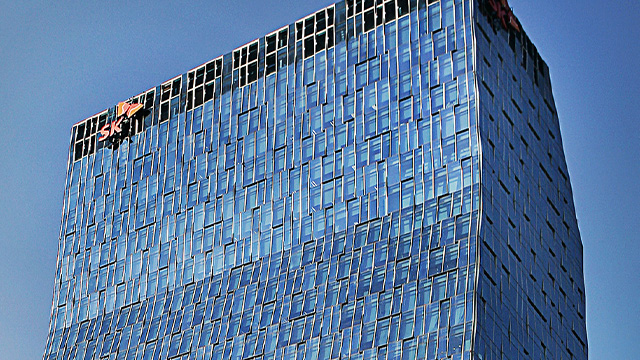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