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상 빼고 다 올랐다” 출구 없는 자영업
입력 2016.12.18 (12:01)
수정 2016.12.18 (13: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기계 공구 골목. 계단을 따라 내려간 지하 횟집은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주인은 얼마 전 아무 말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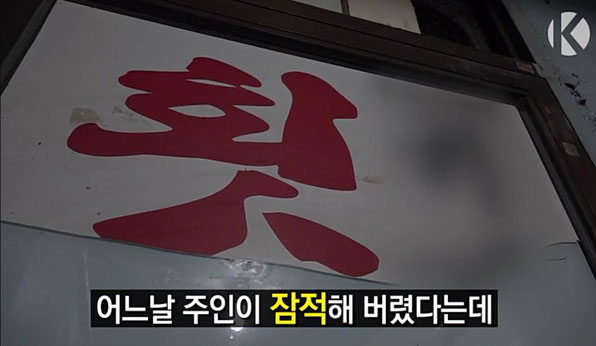
취재진이 만난 한 이웃 주민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라면을 자주 끓여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폐업으로 주인을 잃은 간판은 최근 두 달새 영등포구에서 3백 개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만 서울 시옥외광고협회 영등포구 지부 부회장은 "그냥 놓고 몸만 빠져나가시는 편이죠, 거의. 장사 안 되는 데가 골목이니까 그렇게 간판이 방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식당이나 하지',이렇게 만만하게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식당업은 '창업의 무덤'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식당 주인입니다. 그래도 '만만한 게 식당'이라고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서 식당을 새로 개업합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 골목에는 60미터 정도 거리에 식당이 8개나 있습니다.
지하 포함 4층짜리 한 건물엔 3개 층이 식당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 해요. 식당이 망하든 안 망하든 임대료는 사람 바뀔 때마다 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수동의 경우 인구는 2만여 명인데, 한식당만 5백 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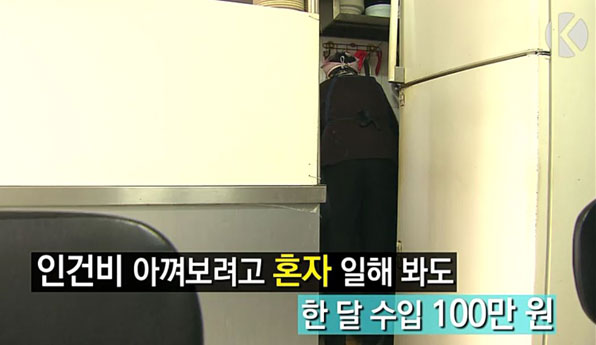
분식집을 하다 장사가 안 돼 한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한 김모 (55) 사장은 인건비라도 아껴보자고 종업원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으로 사장님이라고 하지만 소득으론 하위계층입니다.
김 사장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계속 장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저도 식당을 접고 싶었어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포기하고 장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 받아서 못 해요"라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한식집은 개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낮 12시에 손님 한 명 없는 상황에 사장님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식당 주인 박 모(58·여) 씨는 "옆 가게는 원래 샤브샤브 칼국수집이었어요. 그런데 낙지집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칼국수집 들어왔어요. 이웃 식당들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것도 남일 같지 않아요"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벼랑끝에 선 사람들, 우동집,부대찌개 식당에 이어, 석달 전 시작한 전통주 가맹점도 접기로 한 40대 가장의 어깨는 축 쳐져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임모(48) 씨는 "빨리 빨리 벌어야 되다 보니까 뭐가 됐든 급하게 자영업자로 몰리는 거죠. 패자부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업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입니다.
서민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1년을 버티는 가게는 55%에 불과했고 해가 갈 수록 생존율이 뚝뚝 떨어져서 5년 후에도 살아남는 가게는 17%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장사 형편이 좋지 않다보니 쌀, 달걀 등 식자재 공급하는 사장님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오재필 씨는 "지금 다 다니는 데마다 일단 수금이 잘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가게의 얼굴인 간판을 만들어주는 정일옥 간판제작업체 대표는 "자영업과 간판제작업체는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이 잘 안되면 일감이 빠지죠"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서민 업종들이 함께 악순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임대료에 식자재까지 다 오르는데 가게 매상만 오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더 무겁게 들리는 세밑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주인은 얼마 전 아무 말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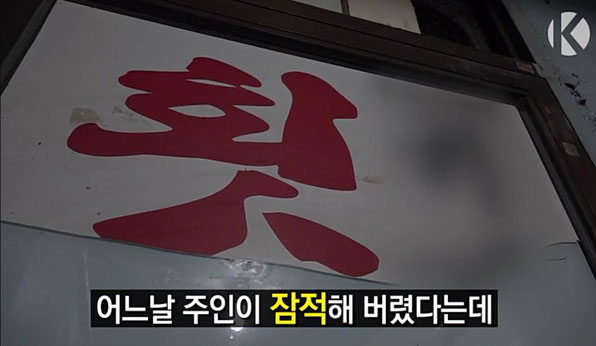
취재진이 만난 한 이웃 주민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라면을 자주 끓여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폐업으로 주인을 잃은 간판은 최근 두 달새 영등포구에서 3백 개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만 서울 시옥외광고협회 영등포구 지부 부회장은 "그냥 놓고 몸만 빠져나가시는 편이죠, 거의. 장사 안 되는 데가 골목이니까 그렇게 간판이 방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식당이나 하지',이렇게 만만하게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식당업은 '창업의 무덤'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식당 주인입니다. 그래도 '만만한 게 식당'이라고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서 식당을 새로 개업합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 골목에는 60미터 정도 거리에 식당이 8개나 있습니다.
지하 포함 4층짜리 한 건물엔 3개 층이 식당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 해요. 식당이 망하든 안 망하든 임대료는 사람 바뀔 때마다 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수동의 경우 인구는 2만여 명인데, 한식당만 5백 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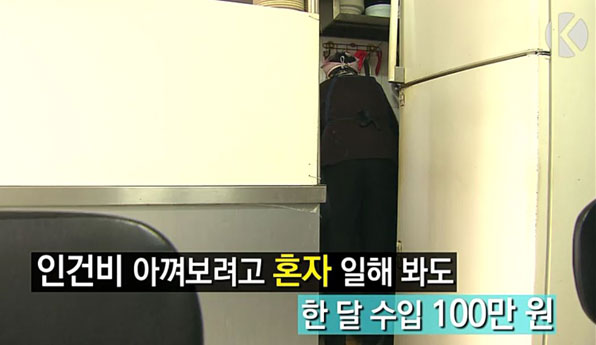
분식집을 하다 장사가 안 돼 한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한 김모 (55) 사장은 인건비라도 아껴보자고 종업원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으로 사장님이라고 하지만 소득으론 하위계층입니다.
김 사장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계속 장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저도 식당을 접고 싶었어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포기하고 장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 받아서 못 해요"라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한식집은 개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낮 12시에 손님 한 명 없는 상황에 사장님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식당 주인 박 모(58·여) 씨는 "옆 가게는 원래 샤브샤브 칼국수집이었어요. 그런데 낙지집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칼국수집 들어왔어요. 이웃 식당들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것도 남일 같지 않아요"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벼랑끝에 선 사람들, 우동집,부대찌개 식당에 이어, 석달 전 시작한 전통주 가맹점도 접기로 한 40대 가장의 어깨는 축 쳐져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임모(48) 씨는 "빨리 빨리 벌어야 되다 보니까 뭐가 됐든 급하게 자영업자로 몰리는 거죠. 패자부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업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입니다.
서민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1년을 버티는 가게는 55%에 불과했고 해가 갈 수록 생존율이 뚝뚝 떨어져서 5년 후에도 살아남는 가게는 17%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장사 형편이 좋지 않다보니 쌀, 달걀 등 식자재 공급하는 사장님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오재필 씨는 "지금 다 다니는 데마다 일단 수금이 잘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가게의 얼굴인 간판을 만들어주는 정일옥 간판제작업체 대표는 "자영업과 간판제작업체는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이 잘 안되면 일감이 빠지죠"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서민 업종들이 함께 악순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임대료에 식자재까지 다 오르는데 가게 매상만 오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더 무겁게 들리는 세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매상 빼고 다 올랐다” 출구 없는 자영업
-
- 입력 2016-12-18 12:01:38
- 수정2016-12-18 13:25:52

서울 영등포의 기계 공구 골목. 계단을 따라 내려간 지하 횟집은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주인은 얼마 전 아무 말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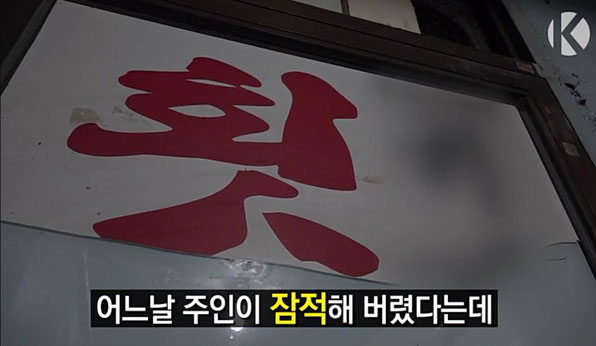
취재진이 만난 한 이웃 주민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라면을 자주 끓여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폐업으로 주인을 잃은 간판은 최근 두 달새 영등포구에서 3백 개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만 서울 시옥외광고협회 영등포구 지부 부회장은 "그냥 놓고 몸만 빠져나가시는 편이죠, 거의. 장사 안 되는 데가 골목이니까 그렇게 간판이 방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식당이나 하지',이렇게 만만하게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식당업은 '창업의 무덤'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식당 주인입니다. 그래도 '만만한 게 식당'이라고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서 식당을 새로 개업합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 골목에는 60미터 정도 거리에 식당이 8개나 있습니다.
지하 포함 4층짜리 한 건물엔 3개 층이 식당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 해요. 식당이 망하든 안 망하든 임대료는 사람 바뀔 때마다 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수동의 경우 인구는 2만여 명인데, 한식당만 5백 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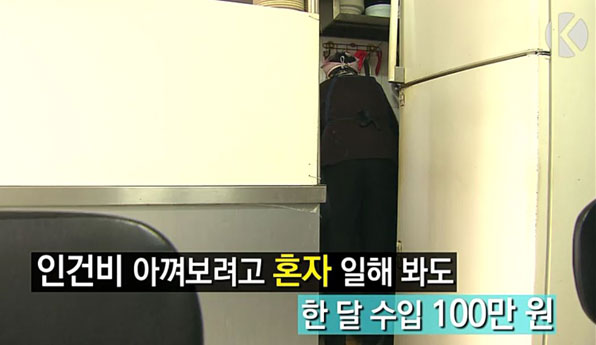
분식집을 하다 장사가 안 돼 한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한 김모 (55) 사장은 인건비라도 아껴보자고 종업원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으로 사장님이라고 하지만 소득으론 하위계층입니다.
김 사장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계속 장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저도 식당을 접고 싶었어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포기하고 장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 받아서 못 해요"라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한식집은 개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낮 12시에 손님 한 명 없는 상황에 사장님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식당 주인 박 모(58·여) 씨는 "옆 가게는 원래 샤브샤브 칼국수집이었어요. 그런데 낙지집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칼국수집 들어왔어요. 이웃 식당들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것도 남일 같지 않아요"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벼랑끝에 선 사람들, 우동집,부대찌개 식당에 이어, 석달 전 시작한 전통주 가맹점도 접기로 한 40대 가장의 어깨는 축 쳐져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임모(48) 씨는 "빨리 빨리 벌어야 되다 보니까 뭐가 됐든 급하게 자영업자로 몰리는 거죠. 패자부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업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입니다.
서민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1년을 버티는 가게는 55%에 불과했고 해가 갈 수록 생존율이 뚝뚝 떨어져서 5년 후에도 살아남는 가게는 17%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장사 형편이 좋지 않다보니 쌀, 달걀 등 식자재 공급하는 사장님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오재필 씨는 "지금 다 다니는 데마다 일단 수금이 잘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가게의 얼굴인 간판을 만들어주는 정일옥 간판제작업체 대표는 "자영업과 간판제작업체는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이 잘 안되면 일감이 빠지죠"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서민 업종들이 함께 악순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임대료에 식자재까지 다 오르는데 가게 매상만 오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더 무겁게 들리는 세밑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주인은 얼마 전 아무 말도 없이 잠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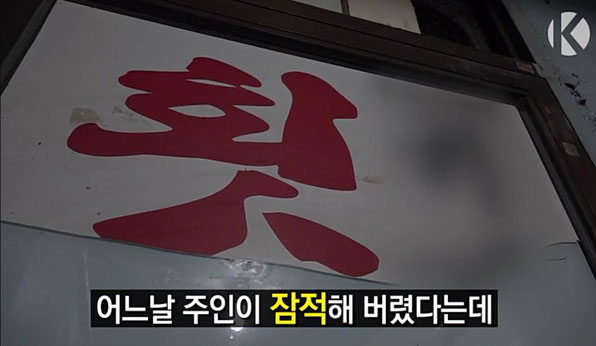
취재진이 만난 한 이웃 주민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라면을 자주 끓여 먹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폐업으로 주인을 잃은 간판은 최근 두 달새 영등포구에서 3백 개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만 서울 시옥외광고협회 영등포구 지부 부회장은 "그냥 놓고 몸만 빠져나가시는 편이죠, 거의. 장사 안 되는 데가 골목이니까 그렇게 간판이 방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식당이나 하지',이렇게 만만하게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식당업은 '창업의 무덤'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폐업한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식당 주인입니다. 그래도 '만만한 게 식당'이라고 사람들은 또 여기저기서 식당을 새로 개업합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 골목에는 60미터 정도 거리에 식당이 8개나 있습니다.
지하 포함 4층짜리 한 건물엔 3개 층이 식당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 해요. 식당이 망하든 안 망하든 임대료는 사람 바뀔 때마다 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수동의 경우 인구는 2만여 명인데, 한식당만 5백 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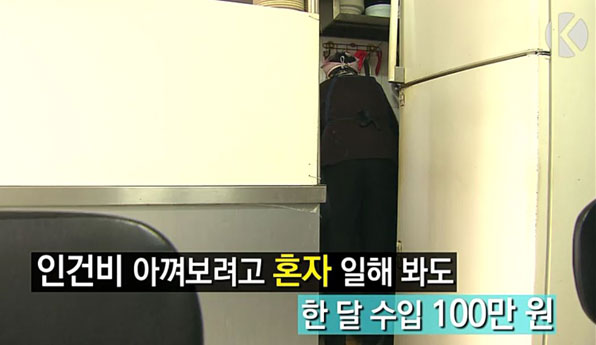
분식집을 하다 장사가 안 돼 한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한 김모 (55) 사장은 인건비라도 아껴보자고 종업원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으로 사장님이라고 하지만 소득으론 하위계층입니다.
김 사장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계속 장사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저도 식당을 접고 싶었어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포기하고 장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 받아서 못 해요"라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한식집은 개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낮 12시에 손님 한 명 없는 상황에 사장님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식당 주인 박 모(58·여) 씨는 "옆 가게는 원래 샤브샤브 칼국수집이었어요. 그런데 낙지집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칼국수집 들어왔어요. 이웃 식당들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것도 남일 같지 않아요"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벼랑끝에 선 사람들, 우동집,부대찌개 식당에 이어, 석달 전 시작한 전통주 가맹점도 접기로 한 40대 가장의 어깨는 축 쳐져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임모(48) 씨는 "빨리 빨리 벌어야 되다 보니까 뭐가 됐든 급하게 자영업자로 몰리는 거죠. 패자부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업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입니다.
서민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1년을 버티는 가게는 55%에 불과했고 해가 갈 수록 생존율이 뚝뚝 떨어져서 5년 후에도 살아남는 가게는 17%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먹는 장사 형편이 좋지 않다보니 쌀, 달걀 등 식자재 공급하는 사장님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는 오재필 씨는 "지금 다 다니는 데마다 일단 수금이 잘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가게의 얼굴인 간판을 만들어주는 정일옥 간판제작업체 대표는 "자영업과 간판제작업체는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영업이 잘 안되면 일감이 빠지죠"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서민 업종들이 함께 악순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임대료에 식자재까지 다 오르는데 가게 매상만 오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더 무겁게 들리는 세밑입니다.
-
-

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김영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윤석열·김용현 등 공모해 군사상 이익 해쳐”<br>…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 적용](/data/layer/904/2025/07/20250714_3VTJV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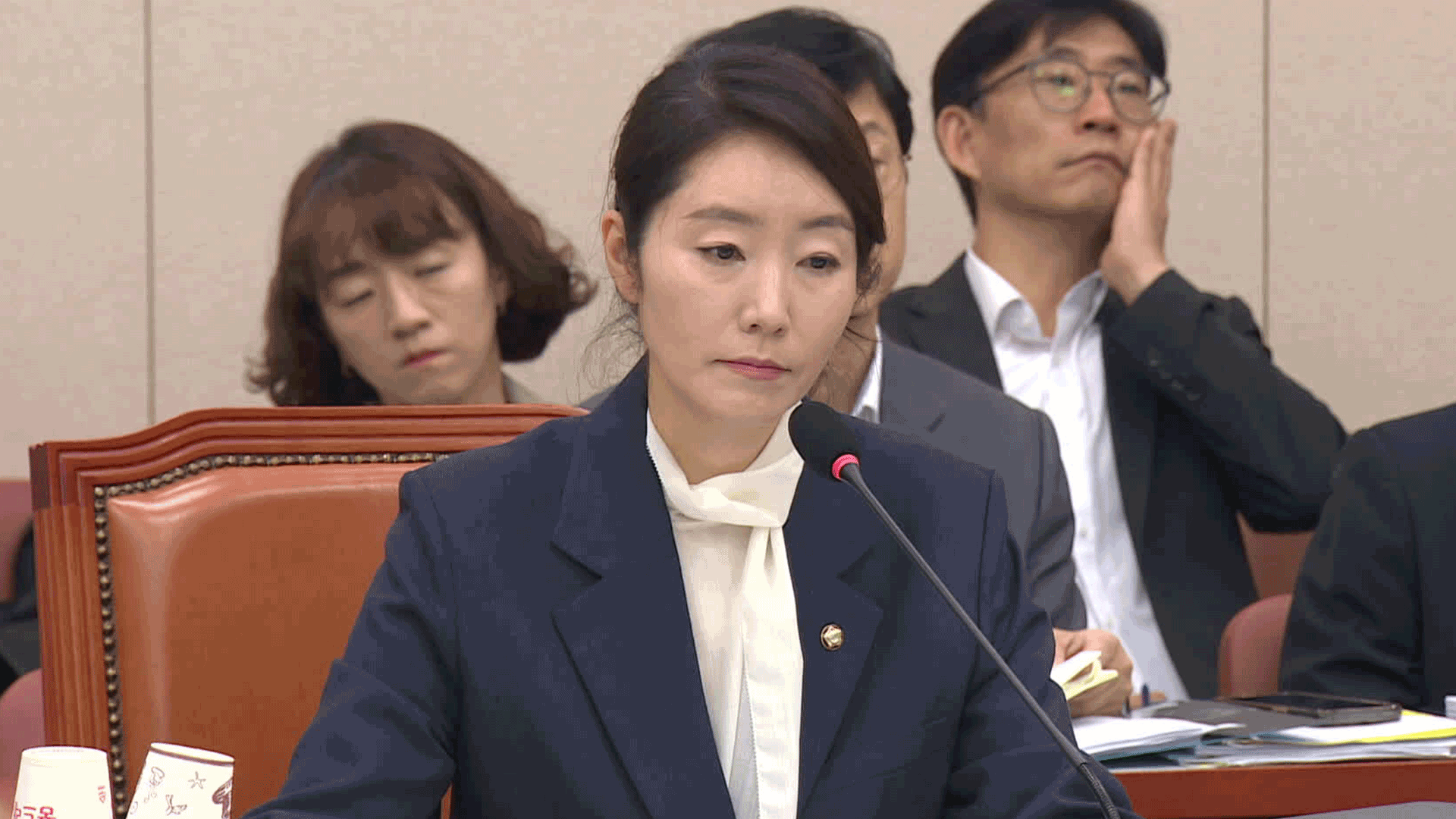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