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아리랑’을 부르는 오키나와 사람들…징용의 역사를 품다
입력 2017.08.27 (05:51)
수정 2017.08.27 (05: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파원리포트] ‘아리랑’을 부르는 오키나와 사람들…징용의 역사를 품다](/data/layer/602/2017/08/965dNkYV4xAcV.png)
[특파원리포트] ‘아리랑’을 부르는 오키나와 사람들…징용의 역사를 품다
 아리랑을 부르는 ‘구다카 할아버지’
아리랑을 부르는 ‘구다카 할아버지’미야코 섬.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45분 정도 더 남쪽으로 날아가야 하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타이완에 더 가까운 남국의 섬이다.
일본군에 소속돼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인 징용부들, 이른바 '군속'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현지 미야코 활동가들로부터 섬에 '아리랑 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리랑 강?'
해 질 녘 남국의 섬 강가에 앉아 아리랑을 부르는 조선 징용자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게 '오키나와 아리랑' 취재는 시작됐다.
■ 70여 년이 흐른 ‘아리랑’을 듣다.
미야코 섬은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만큼 한낮이면 남국의 열기가 뜨겁게 내리쬐며 어질거리게 했다.
'이런 더위에 어떻게 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아리랑 강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 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스프링클러' 하나만 떡 하니 있다.
사실 미야코 섬에는 '강'이 없단다. 대신 미야코 섬 사투리로 우물이나 물이 있던 곳을 '강'이라고 표현한다는 설명. '아리랑 강'이라는 지명은 과거 조선 징용자들이 논 근처에서 흐르던 물길을 정리해 주고는 목욕이나 빨래 등을 하며 물을 쓰던 곳을 일컫는 말이었다.
"조선 사람들이 저기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매일 같이 일했죠. 하나에 50kg씩 하는 시멘트 부대를 나르며 일했죠"
당시 조선 징용자들과 같이 일본군 노역에 동원돼야 했던 구다카 할아버지는 어제 일처럼 그 때를 이야기해 줬다. 태평양 전쟁 말기 주민 6만 명이 살던 미야코 섬에 일본군 3만 명이 들어와 미군과의 격전을 준비했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는 조선 징용자들이나 주민들이나 매한가지 처지였다.
13살 나이에 봤던 조선 사람들. 그리고 구다카 할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않은 노랫가락을 뽑아냈다.
"아리랑을 알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라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부르는 아리랑. 70여 년 만에 되살아난 조선 징용자들로부터 들어 배운 아리랑 가락이었다.
■ 고운 조선 언니가 부르던 아리랑 가락

우에자토 씨는 어머니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어머니가 어렸을 무렵 집 근처에 위안소가 있었는데 아침이면 막내 동생을 엎고는 위안소 언니들에게 놀러가는 게 일과였단다.
"어머니가 오면 그렇게 귀여워해 줬데요. 동생을 안아주고 봐주고,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 줬데요."
그 노래가 아리랑이었다. 우에자토 씨가 불러주는 아리랑에는 후렴구가 더 붙어 있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헤이 헤이요 넘어간다"
"너무 예쁘고 고운 언니들이었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위안소에서 언니들이 모두 갑자기 사라져 버렸더래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렸을까 너무 슬펐다고..."
■ “아리랑이 한국의 국가(國歌)는 아니죠?”

오키나와에 사는 마쓰다 할아버지가 아는 한국말은 "아이고 죽겠다"였다.
"공습이 있었어요. 그때 조선 사람이 누워있었는데, 원래 아팠는지 한국말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주변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집이 조선 징용자 숙소로 쓰였다며 저녁이면 들었다는 그 노래, 아리랑을 들려줬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나요. 한 발자국도 못 가서 발병 난다(일본어)"
후렴구는 한글인데, 본 노래는 일본어다.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던 식민지 치하, 아리랑도 일본어로 불렀단다. 그래서인지 일본어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었다.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부분을 마쓰다 할아버지는 "한 발자국도 못 가서"라고, 또 미야코 섬의 우에자토 씨는 "1리도 못 가서"라고 불렀다. 어떻게 구전됐던 우리네 아리랑 가락이다.
노래를 부르고 난 마쓰다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난 듯 기자를 보더니, "근데 이 노래 국가(國歌)는 아니죠?"라고 묻는다.
10대 초중반 조선 징용자들을 만난 뒤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한국인을 몇 번이나 만났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며 아리랑을 아직도 부를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 근처 사람들이 노래를 다들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들 세상을 떠나서..."
미야코 섬의 구다카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듯 이렇게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키나와 아리랑'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마음 한 켠을 스쳐갔다.
[연관기사] [특파원 스페셜] 징용의 한 서린 ‘오키나와 아리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파원리포트] ‘아리랑’을 부르는 오키나와 사람들…징용의 역사를 품다
-
- 입력 2017-08-27 05:51:10
- 수정2017-08-27 05:54:18
 미야코 섬.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45분 정도 더 남쪽으로 날아가야 하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타이완에 더 가까운 남국의 섬이다.
일본군에 소속돼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인 징용부들, 이른바 '군속'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현지 미야코 활동가들로부터 섬에 '아리랑 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리랑 강?'
해 질 녘 남국의 섬 강가에 앉아 아리랑을 부르는 조선 징용자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게 '오키나와 아리랑' 취재는 시작됐다.
■ 70여 년이 흐른 ‘아리랑’을 듣다.
미야코 섬은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만큼 한낮이면 남국의 열기가 뜨겁게 내리쬐며 어질거리게 했다.
'이런 더위에 어떻게 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아리랑 강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 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스프링클러' 하나만 떡 하니 있다.
사실 미야코 섬에는 '강'이 없단다. 대신 미야코 섬 사투리로 우물이나 물이 있던 곳을 '강'이라고 표현한다는 설명. '아리랑 강'이라는 지명은 과거 조선 징용자들이 논 근처에서 흐르던 물길을 정리해 주고는 목욕이나 빨래 등을 하며 물을 쓰던 곳을 일컫는 말이었다.
"조선 사람들이 저기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매일 같이 일했죠. 하나에 50kg씩 하는 시멘트 부대를 나르며 일했죠"
당시 조선 징용자들과 같이 일본군 노역에 동원돼야 했던 구다카 할아버지는 어제 일처럼 그 때를 이야기해 줬다. 태평양 전쟁 말기 주민 6만 명이 살던 미야코 섬에 일본군 3만 명이 들어와 미군과의 격전을 준비했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는 조선 징용자들이나 주민들이나 매한가지 처지였다.
13살 나이에 봤던 조선 사람들. 그리고 구다카 할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않은 노랫가락을 뽑아냈다.
"아리랑을 알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라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부르는 아리랑. 70여 년 만에 되살아난 조선 징용자들로부터 들어 배운 아리랑 가락이었다.
■ 고운 조선 언니가 부르던 아리랑 가락
미야코 섬.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45분 정도 더 남쪽으로 날아가야 하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타이완에 더 가까운 남국의 섬이다.
일본군에 소속돼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인 징용부들, 이른바 '군속'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던 중 현지 미야코 활동가들로부터 섬에 '아리랑 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리랑 강?'
해 질 녘 남국의 섬 강가에 앉아 아리랑을 부르는 조선 징용자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게 '오키나와 아리랑' 취재는 시작됐다.
■ 70여 년이 흐른 ‘아리랑’을 듣다.
미야코 섬은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만큼 한낮이면 남국의 열기가 뜨겁게 내리쬐며 어질거리게 했다.
'이런 더위에 어떻게 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아리랑 강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 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스프링클러' 하나만 떡 하니 있다.
사실 미야코 섬에는 '강'이 없단다. 대신 미야코 섬 사투리로 우물이나 물이 있던 곳을 '강'이라고 표현한다는 설명. '아리랑 강'이라는 지명은 과거 조선 징용자들이 논 근처에서 흐르던 물길을 정리해 주고는 목욕이나 빨래 등을 하며 물을 쓰던 곳을 일컫는 말이었다.
"조선 사람들이 저기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매일 같이 일했죠. 하나에 50kg씩 하는 시멘트 부대를 나르며 일했죠"
당시 조선 징용자들과 같이 일본군 노역에 동원돼야 했던 구다카 할아버지는 어제 일처럼 그 때를 이야기해 줬다. 태평양 전쟁 말기 주민 6만 명이 살던 미야코 섬에 일본군 3만 명이 들어와 미군과의 격전을 준비했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는 조선 징용자들이나 주민들이나 매한가지 처지였다.
13살 나이에 봤던 조선 사람들. 그리고 구다카 할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않은 노랫가락을 뽑아냈다.
"아리랑을 알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라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부르는 아리랑. 70여 년 만에 되살아난 조선 징용자들로부터 들어 배운 아리랑 가락이었다.
■ 고운 조선 언니가 부르던 아리랑 가락
 우에자토 씨는 어머니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어머니가 어렸을 무렵 집 근처에 위안소가 있었는데 아침이면 막내 동생을 엎고는 위안소 언니들에게 놀러가는 게 일과였단다.
"어머니가 오면 그렇게 귀여워해 줬데요. 동생을 안아주고 봐주고,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 줬데요."
그 노래가 아리랑이었다. 우에자토 씨가 불러주는 아리랑에는 후렴구가 더 붙어 있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헤이 헤이요 넘어간다"
"너무 예쁘고 고운 언니들이었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위안소에서 언니들이 모두 갑자기 사라져 버렸더래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렸을까 너무 슬펐다고..."
■ “아리랑이 한국의 국가(國歌)는 아니죠?”
우에자토 씨는 어머니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어머니가 어렸을 무렵 집 근처에 위안소가 있었는데 아침이면 막내 동생을 엎고는 위안소 언니들에게 놀러가는 게 일과였단다.
"어머니가 오면 그렇게 귀여워해 줬데요. 동생을 안아주고 봐주고,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 줬데요."
그 노래가 아리랑이었다. 우에자토 씨가 불러주는 아리랑에는 후렴구가 더 붙어 있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헤이 헤이요 넘어간다"
"너무 예쁘고 고운 언니들이었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위안소에서 언니들이 모두 갑자기 사라져 버렸더래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렸을까 너무 슬펐다고..."
■ “아리랑이 한국의 국가(國歌)는 아니죠?”
 오키나와에 사는 마쓰다 할아버지가 아는 한국말은 "아이고 죽겠다"였다.
"공습이 있었어요. 그때 조선 사람이 누워있었는데, 원래 아팠는지 한국말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주변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집이 조선 징용자 숙소로 쓰였다며 저녁이면 들었다는 그 노래, 아리랑을 들려줬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나요. 한 발자국도 못 가서 발병 난다(일본어)"
후렴구는 한글인데, 본 노래는 일본어다.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던 식민지 치하, 아리랑도 일본어로 불렀단다. 그래서인지 일본어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었다.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부분을 마쓰다 할아버지는 "한 발자국도 못 가서"라고, 또 미야코 섬의 우에자토 씨는 "1리도 못 가서"라고 불렀다. 어떻게 구전됐던 우리네 아리랑 가락이다.
노래를 부르고 난 마쓰다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난 듯 기자를 보더니, "근데 이 노래 국가(國歌)는 아니죠?"라고 묻는다.
10대 초중반 조선 징용자들을 만난 뒤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한국인을 몇 번이나 만났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며 아리랑을 아직도 부를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 근처 사람들이 노래를 다들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들 세상을 떠나서..."
미야코 섬의 구다카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듯 이렇게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키나와 아리랑'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마음 한 켠을 스쳐갔다.
[연관기사] [특파원 스페셜] 징용의 한 서린 ‘오키나와 아리랑’
오키나와에 사는 마쓰다 할아버지가 아는 한국말은 "아이고 죽겠다"였다.
"공습이 있었어요. 그때 조선 사람이 누워있었는데, 원래 아팠는지 한국말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주변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 집이 조선 징용자 숙소로 쓰였다며 저녁이면 들었다는 그 노래, 아리랑을 들려줬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한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나요. 한 발자국도 못 가서 발병 난다(일본어)"
후렴구는 한글인데, 본 노래는 일본어다.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던 식민지 치하, 아리랑도 일본어로 불렀단다. 그래서인지 일본어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었다.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부분을 마쓰다 할아버지는 "한 발자국도 못 가서"라고, 또 미야코 섬의 우에자토 씨는 "1리도 못 가서"라고 불렀다. 어떻게 구전됐던 우리네 아리랑 가락이다.
노래를 부르고 난 마쓰다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난 듯 기자를 보더니, "근데 이 노래 국가(國歌)는 아니죠?"라고 묻는다.
10대 초중반 조선 징용자들을 만난 뒤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한국인을 몇 번이나 만났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며 아리랑을 아직도 부를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 근처 사람들이 노래를 다들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들 세상을 떠나서..."
미야코 섬의 구다카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듯 이렇게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키나와 아리랑'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마음 한 켠을 스쳐갔다.
[연관기사] [특파원 스페셜] 징용의 한 서린 ‘오키나와 아리랑’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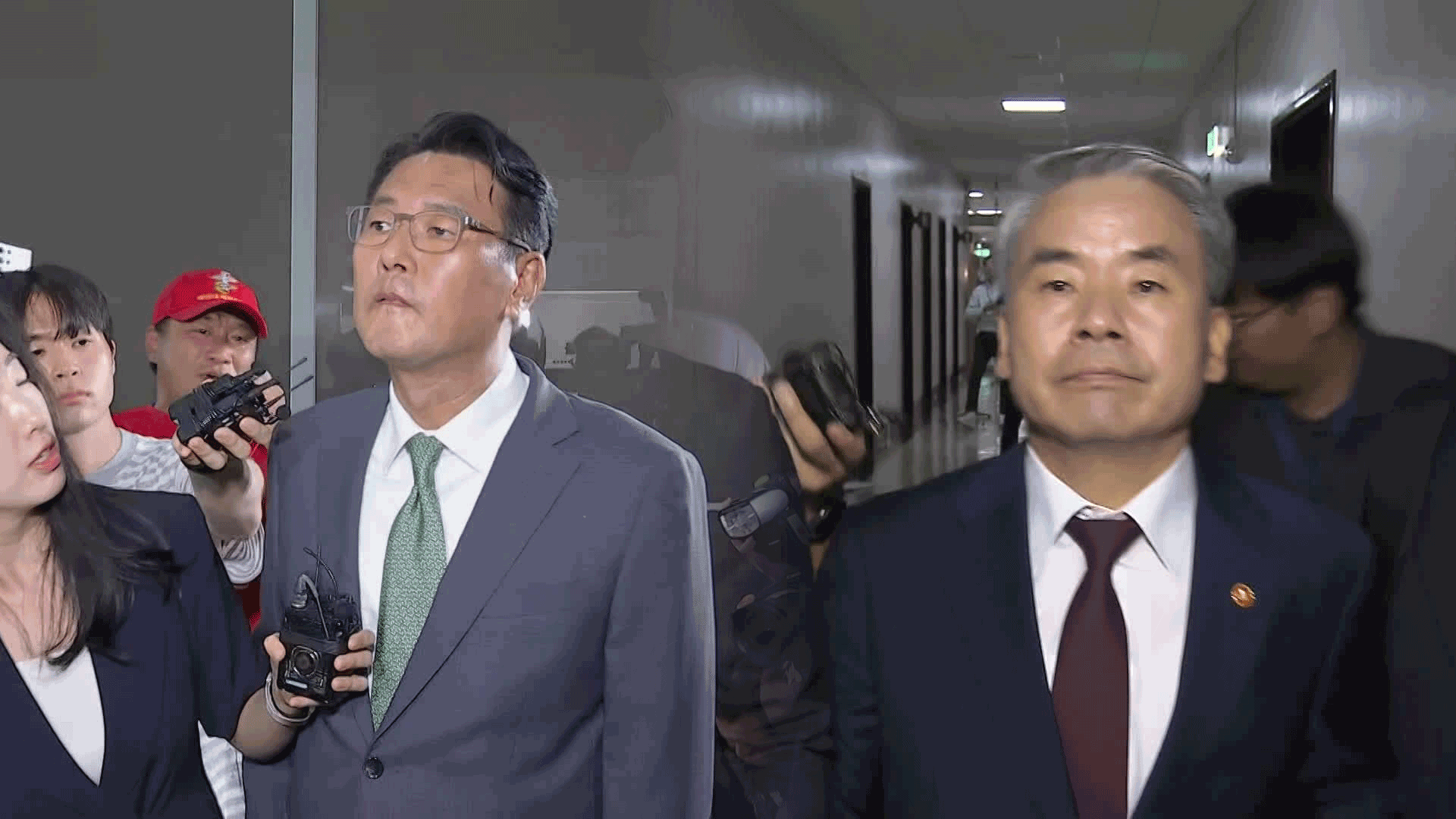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