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예산 30%가 빚, 8,800조 채무…비정상이 정상이 된 日
입력 2018.11.23 (07: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빚을 내지 못하면 예산안을 짜지 못하는 나라, 나랏빚 이자로만 매년 7~8조엔, 우리돈 70~80조 원을 지출하는 나라.
이것만 보면 곧 망할 것 같은데 매년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내면서도 또 통화는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아 경제 위기가 닥칠 때면 강세를 보이는 나라. 일본 이야기다.
8,800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
2018년도까지 일본이 발행한 국채 발행 규모 즉 나랏빚 규모는 883조 엔, 8,830조 원 정도다.
8천조 원이 넘는 나랏빚. 대관절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도 안 온다.
과거 기사를 쓰면서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다.
"1조 원은 매일 천만 원을 3백 년간 쓸 돈이다. 1일 천만 원이면 열흘에 1억 원,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면 3억 원 정도, 1년이면 36억 원이라 치고, 10년 360억 원, 100년 3,600억 원이다. 아주 개략적으로 300년을 매일 천만 원 정도 쓰면 1조 원이 된다는 말이다."
매일 천만 원씩 300년이 쓸 돈이 1조 원이면, 8,000조 원은 매일 천만 원씩 2,400,000년(240만 년) 동안 쓸 돈이다.
절대액도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크지만, 더 문제는 증가 속도다. 1989년 일본의 국채가 161조 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딱 30년 만에 5.5배 빚이 늘었고 증가 속도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일본에서 현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 시기를 헤이세이(平成)라고 하는데, 이 즉위 기간 30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맞다. 오죽하면 일본 재무상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의 수장이 기자회견에서 "계속 경종을 울려왔지만 이런 재정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을까.

내년 예산도 30%가 빚
일본 각 관계부처가 지난 8월까지 재무성에 제출한 일본 요구 총액은 모두 102조 8천억엔 가량. 세부 조정이 있겠지만,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엔(1,000조 원)을 넘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를 넘는 금액은 역시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메꿔야 한다. 지난해에 발행한 '적자 국채(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만 27조 6조엔(276조 원) 가량이다.
우리나라 2018년도 예산액이 429조 원가량이니 일본은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을 국채로 발행해 매년 빚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빚이 늘어난 데는 결국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았다는 데 기인한다.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가장 많았던 90년도 60.1조 엔(600조 원) 정도였지만 2018년도에는 59.1조 엔(591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예산 지출은 31.5조엔(315조 원) 가량 늘었다. 대부분이 사회보장비라는 분석이다.
90년 버블 붕괴, 90년대 말 IMF 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3.11 대지진까지 국가가 대처해야 할 위기 상황에 매번 재정 투입으로 대응했고, 여기에 고령화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국가 수입은 정체되는 데도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일본판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2년이 되면 사회보장비 지출은 더 늘 전망이다.
빚을 중앙은행이 떠안는 구조
일본 재무성에는 국채기획과가 있다. 이곳의 직원이 모두 35명인데, 이 가운데 5명은 시중 은행과 대형 증권사에서 특채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뭘까?
요미우리 신문은 이들의 일을 '시장과의 대화'라고 표현했다.
막대한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이를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일본 정부가 예산안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국채를 발행할지 가늠한 뒤 이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대형 금융 기관과 협의를 하는 역할이다.
일본 재무성은 20일과 21일 '국채 안정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참가대상은 'PD21(프라이머리 딜러 21)이다. PD는 대형 은행과 증권회사 21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대형 금융기관은 일정액의 국채 구매를 의무화하는 대신, 발행 계획이나 시장 동향 등에 있어 재무성과의 의견 교환이 가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말이 특권이지 사실상 국채 소화를 위해 막강한 힘을 가진 재무성이 짜놓은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성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들 카르텔이 입찰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더 큰 카르텔 구조가 존재한다. 즉 PD21로 통칭되는 시중 은행들이 국채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는데, 이를 가장 많이 사는 주체가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의 41.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19%), 보험사 등(19%), 해외투자가(11.2%)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개인 등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상당수를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구조로 나랏빚을 떠받치고 있다 할 수 있다.
답은 증세 뿐…시험대에 오른 아베 정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구조. 이 비정상이 정상인 상태로 일본은 30년 넘게 나라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일본 정부의 핵심, '재무성'의 관료들이다. 지금은 사실상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억누르고 있지만(그래도 매년 지불해야하는 국채 이자만 70~80조 원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흐름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예외일 수는 없고, 결국 국채 이자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한 리스크는 금융위기 등 시장이 출렁일 경우 언제까지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메이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지난 2016년 PD21(국채딜러) 자격을 반납하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국채를 발행해도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재무성의 숙원인 '적자 국채' 탈피는 90년 ~ 93년까지 단 4년간 이뤄졌을 뿐, 그 후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재무성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증세'.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작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세력도 재무성이다.
하지만 늘 증세는 국민의 반발을 불렀고, 증세를 추진하다 선거에서 진 경험까지 있는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소비세를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과거 소비세를 올렸을 때 급격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겪었던 탓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안도 마련 중이다.
아베 총리가 3연임의 길을 열고 국내 정치에 사실상 적수가 없다고 평가되는 만큼 이번에는 안정된 지지층을 기반으로 증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와 개헌 변수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아베 총리가 끝까지 '구국의 결단(?)'을 밀고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것만 보면 곧 망할 것 같은데 매년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내면서도 또 통화는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아 경제 위기가 닥칠 때면 강세를 보이는 나라. 일본 이야기다.
8,800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
2018년도까지 일본이 발행한 국채 발행 규모 즉 나랏빚 규모는 883조 엔, 8,830조 원 정도다.
8천조 원이 넘는 나랏빚. 대관절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도 안 온다.
과거 기사를 쓰면서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다.
"1조 원은 매일 천만 원을 3백 년간 쓸 돈이다. 1일 천만 원이면 열흘에 1억 원,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면 3억 원 정도, 1년이면 36억 원이라 치고, 10년 360억 원, 100년 3,600억 원이다. 아주 개략적으로 300년을 매일 천만 원 정도 쓰면 1조 원이 된다는 말이다."
매일 천만 원씩 300년이 쓸 돈이 1조 원이면, 8,000조 원은 매일 천만 원씩 2,400,000년(240만 년) 동안 쓸 돈이다.
절대액도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크지만, 더 문제는 증가 속도다. 1989년 일본의 국채가 161조 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딱 30년 만에 5.5배 빚이 늘었고 증가 속도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일본에서 현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 시기를 헤이세이(平成)라고 하는데, 이 즉위 기간 30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맞다. 오죽하면 일본 재무상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의 수장이 기자회견에서 "계속 경종을 울려왔지만 이런 재정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을까.

내년 예산도 30%가 빚
일본 각 관계부처가 지난 8월까지 재무성에 제출한 일본 요구 총액은 모두 102조 8천억엔 가량. 세부 조정이 있겠지만,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엔(1,000조 원)을 넘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를 넘는 금액은 역시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메꿔야 한다. 지난해에 발행한 '적자 국채(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만 27조 6조엔(276조 원) 가량이다.
우리나라 2018년도 예산액이 429조 원가량이니 일본은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을 국채로 발행해 매년 빚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빚이 늘어난 데는 결국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았다는 데 기인한다.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가장 많았던 90년도 60.1조 엔(600조 원) 정도였지만 2018년도에는 59.1조 엔(591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예산 지출은 31.5조엔(315조 원) 가량 늘었다. 대부분이 사회보장비라는 분석이다.
90년 버블 붕괴, 90년대 말 IMF 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3.11 대지진까지 국가가 대처해야 할 위기 상황에 매번 재정 투입으로 대응했고, 여기에 고령화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국가 수입은 정체되는 데도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일본판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2년이 되면 사회보장비 지출은 더 늘 전망이다.
빚을 중앙은행이 떠안는 구조
일본 재무성에는 국채기획과가 있다. 이곳의 직원이 모두 35명인데, 이 가운데 5명은 시중 은행과 대형 증권사에서 특채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뭘까?
요미우리 신문은 이들의 일을 '시장과의 대화'라고 표현했다.
막대한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이를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일본 정부가 예산안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국채를 발행할지 가늠한 뒤 이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대형 금융 기관과 협의를 하는 역할이다.
일본 재무성은 20일과 21일 '국채 안정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참가대상은 'PD21(프라이머리 딜러 21)이다. PD는 대형 은행과 증권회사 21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대형 금융기관은 일정액의 국채 구매를 의무화하는 대신, 발행 계획이나 시장 동향 등에 있어 재무성과의 의견 교환이 가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말이 특권이지 사실상 국채 소화를 위해 막강한 힘을 가진 재무성이 짜놓은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성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들 카르텔이 입찰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더 큰 카르텔 구조가 존재한다. 즉 PD21로 통칭되는 시중 은행들이 국채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는데, 이를 가장 많이 사는 주체가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의 41.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19%), 보험사 등(19%), 해외투자가(11.2%)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개인 등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상당수를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구조로 나랏빚을 떠받치고 있다 할 수 있다.
답은 증세 뿐…시험대에 오른 아베 정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구조. 이 비정상이 정상인 상태로 일본은 30년 넘게 나라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일본 정부의 핵심, '재무성'의 관료들이다. 지금은 사실상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억누르고 있지만(그래도 매년 지불해야하는 국채 이자만 70~80조 원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흐름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예외일 수는 없고, 결국 국채 이자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한 리스크는 금융위기 등 시장이 출렁일 경우 언제까지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메이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지난 2016년 PD21(국채딜러) 자격을 반납하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국채를 발행해도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재무성의 숙원인 '적자 국채' 탈피는 90년 ~ 93년까지 단 4년간 이뤄졌을 뿐, 그 후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재무성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증세'.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작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세력도 재무성이다.
하지만 늘 증세는 국민의 반발을 불렀고, 증세를 추진하다 선거에서 진 경험까지 있는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소비세를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과거 소비세를 올렸을 때 급격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겪었던 탓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안도 마련 중이다.
아베 총리가 3연임의 길을 열고 국내 정치에 사실상 적수가 없다고 평가되는 만큼 이번에는 안정된 지지층을 기반으로 증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와 개헌 변수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아베 총리가 끝까지 '구국의 결단(?)'을 밀고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파원리포트] 예산 30%가 빚, 8,800조 채무…비정상이 정상이 된 日
-
- 입력 2018-11-23 07:01:27

빚을 내지 못하면 예산안을 짜지 못하는 나라, 나랏빚 이자로만 매년 7~8조엔, 우리돈 70~80조 원을 지출하는 나라.
이것만 보면 곧 망할 것 같은데 매년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내면서도 또 통화는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아 경제 위기가 닥칠 때면 강세를 보이는 나라. 일본 이야기다.
8,800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
2018년도까지 일본이 발행한 국채 발행 규모 즉 나랏빚 규모는 883조 엔, 8,830조 원 정도다.
8천조 원이 넘는 나랏빚. 대관절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도 안 온다.
과거 기사를 쓰면서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다.
"1조 원은 매일 천만 원을 3백 년간 쓸 돈이다. 1일 천만 원이면 열흘에 1억 원,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면 3억 원 정도, 1년이면 36억 원이라 치고, 10년 360억 원, 100년 3,600억 원이다. 아주 개략적으로 300년을 매일 천만 원 정도 쓰면 1조 원이 된다는 말이다."
매일 천만 원씩 300년이 쓸 돈이 1조 원이면, 8,000조 원은 매일 천만 원씩 2,400,000년(240만 년) 동안 쓸 돈이다.
절대액도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크지만, 더 문제는 증가 속도다. 1989년 일본의 국채가 161조 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딱 30년 만에 5.5배 빚이 늘었고 증가 속도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일본에서 현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 시기를 헤이세이(平成)라고 하는데, 이 즉위 기간 30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맞다. 오죽하면 일본 재무상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의 수장이 기자회견에서 "계속 경종을 울려왔지만 이런 재정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을까.

내년 예산도 30%가 빚
일본 각 관계부처가 지난 8월까지 재무성에 제출한 일본 요구 총액은 모두 102조 8천억엔 가량. 세부 조정이 있겠지만,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엔(1,000조 원)을 넘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를 넘는 금액은 역시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메꿔야 한다. 지난해에 발행한 '적자 국채(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만 27조 6조엔(276조 원) 가량이다.
우리나라 2018년도 예산액이 429조 원가량이니 일본은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을 국채로 발행해 매년 빚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빚이 늘어난 데는 결국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았다는 데 기인한다.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가장 많았던 90년도 60.1조 엔(600조 원) 정도였지만 2018년도에는 59.1조 엔(591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예산 지출은 31.5조엔(315조 원) 가량 늘었다. 대부분이 사회보장비라는 분석이다.
90년 버블 붕괴, 90년대 말 IMF 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3.11 대지진까지 국가가 대처해야 할 위기 상황에 매번 재정 투입으로 대응했고, 여기에 고령화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국가 수입은 정체되는 데도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일본판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2년이 되면 사회보장비 지출은 더 늘 전망이다.
빚을 중앙은행이 떠안는 구조
일본 재무성에는 국채기획과가 있다. 이곳의 직원이 모두 35명인데, 이 가운데 5명은 시중 은행과 대형 증권사에서 특채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뭘까?
요미우리 신문은 이들의 일을 '시장과의 대화'라고 표현했다.
막대한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이를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일본 정부가 예산안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국채를 발행할지 가늠한 뒤 이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대형 금융 기관과 협의를 하는 역할이다.
일본 재무성은 20일과 21일 '국채 안정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참가대상은 'PD21(프라이머리 딜러 21)이다. PD는 대형 은행과 증권회사 21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대형 금융기관은 일정액의 국채 구매를 의무화하는 대신, 발행 계획이나 시장 동향 등에 있어 재무성과의 의견 교환이 가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말이 특권이지 사실상 국채 소화를 위해 막강한 힘을 가진 재무성이 짜놓은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성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들 카르텔이 입찰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더 큰 카르텔 구조가 존재한다. 즉 PD21로 통칭되는 시중 은행들이 국채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는데, 이를 가장 많이 사는 주체가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의 41.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19%), 보험사 등(19%), 해외투자가(11.2%)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개인 등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상당수를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구조로 나랏빚을 떠받치고 있다 할 수 있다.
답은 증세 뿐…시험대에 오른 아베 정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구조. 이 비정상이 정상인 상태로 일본은 30년 넘게 나라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일본 정부의 핵심, '재무성'의 관료들이다. 지금은 사실상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억누르고 있지만(그래도 매년 지불해야하는 국채 이자만 70~80조 원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흐름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예외일 수는 없고, 결국 국채 이자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한 리스크는 금융위기 등 시장이 출렁일 경우 언제까지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메이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지난 2016년 PD21(국채딜러) 자격을 반납하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국채를 발행해도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재무성의 숙원인 '적자 국채' 탈피는 90년 ~ 93년까지 단 4년간 이뤄졌을 뿐, 그 후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재무성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증세'.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작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세력도 재무성이다.
하지만 늘 증세는 국민의 반발을 불렀고, 증세를 추진하다 선거에서 진 경험까지 있는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소비세를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과거 소비세를 올렸을 때 급격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겪었던 탓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안도 마련 중이다.
아베 총리가 3연임의 길을 열고 국내 정치에 사실상 적수가 없다고 평가되는 만큼 이번에는 안정된 지지층을 기반으로 증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와 개헌 변수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아베 총리가 끝까지 '구국의 결단(?)'을 밀고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것만 보면 곧 망할 것 같은데 매년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내면서도 또 통화는 안전 자산으로 취급받아 경제 위기가 닥칠 때면 강세를 보이는 나라. 일본 이야기다.
8,800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
2018년도까지 일본이 발행한 국채 발행 규모 즉 나랏빚 규모는 883조 엔, 8,830조 원 정도다.
8천조 원이 넘는 나랏빚. 대관절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도 안 온다.
과거 기사를 쓰면서 1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다.
"1조 원은 매일 천만 원을 3백 년간 쓸 돈이다. 1일 천만 원이면 열흘에 1억 원,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면 3억 원 정도, 1년이면 36억 원이라 치고, 10년 360억 원, 100년 3,600억 원이다. 아주 개략적으로 300년을 매일 천만 원 정도 쓰면 1조 원이 된다는 말이다."
매일 천만 원씩 300년이 쓸 돈이 1조 원이면, 8,000조 원은 매일 천만 원씩 2,400,000년(240만 년) 동안 쓸 돈이다.
절대액도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크지만, 더 문제는 증가 속도다. 1989년 일본의 국채가 161조 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딱 30년 만에 5.5배 빚이 늘었고 증가 속도도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일본에서 현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 시기를 헤이세이(平成)라고 하는데, 이 즉위 기간 30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게 맞다. 오죽하면 일본 재무상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의 수장이 기자회견에서 "계속 경종을 울려왔지만 이런 재정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을까.

내년 예산도 30%가 빚
일본 각 관계부처가 지난 8월까지 재무성에 제출한 일본 요구 총액은 모두 102조 8천억엔 가량. 세부 조정이 있겠지만,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엔(1,000조 원)을 넘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를 넘는 금액은 역시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메꿔야 한다. 지난해에 발행한 '적자 국채(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만 27조 6조엔(276조 원) 가량이다.
우리나라 2018년도 예산액이 429조 원가량이니 일본은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을 국채로 발행해 매년 빚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빚이 늘어난 데는 결국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았다는 데 기인한다.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이 가장 많았던 90년도 60.1조 엔(600조 원) 정도였지만 2018년도에는 59.1조 엔(591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예산 지출은 31.5조엔(315조 원) 가량 늘었다. 대부분이 사회보장비라는 분석이다.
90년 버블 붕괴, 90년대 말 IMF 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3.11 대지진까지 국가가 대처해야 할 위기 상황에 매번 재정 투입으로 대응했고, 여기에 고령화라는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국가 수입은 정체되는 데도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일본판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2년이 되면 사회보장비 지출은 더 늘 전망이다.
빚을 중앙은행이 떠안는 구조
일본 재무성에는 국채기획과가 있다. 이곳의 직원이 모두 35명인데, 이 가운데 5명은 시중 은행과 대형 증권사에서 특채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뭘까?
요미우리 신문은 이들의 일을 '시장과의 대화'라고 표현했다.
막대한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이를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일본 정부가 예산안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국채를 발행할지 가늠한 뒤 이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대형 금융 기관과 협의를 하는 역할이다.
일본 재무성은 20일과 21일 '국채 안정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참가대상은 'PD21(프라이머리 딜러 21)이다. PD는 대형 은행과 증권회사 21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 대형 금융기관은 일정액의 국채 구매를 의무화하는 대신, 발행 계획이나 시장 동향 등에 있어 재무성과의 의견 교환이 가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말이 특권이지 사실상 국채 소화를 위해 막강한 힘을 가진 재무성이 짜놓은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성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들 카르텔이 입찰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더 큰 카르텔 구조가 존재한다. 즉 PD21로 통칭되는 시중 은행들이 국채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는데, 이를 가장 많이 사는 주체가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점에서 일본은행은 일본 국채의 41.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19%), 보험사 등(19%), 해외투자가(11.2%)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개인 등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상당수를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구조로 나랏빚을 떠받치고 있다 할 수 있다.
답은 증세 뿐…시험대에 오른 아베 정권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구조. 이 비정상이 정상인 상태로 일본은 30년 넘게 나라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일본 정부의 핵심, '재무성'의 관료들이다. 지금은 사실상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억누르고 있지만(그래도 매년 지불해야하는 국채 이자만 70~80조 원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흐름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만 예외일 수는 없고, 결국 국채 이자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한 리스크는 금융위기 등 시장이 출렁일 경우 언제까지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메이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이 지난 2016년 PD21(국채딜러) 자격을 반납하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국채를 발행해도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재무성의 숙원인 '적자 국채' 탈피는 90년 ~ 93년까지 단 4년간 이뤄졌을 뿐, 그 후로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재무성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증세'. 현재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작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세력도 재무성이다.
하지만 늘 증세는 국민의 반발을 불렀고, 증세를 추진하다 선거에서 진 경험까지 있는 아베 총리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에 소비세를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과거 소비세를 올렸을 때 급격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을 겪었던 탓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안도 마련 중이다.
아베 총리가 3연임의 길을 열고 국내 정치에 사실상 적수가 없다고 평가되는 만큼 이번에는 안정된 지지층을 기반으로 증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내년 참의원 선거와 개헌 변수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아베 총리가 끝까지 '구국의 결단(?)'을 밀고 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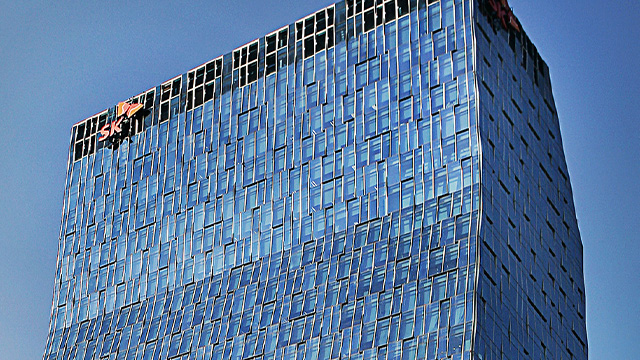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