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밴드 잔나비, 옛 시대 동경하다 황금기 열었다
입력 2019.04.29 (14:28)
수정 2019.04.29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 과거에 대한 동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그게 남들보다 심하고요."(최정훈·27)
요즘 '대세' 밴드인 잔나비는 '옛것'에 끌린다. 이들 음악에 아련한 복고 감성이 깃든 이유다. 1970~80년대 청춘의 낭만을 멋스럽게 리폼한 느낌이다.
스스로 그룹사운드라 칭하는 다섯 멤버는 모두 원숭이띠(잔나비띠)인 1992년생.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를 이끄는 지코, 딘, 크러쉬 등과 동갑내기이니 확연히 다른 길이다.
흥미롭게도 '힙'한 게 싫어 시대를 몇십년 거슬러 간 잔나비의 개성이 통했다. 이들의 익숙한 듯 새로운 소리는 뉴트로(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를 '힙'하다고 여기는 젊은층 취향에 닿았다.
최근 발표한 2집 '전설' 타이틀곡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는 쟁쟁한 아이돌과 경쟁에서 '대중 픽'으로 각종 음원차트 1~2위까지 떠올랐다. 그 반향으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2016), '사랑하긴 했었나요…'(2014), '시'(She·2017) 등 전작까지 역주행해 멜론 100위권에 안착했다. 장기하와얼굴들, 혁오를 잇는 스타 밴드 탄생이다.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보컬 최정훈의 '레트로 라이프'도 시선을 끌었다. 그는 MP3로 박인희의 번안곡 '스카브로우의 추억'(1970)과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1987)를 듣고, 5G 시대에 2G 폴더폰을 사용하고, 시집을 읽었다.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스타일도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과 닮았다. 이번 앨범에선 전영록의 '종이학'(1982) 가사를 인용했단다.
최정훈은 다른 시대를 향한 갈망을 우디 앨런 감독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2012)에 빗댔다.
"주인공(길 펜더)이 동경하던 1920년대 파리로 가서 만난 여성(피카소의 연인 아드리아나)은 더 이전 시대인 1890년대를 그리워하죠. '내'가 있는 시공간이 결국 황금기이겠지만, 과거에 대한 동경과 환상은 있기 마련이고, 우린 남들보다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신 유튜브 영상보다 옛날 브라운관 영상이 더 흥미롭고 느낌 있거든요."(최정훈)
음악은 이들을 쏙 빼닮았다. 2집에선 비틀스, 퀸, 비치 보이스, 산울림, 유재하, 작곡가 이영훈 등 이전 세대 팝과 가요 정취가 짙게 배어있다.
낙차 있는 특유의 멜로디 라인, 조덕배처럼 무심하게 뱉는 창법,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문체의 콜라주는 잔나비 특유의 고풍스러운 화풍이 됐다.
특히 공간계 이펙터를 이용한 소리의 잔향과 울림이 빈티지 사운드 구현에 한몫했다. 자칫 낡은 소리가 될까, 촌스럽지 않게 들리도록 악기 톤 하나까지 사운드 메이킹에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김도형(기타)은 1집 작업 때부터 비틀스 시대 때 나온 기타를 일본에서 사와 연주하는 열의도 보였다.
지난해 10월 16집에서 잔나비와 작업한 이문세는 "나보다 옛날 음악에 더 애착이 있고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장르의 자유분방한 변주, 열린 노선도 잔나비 강점이다. 이들은 몽환적인 록부터 빈티지 팝, 뮤지컬 넘버 스타일까지 융통성 있게 오가며 감상 문턱을 낮췄다.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조이풀 조이풀', '전설', '우리 애는요' 등에선 허를 찌르듯 소프라노, 현악단, 합창단의 울림이 비집고 나와 듣는 묘미도 살렸다.
이 앨범은 언뜻 전설들에 대한 헌사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져 전설처럼 남을 청춘의 처절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멤버들은 "1집 '몽키 호텔'에선 곡마다 인물의 인격을 부여해 재미있고 건강한 음악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면, 좀 더 어른스러워지면서 2집에선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앨범 커버 속 얼굴은 '우리는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꿈과 책과 힘과 벽')라고 묻는 표정이다.
여러 곡에서 어른이 된 '나'의 이야기는 뿌옇게 이미지를 그려낸다. 화자인 '어른 아이'는 거울에 외로움을 비추고('거울'), 엄마란 내 편이 있던 유년 시절이 그립고('우리 애는요'), 어린 날이 박제된 홈그라운드에 향수('돌마로')를 느낀다.
급기야 불면증이 생기고('신나는 잠'), 삶에 대한 넋두리('나쁜 꿈')도 늘어놓지만, '새 어둠이 오면은 그제서야 새 눈을 뜨자'는 희망도 한손에 움켜쥐고 있다.
잔나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팀은 아니다. 올해로 데뷔 5주년이지만 결성은 2012년. 최정훈, 김도형, 유영현(키보드)으로 출발해 2013년 엠넷 '슈퍼스타K 5'에 도전한 뒤 이듬해 싱글 '로켓트'로 정식 데뷔했다.
이후 2015년 장경준(베이스)과 윤결(드럼)이 합류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경남 함양에서 온 윤결 외에 모두 성남시 분당구, 한동네 친구들이다.
"처음에 셋이 밴드를 만들 때 정훈, 도형, 영현 이름을 합해 '정도령'이라고 불렀어요. 보다 못한 다른 친구가 우리가 같은 띠여서 잔나비라고 붙여줬죠. 처음엔 잔나비가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하하."(최정훈)
각기 청소년기 자양분이 된 음악엔 차이가 있다. 최정훈은 초등학교 때부터 엘튼 존, 블랙 사바스, 산울림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2004년 엘튼 존 첫 내한 공연 관람 때 엄마로부터 싱어송라이터 뜻을 듣고서 "초등학교 때부터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김도형은 친척 누나들 영향으로 어린 시절 서태지에 입문해 오지 오즈번, 딥 퍼플로 넓혀갔다. 유영현은 중학교 때 퀸에 빠져 밴드 음악을 하고 싶었다. 이들이 한때 공통으로 심취한 건 비틀스였다.
멤버들은 2013년 첫 콘서트 때를 기억했다. 당시 관객 30여명 중 순수 팬은 4~5명이었다. 멜로디 라인이 강하고 건반이 두드러져 록이 아니라 발라드란 비판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물밑에서 차근차근 팬 베이스를 넓혔고, 지난달 이틀간 2천800석 규모 서울 공연 등 전국투어를 매진시켰다
상승세를 체감한 것은 1집 타이틀곡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이 뒤늦게 입소문을 타면서다. 1970년대 그룹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E.L.O)의 '미드나잇 블루'(Midnight Blue) 잔향이 느껴진 곡으로 각종 차트 진입은 물론 지난해 가을 페스티벌에선 관객이 떼창을 이뤘다.
최정훈은 "이 곡을 기점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잡혔다"고 떠올렸다.
"한때는 마룬파이브처럼 파퓰러 밴드를 꿈꾸기도 했지만 몸에 맞지 않았어요. 퀸이 평론가와 록 팬들에게 멸시당했지만 결국 디스코, 오페라 어떤 장르든 그들 음악으로 인정받았듯이, 저희도 꾸준히 우리만의 음악을 해나가자는 생각뿐이에요."(최정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요즘 '대세' 밴드인 잔나비는 '옛것'에 끌린다. 이들 음악에 아련한 복고 감성이 깃든 이유다. 1970~80년대 청춘의 낭만을 멋스럽게 리폼한 느낌이다.
스스로 그룹사운드라 칭하는 다섯 멤버는 모두 원숭이띠(잔나비띠)인 1992년생.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를 이끄는 지코, 딘, 크러쉬 등과 동갑내기이니 확연히 다른 길이다.
흥미롭게도 '힙'한 게 싫어 시대를 몇십년 거슬러 간 잔나비의 개성이 통했다. 이들의 익숙한 듯 새로운 소리는 뉴트로(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를 '힙'하다고 여기는 젊은층 취향에 닿았다.
최근 발표한 2집 '전설' 타이틀곡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는 쟁쟁한 아이돌과 경쟁에서 '대중 픽'으로 각종 음원차트 1~2위까지 떠올랐다. 그 반향으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2016), '사랑하긴 했었나요…'(2014), '시'(She·2017) 등 전작까지 역주행해 멜론 100위권에 안착했다. 장기하와얼굴들, 혁오를 잇는 스타 밴드 탄생이다.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보컬 최정훈의 '레트로 라이프'도 시선을 끌었다. 그는 MP3로 박인희의 번안곡 '스카브로우의 추억'(1970)과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1987)를 듣고, 5G 시대에 2G 폴더폰을 사용하고, 시집을 읽었다.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스타일도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과 닮았다. 이번 앨범에선 전영록의 '종이학'(1982) 가사를 인용했단다.
최정훈은 다른 시대를 향한 갈망을 우디 앨런 감독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2012)에 빗댔다.
"주인공(길 펜더)이 동경하던 1920년대 파리로 가서 만난 여성(피카소의 연인 아드리아나)은 더 이전 시대인 1890년대를 그리워하죠. '내'가 있는 시공간이 결국 황금기이겠지만, 과거에 대한 동경과 환상은 있기 마련이고, 우린 남들보다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신 유튜브 영상보다 옛날 브라운관 영상이 더 흥미롭고 느낌 있거든요."(최정훈)
음악은 이들을 쏙 빼닮았다. 2집에선 비틀스, 퀸, 비치 보이스, 산울림, 유재하, 작곡가 이영훈 등 이전 세대 팝과 가요 정취가 짙게 배어있다.
낙차 있는 특유의 멜로디 라인, 조덕배처럼 무심하게 뱉는 창법,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문체의 콜라주는 잔나비 특유의 고풍스러운 화풍이 됐다.
특히 공간계 이펙터를 이용한 소리의 잔향과 울림이 빈티지 사운드 구현에 한몫했다. 자칫 낡은 소리가 될까, 촌스럽지 않게 들리도록 악기 톤 하나까지 사운드 메이킹에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김도형(기타)은 1집 작업 때부터 비틀스 시대 때 나온 기타를 일본에서 사와 연주하는 열의도 보였다.
지난해 10월 16집에서 잔나비와 작업한 이문세는 "나보다 옛날 음악에 더 애착이 있고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장르의 자유분방한 변주, 열린 노선도 잔나비 강점이다. 이들은 몽환적인 록부터 빈티지 팝, 뮤지컬 넘버 스타일까지 융통성 있게 오가며 감상 문턱을 낮췄다.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조이풀 조이풀', '전설', '우리 애는요' 등에선 허를 찌르듯 소프라노, 현악단, 합창단의 울림이 비집고 나와 듣는 묘미도 살렸다.
이 앨범은 언뜻 전설들에 대한 헌사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져 전설처럼 남을 청춘의 처절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멤버들은 "1집 '몽키 호텔'에선 곡마다 인물의 인격을 부여해 재미있고 건강한 음악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면, 좀 더 어른스러워지면서 2집에선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앨범 커버 속 얼굴은 '우리는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꿈과 책과 힘과 벽')라고 묻는 표정이다.
여러 곡에서 어른이 된 '나'의 이야기는 뿌옇게 이미지를 그려낸다. 화자인 '어른 아이'는 거울에 외로움을 비추고('거울'), 엄마란 내 편이 있던 유년 시절이 그립고('우리 애는요'), 어린 날이 박제된 홈그라운드에 향수('돌마로')를 느낀다.
급기야 불면증이 생기고('신나는 잠'), 삶에 대한 넋두리('나쁜 꿈')도 늘어놓지만, '새 어둠이 오면은 그제서야 새 눈을 뜨자'는 희망도 한손에 움켜쥐고 있다.
잔나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팀은 아니다. 올해로 데뷔 5주년이지만 결성은 2012년. 최정훈, 김도형, 유영현(키보드)으로 출발해 2013년 엠넷 '슈퍼스타K 5'에 도전한 뒤 이듬해 싱글 '로켓트'로 정식 데뷔했다.
이후 2015년 장경준(베이스)과 윤결(드럼)이 합류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경남 함양에서 온 윤결 외에 모두 성남시 분당구, 한동네 친구들이다.
"처음에 셋이 밴드를 만들 때 정훈, 도형, 영현 이름을 합해 '정도령'이라고 불렀어요. 보다 못한 다른 친구가 우리가 같은 띠여서 잔나비라고 붙여줬죠. 처음엔 잔나비가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하하."(최정훈)
각기 청소년기 자양분이 된 음악엔 차이가 있다. 최정훈은 초등학교 때부터 엘튼 존, 블랙 사바스, 산울림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2004년 엘튼 존 첫 내한 공연 관람 때 엄마로부터 싱어송라이터 뜻을 듣고서 "초등학교 때부터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김도형은 친척 누나들 영향으로 어린 시절 서태지에 입문해 오지 오즈번, 딥 퍼플로 넓혀갔다. 유영현은 중학교 때 퀸에 빠져 밴드 음악을 하고 싶었다. 이들이 한때 공통으로 심취한 건 비틀스였다.
멤버들은 2013년 첫 콘서트 때를 기억했다. 당시 관객 30여명 중 순수 팬은 4~5명이었다. 멜로디 라인이 강하고 건반이 두드러져 록이 아니라 발라드란 비판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물밑에서 차근차근 팬 베이스를 넓혔고, 지난달 이틀간 2천800석 규모 서울 공연 등 전국투어를 매진시켰다
상승세를 체감한 것은 1집 타이틀곡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이 뒤늦게 입소문을 타면서다. 1970년대 그룹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E.L.O)의 '미드나잇 블루'(Midnight Blue) 잔향이 느껴진 곡으로 각종 차트 진입은 물론 지난해 가을 페스티벌에선 관객이 떼창을 이뤘다.
최정훈은 "이 곡을 기점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잡혔다"고 떠올렸다.
"한때는 마룬파이브처럼 파퓰러 밴드를 꿈꾸기도 했지만 몸에 맞지 않았어요. 퀸이 평론가와 록 팬들에게 멸시당했지만 결국 디스코, 오페라 어떤 장르든 그들 음악으로 인정받았듯이, 저희도 꾸준히 우리만의 음악을 해나가자는 생각뿐이에요."(최정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세’ 밴드 잔나비, 옛 시대 동경하다 황금기 열었다
-
- 입력 2019-04-29 14:28:15
- 수정2019-04-29 14:29:23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 과거에 대한 동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그게 남들보다 심하고요."(최정훈·27)
요즘 '대세' 밴드인 잔나비는 '옛것'에 끌린다. 이들 음악에 아련한 복고 감성이 깃든 이유다. 1970~80년대 청춘의 낭만을 멋스럽게 리폼한 느낌이다.
스스로 그룹사운드라 칭하는 다섯 멤버는 모두 원숭이띠(잔나비띠)인 1992년생.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를 이끄는 지코, 딘, 크러쉬 등과 동갑내기이니 확연히 다른 길이다.
흥미롭게도 '힙'한 게 싫어 시대를 몇십년 거슬러 간 잔나비의 개성이 통했다. 이들의 익숙한 듯 새로운 소리는 뉴트로(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를 '힙'하다고 여기는 젊은층 취향에 닿았다.
최근 발표한 2집 '전설' 타이틀곡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는 쟁쟁한 아이돌과 경쟁에서 '대중 픽'으로 각종 음원차트 1~2위까지 떠올랐다. 그 반향으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2016), '사랑하긴 했었나요…'(2014), '시'(She·2017) 등 전작까지 역주행해 멜론 100위권에 안착했다. 장기하와얼굴들, 혁오를 잇는 스타 밴드 탄생이다.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보컬 최정훈의 '레트로 라이프'도 시선을 끌었다. 그는 MP3로 박인희의 번안곡 '스카브로우의 추억'(1970)과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1987)를 듣고, 5G 시대에 2G 폴더폰을 사용하고, 시집을 읽었다.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스타일도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과 닮았다. 이번 앨범에선 전영록의 '종이학'(1982) 가사를 인용했단다.
최정훈은 다른 시대를 향한 갈망을 우디 앨런 감독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2012)에 빗댔다.
"주인공(길 펜더)이 동경하던 1920년대 파리로 가서 만난 여성(피카소의 연인 아드리아나)은 더 이전 시대인 1890년대를 그리워하죠. '내'가 있는 시공간이 결국 황금기이겠지만, 과거에 대한 동경과 환상은 있기 마련이고, 우린 남들보다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신 유튜브 영상보다 옛날 브라운관 영상이 더 흥미롭고 느낌 있거든요."(최정훈)
음악은 이들을 쏙 빼닮았다. 2집에선 비틀스, 퀸, 비치 보이스, 산울림, 유재하, 작곡가 이영훈 등 이전 세대 팝과 가요 정취가 짙게 배어있다.
낙차 있는 특유의 멜로디 라인, 조덕배처럼 무심하게 뱉는 창법,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문체의 콜라주는 잔나비 특유의 고풍스러운 화풍이 됐다.
특히 공간계 이펙터를 이용한 소리의 잔향과 울림이 빈티지 사운드 구현에 한몫했다. 자칫 낡은 소리가 될까, 촌스럽지 않게 들리도록 악기 톤 하나까지 사운드 메이킹에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김도형(기타)은 1집 작업 때부터 비틀스 시대 때 나온 기타를 일본에서 사와 연주하는 열의도 보였다.
지난해 10월 16집에서 잔나비와 작업한 이문세는 "나보다 옛날 음악에 더 애착이 있고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장르의 자유분방한 변주, 열린 노선도 잔나비 강점이다. 이들은 몽환적인 록부터 빈티지 팝, 뮤지컬 넘버 스타일까지 융통성 있게 오가며 감상 문턱을 낮췄다.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조이풀 조이풀', '전설', '우리 애는요' 등에선 허를 찌르듯 소프라노, 현악단, 합창단의 울림이 비집고 나와 듣는 묘미도 살렸다.
이 앨범은 언뜻 전설들에 대한 헌사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져 전설처럼 남을 청춘의 처절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멤버들은 "1집 '몽키 호텔'에선 곡마다 인물의 인격을 부여해 재미있고 건강한 음악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면, 좀 더 어른스러워지면서 2집에선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앨범 커버 속 얼굴은 '우리는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꿈과 책과 힘과 벽')라고 묻는 표정이다.
여러 곡에서 어른이 된 '나'의 이야기는 뿌옇게 이미지를 그려낸다. 화자인 '어른 아이'는 거울에 외로움을 비추고('거울'), 엄마란 내 편이 있던 유년 시절이 그립고('우리 애는요'), 어린 날이 박제된 홈그라운드에 향수('돌마로')를 느낀다.
급기야 불면증이 생기고('신나는 잠'), 삶에 대한 넋두리('나쁜 꿈')도 늘어놓지만, '새 어둠이 오면은 그제서야 새 눈을 뜨자'는 희망도 한손에 움켜쥐고 있다.
잔나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팀은 아니다. 올해로 데뷔 5주년이지만 결성은 2012년. 최정훈, 김도형, 유영현(키보드)으로 출발해 2013년 엠넷 '슈퍼스타K 5'에 도전한 뒤 이듬해 싱글 '로켓트'로 정식 데뷔했다.
이후 2015년 장경준(베이스)과 윤결(드럼)이 합류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경남 함양에서 온 윤결 외에 모두 성남시 분당구, 한동네 친구들이다.
"처음에 셋이 밴드를 만들 때 정훈, 도형, 영현 이름을 합해 '정도령'이라고 불렀어요. 보다 못한 다른 친구가 우리가 같은 띠여서 잔나비라고 붙여줬죠. 처음엔 잔나비가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하하."(최정훈)
각기 청소년기 자양분이 된 음악엔 차이가 있다. 최정훈은 초등학교 때부터 엘튼 존, 블랙 사바스, 산울림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2004년 엘튼 존 첫 내한 공연 관람 때 엄마로부터 싱어송라이터 뜻을 듣고서 "초등학교 때부터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김도형은 친척 누나들 영향으로 어린 시절 서태지에 입문해 오지 오즈번, 딥 퍼플로 넓혀갔다. 유영현은 중학교 때 퀸에 빠져 밴드 음악을 하고 싶었다. 이들이 한때 공통으로 심취한 건 비틀스였다.
멤버들은 2013년 첫 콘서트 때를 기억했다. 당시 관객 30여명 중 순수 팬은 4~5명이었다. 멜로디 라인이 강하고 건반이 두드러져 록이 아니라 발라드란 비판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물밑에서 차근차근 팬 베이스를 넓혔고, 지난달 이틀간 2천800석 규모 서울 공연 등 전국투어를 매진시켰다
상승세를 체감한 것은 1집 타이틀곡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이 뒤늦게 입소문을 타면서다. 1970년대 그룹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E.L.O)의 '미드나잇 블루'(Midnight Blue) 잔향이 느껴진 곡으로 각종 차트 진입은 물론 지난해 가을 페스티벌에선 관객이 떼창을 이뤘다.
최정훈은 "이 곡을 기점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잡혔다"고 떠올렸다.
"한때는 마룬파이브처럼 파퓰러 밴드를 꿈꾸기도 했지만 몸에 맞지 않았어요. 퀸이 평론가와 록 팬들에게 멸시당했지만 결국 디스코, 오페라 어떤 장르든 그들 음악으로 인정받았듯이, 저희도 꾸준히 우리만의 음악을 해나가자는 생각뿐이에요."(최정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요즘 '대세' 밴드인 잔나비는 '옛것'에 끌린다. 이들 음악에 아련한 복고 감성이 깃든 이유다. 1970~80년대 청춘의 낭만을 멋스럽게 리폼한 느낌이다.
스스로 그룹사운드라 칭하는 다섯 멤버는 모두 원숭이띠(잔나비띠)인 1992년생.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를 이끄는 지코, 딘, 크러쉬 등과 동갑내기이니 확연히 다른 길이다.
흥미롭게도 '힙'한 게 싫어 시대를 몇십년 거슬러 간 잔나비의 개성이 통했다. 이들의 익숙한 듯 새로운 소리는 뉴트로(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를 '힙'하다고 여기는 젊은층 취향에 닿았다.
최근 발표한 2집 '전설' 타이틀곡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는 쟁쟁한 아이돌과 경쟁에서 '대중 픽'으로 각종 음원차트 1~2위까지 떠올랐다. 그 반향으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2016), '사랑하긴 했었나요…'(2014), '시'(She·2017) 등 전작까지 역주행해 멜론 100위권에 안착했다. 장기하와얼굴들, 혁오를 잇는 스타 밴드 탄생이다.
MBC TV '나 혼자 산다'에서 보컬 최정훈의 '레트로 라이프'도 시선을 끌었다. 그는 MP3로 박인희의 번안곡 '스카브로우의 추억'(1970)과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1987)를 듣고, 5G 시대에 2G 폴더폰을 사용하고, 시집을 읽었다.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스타일도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과 닮았다. 이번 앨범에선 전영록의 '종이학'(1982) 가사를 인용했단다.
최정훈은 다른 시대를 향한 갈망을 우디 앨런 감독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2012)에 빗댔다.
"주인공(길 펜더)이 동경하던 1920년대 파리로 가서 만난 여성(피카소의 연인 아드리아나)은 더 이전 시대인 1890년대를 그리워하죠. '내'가 있는 시공간이 결국 황금기이겠지만, 과거에 대한 동경과 환상은 있기 마련이고, 우린 남들보다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신 유튜브 영상보다 옛날 브라운관 영상이 더 흥미롭고 느낌 있거든요."(최정훈)
음악은 이들을 쏙 빼닮았다. 2집에선 비틀스, 퀸, 비치 보이스, 산울림, 유재하, 작곡가 이영훈 등 이전 세대 팝과 가요 정취가 짙게 배어있다.
낙차 있는 특유의 멜로디 라인, 조덕배처럼 무심하게 뱉는 창법,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문체의 콜라주는 잔나비 특유의 고풍스러운 화풍이 됐다.
특히 공간계 이펙터를 이용한 소리의 잔향과 울림이 빈티지 사운드 구현에 한몫했다. 자칫 낡은 소리가 될까, 촌스럽지 않게 들리도록 악기 톤 하나까지 사운드 메이킹에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김도형(기타)은 1집 작업 때부터 비틀스 시대 때 나온 기타를 일본에서 사와 연주하는 열의도 보였다.
지난해 10월 16집에서 잔나비와 작업한 이문세는 "나보다 옛날 음악에 더 애착이 있고 잘한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장르의 자유분방한 변주, 열린 노선도 잔나비 강점이다. 이들은 몽환적인 록부터 빈티지 팝, 뮤지컬 넘버 스타일까지 융통성 있게 오가며 감상 문턱을 낮췄다.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조이풀 조이풀', '전설', '우리 애는요' 등에선 허를 찌르듯 소프라노, 현악단, 합창단의 울림이 비집고 나와 듣는 묘미도 살렸다.
이 앨범은 언뜻 전설들에 대한 헌사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져 전설처럼 남을 청춘의 처절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멤버들은 "1집 '몽키 호텔'에선 곡마다 인물의 인격을 부여해 재미있고 건강한 음악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면, 좀 더 어른스러워지면서 2집에선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앨범 커버 속 얼굴은 '우리는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꿈과 책과 힘과 벽')라고 묻는 표정이다.
여러 곡에서 어른이 된 '나'의 이야기는 뿌옇게 이미지를 그려낸다. 화자인 '어른 아이'는 거울에 외로움을 비추고('거울'), 엄마란 내 편이 있던 유년 시절이 그립고('우리 애는요'), 어린 날이 박제된 홈그라운드에 향수('돌마로')를 느낀다.
급기야 불면증이 생기고('신나는 잠'), 삶에 대한 넋두리('나쁜 꿈')도 늘어놓지만, '새 어둠이 오면은 그제서야 새 눈을 뜨자'는 희망도 한손에 움켜쥐고 있다.
잔나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팀은 아니다. 올해로 데뷔 5주년이지만 결성은 2012년. 최정훈, 김도형, 유영현(키보드)으로 출발해 2013년 엠넷 '슈퍼스타K 5'에 도전한 뒤 이듬해 싱글 '로켓트'로 정식 데뷔했다.
이후 2015년 장경준(베이스)과 윤결(드럼)이 합류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 경남 함양에서 온 윤결 외에 모두 성남시 분당구, 한동네 친구들이다.
"처음에 셋이 밴드를 만들 때 정훈, 도형, 영현 이름을 합해 '정도령'이라고 불렀어요. 보다 못한 다른 친구가 우리가 같은 띠여서 잔나비라고 붙여줬죠. 처음엔 잔나비가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하하."(최정훈)
각기 청소년기 자양분이 된 음악엔 차이가 있다. 최정훈은 초등학교 때부터 엘튼 존, 블랙 사바스, 산울림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다. 2004년 엘튼 존 첫 내한 공연 관람 때 엄마로부터 싱어송라이터 뜻을 듣고서 "초등학교 때부터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김도형은 친척 누나들 영향으로 어린 시절 서태지에 입문해 오지 오즈번, 딥 퍼플로 넓혀갔다. 유영현은 중학교 때 퀸에 빠져 밴드 음악을 하고 싶었다. 이들이 한때 공통으로 심취한 건 비틀스였다.
멤버들은 2013년 첫 콘서트 때를 기억했다. 당시 관객 30여명 중 순수 팬은 4~5명이었다. 멜로디 라인이 강하고 건반이 두드러져 록이 아니라 발라드란 비판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물밑에서 차근차근 팬 베이스를 넓혔고, 지난달 이틀간 2천800석 규모 서울 공연 등 전국투어를 매진시켰다
상승세를 체감한 것은 1집 타이틀곡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이 뒤늦게 입소문을 타면서다. 1970년대 그룹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E.L.O)의 '미드나잇 블루'(Midnight Blue) 잔향이 느껴진 곡으로 각종 차트 진입은 물론 지난해 가을 페스티벌에선 관객이 떼창을 이뤘다.
최정훈은 "이 곡을 기점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잡혔다"고 떠올렸다.
"한때는 마룬파이브처럼 파퓰러 밴드를 꿈꾸기도 했지만 몸에 맞지 않았어요. 퀸이 평론가와 록 팬들에게 멸시당했지만 결국 디스코, 오페라 어떤 장르든 그들 음악으로 인정받았듯이, 저희도 꾸준히 우리만의 음악을 해나가자는 생각뿐이에요."(최정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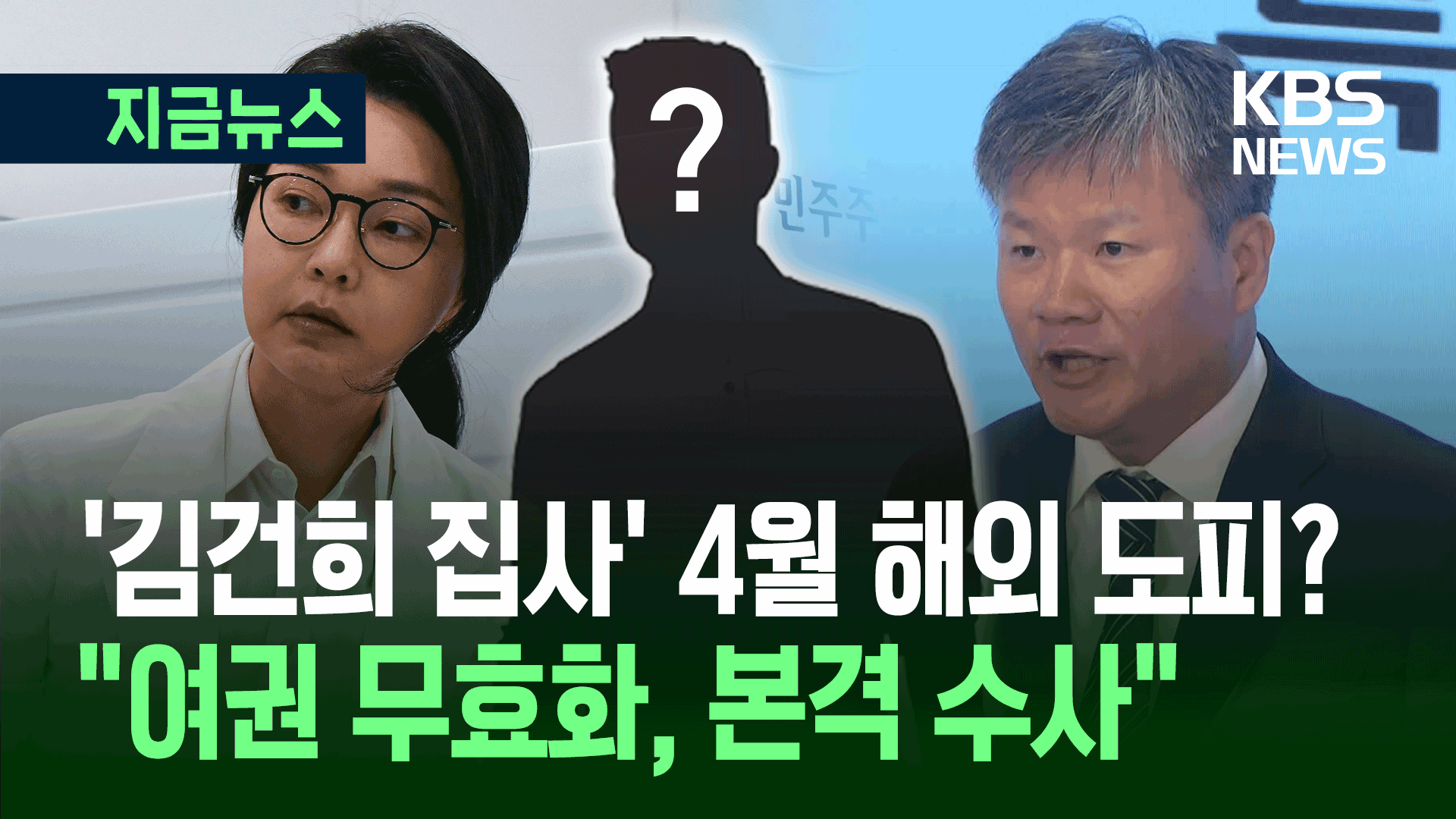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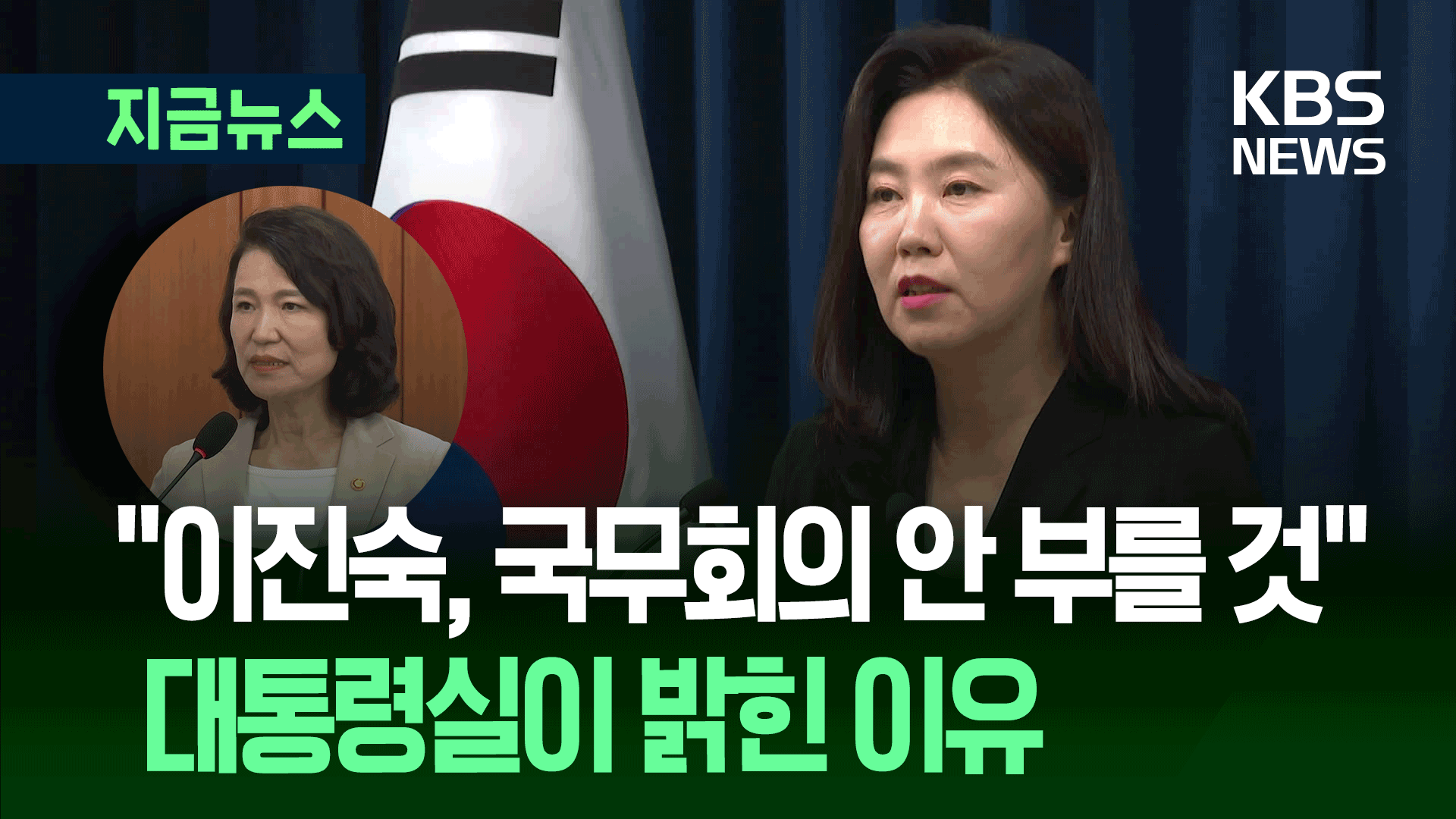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