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왜 제가 못 뛰어요?”…어느 아이스하키 꿈나무의 하소연
입력 2019.07.06 (07:02)
수정 2019.07.06 (0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못 뛰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고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속상했고 계속 '왜?'라는 생각뿐이어요."
부산에 사는 12살 A 군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엘리트 선수도 아니고 그저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A 군은 부산 경남 지역의 초등부 아이스하키 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들뜬 마음으로 훈련해왔는데 갑자기 개막 2주 전 대회 출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왜? 라는 자녀의 질문에 해당 선수의 부모들은 어떤 답도 해주지 못했다. 지도자들의 '짬짜미'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조차 민망한 어른들의 민낯이었다.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두 선수의 학부모는 "이건 앙갚음이다 싶었다"며 취재진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6월 초에 대진표까지 다 나왔고 경기만 기다리면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13일쯤 감독님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뛸 수 없다고. 지도자들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 이적이 문제가 됐다면서, 만약 출전하면 본인들 팀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은 한 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줬다고 했다.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대화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초등부 아이스하키팀 지도자들끼리 선수 이적 방지를 위해 한 약속이었는데 '각 팀 감독들의 동의 없는 선수 이적은 제한하고 이를 어긴 팀은 해당 선수의 대회 출전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속력 있는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감독들끼리의 '구두 약속'이었다.
감독들끼리 '담합'에 의해 이적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격분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클럽팀에서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즐긴 A와 B 군은 지난해 다른 클럽팀으로 옮겼고, 이 '담합 규정'에 따라 대회 출전이 막힌 것이다.
더구나 해당 학부모가 더욱 반발한 이유는 이 두 선수가 정식으로 이적 동의서까지 받아 팀을 옮겼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팀을 옮길 때 절차대로 이적 동의서까지 받고 현 소속팀으로 옮겼어요.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정식으로 선수 등록도 되어있고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들끼리 약속했다면서 아이들을 뛰게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결국, 피해 선수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과 해당 체육회에 항의했고, KBS의 취재가 들어가자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가 뒤늦게 조치를 위한 것이다. 그것도 대회 개막 하루를 앞두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뒤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는 적극적 대응보다 형식적 중재에 그쳐 더욱 비판을 받았다. 대회 참가 감독들끼리 구두 약속을 근거로 대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협회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KBS 취재에 응한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저희가 누구를 데리고 나와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두 팀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우리 협회는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서 양쪽에 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협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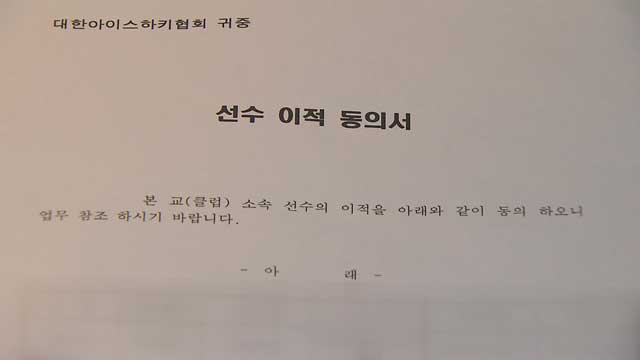
이번 사태를 야기한 아이스하키 지도자들도 할 말은 있다. 아이스하키라는 비인기 종목의 열악한 환경 탓이라는 것이다. 만약 선수 이적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가뜩이나 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팀이 해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지도자들끼리 선수의 이적을 '해 주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말자'는 암묵적 관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장배 대회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지도자는 "저변이 약한 스포츠 종목의 경우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사실 한 지역에 팀이 2~3개밖에 없어요. 감독들끼리 사실상 다들 서로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아이스하키는 단체 종목인데 잘 운영되던 팀에서 몇 명이 빠져버리면 당장 팀을 못 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팀과 경기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안되는 거죠. 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수 저변이 얇아 팀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 그저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대회에 나가려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받은 상처는 이미 회복할 수 없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행, 암묵적 담합에 대해 이제는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합 체육 시대에 스포츠 클럽과 기존 학교 운동부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학생 선수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산에 사는 12살 A 군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엘리트 선수도 아니고 그저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A 군은 부산 경남 지역의 초등부 아이스하키 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들뜬 마음으로 훈련해왔는데 갑자기 개막 2주 전 대회 출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왜? 라는 자녀의 질문에 해당 선수의 부모들은 어떤 답도 해주지 못했다. 지도자들의 '짬짜미'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조차 민망한 어른들의 민낯이었다.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두 선수의 학부모는 "이건 앙갚음이다 싶었다"며 취재진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6월 초에 대진표까지 다 나왔고 경기만 기다리면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13일쯤 감독님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뛸 수 없다고. 지도자들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 이적이 문제가 됐다면서, 만약 출전하면 본인들 팀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은 한 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줬다고 했다.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대화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초등부 아이스하키팀 지도자들끼리 선수 이적 방지를 위해 한 약속이었는데 '각 팀 감독들의 동의 없는 선수 이적은 제한하고 이를 어긴 팀은 해당 선수의 대회 출전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속력 있는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감독들끼리의 '구두 약속'이었다.
감독들끼리 '담합'에 의해 이적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격분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클럽팀에서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즐긴 A와 B 군은 지난해 다른 클럽팀으로 옮겼고, 이 '담합 규정'에 따라 대회 출전이 막힌 것이다.
더구나 해당 학부모가 더욱 반발한 이유는 이 두 선수가 정식으로 이적 동의서까지 받아 팀을 옮겼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팀을 옮길 때 절차대로 이적 동의서까지 받고 현 소속팀으로 옮겼어요.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정식으로 선수 등록도 되어있고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들끼리 약속했다면서 아이들을 뛰게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결국, 피해 선수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과 해당 체육회에 항의했고, KBS의 취재가 들어가자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가 뒤늦게 조치를 위한 것이다. 그것도 대회 개막 하루를 앞두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뒤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는 적극적 대응보다 형식적 중재에 그쳐 더욱 비판을 받았다. 대회 참가 감독들끼리 구두 약속을 근거로 대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협회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KBS 취재에 응한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저희가 누구를 데리고 나와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두 팀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우리 협회는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서 양쪽에 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협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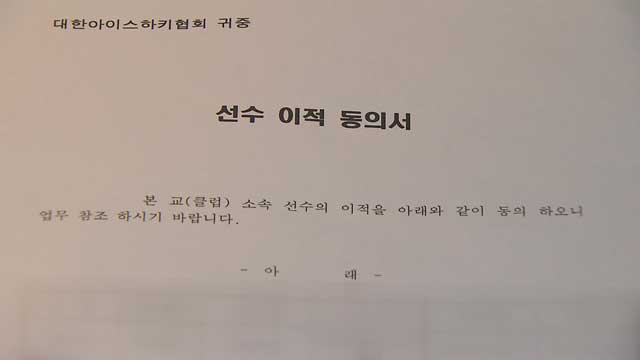
이번 사태를 야기한 아이스하키 지도자들도 할 말은 있다. 아이스하키라는 비인기 종목의 열악한 환경 탓이라는 것이다. 만약 선수 이적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가뜩이나 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팀이 해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지도자들끼리 선수의 이적을 '해 주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말자'는 암묵적 관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장배 대회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지도자는 "저변이 약한 스포츠 종목의 경우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사실 한 지역에 팀이 2~3개밖에 없어요. 감독들끼리 사실상 다들 서로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아이스하키는 단체 종목인데 잘 운영되던 팀에서 몇 명이 빠져버리면 당장 팀을 못 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팀과 경기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안되는 거죠. 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수 저변이 얇아 팀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 그저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대회에 나가려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받은 상처는 이미 회복할 수 없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행, 암묵적 담합에 대해 이제는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합 체육 시대에 스포츠 클럽과 기존 학교 운동부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학생 선수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왜 제가 못 뛰어요?”…어느 아이스하키 꿈나무의 하소연
-
- 입력 2019-07-06 07:02:19
- 수정2019-07-06 07:03:00

"왜 제가 못 뛰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고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속상했고 계속 '왜?'라는 생각뿐이어요."
부산에 사는 12살 A 군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엘리트 선수도 아니고 그저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A 군은 부산 경남 지역의 초등부 아이스하키 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들뜬 마음으로 훈련해왔는데 갑자기 개막 2주 전 대회 출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왜? 라는 자녀의 질문에 해당 선수의 부모들은 어떤 답도 해주지 못했다. 지도자들의 '짬짜미'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조차 민망한 어른들의 민낯이었다.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두 선수의 학부모는 "이건 앙갚음이다 싶었다"며 취재진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6월 초에 대진표까지 다 나왔고 경기만 기다리면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13일쯤 감독님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뛸 수 없다고. 지도자들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 이적이 문제가 됐다면서, 만약 출전하면 본인들 팀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은 한 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줬다고 했다.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대화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초등부 아이스하키팀 지도자들끼리 선수 이적 방지를 위해 한 약속이었는데 '각 팀 감독들의 동의 없는 선수 이적은 제한하고 이를 어긴 팀은 해당 선수의 대회 출전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속력 있는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감독들끼리의 '구두 약속'이었다.
감독들끼리 '담합'에 의해 이적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격분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클럽팀에서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즐긴 A와 B 군은 지난해 다른 클럽팀으로 옮겼고, 이 '담합 규정'에 따라 대회 출전이 막힌 것이다.
더구나 해당 학부모가 더욱 반발한 이유는 이 두 선수가 정식으로 이적 동의서까지 받아 팀을 옮겼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팀을 옮길 때 절차대로 이적 동의서까지 받고 현 소속팀으로 옮겼어요.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정식으로 선수 등록도 되어있고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들끼리 약속했다면서 아이들을 뛰게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결국, 피해 선수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과 해당 체육회에 항의했고, KBS의 취재가 들어가자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가 뒤늦게 조치를 위한 것이다. 그것도 대회 개막 하루를 앞두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뒤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는 적극적 대응보다 형식적 중재에 그쳐 더욱 비판을 받았다. 대회 참가 감독들끼리 구두 약속을 근거로 대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협회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KBS 취재에 응한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저희가 누구를 데리고 나와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두 팀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우리 협회는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서 양쪽에 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협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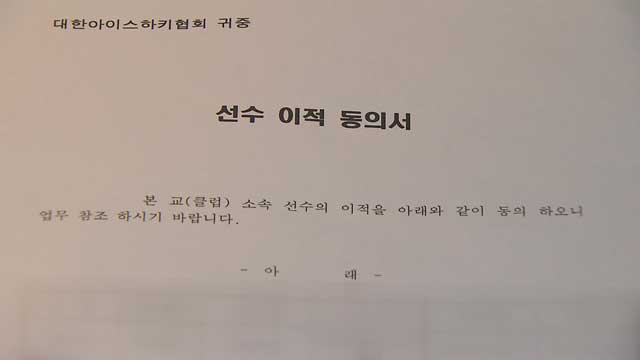
이번 사태를 야기한 아이스하키 지도자들도 할 말은 있다. 아이스하키라는 비인기 종목의 열악한 환경 탓이라는 것이다. 만약 선수 이적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가뜩이나 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팀이 해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지도자들끼리 선수의 이적을 '해 주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말자'는 암묵적 관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장배 대회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지도자는 "저변이 약한 스포츠 종목의 경우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사실 한 지역에 팀이 2~3개밖에 없어요. 감독들끼리 사실상 다들 서로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아이스하키는 단체 종목인데 잘 운영되던 팀에서 몇 명이 빠져버리면 당장 팀을 못 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팀과 경기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안되는 거죠. 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수 저변이 얇아 팀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 그저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대회에 나가려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받은 상처는 이미 회복할 수 없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행, 암묵적 담합에 대해 이제는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합 체육 시대에 스포츠 클럽과 기존 학교 운동부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학생 선수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산에 사는 12살 A 군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엘리트 선수도 아니고 그저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즐겼던 A 군은 부산 경남 지역의 초등부 아이스하키 대회를 앞두고 있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들뜬 마음으로 훈련해왔는데 갑자기 개막 2주 전 대회 출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왜? 라는 자녀의 질문에 해당 선수의 부모들은 어떤 답도 해주지 못했다. 지도자들의 '짬짜미' 때문이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조차 민망한 어른들의 민낯이었다.
출전 불가 통보를 받은 두 선수의 학부모는 "이건 앙갚음이다 싶었다"며 취재진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6월 초에 대진표까지 다 나왔고 경기만 기다리면서 훈련하고 있었는데 13일쯤 감독님이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뛸 수 없다고. 지도자들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 이적이 문제가 됐다면서, 만약 출전하면 본인들 팀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를 출전 명단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은 한 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줬다고 했다.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대화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초등부 아이스하키팀 지도자들끼리 선수 이적 방지를 위해 한 약속이었는데 '각 팀 감독들의 동의 없는 선수 이적은 제한하고 이를 어긴 팀은 해당 선수의 대회 출전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속력 있는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고, 말 그대로 감독들끼리의 '구두 약속'이었다.
감독들끼리 '담합'에 의해 이적한 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격분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클럽팀에서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즐긴 A와 B 군은 지난해 다른 클럽팀으로 옮겼고, 이 '담합 규정'에 따라 대회 출전이 막힌 것이다.
더구나 해당 학부모가 더욱 반발한 이유는 이 두 선수가 정식으로 이적 동의서까지 받아 팀을 옮겼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팀을 옮길 때 절차대로 이적 동의서까지 받고 현 소속팀으로 옮겼어요.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했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정식으로 선수 등록도 되어있고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들끼리 약속했다면서 아이들을 뛰게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결국, 피해 선수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과 해당 체육회에 항의했고, KBS의 취재가 들어가자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가 뒤늦게 조치를 위한 것이다. 그것도 대회 개막 하루를 앞두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뒤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아이스하키협회는 적극적 대응보다 형식적 중재에 그쳐 더욱 비판을 받았다. 대회 참가 감독들끼리 구두 약속을 근거로 대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협회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KBS 취재에 응한 협회의 한 관계자는 "저희가 누구를 데리고 나와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두 팀의 문제인 거고 어쨌든 우리 협회는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서 양쪽에 다 이렇게 하는 거에요. 협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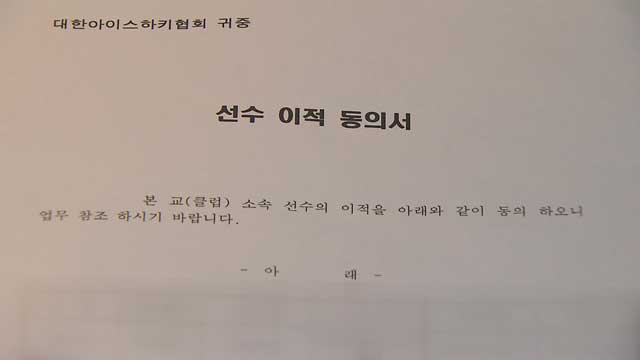
이번 사태를 야기한 아이스하키 지도자들도 할 말은 있다. 아이스하키라는 비인기 종목의 열악한 환경 탓이라는 것이다. 만약 선수 이적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가뜩이나 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팀이 해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지도자들끼리 선수의 이적을 '해 주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말자'는 암묵적 관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부산시장배 대회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지도자는 "저변이 약한 스포츠 종목의 경우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사실 한 지역에 팀이 2~3개밖에 없어요. 감독들끼리 사실상 다들 서로 서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아이스하키는 단체 종목인데 잘 운영되던 팀에서 몇 명이 빠져버리면 당장 팀을 못 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팀과 경기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안되는 거죠. 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선수 저변이 얇아 팀 구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 그저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대회에 나가려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받은 상처는 이미 회복할 수 없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행, 암묵적 담합에 대해 이제는 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합 체육 시대에 스포츠 클럽과 기존 학교 운동부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학생 선수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

박주미 기자 jjum@kbs.co.kr
박주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경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혐의 47억 원 추가 확인](/data/news/2025/07/02/20250702_RyG3im.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