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확인 않고 처방해 환자 사망…병원 경영진도 배상”
입력 2019.08.27 (17:48)
수정 2019.08.27 (1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 약물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는 물론, 병원 경영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2부는 주사제 부작용으로 숨진 53살 A 씨의 유족이 충북 보은군의 한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이 유족에게 2억 3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심근경색 치료제를 복용해 특정 약물(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에 부작용이 있던 A 씨는 2016년 11월 발목을 다쳐 보은군의 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근처 약국으로 간 A 씨는 평소 약물명(디클로페낙)을 적어 다니던 쪽지를 약사에게 보여주며 성분을 직접 묻는 과정에서 처방 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사제 성분도 급히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이며 2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A 씨의 사인이 사전에 알고 있던 이 과민반응 약물에 의한 쇼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진료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병사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당시 A 씨가 과거 병력이나 투약력 등을 묻는 의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평소 앓던 질환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이전 진료 전산 기록에 참고사항으로 부작용 약물에 대해 기록돼 있고, 약국에서 스스로 처방 약의 성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A 씨가 문진 과정에서 답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진료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사전 문진표 작성과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병원을 함께 간 보호자나 A 씨에게 의사는 처방한 주사제와 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도 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를 갖추지 않아 안타까운 희생을 냈다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 의료재단의 책임 범위를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랫동안 심근경색 치료제를 복용해 특정 약물(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에 부작용이 있던 A 씨는 2016년 11월 발목을 다쳐 보은군의 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근처 약국으로 간 A 씨는 평소 약물명(디클로페낙)을 적어 다니던 쪽지를 약사에게 보여주며 성분을 직접 묻는 과정에서 처방 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사제 성분도 급히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이며 2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A 씨의 사인이 사전에 알고 있던 이 과민반응 약물에 의한 쇼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진료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병사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당시 A 씨가 과거 병력이나 투약력 등을 묻는 의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평소 앓던 질환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이전 진료 전산 기록에 참고사항으로 부작용 약물에 대해 기록돼 있고, 약국에서 스스로 처방 약의 성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A 씨가 문진 과정에서 답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진료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사전 문진표 작성과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병원을 함께 간 보호자나 A 씨에게 의사는 처방한 주사제와 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도 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를 갖추지 않아 안타까운 희생을 냈다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 의료재단의 책임 범위를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작용 확인 않고 처방해 환자 사망…병원 경영진도 배상”
-
- 입력 2019-08-27 17:48:47
- 수정2019-08-27 17:49:18

부작용 약물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는 물론, 병원 경영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2부는 주사제 부작용으로 숨진 53살 A 씨의 유족이 충북 보은군의 한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이 유족에게 2억 3천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심근경색 치료제를 복용해 특정 약물(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에 부작용이 있던 A 씨는 2016년 11월 발목을 다쳐 보은군의 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근처 약국으로 간 A 씨는 평소 약물명(디클로페낙)을 적어 다니던 쪽지를 약사에게 보여주며 성분을 직접 묻는 과정에서 처방 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사제 성분도 급히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이며 2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A 씨의 사인이 사전에 알고 있던 이 과민반응 약물에 의한 쇼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진료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병사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당시 A 씨가 과거 병력이나 투약력 등을 묻는 의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평소 앓던 질환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이전 진료 전산 기록에 참고사항으로 부작용 약물에 대해 기록돼 있고, 약국에서 스스로 처방 약의 성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A 씨가 문진 과정에서 답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진료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사전 문진표 작성과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병원을 함께 간 보호자나 A 씨에게 의사는 처방한 주사제와 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도 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를 갖추지 않아 안타까운 희생을 냈다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 의료재단의 책임 범위를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랫동안 심근경색 치료제를 복용해 특정 약물(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에 부작용이 있던 A 씨는 2016년 11월 발목을 다쳐 보은군의 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근처 약국으로 간 A 씨는 평소 약물명(디클로페낙)을 적어 다니던 쪽지를 약사에게 보여주며 성분을 직접 묻는 과정에서 처방 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사제 성분도 급히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이며 2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A 씨의 사인이 사전에 알고 있던 이 과민반응 약물에 의한 쇼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진료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병사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당시 A 씨가 과거 병력이나 투약력 등을 묻는 의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평소 앓던 질환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이전 진료 전산 기록에 참고사항으로 부작용 약물에 대해 기록돼 있고, 약국에서 스스로 처방 약의 성분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A 씨가 문진 과정에서 답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진료 의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며, 사전 문진표 작성과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 경영진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병원을 함께 간 보호자나 A 씨에게 의사는 처방한 주사제와 약에 대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도 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를 갖추지 않아 안타까운 희생을 냈다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병원 의료재단의 책임 범위를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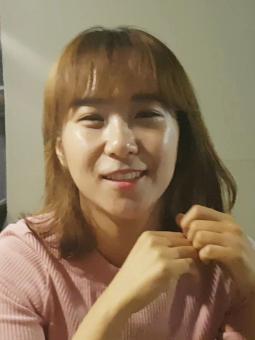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진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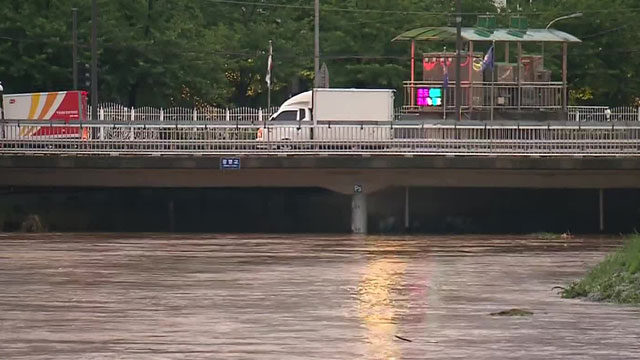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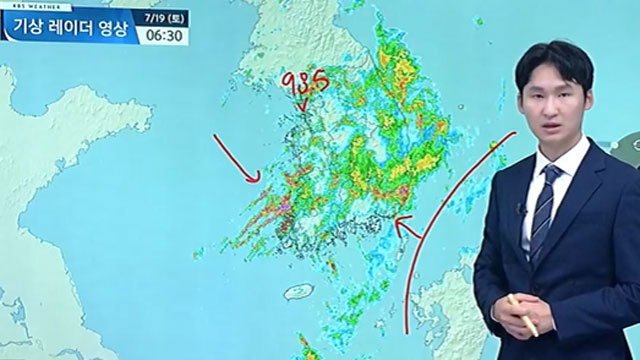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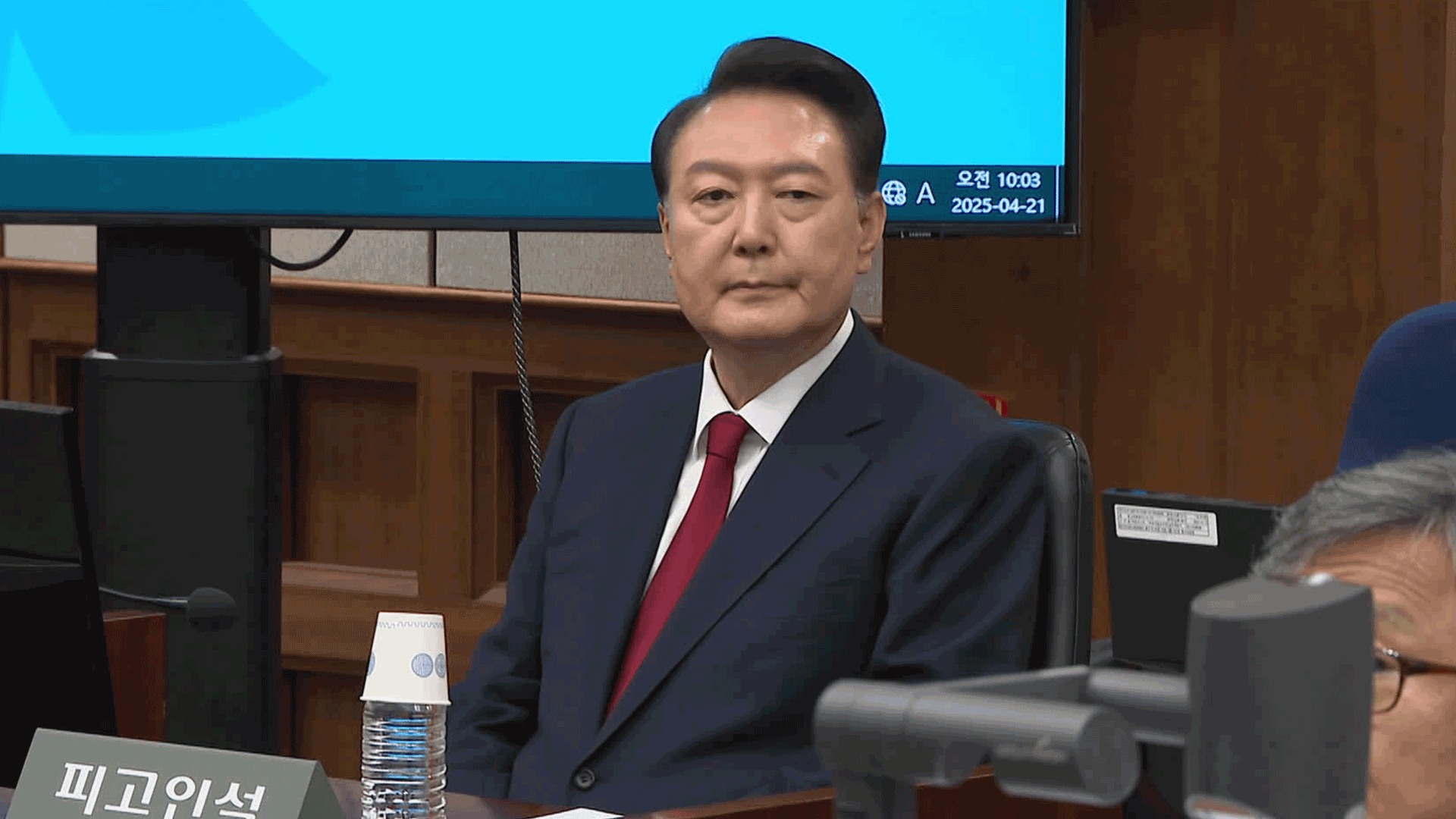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