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늦은 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 나선 부모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아응급실인데요.
저출산 여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계 실태를
취재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1]
안승길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응급실,
현재 어떤 상황인 겁니까?
[답변1]
전북대병원 응급실은
국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격을 잃었다가
지난해 12월 재지정됐죠.
현재 응급의료센터에는
일반 성인 환자와 공간을 분리한
소아 전용 응급실이
5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4만여 명 가운데
소아 환자는 10분의 1을 넘는
4천5백 명가량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몰리는
소아 환자를 돌보기 벅찬 상황에서,
전공의 충원도 어려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병원 측은
중증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응급실을 찾는
경증 소아 환자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 환자가 밀릴 경우 되도록
주변 병원을 찾아달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문2]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북대병원 소아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2]
지역 대표 의료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요.
소아 환자의 경우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부모가 퇴근한 뒤나 주말에
긴급히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소아응급실밖에 없다 보니
환자가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아응급실이 있는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천14년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북에는 두 곳에 불과하고,
도심에 몰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안감이 큰 부모들이
결국, 소아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어
과밀화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3]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답변3]
지난해 2월 1일
의료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바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 차 전공의였던
고 신형록 씨가
당직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일입니다.
주당 백 시간 안팎의
과로에 시달렸고,
결국,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간 근무와
소아응급실 당직 등을 오가다 보니
장시간 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현실인데요.
지난 2천16년 제정된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 시간이
주당 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일을 맡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전북대병원처럼
신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한 곳은
당직 인력 운용이
한계에 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4]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청년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꺼리면서
병원마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인력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4]
이른바 피·안·성이라 불리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대표되는 인기과로
인력이 쏠리고
힘든 전공을 꺼리는 현상은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결국 청년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데요.
힘겨운 수련 과정을 마치더라도
전문의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고
병원을 개업한 뒤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단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명확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인데요.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열 명 안팎의 전공의를 충원했지만,
지역 병원들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질문5]
저출산 문제를
주요 과제로 안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답변5]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5곳에 불과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수가 혜택과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10곳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 방안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소아 의료진 확보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핵심축인 만큼
현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떠나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과 함께
촘촘한 소아 의료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그렇다면
현재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주요 병원의 대책은
있는 건가요?
[답변6]
전공의 확보에 실패한 예수병원은
소아응급실 전담의 3명을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역시
전담의 5명을 뽑을 계획인데요.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이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늦은 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 나선 부모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아응급실인데요.
저출산 여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계 실태를
취재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1]
안승길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응급실,
현재 어떤 상황인 겁니까?
[답변1]
전북대병원 응급실은
국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격을 잃었다가
지난해 12월 재지정됐죠.
현재 응급의료센터에는
일반 성인 환자와 공간을 분리한
소아 전용 응급실이
5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4만여 명 가운데
소아 환자는 10분의 1을 넘는
4천5백 명가량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몰리는
소아 환자를 돌보기 벅찬 상황에서,
전공의 충원도 어려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병원 측은
중증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응급실을 찾는
경증 소아 환자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 환자가 밀릴 경우 되도록
주변 병원을 찾아달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문2]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북대병원 소아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2]
지역 대표 의료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요.
소아 환자의 경우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부모가 퇴근한 뒤나 주말에
긴급히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소아응급실밖에 없다 보니
환자가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아응급실이 있는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천14년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북에는 두 곳에 불과하고,
도심에 몰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안감이 큰 부모들이
결국, 소아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어
과밀화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3]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답변3]
지난해 2월 1일
의료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바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 차 전공의였던
고 신형록 씨가
당직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일입니다.
주당 백 시간 안팎의
과로에 시달렸고,
결국,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간 근무와
소아응급실 당직 등을 오가다 보니
장시간 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현실인데요.
지난 2천16년 제정된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 시간이
주당 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일을 맡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전북대병원처럼
신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한 곳은
당직 인력 운용이
한계에 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4]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청년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꺼리면서
병원마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인력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4]
이른바 피·안·성이라 불리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대표되는 인기과로
인력이 쏠리고
힘든 전공을 꺼리는 현상은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결국 청년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데요.
힘겨운 수련 과정을 마치더라도
전문의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고
병원을 개업한 뒤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단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명확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인데요.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열 명 안팎의 전공의를 충원했지만,
지역 병원들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질문5]
저출산 문제를
주요 과제로 안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답변5]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5곳에 불과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수가 혜택과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10곳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 방안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소아 의료진 확보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핵심축인 만큼
현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떠나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과 함께
촘촘한 소아 의료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그렇다면
현재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주요 병원의 대책은
있는 건가요?
[답변6]
전공의 확보에 실패한 예수병원은
소아응급실 전담의 3명을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역시
전담의 5명을 뽑을 계획인데요.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이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길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섹션뉴스 기자 Q&A)의사 수급 비상..위기의 소아응급실
-
- 입력 2020-02-12 23:40:23
[앵커멘트]
늦은 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 나선 부모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아응급실인데요.
저출산 여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계 실태를
취재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1]
안승길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응급실,
현재 어떤 상황인 겁니까?
[답변1]
전북대병원 응급실은
국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격을 잃었다가
지난해 12월 재지정됐죠.
현재 응급의료센터에는
일반 성인 환자와 공간을 분리한
소아 전용 응급실이
5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4만여 명 가운데
소아 환자는 10분의 1을 넘는
4천5백 명가량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몰리는
소아 환자를 돌보기 벅찬 상황에서,
전공의 충원도 어려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병원 측은
중증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응급실을 찾는
경증 소아 환자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 환자가 밀릴 경우 되도록
주변 병원을 찾아달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문2]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북대병원 소아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2]
지역 대표 의료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요.
소아 환자의 경우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부모가 퇴근한 뒤나 주말에
긴급히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소아응급실밖에 없다 보니
환자가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아응급실이 있는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천14년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북에는 두 곳에 불과하고,
도심에 몰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안감이 큰 부모들이
결국, 소아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어
과밀화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3]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답변3]
지난해 2월 1일
의료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바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 차 전공의였던
고 신형록 씨가
당직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일입니다.
주당 백 시간 안팎의
과로에 시달렸고,
결국,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간 근무와
소아응급실 당직 등을 오가다 보니
장시간 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현실인데요.
지난 2천16년 제정된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 시간이
주당 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일을 맡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전북대병원처럼
신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한 곳은
당직 인력 운용이
한계에 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4]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청년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꺼리면서
병원마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인력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4]
이른바 피·안·성이라 불리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대표되는 인기과로
인력이 쏠리고
힘든 전공을 꺼리는 현상은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결국 청년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데요.
힘겨운 수련 과정을 마치더라도
전문의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고
병원을 개업한 뒤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단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명확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인데요.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열 명 안팎의 전공의를 충원했지만,
지역 병원들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질문5]
저출산 문제를
주요 과제로 안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답변5]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5곳에 불과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수가 혜택과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10곳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 방안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소아 의료진 확보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핵심축인 만큼
현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떠나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과 함께
촘촘한 소아 의료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그렇다면
현재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주요 병원의 대책은
있는 건가요?
[답변6]
전공의 확보에 실패한 예수병원은
소아응급실 전담의 3명을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역시
전담의 5명을 뽑을 계획인데요.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이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늦은 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 나선 부모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아응급실인데요.
저출산 여파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계 실태를
취재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1]
안승길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응급실,
현재 어떤 상황인 겁니까?
[답변1]
전북대병원 응급실은
국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자격을 잃었다가
지난해 12월 재지정됐죠.
현재 응급의료센터에는
일반 성인 환자와 공간을 분리한
소아 전용 응급실이
5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4만여 명 가운데
소아 환자는 10분의 1을 넘는
4천5백 명가량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몰리는
소아 환자를 돌보기 벅찬 상황에서,
전공의 충원도 어려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병원 측은
중증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게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응급실을 찾는
경증 소아 환자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 환자가 밀릴 경우 되도록
주변 병원을 찾아달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질문2]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북대병원 소아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2]
지역 대표 의료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요.
소아 환자의 경우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는 추세에
부모가 퇴근한 뒤나 주말에
긴급히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소아응급실밖에 없다 보니
환자가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아응급실이 있는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천14년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북에는 두 곳에 불과하고,
도심에 몰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안감이 큰 부모들이
결국, 소아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어
과밀화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3]
응급실에서 소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답변3]
지난해 2월 1일
의료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바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 차 전공의였던
고 신형록 씨가
당직실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일입니다.
주당 백 시간 안팎의
과로에 시달렸고,
결국,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간 근무와
소아응급실 당직 등을 오가다 보니
장시간 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현실인데요.
지난 2천16년 제정된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수련 시간이
주당 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일을 맡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전북대병원처럼
신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한 곳은
당직 인력 운용이
한계에 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4]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청년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를 꺼리면서
병원마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인력난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4]
이른바 피·안·성이라 불리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대표되는 인기과로
인력이 쏠리고
힘든 전공을 꺼리는 현상은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결국 청년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데요.
힘겨운 수련 과정을 마치더라도
전문의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고
병원을 개업한 뒤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을 비롯해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단 한 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명확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인데요.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열 명 안팎의 전공의를 충원했지만,
지역 병원들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질문5]
저출산 문제를
주요 과제로 안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답변5]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5곳에 불과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수가 혜택과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10곳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 방안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소아 의료진 확보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핵심축인 만큼
현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떠나
의료기관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병원의 노력과 함께
촘촘한 소아 의료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
그렇다면
현재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주요 병원의 대책은
있는 건가요?
[답변6]
전공의 확보에 실패한 예수병원은
소아응급실 전담의 3명을
자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역시
전담의 5명을 뽑을 계획인데요.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이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승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속보] 이 대통령 “주택 투기 수단되며 주거 불안정 <br>초래”](/data/news/2025/07/01/20250701_NWBMR4.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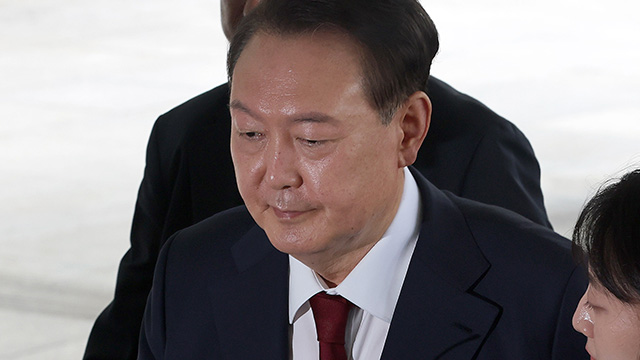
![[영상] 정성호 “검찰 해체 표현 적절치 않아…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data/fckeditor/vod/2025/07/01/305901751367182615.pn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