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제조업 생산능력 2년 연속 감소…고용 악화 우려”
입력 2020.08.24 (12:38)
수정 2020.08.24 (12: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이 나빠지면서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와 인력, 노동시간 등 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실적을 말합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지난 2017년 103.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2018년 103.0, 지난해 102.9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였습니다.
이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4.7%의 7분의 1 수준, 직전 5년인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2.2%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고용친화형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생산액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중에서 2015년보다 지난해 생산능력이 1% 이상 향상된 업종은 전자부품(20.1%), 화학(8.0%) 등 5개였습니다.
생산능력이 1% 이상 감소한 업종은 고무·플라스틱과 금속·가공으로 각각 3.6%, 8.5% 줄었습니다.
2015년 수준을 유지한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3개였습니다.
이들 업종의 2018년 기준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보면, 생산능력이 상승한 5개 업종의 비중이 55.1%로 절반 이상이었고, 생산능력이 정체한 3개 업종과 하락한 2개 업종의 비중은 각각 34.1%, 10.8%였습니다.
10대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능력이 정체하거나, 하락한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능력이 상승한 업종은 국내 고용 비중이 39.7%, 정체한 업종은 35.2%, 하락한 업종은 25.1%였습니다.
한경연은 "고용인원 비중이 높은 5개 업종 가운데 전자부품을 제외한 4개 업종(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일자리 해외 유출 등 고용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경연이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 업종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제조업 가운데 생산능력지수 감소폭이 8.5%로 가장 컸던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2018년 해외 종업원 수는 2015년보다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국내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3.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이 재편되면서 전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 자국 복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관련 규제 개선,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제조업 경영환경의 비교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와 인력, 노동시간 등 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실적을 말합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지난 2017년 103.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2018년 103.0, 지난해 102.9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였습니다.
이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4.7%의 7분의 1 수준, 직전 5년인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2.2%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고용친화형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생산액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중에서 2015년보다 지난해 생산능력이 1% 이상 향상된 업종은 전자부품(20.1%), 화학(8.0%) 등 5개였습니다.
생산능력이 1% 이상 감소한 업종은 고무·플라스틱과 금속·가공으로 각각 3.6%, 8.5% 줄었습니다.
2015년 수준을 유지한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3개였습니다.
이들 업종의 2018년 기준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보면, 생산능력이 상승한 5개 업종의 비중이 55.1%로 절반 이상이었고, 생산능력이 정체한 3개 업종과 하락한 2개 업종의 비중은 각각 34.1%, 10.8%였습니다.
10대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능력이 정체하거나, 하락한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능력이 상승한 업종은 국내 고용 비중이 39.7%, 정체한 업종은 35.2%, 하락한 업종은 25.1%였습니다.
한경연은 "고용인원 비중이 높은 5개 업종 가운데 전자부품을 제외한 4개 업종(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일자리 해외 유출 등 고용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경연이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 업종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제조업 가운데 생산능력지수 감소폭이 8.5%로 가장 컸던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2018년 해외 종업원 수는 2015년보다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국내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3.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이 재편되면서 전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 자국 복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관련 규제 개선,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제조업 경영환경의 비교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경연 “제조업 생산능력 2년 연속 감소…고용 악화 우려”
-
- 입력 2020-08-24 12:38:32
- 수정2020-08-24 12:47:47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이 나빠지면서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와 인력, 노동시간 등 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실적을 말합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지난 2017년 103.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2018년 103.0, 지난해 102.9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였습니다.
이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4.7%의 7분의 1 수준, 직전 5년인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2.2%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고용친화형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생산액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중에서 2015년보다 지난해 생산능력이 1% 이상 향상된 업종은 전자부품(20.1%), 화학(8.0%) 등 5개였습니다.
생산능력이 1% 이상 감소한 업종은 고무·플라스틱과 금속·가공으로 각각 3.6%, 8.5% 줄었습니다.
2015년 수준을 유지한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3개였습니다.
이들 업종의 2018년 기준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보면, 생산능력이 상승한 5개 업종의 비중이 55.1%로 절반 이상이었고, 생산능력이 정체한 3개 업종과 하락한 2개 업종의 비중은 각각 34.1%, 10.8%였습니다.
10대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능력이 정체하거나, 하락한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능력이 상승한 업종은 국내 고용 비중이 39.7%, 정체한 업종은 35.2%, 하락한 업종은 25.1%였습니다.
한경연은 "고용인원 비중이 높은 5개 업종 가운데 전자부품을 제외한 4개 업종(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일자리 해외 유출 등 고용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경연이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 업종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제조업 가운데 생산능력지수 감소폭이 8.5%로 가장 컸던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2018년 해외 종업원 수는 2015년보다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국내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3.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이 재편되면서 전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 자국 복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관련 규제 개선,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제조업 경영환경의 비교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와 인력, 노동시간 등 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실적을 말합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지난 2017년 103.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2018년 103.0, 지난해 102.9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였습니다.
이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4.7%의 7분의 1 수준, 직전 5년인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2.2%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고용친화형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생산액 기준 상위 10대 제조업 중에서 2015년보다 지난해 생산능력이 1% 이상 향상된 업종은 전자부품(20.1%), 화학(8.0%) 등 5개였습니다.
생산능력이 1% 이상 감소한 업종은 고무·플라스틱과 금속·가공으로 각각 3.6%, 8.5% 줄었습니다.
2015년 수준을 유지한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3개였습니다.
이들 업종의 2018년 기준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보면, 생산능력이 상승한 5개 업종의 비중이 55.1%로 절반 이상이었고, 생산능력이 정체한 3개 업종과 하락한 2개 업종의 비중은 각각 34.1%, 10.8%였습니다.
10대 제조업의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능력이 정체하거나, 하락한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능력이 상승한 업종은 국내 고용 비중이 39.7%, 정체한 업종은 35.2%, 하락한 업종은 25.1%였습니다.
한경연은 "고용인원 비중이 높은 5개 업종 가운데 전자부품을 제외한 4개 업종(기타 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의 생산능력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일자리 해외 유출 등 고용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경연이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지법인 업종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제조업 가운데 생산능력지수 감소폭이 8.5%로 가장 컸던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2018년 해외 종업원 수는 2015년보다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국내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3.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이 재편되면서 전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 자국 복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관련 규제 개선,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제조업 경영환경의 비교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최준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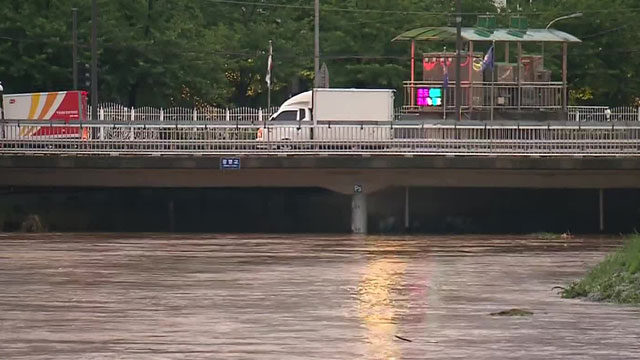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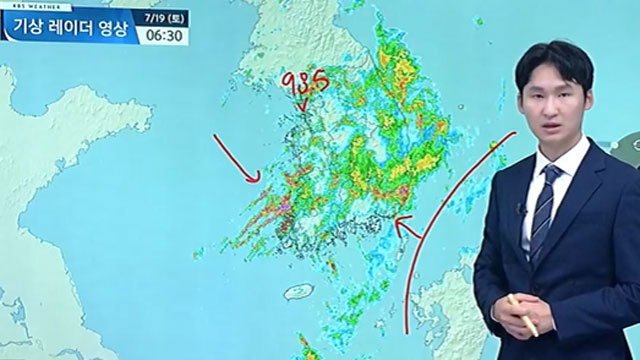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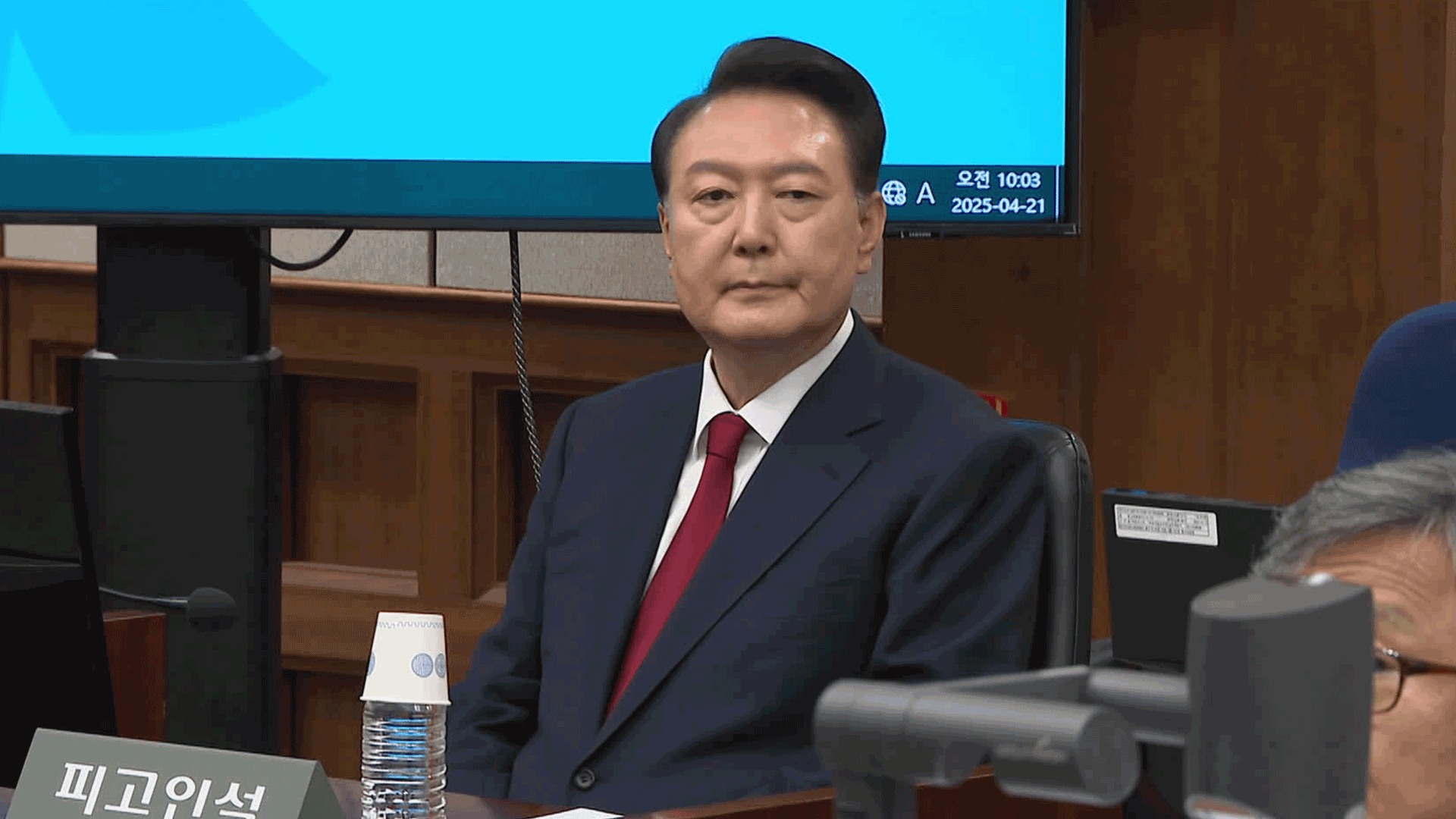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