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 세계에서 각광…정작 국내에선 명맥 유지만
입력 2020.10.09 (21:49)
수정 2020.10.09 (2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통 종이인 한지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선, 쓰임새가 갈수록 줄면서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컴컴한 작업장, 장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닥나무 껍질을 삶고, 세척하고, 표백한 뒤 저어주고, 종이를 뜨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지 1장 나오기까지 손이 백 번 간다고 해서, 한지를 '백지'라고도 합니다.
[장응열/한지장 : "염색을 해서 뜨면 색한지가 나오고, 하얀 걸 그냥 뜨면 흰 종이가 나옵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건조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한지의 우수성, 문화강국에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한지가 문화재 복원용 용지로 적합하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부텁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한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엔 일본 종이인 화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김민중/전 루브르 박물관 복원사 : "(한지는) 높은 영구성이 있고요. 견고한 부분도 있으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치수 안정성이란 부분들이 복원에선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지난 8월 전주 한지를 문화재 복원 용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처럼 한지가 세계에서 각광받을 정도로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사양길이라 할 만큼 어둡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20여 곳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문풍지나 벽지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공예와 서예에 쓰일 뿐 판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장응열/한지장 :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한지의 질도 높이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지류 문화재는 위대한 종이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한지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쓰임새가 더 확장돼야 '한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강정희
전통 종이인 한지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선, 쓰임새가 갈수록 줄면서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컴컴한 작업장, 장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닥나무 껍질을 삶고, 세척하고, 표백한 뒤 저어주고, 종이를 뜨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지 1장 나오기까지 손이 백 번 간다고 해서, 한지를 '백지'라고도 합니다.
[장응열/한지장 : "염색을 해서 뜨면 색한지가 나오고, 하얀 걸 그냥 뜨면 흰 종이가 나옵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건조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한지의 우수성, 문화강국에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한지가 문화재 복원용 용지로 적합하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부텁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한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엔 일본 종이인 화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김민중/전 루브르 박물관 복원사 : "(한지는) 높은 영구성이 있고요. 견고한 부분도 있으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치수 안정성이란 부분들이 복원에선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지난 8월 전주 한지를 문화재 복원 용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처럼 한지가 세계에서 각광받을 정도로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사양길이라 할 만큼 어둡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20여 곳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문풍지나 벽지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공예와 서예에 쓰일 뿐 판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장응열/한지장 :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한지의 질도 높이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지류 문화재는 위대한 종이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한지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쓰임새가 더 확장돼야 '한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지’ 세계에서 각광…정작 국내에선 명맥 유지만
-
- 입력 2020-10-09 21:49:10
- 수정2020-10-09 22:57:27

[앵커]
전통 종이인 한지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선, 쓰임새가 갈수록 줄면서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컴컴한 작업장, 장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닥나무 껍질을 삶고, 세척하고, 표백한 뒤 저어주고, 종이를 뜨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지 1장 나오기까지 손이 백 번 간다고 해서, 한지를 '백지'라고도 합니다.
[장응열/한지장 : "염색을 해서 뜨면 색한지가 나오고, 하얀 걸 그냥 뜨면 흰 종이가 나옵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건조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한지의 우수성, 문화강국에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한지가 문화재 복원용 용지로 적합하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부텁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한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엔 일본 종이인 화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김민중/전 루브르 박물관 복원사 : "(한지는) 높은 영구성이 있고요. 견고한 부분도 있으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치수 안정성이란 부분들이 복원에선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지난 8월 전주 한지를 문화재 복원 용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처럼 한지가 세계에서 각광받을 정도로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사양길이라 할 만큼 어둡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20여 곳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문풍지나 벽지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공예와 서예에 쓰일 뿐 판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장응열/한지장 :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한지의 질도 높이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지류 문화재는 위대한 종이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한지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쓰임새가 더 확장돼야 '한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강정희
전통 종이인 한지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선, 쓰임새가 갈수록 줄면서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두컴컴한 작업장, 장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닥나무 껍질을 삶고, 세척하고, 표백한 뒤 저어주고, 종이를 뜨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지 1장 나오기까지 손이 백 번 간다고 해서, 한지를 '백지'라고도 합니다.
[장응열/한지장 : "염색을 해서 뜨면 색한지가 나오고, 하얀 걸 그냥 뜨면 흰 종이가 나옵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건조를 하면 완성이 됩니다."]
한지의 우수성, 문화강국에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한지가 문화재 복원용 용지로 적합하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부텁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한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전엔 일본 종이인 화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김민중/전 루브르 박물관 복원사 : "(한지는) 높은 영구성이 있고요. 견고한 부분도 있으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치수 안정성이란 부분들이 복원에선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지난 8월 전주 한지를 문화재 복원 용지로 공식 인증했습니다.
이처럼 한지가 세계에서 각광받을 정도로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사양길이라 할 만큼 어둡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곳은 전국에 20여 곳만 남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과거에는 문풍지나 벽지로도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공예와 서예에 쓰일 뿐 판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장응열/한지장 :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한지의 질도 높이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지류 문화재는 위대한 종이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에서 한지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쓰임새가 더 확장돼야 '한지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강정희
-
-

선재희 기자 ana@kbs.co.kr
선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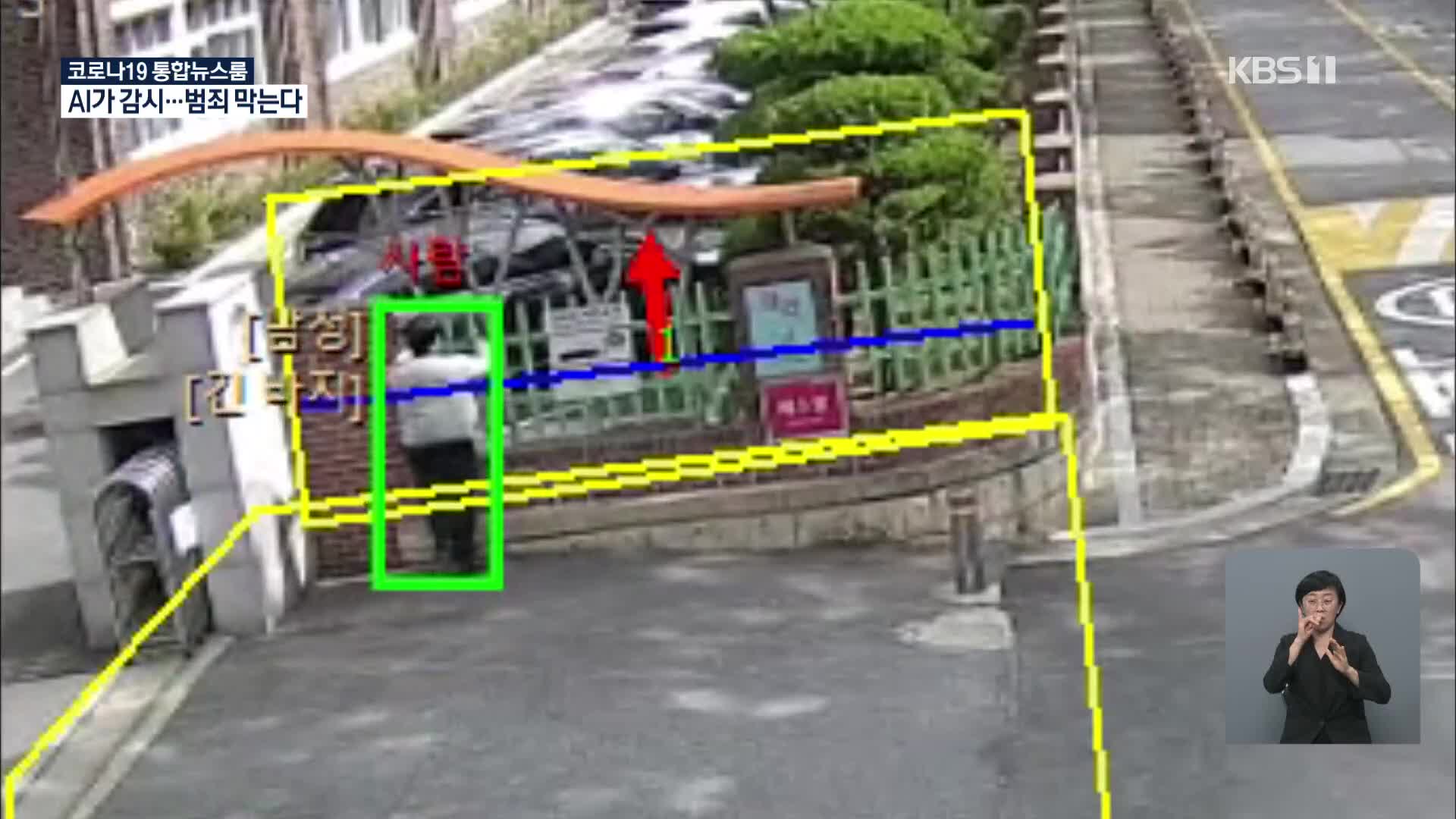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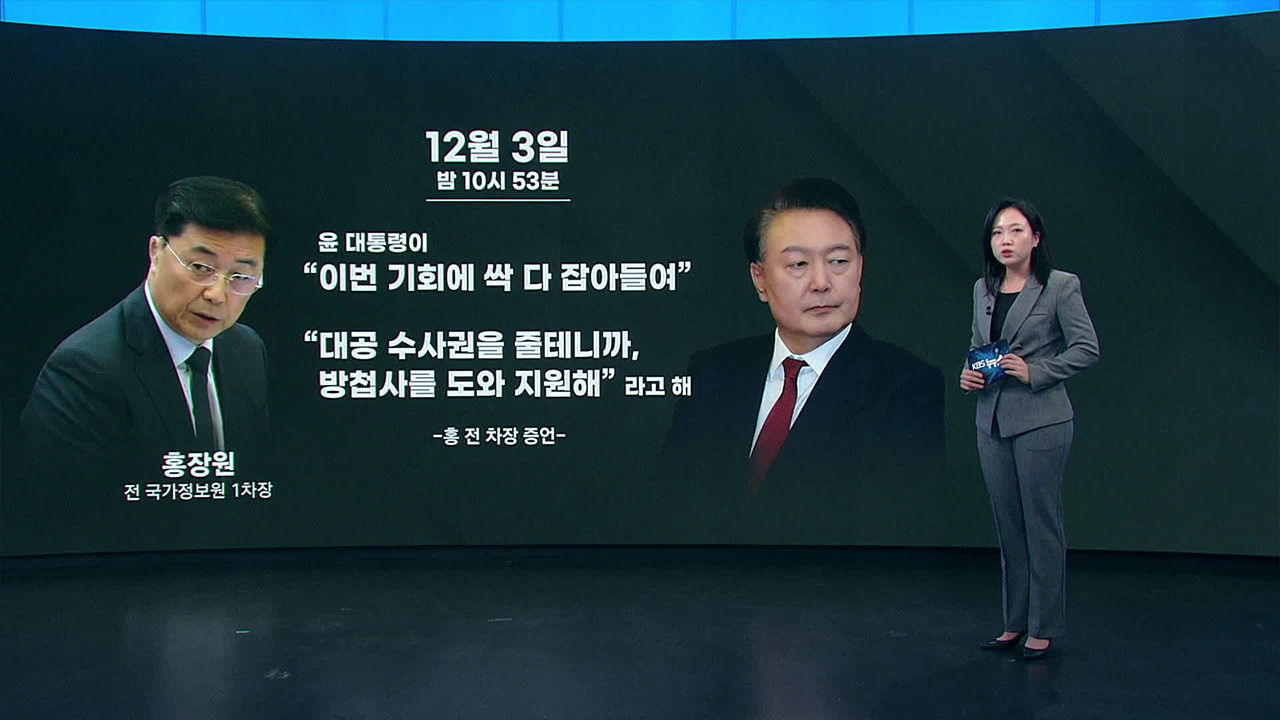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