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의 유언 지키려 매일 구청에 전화한 친구
입력 2021.02.24 (09:00)
수정 2021.02.24 (15: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나를 물에다 띄워 줘, 강에다 띄워 줘, 바다에 띄워 줘'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주 쉽게 '알았어, 그래'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모명상 씨는 지난해 40년 지기를 대장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자녀 등과 사실상 연락을 끊었지만 모 씨와는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안 것도,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해 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요양 병원에 함께 간 것도 모 씨입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음식을 챙겨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정오쯤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가 입원해있는 요양 병원이었습니다. 모 씨는 "아무래도 친구가 사망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달려갔더니 막 숨을 멎었더라고요. 제가 친구 이름을 부르며 '나 왔어. 편안히 가'라고 했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모 씨는 '물에 뿌려달라'는 친구의 마지막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까지 수차례 이야기 할 정도로 간곡했던 그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조차 바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가족 대신 장례' 가능해졌지만...한계 여전
기존에는 수십 년 함께 산 사람이라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행정기관이 연고자가 돼 화장하거나 공영장례를 하면, 가족 아닌 사람들은 이 장례에 참석하는 데 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020년 장사 업무 안내'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사실혼 관계나 친구 등 삶의 동반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장사법상 연고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확인한 뒤 고인이 '무연고자'가 돼야 가족이 아닌 사람도 연고자(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가족'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묻고 답을 받기까지만 최대 14일 걸리는 데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시신을 장례식장 냉동고에 보관한 채 속절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 씨는 친구가 숨진 이후 매일 아침 9시 출근 시간에 맞춰 구청과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 씨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냐 계속 물었죠"라며 "친구가 장례식장 냉동실에 있었는데 혹시 아무렇게나 해서 버렸을까 봐 '우리 친구 있습니까'도 확인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 씨는 "저는 친구와의 약속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하니까 서류를 여러 가지 해오라고 하더라고요"라며 "그거를 다 해다 줬는데도 기다리는 과정이 길더라고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친구가 세상을 떠난 지 19일 만에야 겨우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구가 그토록 원했던 해양장(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도 했습니다.

모 씨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걸렸을 것 같아요"라며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내가 장례를 하겠다'하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해주고 뜸을 들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전문가 "혈연 중심 연고자 개념 바뀌어야"
지난해 말 KBS는 결혼하지 않은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상 가족' 위주의 출산 제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단계인 '장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혈연 중심의 연고자 개념을 바꾸고 생전에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연고 장례지원 비영리단체인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는 "생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기까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에서 더 길게는 한 달까지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서울시만 해도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이후 평균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상임이사는 "사망 진단서 발급이 장례 절차의 시작인데 의료법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 배우자와 직계와 형제까지다"라며 "복지부 장사 지침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률적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연고가 된 이후에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생전에 장례 주관자로 지정을 한다든지 등 법률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상임이사는 또 "일각에서는 연고자나 장례주관자로 지정되면 재산 상속도 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장례를 할 수 있는 것과 상속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법적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재산이나 빚 상속도 포기되는 게 아니라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0년 지기의 유언 지키려 매일 구청에 전화한 친구
-
- 입력 2021-02-24 09:00:19
- 수정2021-02-24 15:42:36

"세상 떠나기 전에 '나를 물에다 띄워 줘, 강에다 띄워 줘, 바다에 띄워 줘'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주 쉽게 '알았어, 그래'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모명상 씨는 지난해 40년 지기를 대장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자녀 등과 사실상 연락을 끊었지만 모 씨와는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안 것도,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해 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요양 병원에 함께 간 것도 모 씨입니다. 아프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음식을 챙겨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정오쯤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가 입원해있는 요양 병원이었습니다. 모 씨는 "아무래도 친구가 사망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달려갔더니 막 숨을 멎었더라고요. 제가 친구 이름을 부르며 '나 왔어. 편안히 가'라고 했어요."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모 씨는 '물에 뿌려달라'는 친구의 마지막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전까지 수차례 이야기 할 정도로 간곡했던 그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조차 바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가족 대신 장례' 가능해졌지만...한계 여전
기존에는 수십 년 함께 산 사람이라도 '법적 가족'이 아니면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행정기관이 연고자가 돼 화장하거나 공영장례를 하면, 가족 아닌 사람들은 이 장례에 참석하는 데 그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020년 장사 업무 안내'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사실혼 관계나 친구 등 삶의 동반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장사법상 연고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확인한 뒤 고인이 '무연고자'가 돼야 가족이 아닌 사람도 연고자(장례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 가족'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묻고 답을 받기까지만 최대 14일 걸리는 데다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시신을 장례식장 냉동고에 보관한 채 속절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 씨는 친구가 숨진 이후 매일 아침 9시 출근 시간에 맞춰 구청과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 씨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거냐 계속 물었죠"라며 "친구가 장례식장 냉동실에 있었는데 혹시 아무렇게나 해서 버렸을까 봐 '우리 친구 있습니까'도 확인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 씨는 "저는 친구와의 약속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약속을 꼭 지켜야 해요 하니까 서류를 여러 가지 해오라고 하더라고요"라며 "그거를 다 해다 줬는데도 기다리는 과정이 길더라고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친구가 세상을 떠난 지 19일 만에야 겨우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구가 그토록 원했던 해양장(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도 했습니다.

모 씨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걸렸을 것 같아요"라며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내가 장례를 하겠다'하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 해주고 뜸을 들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전문가 "혈연 중심 연고자 개념 바뀌어야"
지난해 말 KBS는 결혼하지 않은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상 가족' 위주의 출산 제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삶의 마지막 단계인 '장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혈연 중심의 연고자 개념을 바꾸고 생전에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연고 장례지원 비영리단체인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는 "생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기까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에서 더 길게는 한 달까지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서울시만 해도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이후 평균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상임이사는 "사망 진단서 발급이 장례 절차의 시작인데 의료법상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 배우자와 직계와 형제까지다"라며 "복지부 장사 지침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률적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연고가 된 이후에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생전에 장례 주관자로 지정을 한다든지 등 법률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상임이사는 또 "일각에서는 연고자나 장례주관자로 지정되면 재산 상속도 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장례를 할 수 있는 것과 상속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법적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재산이나 빚 상속도 포기되는 게 아니라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

신지수 기자 js@kbs.co.kr
신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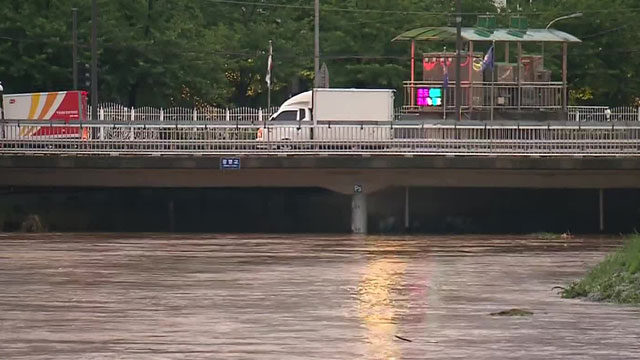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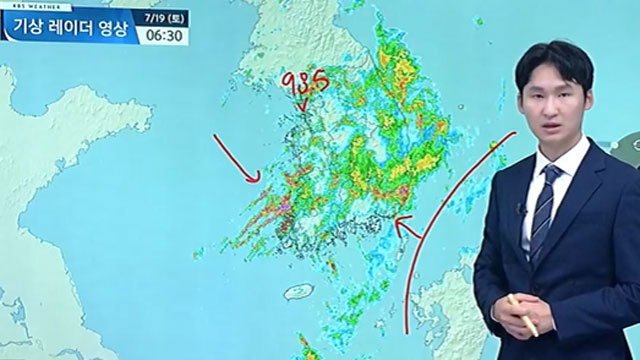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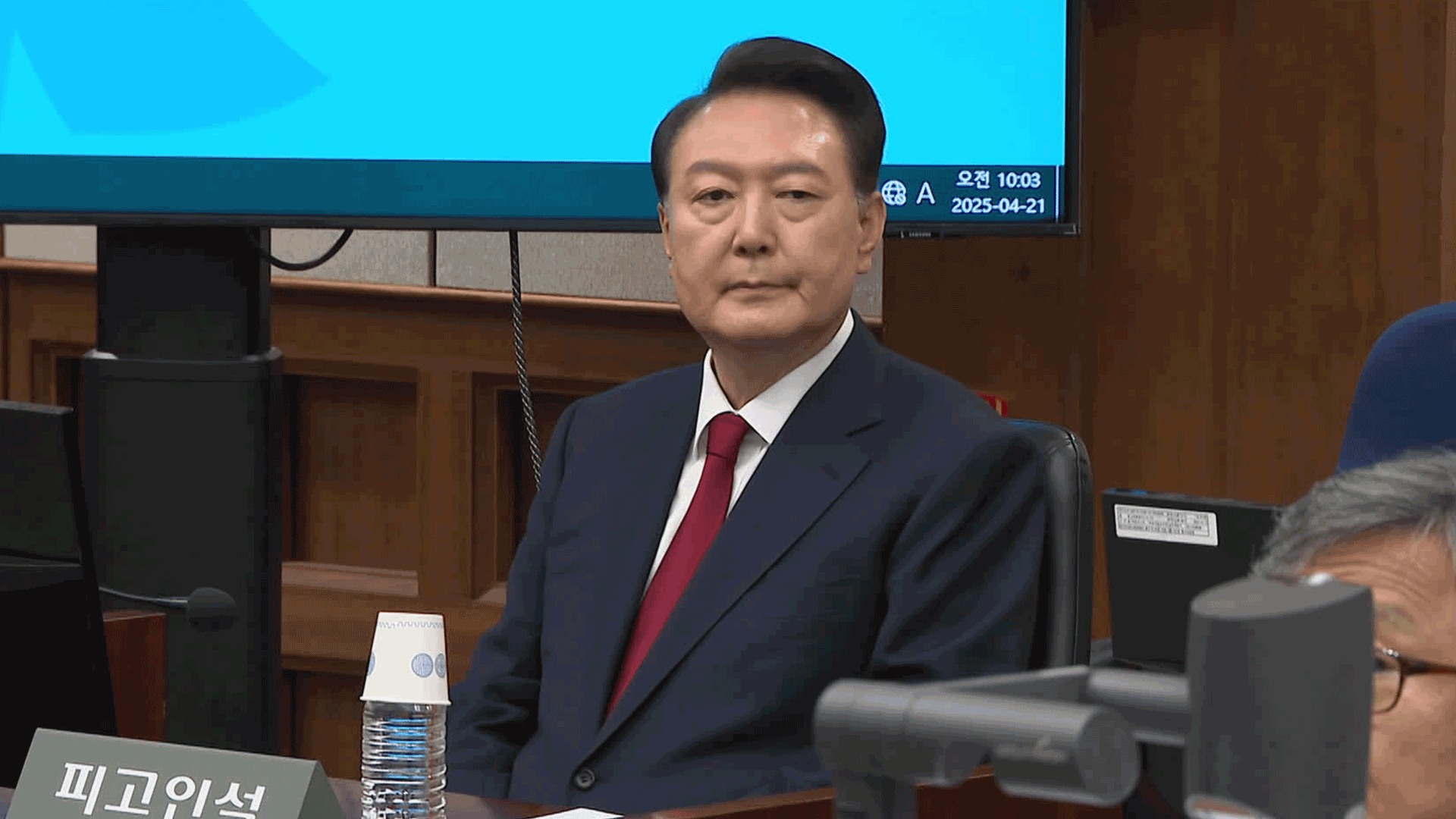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