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미얀마 100일, 쿠데타는 민주주의만 무너뜨렸을까
입력 2021.05.10 (13:42)
수정 2021.05.10 (14: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듯이, 국가나 민족에게도 기회가 찾아온다.
주택수요가 급증하던 71년, 박정희 정권은 아파트를 지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 행정부 주택부서가 중남미 국가들의 주택사업을 원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택차관을 요청했다.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지금 강남과 반포의 AID아파트다(그 아파트가 지금 2~3백만 달러에 팔리는 것을 미국사람들이 알면 어떨까).
60년대 후반 전세계로 번지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경계선의 국가에 막대한 원조를 했다. 경제발전을 통해 시장경제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69년부터 막대한 달러가 ‘차관’이나 ‘무상원조’형식으로 지원됐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야말로 우리 산업의 종잣돈이 됐다.
이렇게 빌려온 달러로 도로나 항만같은 기반시설을 짓고, 탄광을 뚫었다. 섬유와 화학공장이 들어섰다. 성과는 놀라웠다. 정부 스스로 세운 경제개발계획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성공은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전자업종이 들어서는데 발판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 ‘기회’를 잡았다.
 미얀마군이 도로에 남아있는 시위대의 핏자국을 씻어내고 있다
미얀마군이 도로에 남아있는 시위대의 핏자국을 씻어내고 있다
미얀마는 최북단으로 해발 5천미터가 넘는 만년설에 덮여있고, 남쪽으론 인도양을 낀 자원대국이다. 지구의 공장인 인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행운의 땅은 1948년 영국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88년에 첫 기회가 찾아왔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네윈정권의 1당독재에 저항했다. 이 시위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희생됐고 네윈 정권은 무너졌다. 독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오는 듯했다.
하지만 사회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첫 번째 기회는 그렇게 날아갔다. 이후 15년간 갇혀있던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풀려나고 서방의 경제재제가 풀린 2012년까지 꼬박 24년이 걸렸다.
2012년 군부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풀리자, 이 기회의 땅에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자본이 밀려왔다. 2013년 개발원조 (ODA)자금이 1년 만에 7배가 늘었다. 이후에도 해마다 수조원의 개발원조가 물밀듯 들어왔다. 이 무렵 우리 언론도 ‘개방에 나선 은둔의 나라 미얀마’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양곤에 우리 CGV가 들어선 것도 이 무렵이다)
2000년대 후반이 되자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 등이 7%씩 성장하는 미얀마경제에 본격적으로 숟가락을 얹었다. 양곤주 18개 도시를 개발하는 ‘대양곤 도시개발계획(Greater Yangon Master Plan)’에 한국 일본 등의 투자가 줄을 이었다.
최대도시 양곤에서 20분 거리에는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KMIC)도 조성됐다(이재용부회장도 이곳을 직접 찾아 투자를 검토했었다) 공장 근로자의 소득은 월 150달러로 껑충 뛰었다. 절대빈곤층은 48.2%(2005년)에서 24.8%(2017년)로 줄었다.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는 것 같았다. ‘한강의 기적’처럼 ‘양곤강의 기적’이 찾아오는 줄 알았다.
 대양곤 개발계획 조감도.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개방경제를 선언하자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대양곤 개발계획 조감도.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개방경제를 선언하자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하지만 ‘아웅 산 수 치’ 수반이 총선에서 다시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하는 바로 그날(2월 1일은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였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 이후 석달동안 군인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700여명을 죽였다. 군인들은 사람만 죽인 게 아니다. 투자와 성장의 동력도 끊어놓았다. 198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 황금의 나라는 또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당장 600여 개의 봉제공장 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계 봉제공장들이 일거리를 잃고 있다. 발주처들이 빠르게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다. 봉제업에서만 당장 40만 명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다. 여기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치솟는다. 은행과 의료서비스는 사실상 멈춰섰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하루 1.10달러 미만의 빈곤선으로 추락중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2년까지 코로나와 쿠데타로 미얀마 인구의 48%인 2,500만 명이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은 훨씬 더 크다. 코로나 이후 찾아온 무제한 발권의 시대. 세상 모든 자산가격이 치솟는다. 돈은 넘치고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시대, 쿠데타가 아니였다면 전세계는 이 아세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프론티어 마켓에 얼마를 베팅했을까.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미얀마인들이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까?
지난 10년동안 6-8%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미얀마는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오늘도 미얀마 군부는 파업에 참가한 2,233명의 대학교수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민쟌에선 15살의 9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다. 그래도 시민들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카렌반군(KNLA)나 카친반군(KIA)에 입대하는 미얀마 청년들이 늘어난다.
 어린 아들이 시위도중 죽은 아버지의 이마에 입맞추고 있다(위). 죽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안고 있는 아버지(아래).
어린 아들이 시위도중 죽은 아버지의 이마에 입맞추고 있다(위). 죽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안고 있는 아버지(아래).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불가피하게 잃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총선에서 진 뒤 사법처리가 두려워 쿠데타를 일으킨 한 늙은 군인의 선택으로 5,500만 미얀마 국민들은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할까.
미국의 원조가 시작된 69년 14.1%를 시작으로, 한국은 정말 유래없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77년 10%, 78년 10.3%, 79년 8.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한국에선 쿠데타 세력이 시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그해 한국의 성장률은 –1.9%로 뒷걸음쳤다. 이후 87년
6.10항쟁까지 한국인들은 싸우고 또 싸워 민주화를 이룩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모두 ‘민주화된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87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는 세력의 승리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2번째 기회’를 잡았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그 기회가 자주 온다면 도대체 동남아의 숱한 개발독재 국가들은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한 쿠데타 세력의 진짜 범죄는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대역죄다.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올까. 서슬 퍼런 군부의 폭력에 맞서 오늘도 미얀마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다.
 미얀마 공군의 공습을 피해 골짜기에 숨은 모자...공포에 질린 아이가 나무 뿌리를 꽉쥐고 있다(위). 한 소녀가 시위대에 수박을 나눠주고 있다(아래).
미얀마 공군의 공습을 피해 골짜기에 숨은 모자...공포에 질린 아이가 나무 뿌리를 꽉쥐고 있다(위). 한 소녀가 시위대에 수박을 나눠주고 있다(아래).
주택수요가 급증하던 71년, 박정희 정권은 아파트를 지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 행정부 주택부서가 중남미 국가들의 주택사업을 원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택차관을 요청했다.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지금 강남과 반포의 AID아파트다(그 아파트가 지금 2~3백만 달러에 팔리는 것을 미국사람들이 알면 어떨까).
60년대 후반 전세계로 번지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경계선의 국가에 막대한 원조를 했다. 경제발전을 통해 시장경제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69년부터 막대한 달러가 ‘차관’이나 ‘무상원조’형식으로 지원됐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야말로 우리 산업의 종잣돈이 됐다.
이렇게 빌려온 달러로 도로나 항만같은 기반시설을 짓고, 탄광을 뚫었다. 섬유와 화학공장이 들어섰다. 성과는 놀라웠다. 정부 스스로 세운 경제개발계획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성공은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전자업종이 들어서는데 발판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 ‘기회’를 잡았다.
 미얀마군이 도로에 남아있는 시위대의 핏자국을 씻어내고 있다
미얀마군이 도로에 남아있는 시위대의 핏자국을 씻어내고 있다미얀마는 최북단으로 해발 5천미터가 넘는 만년설에 덮여있고, 남쪽으론 인도양을 낀 자원대국이다. 지구의 공장인 인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행운의 땅은 1948년 영국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88년에 첫 기회가 찾아왔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네윈정권의 1당독재에 저항했다. 이 시위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희생됐고 네윈 정권은 무너졌다. 독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오는 듯했다.
하지만 사회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첫 번째 기회는 그렇게 날아갔다. 이후 15년간 갇혀있던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풀려나고 서방의 경제재제가 풀린 2012년까지 꼬박 24년이 걸렸다.
2012년 군부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풀리자, 이 기회의 땅에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자본이 밀려왔다. 2013년 개발원조 (ODA)자금이 1년 만에 7배가 늘었다. 이후에도 해마다 수조원의 개발원조가 물밀듯 들어왔다. 이 무렵 우리 언론도 ‘개방에 나선 은둔의 나라 미얀마’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양곤에 우리 CGV가 들어선 것도 이 무렵이다)
2000년대 후반이 되자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 등이 7%씩 성장하는 미얀마경제에 본격적으로 숟가락을 얹었다. 양곤주 18개 도시를 개발하는 ‘대양곤 도시개발계획(Greater Yangon Master Plan)’에 한국 일본 등의 투자가 줄을 이었다.
최대도시 양곤에서 20분 거리에는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KMIC)도 조성됐다(이재용부회장도 이곳을 직접 찾아 투자를 검토했었다) 공장 근로자의 소득은 월 150달러로 껑충 뛰었다. 절대빈곤층은 48.2%(2005년)에서 24.8%(2017년)로 줄었다.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는 것 같았다. ‘한강의 기적’처럼 ‘양곤강의 기적’이 찾아오는 줄 알았다.
 대양곤 개발계획 조감도.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개방경제를 선언하자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대양곤 개발계획 조감도.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개방경제를 선언하자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하지만 ‘아웅 산 수 치’ 수반이 총선에서 다시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하는 바로 그날(2월 1일은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였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 이후 석달동안 군인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700여명을 죽였다. 군인들은 사람만 죽인 게 아니다. 투자와 성장의 동력도 끊어놓았다. 198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 황금의 나라는 또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당장 600여 개의 봉제공장 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계 봉제공장들이 일거리를 잃고 있다. 발주처들이 빠르게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다. 봉제업에서만 당장 40만 명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다. 여기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치솟는다. 은행과 의료서비스는 사실상 멈춰섰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하루 1.10달러 미만의 빈곤선으로 추락중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2년까지 코로나와 쿠데타로 미얀마 인구의 48%인 2,500만 명이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은 훨씬 더 크다. 코로나 이후 찾아온 무제한 발권의 시대. 세상 모든 자산가격이 치솟는다. 돈은 넘치고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시대, 쿠데타가 아니였다면 전세계는 이 아세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프론티어 마켓에 얼마를 베팅했을까.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미얀마인들이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까?
지난 10년동안 6-8%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미얀마는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오늘도 미얀마 군부는 파업에 참가한 2,233명의 대학교수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민쟌에선 15살의 9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다. 그래도 시민들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카렌반군(KNLA)나 카친반군(KIA)에 입대하는 미얀마 청년들이 늘어난다.
 어린 아들이 시위도중 죽은 아버지의 이마에 입맞추고 있다(위). 죽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안고 있는 아버지(아래).
어린 아들이 시위도중 죽은 아버지의 이마에 입맞추고 있다(위). 죽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안고 있는 아버지(아래).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불가피하게 잃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총선에서 진 뒤 사법처리가 두려워 쿠데타를 일으킨 한 늙은 군인의 선택으로 5,500만 미얀마 국민들은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할까.
미국의 원조가 시작된 69년 14.1%를 시작으로, 한국은 정말 유래없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77년 10%, 78년 10.3%, 79년 8.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한국에선 쿠데타 세력이 시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그해 한국의 성장률은 –1.9%로 뒷걸음쳤다. 이후 87년
6.10항쟁까지 한국인들은 싸우고 또 싸워 민주화를 이룩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모두 ‘민주화된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87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는 세력의 승리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2번째 기회’를 잡았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그 기회가 자주 온다면 도대체 동남아의 숱한 개발독재 국가들은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한 쿠데타 세력의 진짜 범죄는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대역죄다.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올까. 서슬 퍼런 군부의 폭력에 맞서 오늘도 미얀마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다.
 미얀마 공군의 공습을 피해 골짜기에 숨은 모자...공포에 질린 아이가 나무 뿌리를 꽉쥐고 있다(위). 한 소녀가 시위대에 수박을 나눠주고 있다(아래).
미얀마 공군의 공습을 피해 골짜기에 숨은 모자...공포에 질린 아이가 나무 뿌리를 꽉쥐고 있다(위). 한 소녀가 시위대에 수박을 나눠주고 있다(아래).■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파원 리포트] 미얀마 100일, 쿠데타는 민주주의만 무너뜨렸을까
-
- 입력 2021-05-10 13:42:39
- 수정2021-05-10 14:14:22

사람에게도 기회가 찾아오듯이, 국가나 민족에게도 기회가 찾아온다.
주택수요가 급증하던 71년, 박정희 정권은 아파트를 지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 행정부 주택부서가 중남미 국가들의 주택사업을 원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택차관을 요청했다.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지금 강남과 반포의 AID아파트다(그 아파트가 지금 2~3백만 달러에 팔리는 것을 미국사람들이 알면 어떨까).
60년대 후반 전세계로 번지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경계선의 국가에 막대한 원조를 했다. 경제발전을 통해 시장경제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69년부터 막대한 달러가 ‘차관’이나 ‘무상원조’형식으로 지원됐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야말로 우리 산업의 종잣돈이 됐다.
이렇게 빌려온 달러로 도로나 항만같은 기반시설을 짓고, 탄광을 뚫었다. 섬유와 화학공장이 들어섰다. 성과는 놀라웠다. 정부 스스로 세운 경제개발계획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성공은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전자업종이 들어서는데 발판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 ‘기회’를 잡았다.

미얀마는 최북단으로 해발 5천미터가 넘는 만년설에 덮여있고, 남쪽으론 인도양을 낀 자원대국이다. 지구의 공장인 인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행운의 땅은 1948년 영국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88년에 첫 기회가 찾아왔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네윈정권의 1당독재에 저항했다. 이 시위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희생됐고 네윈 정권은 무너졌다. 독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오는 듯했다.
하지만 사회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첫 번째 기회는 그렇게 날아갔다. 이후 15년간 갇혀있던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풀려나고 서방의 경제재제가 풀린 2012년까지 꼬박 24년이 걸렸다.
2012년 군부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풀리자, 이 기회의 땅에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자본이 밀려왔다. 2013년 개발원조 (ODA)자금이 1년 만에 7배가 늘었다. 이후에도 해마다 수조원의 개발원조가 물밀듯 들어왔다. 이 무렵 우리 언론도 ‘개방에 나선 은둔의 나라 미얀마’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양곤에 우리 CGV가 들어선 것도 이 무렵이다)
2000년대 후반이 되자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 등이 7%씩 성장하는 미얀마경제에 본격적으로 숟가락을 얹었다. 양곤주 18개 도시를 개발하는 ‘대양곤 도시개발계획(Greater Yangon Master Plan)’에 한국 일본 등의 투자가 줄을 이었다.
최대도시 양곤에서 20분 거리에는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KMIC)도 조성됐다(이재용부회장도 이곳을 직접 찾아 투자를 검토했었다) 공장 근로자의 소득은 월 150달러로 껑충 뛰었다. 절대빈곤층은 48.2%(2005년)에서 24.8%(2017년)로 줄었다.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는 것 같았다. ‘한강의 기적’처럼 ‘양곤강의 기적’이 찾아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웅 산 수 치’ 수반이 총선에서 다시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하는 바로 그날(2월 1일은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였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 이후 석달동안 군인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700여명을 죽였다. 군인들은 사람만 죽인 게 아니다. 투자와 성장의 동력도 끊어놓았다. 198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 황금의 나라는 또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당장 600여 개의 봉제공장 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계 봉제공장들이 일거리를 잃고 있다. 발주처들이 빠르게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다. 봉제업에서만 당장 40만 명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다. 여기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치솟는다. 은행과 의료서비스는 사실상 멈춰섰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하루 1.10달러 미만의 빈곤선으로 추락중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2년까지 코로나와 쿠데타로 미얀마 인구의 48%인 2,500만 명이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은 훨씬 더 크다. 코로나 이후 찾아온 무제한 발권의 시대. 세상 모든 자산가격이 치솟는다. 돈은 넘치고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시대, 쿠데타가 아니였다면 전세계는 이 아세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프론티어 마켓에 얼마를 베팅했을까.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미얀마인들이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까?
지난 10년동안 6-8%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미얀마는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오늘도 미얀마 군부는 파업에 참가한 2,233명의 대학교수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민쟌에선 15살의 9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다. 그래도 시민들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카렌반군(KNLA)나 카친반군(KIA)에 입대하는 미얀마 청년들이 늘어난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불가피하게 잃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총선에서 진 뒤 사법처리가 두려워 쿠데타를 일으킨 한 늙은 군인의 선택으로 5,500만 미얀마 국민들은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할까.
미국의 원조가 시작된 69년 14.1%를 시작으로, 한국은 정말 유래없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77년 10%, 78년 10.3%, 79년 8.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한국에선 쿠데타 세력이 시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그해 한국의 성장률은 –1.9%로 뒷걸음쳤다. 이후 87년
6.10항쟁까지 한국인들은 싸우고 또 싸워 민주화를 이룩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모두 ‘민주화된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87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는 세력의 승리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2번째 기회’를 잡았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그 기회가 자주 온다면 도대체 동남아의 숱한 개발독재 국가들은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한 쿠데타 세력의 진짜 범죄는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대역죄다.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올까. 서슬 퍼런 군부의 폭력에 맞서 오늘도 미얀마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다.

주택수요가 급증하던 71년, 박정희 정권은 아파트를 지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 행정부 주택부서가 중남미 국가들의 주택사업을 원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택차관을 요청했다.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지금 강남과 반포의 AID아파트다(그 아파트가 지금 2~3백만 달러에 팔리는 것을 미국사람들이 알면 어떨까).
60년대 후반 전세계로 번지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경계선의 국가에 막대한 원조를 했다. 경제발전을 통해 시장경제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69년부터 막대한 달러가 ‘차관’이나 ‘무상원조’형식으로 지원됐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그야말로 우리 산업의 종잣돈이 됐다.
이렇게 빌려온 달러로 도로나 항만같은 기반시설을 짓고, 탄광을 뚫었다. 섬유와 화학공장이 들어섰다. 성과는 놀라웠다. 정부 스스로 세운 경제개발계획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성공은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전자업종이 들어서는데 발판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 ‘기회’를 잡았다.

미얀마는 최북단으로 해발 5천미터가 넘는 만년설에 덮여있고, 남쪽으론 인도양을 낀 자원대국이다. 지구의 공장인 인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행운의 땅은 1948년 영국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88년에 첫 기회가 찾아왔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네윈정권의 1당독재에 저항했다. 이 시위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희생됐고 네윈 정권은 무너졌다. 독재에서 벗어날 기회가 오는 듯했다.
하지만 사회 혼란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다시 군부가 집권했다(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첫 번째 기회는 그렇게 날아갔다. 이후 15년간 갇혀있던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풀려나고 서방의 경제재제가 풀린 2012년까지 꼬박 24년이 걸렸다.
2012년 군부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풀리자, 이 기회의 땅에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자본이 밀려왔다. 2013년 개발원조 (ODA)자금이 1년 만에 7배가 늘었다. 이후에도 해마다 수조원의 개발원조가 물밀듯 들어왔다. 이 무렵 우리 언론도 ‘개방에 나선 은둔의 나라 미얀마’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양곤에 우리 CGV가 들어선 것도 이 무렵이다)
2000년대 후반이 되자 싱가포르와 일본, 한국 등이 7%씩 성장하는 미얀마경제에 본격적으로 숟가락을 얹었다. 양곤주 18개 도시를 개발하는 ‘대양곤 도시개발계획(Greater Yangon Master Plan)’에 한국 일본 등의 투자가 줄을 이었다.
최대도시 양곤에서 20분 거리에는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KMIC)도 조성됐다(이재용부회장도 이곳을 직접 찾아 투자를 검토했었다) 공장 근로자의 소득은 월 150달러로 껑충 뛰었다. 절대빈곤층은 48.2%(2005년)에서 24.8%(2017년)로 줄었다.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는 것 같았다. ‘한강의 기적’처럼 ‘양곤강의 기적’이 찾아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웅 산 수 치’ 수반이 총선에서 다시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하는 바로 그날(2월 1일은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였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 이후 석달동안 군인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700여명을 죽였다. 군인들은 사람만 죽인 게 아니다. 투자와 성장의 동력도 끊어놓았다. 198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 황금의 나라는 또 기회를 놓치고 있다.
당장 600여 개의 봉제공장 중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계 봉제공장들이 일거리를 잃고 있다. 발주처들이 빠르게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다. 봉제업에서만 당장 40만 명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다. 여기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치솟는다. 은행과 의료서비스는 사실상 멈춰섰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하루 1.10달러 미만의 빈곤선으로 추락중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2022년까지 코로나와 쿠데타로 미얀마 인구의 48%인 2,500만 명이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지 않는 손실은 훨씬 더 크다. 코로나 이후 찾아온 무제한 발권의 시대. 세상 모든 자산가격이 치솟는다. 돈은 넘치고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시대, 쿠데타가 아니였다면 전세계는 이 아세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프론티어 마켓에 얼마를 베팅했을까.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미얀마인들이 직장을 얻고, 집을 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까?
지난 10년동안 6-8%의 고성장을 거듭하던 미얀마는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오늘도 미얀마 군부는 파업에 참가한 2,233명의 대학교수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 민쟌에선 15살의 9학년 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다. 그래도 시민들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카렌반군(KNLA)나 카친반군(KIA)에 입대하는 미얀마 청년들이 늘어난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불가피하게 잃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총선에서 진 뒤 사법처리가 두려워 쿠데타를 일으킨 한 늙은 군인의 선택으로 5,500만 미얀마 국민들은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할까.
미국의 원조가 시작된 69년 14.1%를 시작으로, 한국은 정말 유래없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77년 10%, 78년 10.3%, 79년 8.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한국에선 쿠데타 세력이 시민을 무차별 학살했다. 그해 한국의 성장률은 –1.9%로 뒷걸음쳤다. 이후 87년
6.10항쟁까지 한국인들은 싸우고 또 싸워 민주화를 이룩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모두 ‘민주화된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87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는 세력의 승리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2번째 기회’를 잡았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그 기회가 자주 온다면 도대체 동남아의 숱한 개발독재 국가들은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한 쿠데타 세력의 진짜 범죄는 ‘그 나라의 성장 동력’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대역죄다.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올까. 서슬 퍼런 군부의 폭력에 맞서 오늘도 미얀마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다.

-
-

김원장 기자 kim9@kbs.co.kr
김원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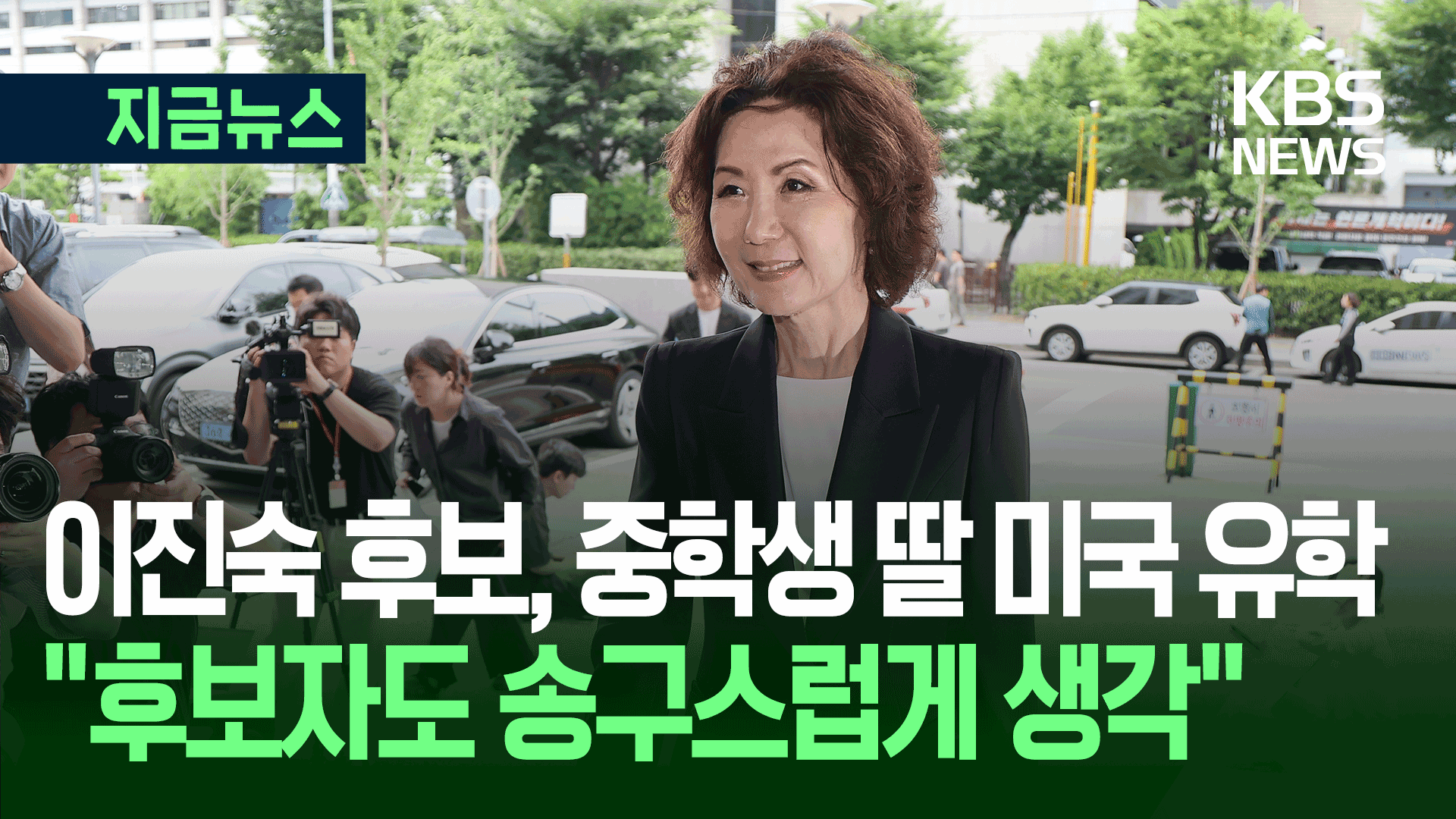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