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플러스]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
입력 2021.07.04 (23:18)
수정 2021.07.04 (2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솔희 :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흔히 국민의 알 권리 대변을 이유로 들죠. 그렇다면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도 뉴스 이용자인 국민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독자와 시청자보다 정치 권력의 언어를 대변하는 언론의 언어 사용 실태. 그리고 언론의 언어가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어 탐험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신지영 : 안녕하세요?
김솔희 : 제가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이거 적절한지요?
신지영 : 너무 마음에 드는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 탐험가 그러면 뭔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신지영 :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언어는 보통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약속에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점들을 토대로 오늘 강연 잘 듣겠습니다.
신지영 :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자가 미국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당선을 알리는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조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선인, 어딘가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당선자가 훨씬 더 익숙한데 언제부터인가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립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1개의 종합 일간지와 5개 방송사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볼까요? 2007년까지 사용 빈도가 매년 수십 회에 불과했던 당선인이 2008년이 되면서 무려 1만 457회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크게 늘었습니다. 웬일일까요? 맞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이거나 이듬해,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우리 언론 기사에서 2008년 이후 당선인 사용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2008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줄 것을 언론에 요청합니다. 당선자에 놈 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선자라는 표현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이유로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앞둔 사람이 헌법에 명시된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의 대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만 있던 해를 볼까요? 당선인 대신 당선자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도하며 언론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선자라는 표현을 일제히 거두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통일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결과를 전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선인이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당선자로 쓴 건데요. 당선의 가치와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봐서일까요? 그렇다면 이 또한 권력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일컫는 당선자라는 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의 새김이 비록 놈 자이긴 하지만 자에는 결코 비하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가 비하의 표현이라면 과학자, 철학자, 저 같은 언어학자, 교육자 등 지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에 자자가 붙지는 않겠죠. 또한, 노동자, 참석자, 승리자, 낙관론자, 운명론자 등에 쓰인 자를 보면 비하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후보자였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당선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던가요? 후보자나 유권자일 때는 괜찮다가 당선자가 되니 갑자기 자가 들어간 당선자가 싫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자가 비하의 표현이니 인으로 바꿔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자를 바꾸자고 하기 이전에 유권자부터 바꾸자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언론이 쓰는 권력의 언어는 더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요. 전관을 예우한다는 뜻의 단어는 전관의 특혜, 비리, 범죄를 예우라고 표현함으로써 언론이 전관의 관점에 서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맥락에 맞게 전관 특혜, 전관 비리, 전관범죄 등으로 표현해야 바른 의미가 전달됩니다. 재가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뜻으로 주로 대통령에게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를 찍고 이르던 말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일을 왕의 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표현입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는 이뿐이 아닙니다. 특히 감염병의 상황에서 사용된 보도 언어를 잘 보면 그 보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비말입니다.
감염병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메르스 혹은 코로나 19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침방울이라는 단어 대신 소위 전문 용어인 비말이라는 단어를 발굴해서 적극 사용함으로써 굳이 몰라도 되는 단어 때문에 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했고 급기야 굳이 몰라도 되는 비말이라는 단어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COVID-19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편에 서서 짐작도 할 수 없는 코호트격리, 음압병실, 에크모 치료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언택트, 드라이브 스루, 워크스루,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낯설고 어려운 단어를 쏟아내면서 시민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 가득한 재난 보도를 들으며 누군가는 감염병을 더욱 공포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설명을 학습하여 그대로 받아적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민 사회에서 언론은 시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견제하고 언어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늘 감시하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어가 권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처하고 언어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시하며 질문을 던져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언어를 권력화하고 있진 않은가요? 언론은 이제 당선인과 비말이 던진 질문에 귀를 기울이며 언어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지, 혹은 언어가 권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솔희 :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의 권력성. 그동안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참신한 시각이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뭔가 항상 딱딱하지? 어렵지? 말은 말인데 왜 와 닿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앞으로 언론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당부해 주신다면요?
신지영 :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면 말씀 언에 논할 논 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이다, 언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고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의 생태계가 정화되는 그 날까지 질문하는 기자들 Q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지영 : 안녕하세요?
김솔희 : 제가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이거 적절한지요?
신지영 : 너무 마음에 드는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 탐험가 그러면 뭔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신지영 :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언어는 보통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약속에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점들을 토대로 오늘 강연 잘 듣겠습니다.
신지영 :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자가 미국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당선을 알리는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조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선인, 어딘가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당선자가 훨씬 더 익숙한데 언제부터인가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립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1개의 종합 일간지와 5개 방송사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볼까요? 2007년까지 사용 빈도가 매년 수십 회에 불과했던 당선인이 2008년이 되면서 무려 1만 457회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크게 늘었습니다. 웬일일까요? 맞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이거나 이듬해,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우리 언론 기사에서 2008년 이후 당선인 사용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2008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줄 것을 언론에 요청합니다. 당선자에 놈 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선자라는 표현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이유로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앞둔 사람이 헌법에 명시된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의 대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만 있던 해를 볼까요? 당선인 대신 당선자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도하며 언론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선자라는 표현을 일제히 거두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통일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결과를 전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선인이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당선자로 쓴 건데요. 당선의 가치와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봐서일까요? 그렇다면 이 또한 권력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일컫는 당선자라는 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의 새김이 비록 놈 자이긴 하지만 자에는 결코 비하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가 비하의 표현이라면 과학자, 철학자, 저 같은 언어학자, 교육자 등 지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에 자자가 붙지는 않겠죠. 또한, 노동자, 참석자, 승리자, 낙관론자, 운명론자 등에 쓰인 자를 보면 비하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후보자였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당선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던가요? 후보자나 유권자일 때는 괜찮다가 당선자가 되니 갑자기 자가 들어간 당선자가 싫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자가 비하의 표현이니 인으로 바꿔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자를 바꾸자고 하기 이전에 유권자부터 바꾸자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언론이 쓰는 권력의 언어는 더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요. 전관을 예우한다는 뜻의 단어는 전관의 특혜, 비리, 범죄를 예우라고 표현함으로써 언론이 전관의 관점에 서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맥락에 맞게 전관 특혜, 전관 비리, 전관범죄 등으로 표현해야 바른 의미가 전달됩니다. 재가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뜻으로 주로 대통령에게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를 찍고 이르던 말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일을 왕의 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표현입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는 이뿐이 아닙니다. 특히 감염병의 상황에서 사용된 보도 언어를 잘 보면 그 보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비말입니다.
감염병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메르스 혹은 코로나 19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침방울이라는 단어 대신 소위 전문 용어인 비말이라는 단어를 발굴해서 적극 사용함으로써 굳이 몰라도 되는 단어 때문에 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했고 급기야 굳이 몰라도 되는 비말이라는 단어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COVID-19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편에 서서 짐작도 할 수 없는 코호트격리, 음압병실, 에크모 치료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언택트, 드라이브 스루, 워크스루,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낯설고 어려운 단어를 쏟아내면서 시민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 가득한 재난 보도를 들으며 누군가는 감염병을 더욱 공포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설명을 학습하여 그대로 받아적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민 사회에서 언론은 시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견제하고 언어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늘 감시하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어가 권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처하고 언어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시하며 질문을 던져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언어를 권력화하고 있진 않은가요? 언론은 이제 당선인과 비말이 던진 질문에 귀를 기울이며 언어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지, 혹은 언어가 권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솔희 :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의 권력성. 그동안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참신한 시각이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뭔가 항상 딱딱하지? 어렵지? 말은 말인데 왜 와 닿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앞으로 언론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당부해 주신다면요?
신지영 :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면 말씀 언에 논할 논 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이다, 언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고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의 생태계가 정화되는 그 날까지 질문하는 기자들 Q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Q플러스]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
-
- 입력 2021-07-04 23:18:52
- 수정2021-07-04 23:30:31

김솔희 :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흔히 국민의 알 권리 대변을 이유로 들죠. 그렇다면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도 뉴스 이용자인 국민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독자와 시청자보다 정치 권력의 언어를 대변하는 언론의 언어 사용 실태. 그리고 언론의 언어가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어 탐험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신지영 : 안녕하세요?
김솔희 : 제가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이거 적절한지요?
신지영 : 너무 마음에 드는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 탐험가 그러면 뭔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신지영 :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언어는 보통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약속에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점들을 토대로 오늘 강연 잘 듣겠습니다.
신지영 :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자가 미국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당선을 알리는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조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선인, 어딘가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당선자가 훨씬 더 익숙한데 언제부터인가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립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1개의 종합 일간지와 5개 방송사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볼까요? 2007년까지 사용 빈도가 매년 수십 회에 불과했던 당선인이 2008년이 되면서 무려 1만 457회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크게 늘었습니다. 웬일일까요? 맞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이거나 이듬해,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우리 언론 기사에서 2008년 이후 당선인 사용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2008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줄 것을 언론에 요청합니다. 당선자에 놈 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선자라는 표현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이유로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앞둔 사람이 헌법에 명시된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의 대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만 있던 해를 볼까요? 당선인 대신 당선자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도하며 언론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선자라는 표현을 일제히 거두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통일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결과를 전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선인이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당선자로 쓴 건데요. 당선의 가치와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봐서일까요? 그렇다면 이 또한 권력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일컫는 당선자라는 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의 새김이 비록 놈 자이긴 하지만 자에는 결코 비하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가 비하의 표현이라면 과학자, 철학자, 저 같은 언어학자, 교육자 등 지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에 자자가 붙지는 않겠죠. 또한, 노동자, 참석자, 승리자, 낙관론자, 운명론자 등에 쓰인 자를 보면 비하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후보자였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당선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던가요? 후보자나 유권자일 때는 괜찮다가 당선자가 되니 갑자기 자가 들어간 당선자가 싫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자가 비하의 표현이니 인으로 바꿔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자를 바꾸자고 하기 이전에 유권자부터 바꾸자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언론이 쓰는 권력의 언어는 더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요. 전관을 예우한다는 뜻의 단어는 전관의 특혜, 비리, 범죄를 예우라고 표현함으로써 언론이 전관의 관점에 서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맥락에 맞게 전관 특혜, 전관 비리, 전관범죄 등으로 표현해야 바른 의미가 전달됩니다. 재가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뜻으로 주로 대통령에게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를 찍고 이르던 말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일을 왕의 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표현입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는 이뿐이 아닙니다. 특히 감염병의 상황에서 사용된 보도 언어를 잘 보면 그 보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비말입니다.
감염병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메르스 혹은 코로나 19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침방울이라는 단어 대신 소위 전문 용어인 비말이라는 단어를 발굴해서 적극 사용함으로써 굳이 몰라도 되는 단어 때문에 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했고 급기야 굳이 몰라도 되는 비말이라는 단어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COVID-19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편에 서서 짐작도 할 수 없는 코호트격리, 음압병실, 에크모 치료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언택트, 드라이브 스루, 워크스루,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낯설고 어려운 단어를 쏟아내면서 시민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 가득한 재난 보도를 들으며 누군가는 감염병을 더욱 공포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설명을 학습하여 그대로 받아적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민 사회에서 언론은 시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견제하고 언어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늘 감시하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어가 권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처하고 언어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시하며 질문을 던져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언어를 권력화하고 있진 않은가요? 언론은 이제 당선인과 비말이 던진 질문에 귀를 기울이며 언어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지, 혹은 언어가 권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솔희 :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의 권력성. 그동안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참신한 시각이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뭔가 항상 딱딱하지? 어렵지? 말은 말인데 왜 와 닿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앞으로 언론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당부해 주신다면요?
신지영 :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면 말씀 언에 논할 논 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이다, 언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고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의 생태계가 정화되는 그 날까지 질문하는 기자들 Q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지영 : 안녕하세요?
김솔희 : 제가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이거 적절한지요?
신지영 : 너무 마음에 드는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어 탐험가 그러면 뭔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신지영 :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언어는 보통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약속에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점들을 토대로 오늘 강연 잘 듣겠습니다.
신지영 : 지난해 11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자가 미국의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의 당선을 알리는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조 바이든을 당선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선인, 어딘가 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당선자가 훨씬 더 익숙한데 언제부터인가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립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1개의 종합 일간지와 5개 방송사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당선자와 당선인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볼까요? 2007년까지 사용 빈도가 매년 수십 회에 불과했던 당선인이 2008년이 되면서 무려 1만 457회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크게 늘었습니다. 웬일일까요? 맞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이거나 이듬해,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우리 언론 기사에서 2008년 이후 당선인 사용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2008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줄 것을 언론에 요청합니다. 당선자에 놈 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선자라는 표현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이유로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앞둔 사람이 헌법에 명시된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의 대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만 있던 해를 볼까요? 당선인 대신 당선자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도하며 언론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선자라는 표현을 일제히 거두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통일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결과를 전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선인이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당선자로 쓴 건데요. 당선의 가치와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봐서일까요? 그렇다면 이 또한 권력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일컫는 당선자라는 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의 새김이 비록 놈 자이긴 하지만 자에는 결코 비하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가 비하의 표현이라면 과학자, 철학자, 저 같은 언어학자, 교육자 등 지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에 자자가 붙지는 않겠죠. 또한, 노동자, 참석자, 승리자, 낙관론자, 운명론자 등에 쓰인 자를 보면 비하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후보자였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당선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던가요? 후보자나 유권자일 때는 괜찮다가 당선자가 되니 갑자기 자가 들어간 당선자가 싫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자가 비하의 표현이니 인으로 바꿔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자를 바꾸자고 하기 이전에 유권자부터 바꾸자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언론이 쓰는 권력의 언어는 더 있습니다.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요. 전관을 예우한다는 뜻의 단어는 전관의 특혜, 비리, 범죄를 예우라고 표현함으로써 언론이 전관의 관점에 서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맥락에 맞게 전관 특혜, 전관 비리, 전관범죄 등으로 표현해야 바른 의미가 전달됩니다. 재가는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한다는 뜻으로 주로 대통령에게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를 찍고 이르던 말인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일을 왕의 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표현입니다.
언론에 드러나는 권력의 언어는 이뿐이 아닙니다. 특히 감염병의 상황에서 사용된 보도 언어를 잘 보면 그 보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비말입니다.
감염병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메르스 혹은 코로나 19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침방울이라는 단어 대신 소위 전문 용어인 비말이라는 단어를 발굴해서 적극 사용함으로써 굳이 몰라도 되는 단어 때문에 시민들을 당황스럽게 했고 급기야 굳이 몰라도 되는 비말이라는 단어를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COVID-19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편에 서서 짐작도 할 수 없는 코호트격리, 음압병실, 에크모 치료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언택트, 드라이브 스루, 워크스루,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낯설고 어려운 단어를 쏟아내면서 시민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 가득한 재난 보도를 들으며 누군가는 감염병을 더욱 공포스럽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전문가들과 그들의 설명을 학습하여 그대로 받아적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민 사회에서 언론은 시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견제하고 언어가 권력이 되지 않도록 늘 감시하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어가 권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처하고 언어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시하며 질문을 던져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언어를 권력화하고 있진 않은가요? 언론은 이제 당선인과 비말이 던진 질문에 귀를 기울이며 언어가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지, 혹은 언어가 권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솔희 :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의 권력성. 그동안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참신한 시각이었는데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왜 이렇게 뭔가 항상 딱딱하지? 어렵지? 말은 말인데 왜 와 닿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럼요, 앞으로 언론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당부해 주신다면요?
신지영 :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면 말씀 언에 논할 논 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이다, 언론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고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솔희 :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의 생태계가 정화되는 그 날까지 질문하는 기자들 Q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홍석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질문하는 기자들Q] 클릭은 있고 내용은 없다…품격 내려놓은 국제뉴스](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question_q/2021/07/04/11_522504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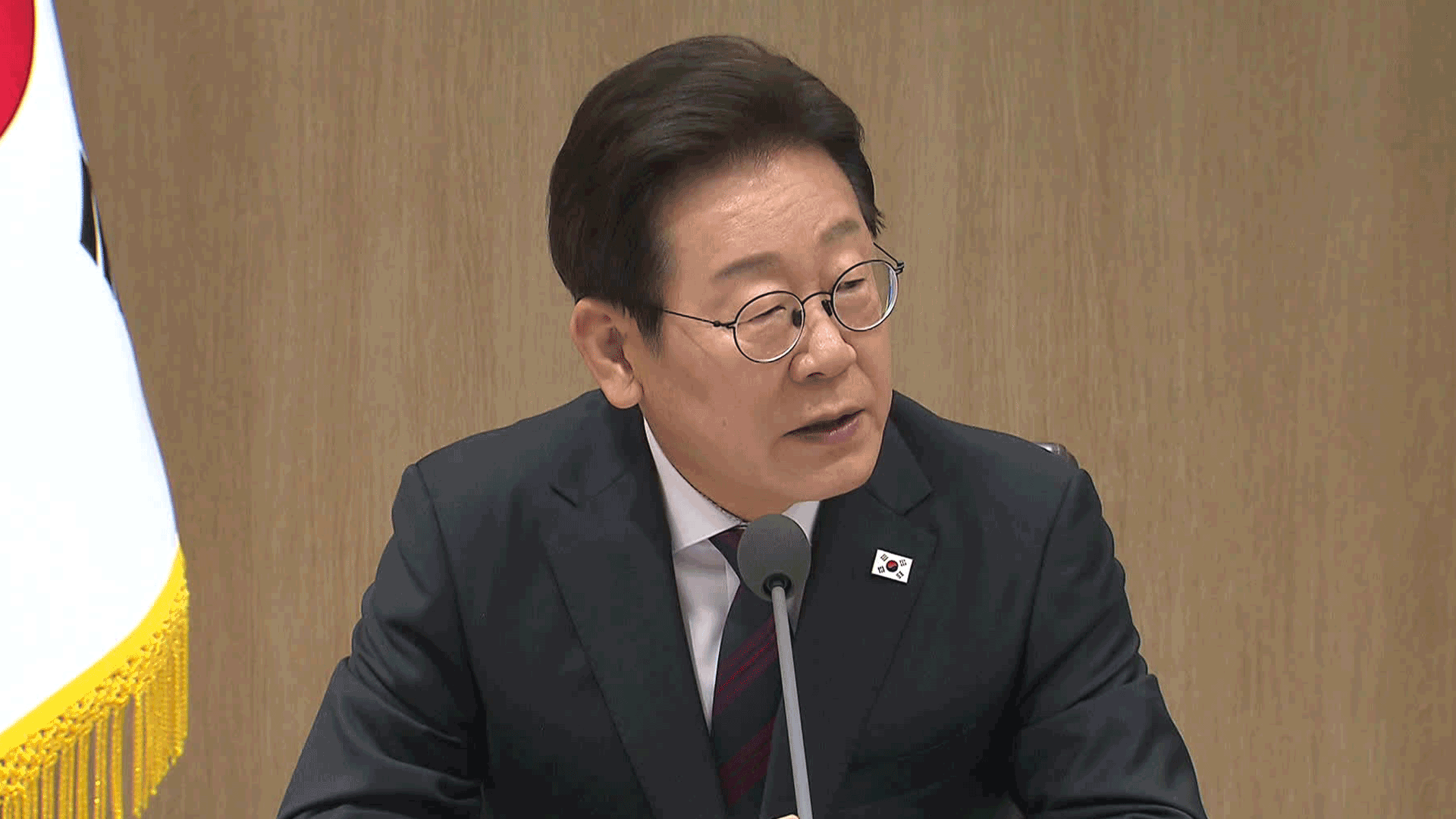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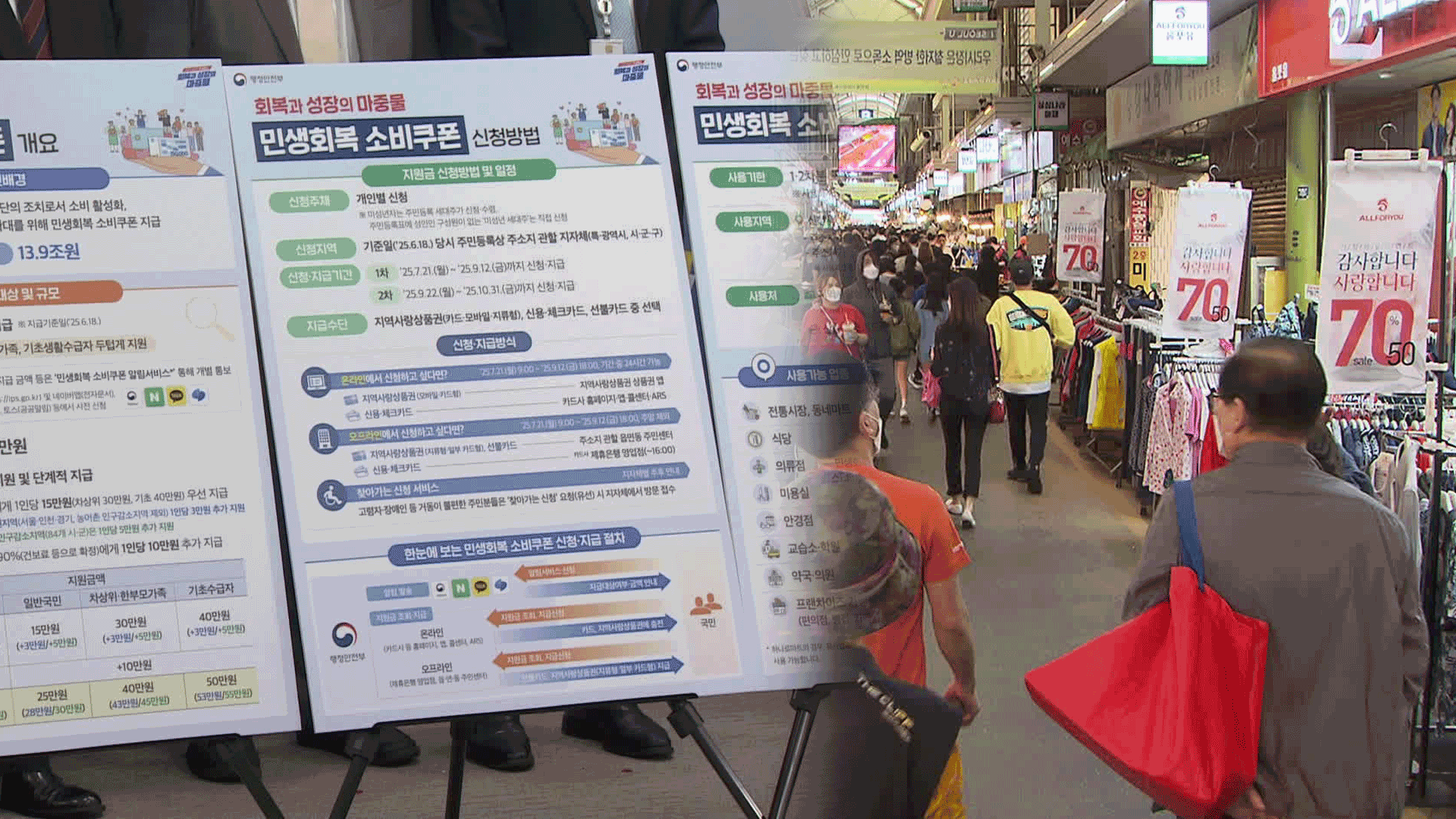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