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발표된 담화라고 '굳이' 밝히면서, 위협과 경고의 무게감을 높였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건 처음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갖은 우여곡절과 진통이 계속됐지만, 북한은 '주한미군' 이슈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체적으로는 남한과 미국을 모두 비난했지만, 방점은 미국에 찍혀 있었습니다. "훈련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 표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 "현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 한동안 공식 언급 자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했는데, 주한미군 관련 부분에선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란 기존 문구를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로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199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는 "미국과 수교를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2003년 발간한 회고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물었더니 "냉전 이후 북의 관점이 바뀌었다, 주한미군은 지역 안정을 유지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 왜 다시 꺼내들었나?
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을까요?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역학 관계의 변동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중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고 북중 밀착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중이 대미 공동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중국이 대신 언급해 줬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장비'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상징처럼 떠오릅니다. 주한미군과 사드, 모두 중국이 민감해 하는 존재들입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요구사항의 문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거듭 공개적으로 나올 경우, 남한 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남측과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두 달 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3개월 간 단절됐던 남북 통신선이 다시 연결되자, 남북 정상회담 언급까지 나오며 곧 남북 대화가 재개될 거란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아직 대화에 나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협상 개시의 조건을 바꾸는 방법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여러 분석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미간·남북간 대화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 질 것이란 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한미군 철수’ 다시 꺼내든 북, 의도는?
-
- 입력 2021-08-13 16:08:52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 유독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발표된 담화라고 '굳이' 밝히면서, 위협과 경고의 무게감을 높였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건 처음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갖은 우여곡절과 진통이 계속됐지만, 북한은 '주한미군' 이슈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체적으로는 남한과 미국을 모두 비난했지만, 방점은 미국에 찍혀 있었습니다. "훈련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 표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 "현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한미군 철수' 한동안 공식 언급 자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했는데, 주한미군 관련 부분에선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란 기존 문구를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로 바꿨을 뿐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1992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는 "미국과 수교를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2003년 발간한 회고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0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물었더니 "냉전 이후 북의 관점이 바뀌었다, 주한미군은 지역 안정을 유지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 왜 다시 꺼내들었나?
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을까요?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역학 관계의 변동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중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고 북중 밀착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중이 대미 공동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중국이 대신 언급해 줬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장비'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상징처럼 떠오릅니다. 주한미군과 사드, 모두 중국이 민감해 하는 존재들입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요구사항의 문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거듭 공개적으로 나올 경우, 남한 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남측과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두 달 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3개월 간 단절됐던 남북 통신선이 다시 연결되자, 남북 정상회담 언급까지 나오며 곧 남북 대화가 재개될 거란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아직 대화에 나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협상 개시의 조건을 바꾸는 방법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은 여러 분석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미간·남북간 대화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 질 것이란 점입니다.
-
-

윤진 기자 jin@kbs.co.kr
윤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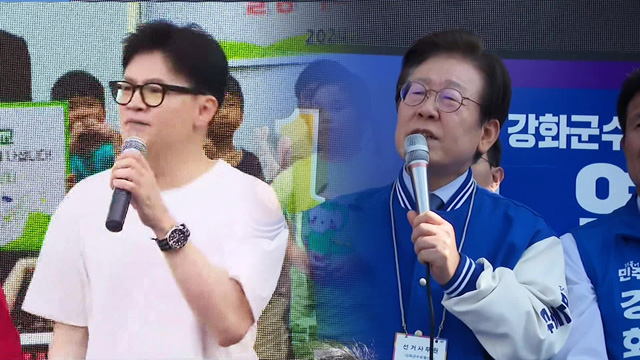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