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아프간 철군’에 다시 주목받는<강대국의 흥망>…중국도 예외 아니다
입력 2021.08.18 (1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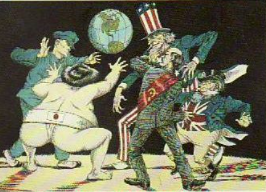 폴 케네디의<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하퍼콜린스 출판사)에서 강대국들의 경쟁을 풍자한 삽화.
폴 케네디의<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하퍼콜린스 출판사)에서 강대국들의 경쟁을 풍자한 삽화.'미군 사망자 2,500명, 동맹군 사망자 1,100명, 아프간군 사망자 66,000명. 탈레반 사망자 51,000명.'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세월은 이처럼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서방 세계는 쫓기듯 카불을 떠나고 있습니다 . 아프간 정부는 붕괴되고 정치 권력이 다시 탈레반의 손아귀에 들어가며 아프간 사회는 혼란의 두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 혼란속 쫓기듯 떠나는 아프간 미군...다시 주목 받는 <강대국의 흥망>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재직시 '필요한 전쟁'이라고 옹호했던 미국의 대아프가니탄 정책.
오랜 전쟁에 지친 미국은 결국 국내 여론과 국익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미군 수송기에 올라타기 위해 달리는 아프간인들.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심각한 혼란상이 시시각각 전달되자 철군을 지지했던 미국내 여론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군 수송기에 올라타기 위해 달리는 아프간인들.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심각한 혼란상이 시시각각 전달되자 철군을 지지했던 미국내 여론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아프간 철수의 혼란상이 미디어를 통해 시시각각 생생하게 전해지면서 철군 결정에 대한 미국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8월 16일한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46%로 취임 후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사흘만에 7%p 급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아프간 정책 실패와 혼란스런 철군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 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의 과도한 팽창(imperial overstretch)'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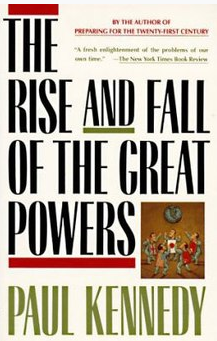 폴 케네디의 역저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한국에는 1989년 번역 출간됐다.
폴 케네디의 역저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한국에는 1989년 번역 출간됐다.1987년 폴 케네디 교수가 출간한 글로벌 베스트셀러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의 핵심 개념입니다.
케네디 교수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을 깨는 제국의 과도한 팽창이 결국 쇠퇴를 가져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됐습니다.
이후 '소련 붕괴' 예측 실패, 일본에 대한 과대 평가 등으로 비판받았지만 그럼에도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필독서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경제학 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치열한 미중 경쟁 속 아프간 철군은 <강대국의 흥망>이 설명한 제국의 과도한 팽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과도한 팽창 이후 미군의 '전 지구적 후퇴'를 예고하는 징조일까?
■ 중국 매체 "어제는 사이공,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
중국에서는 '아프간 실패'를 경쟁국 미국의 정책 실패이자 쇠퇴 징조로 강조하는 동시에 타이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8월 17일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거론하며 "미국의 힘과 역할은 건설이 아니라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 패권 쇠락의 조종이 울렸다'고 논평했고, 환구시보는 “어제는 사이공(베트남), 오늘은 카불(아프가니스탄), 내일은 타이베이(타이완)가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압박은 심리적, 물리적 계속되고 있다. 관영매체가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이라고 조롱하고, 중국군은 타이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중국 H-6폭격기를 근접 감시하는 타이완 F-16 전투기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타이완 압박은 심리적, 물리적 계속되고 있다. 관영매체가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이라고 조롱하고, 중국군은 타이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중국 H-6폭격기를 근접 감시하는 타이완 F-16 전투기 (사진=연합뉴스)아프가니스탄 상황은 분명 미국의 정책 실패와 쇠락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를 쇠퇴 과정을 관리하는 미국의 자기 교정 능력, 또는 냉정한 자원 재분배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타이완 포기 가능성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섣불리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둔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현지 시간 8월 16일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원과 관심을 계속 쏟아붓기를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간전 종료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간전 종료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중국과의 경쟁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 패권 건설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타이완은 중국 견제를 위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미국...아프간 철군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중국
중국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18일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 탈출을 도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힘을 빼는 지역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 주변에서 순조롭게 도발하도록 돕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군 철수가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프간 미군 철수는 중국에게 껄끄러운 과제도 남기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이 와칸회랑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중국쪽 접경 지대가 다름 아닌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탈레반과 위구르는 같은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과 탈레반의 정치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7월 28일 톈진에서 만나 회담했다. 중국 측은 신장 분리주의 무장 단체에 대한 탈레반의 견제를 요구했다.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과 탈레반의 정치지도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7월 28일 톈진에서 만나 회담했다. 중국 측은 신장 분리주의 무장 단체에 대한 탈레반의 견제를 요구했다.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미국은 지난해 말 중국이 테러집단이라고 지목하는 신장 분리주의 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을 테러 조직 명단에서 해제했습니다. 중국 뒷마당의 불안 요인을 자극한 셈입니다.
■ <강대국의 흥망>, 폐쇄·배타로 흘렀다 쇠퇴한 명나라 주목...오늘의 중국은?
<강대국의 흥망>은 중국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16세기 세계 최강국 명나라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명(明)은 한때 정화의 대원정까지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개방과 포용보다는 폐쇄·배타적으로 흐르고 사상과 경제에 대한 간섭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결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폴 케네디는 지적합니다.
반면 유럽은 봉건 영주들의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쌓아 훗날 중국과 유럽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중국은 어떨까요?
신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과 WTO 가입으로 개방과 포용의 큰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지도부는 '중화 민족의 부흥'을 강조하고 공산당 역사 교육 등 사상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안보, 반독점 등을 이유로 알리바바, 디디추싱, 메이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디추싱은 뉴욕 증시 상장 뒤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으며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안보, 반독점 등을 이유로 알리바바, 디디추싱, 메이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디추싱은 뉴욕 증시 상장 뒤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으며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경제적으로는 당국의 갑작스런 규제가 커다란 투자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군기잡기와 사교육 업체들의 몰락이 대표적입니다. 인권 논란 속에 유럽 연합과의 포괄적투자협정은 멈춰섰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벽은 여전히 철옹성 같습니다.
명(明)을 떠올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파원 리포트] ‘아프간 철군’에 다시 주목받는<강대국의 흥망>…중국도 예외 아니다
-
- 입력 2021-08-18 16:3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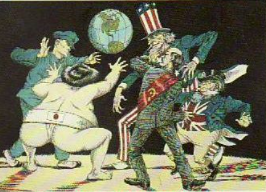
'미군 사망자 2,500명, 동맹군 사망자 1,100명, 아프간군 사망자 66,000명. 탈레반 사망자 51,000명.'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세월은 이처럼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서방 세계는 쫓기듯 카불을 떠나고 있습니다 . 아프간 정부는 붕괴되고 정치 권력이 다시 탈레반의 손아귀에 들어가며 아프간 사회는 혼란의 두려움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 혼란속 쫓기듯 떠나는 아프간 미군...다시 주목 받는 <강대국의 흥망>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재직시 '필요한 전쟁'이라고 옹호했던 미국의 대아프가니탄 정책.
오랜 전쟁에 지친 미국은 결국 국내 여론과 국익을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철수의 혼란상이 미디어를 통해 시시각각 생생하게 전해지면서 철군 결정에 대한 미국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8월 16일한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46%로 취임 후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사흘만에 7%p 급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아프간 정책 실패와 혼란스런 철군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 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제국의 과도한 팽창(imperial overstretch)'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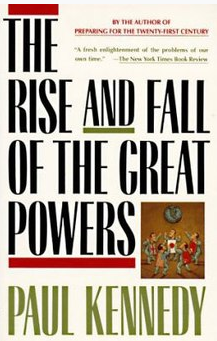
1987년 폴 케네디 교수가 출간한 글로벌 베스트셀러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의 핵심 개념입니다.
케네디 교수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균형을 깨는 제국의 과도한 팽창이 결국 쇠퇴를 가져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됐습니다.
이후 '소련 붕괴' 예측 실패, 일본에 대한 과대 평가 등으로 비판받았지만 그럼에도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필독서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경제학 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치열한 미중 경쟁 속 아프간 철군은 <강대국의 흥망>이 설명한 제국의 과도한 팽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과도한 팽창 이후 미군의 '전 지구적 후퇴'를 예고하는 징조일까?
■ 중국 매체 "어제는 사이공,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
중국에서는 '아프간 실패'를 경쟁국 미국의 정책 실패이자 쇠퇴 징조로 강조하는 동시에 타이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8월 17일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거론하며 "미국의 힘과 역할은 건설이 아니라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 패권 쇠락의 조종이 울렸다'고 논평했고, 환구시보는 “어제는 사이공(베트남), 오늘은 카불(아프가니스탄), 내일은 타이베이(타이완)가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분명 미국의 정책 실패와 쇠락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를 쇠퇴 과정을 관리하는 미국의 자기 교정 능력, 또는 냉정한 자원 재분배 전략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타이완 포기 가능성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섣불리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철수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둔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현지 시간 8월 16일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원과 관심을 계속 쏟아붓기를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 패권 건설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타이완은 중국 견제를 위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미국...아프간 철군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중국
중국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18일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 탈출을 도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힘을 빼는 지역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 주변에서 순조롭게 도발하도록 돕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군 철수가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프간 미군 철수는 중국에게 껄끄러운 과제도 남기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이 와칸회랑을 경계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중국쪽 접경 지대가 다름 아닌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탈레반과 위구르는 같은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중국이 테러집단이라고 지목하는 신장 분리주의 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을 테러 조직 명단에서 해제했습니다. 중국 뒷마당의 불안 요인을 자극한 셈입니다.
■ <강대국의 흥망>, 폐쇄·배타로 흘렀다 쇠퇴한 명나라 주목...오늘의 중국은?
<강대국의 흥망>은 중국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16세기 세계 최강국 명나라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명(明)은 한때 정화의 대원정까지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개방과 포용보다는 폐쇄·배타적으로 흐르고 사상과 경제에 대한 간섭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결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폴 케네디는 지적합니다.
반면 유럽은 봉건 영주들의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쌓아 훗날 중국과 유럽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의 중국은 어떨까요?
신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과 WTO 가입으로 개방과 포용의 큰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지도부는 '중화 민족의 부흥'을 강조하고 공산당 역사 교육 등 사상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당국의 갑작스런 규제가 커다란 투자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군기잡기와 사교육 업체들의 몰락이 대표적입니다. 인권 논란 속에 유럽 연합과의 포괄적투자협정은 멈춰섰습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벽은 여전히 철옹성 같습니다.
명(明)을 떠올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
-

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조성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탈레반 ‘아프간 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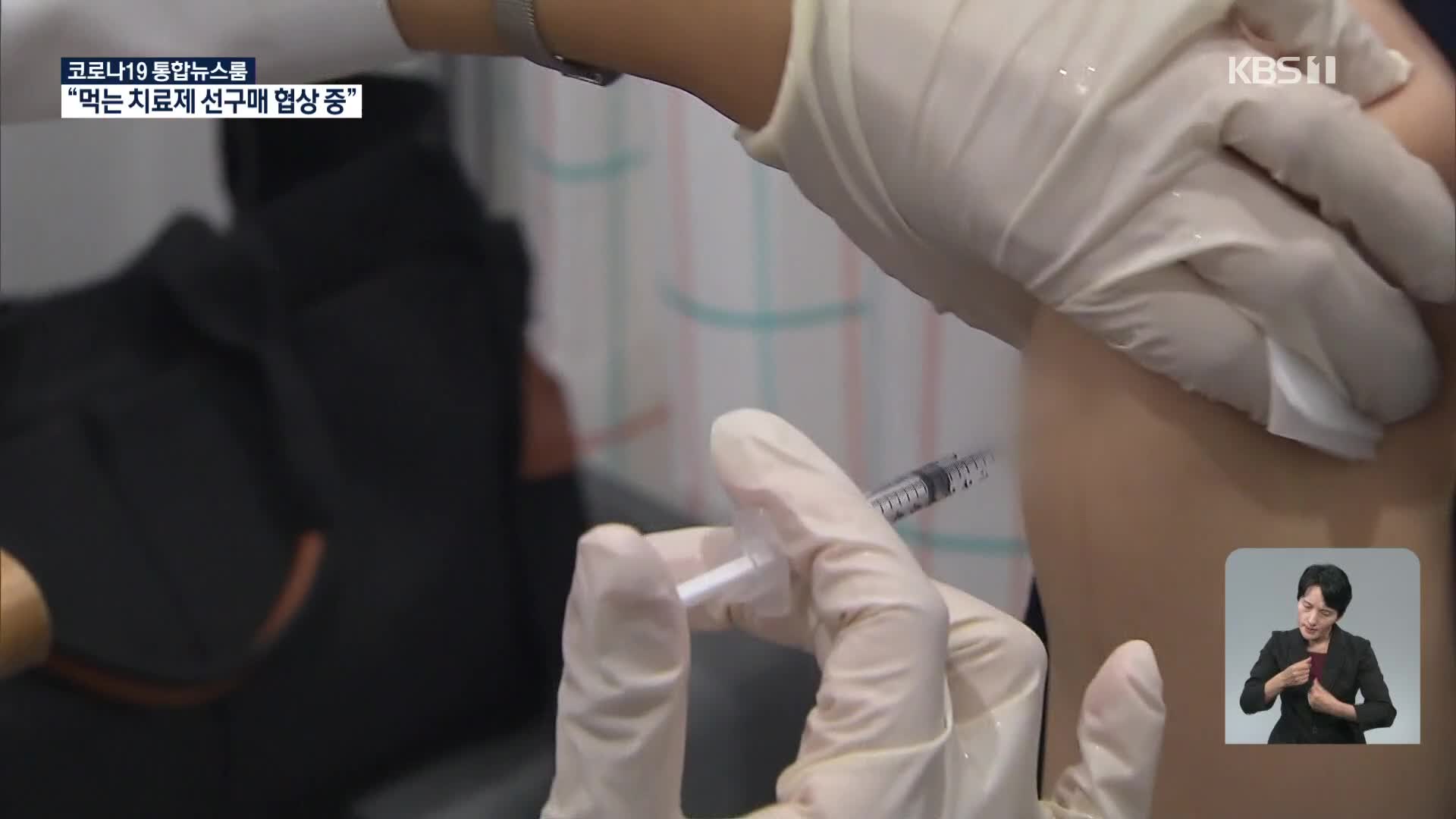



![[속보] 위성락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로 <br>관세 협의 진전시킬 것…미국 측 공감”](/data/layer/904/2025/07/20250709_u4yjkF.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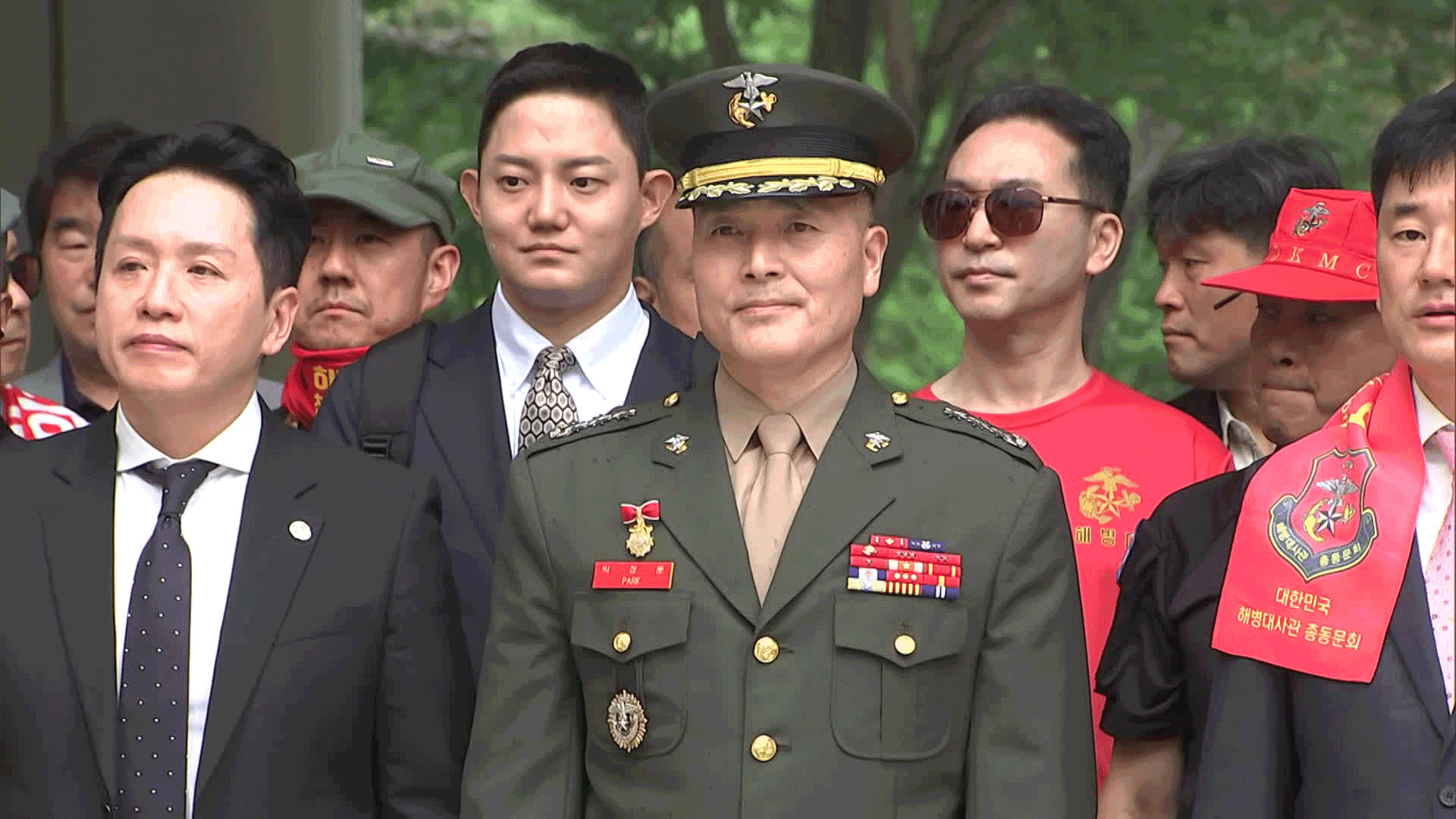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