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과 한지로 더럽고 추한 것 떨어져 나가길”…프랑스서 활동하는 이진우 작가 인터뷰
입력 2021.11.20 (08: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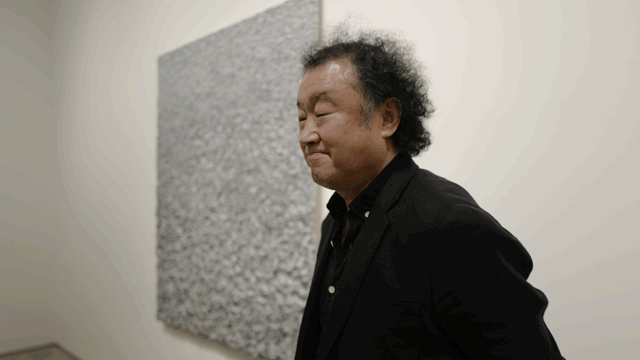
‘숯과 한지의 화가’로 불리는 이진우 작가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리안 갤러리 서울’이 바로 그의 작품들을 처음으로 보고, 인터뷰할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이곳에서 개인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전통적 의미의 그림’이라기 보다는 입체감이 풍부한 조각 작품 같았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한지를 겹겹이 계속 덮고 ‘브러시’란 도구로 긁어내는 작업은 “고된 노동”이라고 작가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작가적 수행의 결과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작가는 “작업 방식이 독특하고, 작가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평으로 프랑스 화단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고 갤러리 측은 밝혔습니다.

그의 작품은 숯으로 먼저 그리고, 그 위에 한지를 덮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붓글씨를 쓰기도 하는데, 온몸을 사용하다시피 하는 창작 작업을 30년 넘게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작가는 서양화(세종대)를 전공한 뒤, 1989년까지 파리 8대학과 파리 국립 고등미술학교에서 미술재료학을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료를 공부하니 안료(顔料), 붓, 종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이런 공부가 결국 현재 작업의 밑바탕이 된 것 같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주로 프랑스에서 지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한국서 만나기 어려운 편인데 이번 전시를 위해 귀국한 셈입니다.
이진우 작가는 “‘인류의 재앙’ 같이 느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작업에 몰입할수 있었지만, 마음속 슬픔도 커졌고 작품에도 고스란히 이런 감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자고 일어나는 일상과 같은 “꾸준한 작업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래 생활하면서 겪어보니 프랑스에서는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작가를 더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현지 평단에서 ‘머리가 없는 작가’ 다시 설명하면 긴 세월 동안 작업이 몸에 익어서 만든 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니까요.
예술적으로 동양이나 서양 중 한 곳이 더 우수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점차 서양미술에서는 회화가 침체를 겪게 되었지만, 한국 작가들은 단순하고 담백하며 명상적인 단색화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이 지닌 강점이라고 봅니다.
정말 한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에겐 태생적인 DNA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의 작품들의 제목은 대부분이 ‘무제(無題)’입니다. 미술관에 온 관람객 각자가 본 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감상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손으로 만지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모든 관람객에게 이런 것을 허용할지는 갤러리 측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료의 특성상 외부의 가벼운 접촉에는 색과 질감이 변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전통 한지로 된 작품을 기름기가 묻은 손 등으로 만진다면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색과 질감이 변하지 않는 전통 한지의 매력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지에 대해 공부하던 시절 지방에 가서 한지를 만드는 전통 장인의 모습을 보고, 어렵게 배운 것들이 기억납니다. 일주일을 그냥 문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분이 받아주길 기다려야 할 정도였지요.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한지의 우수성 관련 TV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저를 찾아와 인터뷰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총 6분 정도 분량으로 제 인터뷰가 소화된 것 같은데, 아마 KBS 등에서 방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해외 평단에서도 유행하는 단색화의 전통이 ‘한국’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현대의 단색화란 것은 ”전통적인 수묵화, 특히 남종화의 ‘여백 미’나 ‘선비 정신’을 현대 미술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의 작업용 천위에 일정한 크기로 부순 숯을 뿌려서 붙인 다음, 그 위에 한지를 덮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쇠로 된 도구로 문지르고, 다시 한지를 위에 붙인 뒤 다시 도구를 사용해 문지르는 작업을 반복해 평면으로 보일수 있는 작품에 입체감을 입히는 셈입니다.

보통 한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보통 한지를 10번 덮는데 많을 때는 30번을 덮고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제가 63살인데, 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예술에 재능이 없는 것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한지를 덮고 다시 긁어내는 작업을 통해 ‘저 스스로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지요. 한지를 덮는 것은 저를 무효화시키는 행위구요, 흰 눈으로 사물을 덮는 것처럼 저 자신의 추한 것, 모자란 것, 부끄러운 것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작업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든 ‘숯과 한지로 만들어낸 풍경’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되길 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관람객들이 융합된 세계, 재료들이 본래의 물성을 초월한 것을 접하고, 전시의 주제와 이어지는 ‘비움’ 을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숯과 한지로 더럽고 추한 것 떨어져 나가길”…프랑스서 활동하는 이진우 작가 인터뷰
-
- 입력 2021-11-20 08:0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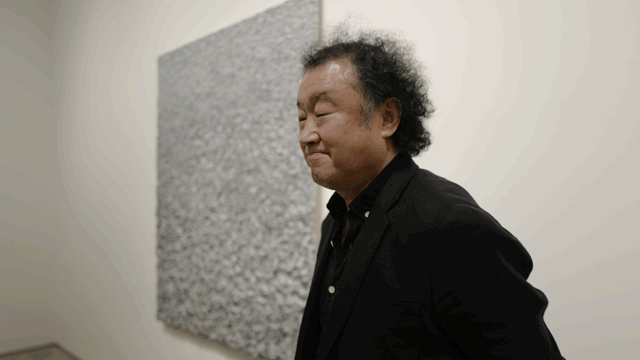
‘숯과 한지의 화가’로 불리는 이진우 작가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리안 갤러리 서울’이 바로 그의 작품들을 처음으로 보고, 인터뷰할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이곳에서 개인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전통적 의미의 그림’이라기 보다는 입체감이 풍부한 조각 작품 같았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한지를 겹겹이 계속 덮고 ‘브러시’란 도구로 긁어내는 작업은 “고된 노동”이라고 작가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작가적 수행의 결과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작가는 “작업 방식이 독특하고, 작가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평으로 프랑스 화단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고 갤러리 측은 밝혔습니다.

그의 작품은 숯으로 먼저 그리고, 그 위에 한지를 덮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붓글씨를 쓰기도 하는데, 온몸을 사용하다시피 하는 창작 작업을 30년 넘게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작가는 서양화(세종대)를 전공한 뒤, 1989년까지 파리 8대학과 파리 국립 고등미술학교에서 미술재료학을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료를 공부하니 안료(顔料), 붓, 종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이런 공부가 결국 현재 작업의 밑바탕이 된 것 같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주로 프랑스에서 지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한국서 만나기 어려운 편인데 이번 전시를 위해 귀국한 셈입니다.
이진우 작가는 “‘인류의 재앙’ 같이 느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작업에 몰입할수 있었지만, 마음속 슬픔도 커졌고 작품에도 고스란히 이런 감정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작가가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자고 일어나는 일상과 같은 “꾸준한 작업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래 생활하면서 겪어보니 프랑스에서는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작가를 더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현지 평단에서 ‘머리가 없는 작가’ 다시 설명하면 긴 세월 동안 작업이 몸에 익어서 만든 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니까요.
예술적으로 동양이나 서양 중 한 곳이 더 우수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점차 서양미술에서는 회화가 침체를 겪게 되었지만, 한국 작가들은 단순하고 담백하며 명상적인 단색화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미술이 지닌 강점이라고 봅니다.
정말 한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에겐 태생적인 DNA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의 작품들의 제목은 대부분이 ‘무제(無題)’입니다. 미술관에 온 관람객 각자가 본 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감상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손으로 만지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모든 관람객에게 이런 것을 허용할지는 갤러리 측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료의 특성상 외부의 가벼운 접촉에는 색과 질감이 변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전통 한지로 된 작품을 기름기가 묻은 손 등으로 만진다면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색과 질감이 변하지 않는 전통 한지의 매력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지에 대해 공부하던 시절 지방에 가서 한지를 만드는 전통 장인의 모습을 보고, 어렵게 배운 것들이 기억납니다. 일주일을 그냥 문밖에서 기다리면서 그분이 받아주길 기다려야 할 정도였지요.
최근에는 프랑스에서도 한지의 우수성 관련 TV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저를 찾아와 인터뷰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총 6분 정도 분량으로 제 인터뷰가 소화된 것 같은데, 아마 KBS 등에서 방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해외 평단에서도 유행하는 단색화의 전통이 ‘한국’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현대의 단색화란 것은 ”전통적인 수묵화, 특히 남종화의 ‘여백 미’나 ‘선비 정신’을 현대 미술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의 작업용 천위에 일정한 크기로 부순 숯을 뿌려서 붙인 다음, 그 위에 한지를 덮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쇠로 된 도구로 문지르고, 다시 한지를 위에 붙인 뒤 다시 도구를 사용해 문지르는 작업을 반복해 평면으로 보일수 있는 작품에 입체감을 입히는 셈입니다.

보통 한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보통 한지를 10번 덮는데 많을 때는 30번을 덮고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제가 63살인데, 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예술에 재능이 없는 것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한지를 덮고 다시 긁어내는 작업을 통해 ‘저 스스로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지요. 한지를 덮는 것은 저를 무효화시키는 행위구요, 흰 눈으로 사물을 덮는 것처럼 저 자신의 추한 것, 모자란 것, 부끄러운 것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작업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만든 ‘숯과 한지로 만들어낸 풍경’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되길 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관람객들이 융합된 세계, 재료들이 본래의 물성을 초월한 것을 접하고, 전시의 주제와 이어지는 ‘비움’ 을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
-

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김종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