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원이 다른 도전”이라 아직은 생각 없다
SK온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LG화학과의 '세기의 소송'에 조 단위 돈을 물어주면서 짓는 공장이다. SKC는 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용 글라스 기판 공장 설립도 추진한다. SK 그룹은 미국투자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천문학적 세제 혜택까지 제시하자, 삼성은 텍사스에 두 자릿수 조 단위 돈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쌍두마차 SK도 욕심을 낼 법도 하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fab)을 짓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전”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도체 공장 지을 계획은 아직 없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을 살피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미국엔 "생산을 위한 기술 엔지니어는 많지 않다”고도 했다. 이쯤 말하면 속내는 보나 마나다. 지을 계획이 없다. 왜 그럴까. 수천 가지 논리적 이유보다 강력한 뼈아픈 경험이 SK에겐 있다.
■<SK하이닉스 美 유진 공장>의 추억
-1조 5천억 원 들였지만 10년만 가동
-30년 뒤 70억 원에 팔렸다
SK하이닉스에겐 1998년 문을 연 미국 공장이 있었다. 오레곤주 유진 시에 있었다. 당시 현대전자였던 하이닉스는 13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완공했다. 단순 현재 환율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 지금 삼성이 텍사스에 짓는 파운드리 공장과 비견할 만도 하다.)
그리고 2001년엔 라인 업그레이드도 했다. 64M SD램 공정을 256M 공정으로 전환했다. 당시 오레곤주 현지 신문들은 여기에 하이닉스가 추가로 쓴 돈이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됐다고 했다.
 부동산 업체 Ten-X.com 사진, 오레곤주 유진시 (구)하이닉스 반도체 제조시설
부동산 업체 Ten-X.com 사진, 오레곤주 유진시 (구)하이닉스 반도체 제조시설하지만 유진 공장의 역사는 10년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하이닉스는 미국공장 생산을 중단한다. 오레곤 공장은 D램 메모리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유진공장에서는 200mm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세계 D램 산업은 300mm 웨이퍼 체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웨이버 직경이 1.5배 커지면 반도체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어난다.)
유진 공장은 이후 12년간 용도 없이 비어 있었다. 중간에 브로드컴이나 코닝이 인수하기도 했지만, 생산시설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부지와 공장이 경매에 나와 낙찰된다. 낙찰 시작가격은 150만 달러, 실제 낙찰가는 630만 달러였다.
Stratacache라는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샀다. 반도체가 아닌 고속도로 광고판이나 패스트푸드 메뉴 보드, 공항 티켓 키오스크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게 될 것이란 게 오레곤 현지 매체들의 이야기다. 1조 5천억 원 넘게 들였던 공장이 70억 원짜리가 됐다.
SK의 유진공장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메모리 반도체 핵심 공장은 왜 해외에 못 짓나
① '무시무시한 사이클'을 버티기 어렵다
우선은 사이클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는 사업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 바닥까지 떨어진다.
2000년대 중반 메모리 반도체 경쟁(치킨게임)이 심화했다. 디램 가격이 80% 이상 급락했다. 어지간한 반도체 회사들은 이때 손을 들고 나갔다. 일본 업체들은 그야말로 몰락했다.
하이닉스도 이 죽음의 게임에서 휘청거렸다. 유진공장은 2008년 가동이 중단됐다. 주인도 바뀌었다. SK가 새 주인이 된 건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고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시작되려던 2012년이다.
치킨 게임으로 인한 하락 사이클을 버티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격(원가경쟁력 유지)이다. 싸야한다. 싸게 못만들면 망한다. 메모리는 그래서 기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 점에서 파운드리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외의 외따로 떨어져 있는 구식 시설에선 쉽지 않다. 고난의 시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공장은 폐기 대상이 될 뿐이다. 조 단위의 거대한 매몰 비용은 덤이다. 진출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장 신설에 '세제 혜택' 등의 당근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리스크가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유진공장이 가르쳐준 교훈이다.

② 생산 효율성 극대화도 쉽지 않다
게다가 D램은 '수요처'와의 거리보다는 '생산 효율성 극대화'가 중요하다. 사 줄 사람이 많은 곳에 가까울 필요성은 크지 않다. 작기 때문에 비행기로 날라도 된다. (코로나 초기 대한항공이 흑자를 낸 이유, 외신들은 삼성과 SK 반도체 수송 덕분이라고 했다)
대신 D램 시설은 '집적'되어야 한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한 곳에서 이뤄져야 한단 얘기다.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다. 현재 집적을 이루지 못한 경쟁자는 제대로 된 경쟁에 참여조차 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거대한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5나노 7나노 최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개발에는 2~3천억 원짜리 EUV 장비가 들어간다. 라인 하나 만드는 데 조 단위 '천문학적인 설비투자'가 필수적이다.
만들었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로 라인을 지속적으로 최신화시켜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거대 자본의 투하'에는 끝이 없다 .
게다가 "생산을 위한 기술 엔지니어"가 24시간 달라붙어 이 거대 시설을 계속 최신화, 효율화시켜야 한다. 자연히 집적되어야 관리도 투자도 용이해진다.
(삼성이나 LG, SK가 휴대전화나 LCD 공장, 심지어 배터리 공장까지도 '수요가 많은 곳'이나 '인건비가 싼 곳'에 짓지만, 반도체 핵심 공장(Fab)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다.)
■ 왜 반도체 수출 경쟁력은 여전한 것일까
물론 SK도 삼성전자도 해외 공장을 갖고는 있다. 삼성은 중국과 미국에, 하이닉스도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는 했다. 하지만 다른 전자 산업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다.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의 핵심 기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밖으로 떠날 가능성도 작다.

■ 최태원 회장은 왜 'Yes'라고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모리 시장의 고질적인 '가격 사이클'을 견디고,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야 유지 가능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을 자신이 없어서다. 아직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태원 회장은 왜 ‘Yes’라고 못했을까
-
- 입력 2021-12-11 09:05:08

■ "차원이 다른 도전”이라 아직은 생각 없다
SK온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LG화학과의 '세기의 소송'에 조 단위 돈을 물어주면서 짓는 공장이다. SKC는 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용 글라스 기판 공장 설립도 추진한다. SK 그룹은 미국투자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천문학적 세제 혜택까지 제시하자, 삼성은 텍사스에 두 자릿수 조 단위 돈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쌍두마차 SK도 욕심을 낼 법도 하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fab)을 짓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전”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도체 공장 지을 계획은 아직 없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을 살피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미국엔 "생산을 위한 기술 엔지니어는 많지 않다”고도 했다. 이쯤 말하면 속내는 보나 마나다. 지을 계획이 없다. 왜 그럴까. 수천 가지 논리적 이유보다 강력한 뼈아픈 경험이 SK에겐 있다.
■<SK하이닉스 美 유진 공장>의 추억
-1조 5천억 원 들였지만 10년만 가동
-30년 뒤 70억 원에 팔렸다
SK하이닉스에겐 1998년 문을 연 미국 공장이 있었다. 오레곤주 유진 시에 있었다. 당시 현대전자였던 하이닉스는 13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완공했다. 단순 현재 환율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면 지금 삼성이 텍사스에 짓는 파운드리 공장과 비견할 만도 하다.)
그리고 2001년엔 라인 업그레이드도 했다. 64M SD램 공정을 256M 공정으로 전환했다. 당시 오레곤주 현지 신문들은 여기에 하이닉스가 추가로 쓴 돈이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됐다고 했다.

하지만 유진 공장의 역사는 10년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하이닉스는 미국공장 생산을 중단한다. 오레곤 공장은 D램 메모리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유진공장에서는 200mm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세계 D램 산업은 300mm 웨이퍼 체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웨이버 직경이 1.5배 커지면 반도체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어난다.)
유진 공장은 이후 12년간 용도 없이 비어 있었다. 중간에 브로드컴이나 코닝이 인수하기도 했지만, 생산시설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부지와 공장이 경매에 나와 낙찰된다. 낙찰 시작가격은 150만 달러, 실제 낙찰가는 630만 달러였다.
Stratacache라는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샀다. 반도체가 아닌 고속도로 광고판이나 패스트푸드 메뉴 보드, 공항 티켓 키오스크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게 될 것이란 게 오레곤 현지 매체들의 이야기다. 1조 5천억 원 넘게 들였던 공장이 70억 원짜리가 됐다.
SK의 유진공장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메모리 반도체 핵심 공장은 왜 해외에 못 짓나
① '무시무시한 사이클'을 버티기 어렵다
우선은 사이클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는 사업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 바닥까지 떨어진다.
2000년대 중반 메모리 반도체 경쟁(치킨게임)이 심화했다. 디램 가격이 80% 이상 급락했다. 어지간한 반도체 회사들은 이때 손을 들고 나갔다. 일본 업체들은 그야말로 몰락했다.
하이닉스도 이 죽음의 게임에서 휘청거렸다. 유진공장은 2008년 가동이 중단됐다. 주인도 바뀌었다. SK가 새 주인이 된 건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고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시작되려던 2012년이다.
치킨 게임으로 인한 하락 사이클을 버티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격(원가경쟁력 유지)이다. 싸야한다. 싸게 못만들면 망한다. 메모리는 그래서 기술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 점에서 파운드리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외의 외따로 떨어져 있는 구식 시설에선 쉽지 않다. 고난의 시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공장은 폐기 대상이 될 뿐이다. 조 단위의 거대한 매몰 비용은 덤이다. 진출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장 신설에 '세제 혜택' 등의 당근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리스크가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유진공장이 가르쳐준 교훈이다.

② 생산 효율성 극대화도 쉽지 않다
게다가 D램은 '수요처'와의 거리보다는 '생산 효율성 극대화'가 중요하다. 사 줄 사람이 많은 곳에 가까울 필요성은 크지 않다. 작기 때문에 비행기로 날라도 된다. (코로나 초기 대한항공이 흑자를 낸 이유, 외신들은 삼성과 SK 반도체 수송 덕분이라고 했다)
대신 D램 시설은 '집적'되어야 한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한 곳에서 이뤄져야 한단 얘기다.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다. 현재 집적을 이루지 못한 경쟁자는 제대로 된 경쟁에 참여조차 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거대한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5나노 7나노 최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개발에는 2~3천억 원짜리 EUV 장비가 들어간다. 라인 하나 만드는 데 조 단위 '천문학적인 설비투자'가 필수적이다.
만들었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대규모 투자로 라인을 지속적으로 최신화시켜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거대 자본의 투하'에는 끝이 없다 .
게다가 "생산을 위한 기술 엔지니어"가 24시간 달라붙어 이 거대 시설을 계속 최신화, 효율화시켜야 한다. 자연히 집적되어야 관리도 투자도 용이해진다.
(삼성이나 LG, SK가 휴대전화나 LCD 공장, 심지어 배터리 공장까지도 '수요가 많은 곳'이나 '인건비가 싼 곳'에 짓지만, 반도체 핵심 공장(Fab)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다.)
■ 왜 반도체 수출 경쟁력은 여전한 것일까
물론 SK도 삼성전자도 해외 공장을 갖고는 있다. 삼성은 중국과 미국에, 하이닉스도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는 했다. 하지만 다른 전자 산업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숫자다.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의 핵심 기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밖으로 떠날 가능성도 작다.

■ 최태원 회장은 왜 'Yes'라고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메모리 시장의 고질적인 '가격 사이클'을 견디고,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야 유지 가능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을 자신이 없어서다. 아직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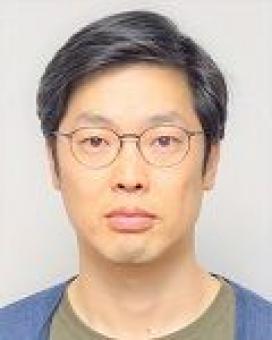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서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단독] 북한 외교관, 밀수가 <br>일상인데…중국 이례적 수색, 왜?](/data/news/2024/05/30/20240530_f6BGju.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