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불법 어업 선박이 부산항에 드나든다
입력 2022.03.22 (18:11)
수정 2022.03.22 (1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해양 멸종위기종 등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세계 69개국이 맺은 약정이 '항만국 조치 협정'인데요.
불법 어업을 했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선박에 대해 입항을 제한하자는 국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협정에 가입했는데, 불법 어선 단속 등과 관련한 현장 규제에 빈틈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부 이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항만국 조치 협정'이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중국의 전통요리인 '샥스핀' 잘 알고 계시죠?
이 요리의 재료인 상어 지느러미가 중화권에서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상어 남획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 내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까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1억 마리 상어가 지느러미를 잃고 죽어갈 정도인데요.
이처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을 퇴출시키자며 탄생한 게 바로 항만국 조치 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 어업을 저지른 어선에 대해선 입항을 전면 가로 막아서 불법 어획물의 거래를 차단시키고요.
불법 어업이 강하게 의심되는 고위험 어선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입니다.
[앵커]
협정대로면 어선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할텐데, 현장 단속 실태는 어떤가요?
[기자]
국내에는 부산항이 원양어선들의 입항 항만입니다.
이곳을 지난달 KBS 취재진이 찾아가봤는데요.
미국과 EU 등이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인 러시아와 파나마 등 국적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비불법어업국이란 심각한 불법 어업 관행이 계속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인데요.
항만국 조치 협정대로라면 항만 당국은 이들 고위험군 선박들에 대해서 불법 어획물 선적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단속 인력은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없었고요.
이 항만에서 매일 같이 일하는 하역 작업자들 역시 단속원들이 선박 내부를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슨해진 경계심을 틈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한 상어 지느러미를 싣고 부산항에 입항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항만에 불법 고위험 어선들의 입항이 빈번한 상황인가요?
[기자]
협정 체결 이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입항 횟수를 살펴봤더니, 10차례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조업이 강하게 의심되는 일명 '고위험 어선'의 출입인데요.
불법에 연루된 국가의 고위험 어선은 최근까지 5,800여 차례나 들어왔고, 90% 가까이가 검문검색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이 불법 어업의 중간 기착지가 된 셈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면, 현재 항만 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항만 당국은 국제수산기구가 제공하는 불법 어선 목록을 보고 어선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항 신고를 한 어선이 불법 목록에 있으면 입항을 막고요.
목록에 없으면 입항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록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해당 목록에는 어선들의 과거 선박 이름이나 고유 번호와 같은 핵심 정보들이 다수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불법 어선의 경우 그대로 입항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목록에만 의존하다 보면 불법 조업에 가담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절차적 이유 등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일명 고위험 선박 상당수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앵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불법 고위험 선박에 대해 폭넓게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항만 환경에 맞는 검색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또,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133명이 전국 31개 항만의 검색을 담당하는데요.
다른 업무도 함께 하다 보니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검색관 숫자를 더 늘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해양 멸종위기종 등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세계 69개국이 맺은 약정이 '항만국 조치 협정'인데요.
불법 어업을 했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선박에 대해 입항을 제한하자는 국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협정에 가입했는데, 불법 어선 단속 등과 관련한 현장 규제에 빈틈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부 이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항만국 조치 협정'이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중국의 전통요리인 '샥스핀' 잘 알고 계시죠?
이 요리의 재료인 상어 지느러미가 중화권에서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상어 남획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 내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까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1억 마리 상어가 지느러미를 잃고 죽어갈 정도인데요.
이처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을 퇴출시키자며 탄생한 게 바로 항만국 조치 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 어업을 저지른 어선에 대해선 입항을 전면 가로 막아서 불법 어획물의 거래를 차단시키고요.
불법 어업이 강하게 의심되는 고위험 어선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입니다.
[앵커]
협정대로면 어선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할텐데, 현장 단속 실태는 어떤가요?
[기자]
국내에는 부산항이 원양어선들의 입항 항만입니다.
이곳을 지난달 KBS 취재진이 찾아가봤는데요.
미국과 EU 등이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인 러시아와 파나마 등 국적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비불법어업국이란 심각한 불법 어업 관행이 계속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인데요.
항만국 조치 협정대로라면 항만 당국은 이들 고위험군 선박들에 대해서 불법 어획물 선적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단속 인력은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없었고요.
이 항만에서 매일 같이 일하는 하역 작업자들 역시 단속원들이 선박 내부를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슨해진 경계심을 틈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한 상어 지느러미를 싣고 부산항에 입항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항만에 불법 고위험 어선들의 입항이 빈번한 상황인가요?
[기자]
협정 체결 이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입항 횟수를 살펴봤더니, 10차례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조업이 강하게 의심되는 일명 '고위험 어선'의 출입인데요.
불법에 연루된 국가의 고위험 어선은 최근까지 5,800여 차례나 들어왔고, 90% 가까이가 검문검색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이 불법 어업의 중간 기착지가 된 셈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면, 현재 항만 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항만 당국은 국제수산기구가 제공하는 불법 어선 목록을 보고 어선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항 신고를 한 어선이 불법 목록에 있으면 입항을 막고요.
목록에 없으면 입항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록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해당 목록에는 어선들의 과거 선박 이름이나 고유 번호와 같은 핵심 정보들이 다수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불법 어선의 경우 그대로 입항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목록에만 의존하다 보면 불법 조업에 가담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절차적 이유 등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일명 고위험 선박 상당수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앵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불법 고위험 선박에 대해 폭넓게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항만 환경에 맞는 검색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또,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133명이 전국 31개 항만의 검색을 담당하는데요.
다른 업무도 함께 하다 보니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검색관 숫자를 더 늘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불법 어업 선박이 부산항에 드나든다
-
- 입력 2022-03-22 18:11:05
- 수정2022-03-22 18:32:28

[앵커]
해양 멸종위기종 등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세계 69개국이 맺은 약정이 '항만국 조치 협정'인데요.
불법 어업을 했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선박에 대해 입항을 제한하자는 국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협정에 가입했는데, 불법 어선 단속 등과 관련한 현장 규제에 빈틈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부 이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항만국 조치 협정'이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중국의 전통요리인 '샥스핀' 잘 알고 계시죠?
이 요리의 재료인 상어 지느러미가 중화권에서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상어 남획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 내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까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1억 마리 상어가 지느러미를 잃고 죽어갈 정도인데요.
이처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을 퇴출시키자며 탄생한 게 바로 항만국 조치 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 어업을 저지른 어선에 대해선 입항을 전면 가로 막아서 불법 어획물의 거래를 차단시키고요.
불법 어업이 강하게 의심되는 고위험 어선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입니다.
[앵커]
협정대로면 어선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할텐데, 현장 단속 실태는 어떤가요?
[기자]
국내에는 부산항이 원양어선들의 입항 항만입니다.
이곳을 지난달 KBS 취재진이 찾아가봤는데요.
미국과 EU 등이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인 러시아와 파나마 등 국적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비불법어업국이란 심각한 불법 어업 관행이 계속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인데요.
항만국 조치 협정대로라면 항만 당국은 이들 고위험군 선박들에 대해서 불법 어획물 선적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단속 인력은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없었고요.
이 항만에서 매일 같이 일하는 하역 작업자들 역시 단속원들이 선박 내부를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슨해진 경계심을 틈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한 상어 지느러미를 싣고 부산항에 입항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항만에 불법 고위험 어선들의 입항이 빈번한 상황인가요?
[기자]
협정 체결 이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입항 횟수를 살펴봤더니, 10차례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조업이 강하게 의심되는 일명 '고위험 어선'의 출입인데요.
불법에 연루된 국가의 고위험 어선은 최근까지 5,800여 차례나 들어왔고, 90% 가까이가 검문검색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이 불법 어업의 중간 기착지가 된 셈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면, 현재 항만 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항만 당국은 국제수산기구가 제공하는 불법 어선 목록을 보고 어선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항 신고를 한 어선이 불법 목록에 있으면 입항을 막고요.
목록에 없으면 입항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록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해당 목록에는 어선들의 과거 선박 이름이나 고유 번호와 같은 핵심 정보들이 다수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불법 어선의 경우 그대로 입항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목록에만 의존하다 보면 불법 조업에 가담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절차적 이유 등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일명 고위험 선박 상당수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앵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불법 고위험 선박에 대해 폭넓게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항만 환경에 맞는 검색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또,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133명이 전국 31개 항만의 검색을 담당하는데요.
다른 업무도 함께 하다 보니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검색관 숫자를 더 늘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해양 멸종위기종 등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세계 69개국이 맺은 약정이 '항만국 조치 협정'인데요.
불법 어업을 했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선박에 대해 입항을 제한하자는 국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협정에 가입했는데, 불법 어선 단속 등과 관련한 현장 규제에 빈틈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부 이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항만국 조치 협정'이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중국의 전통요리인 '샥스핀' 잘 알고 계시죠?
이 요리의 재료인 상어 지느러미가 중화권에서 고가에 거래되다 보니 상어 남획이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멸종위기종 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 내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까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1억 마리 상어가 지느러미를 잃고 죽어갈 정도인데요.
이처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을 퇴출시키자며 탄생한 게 바로 항만국 조치 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 어업을 저지른 어선에 대해선 입항을 전면 가로 막아서 불법 어획물의 거래를 차단시키고요.
불법 어업이 강하게 의심되는 고위험 어선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입니다.
[앵커]
협정대로면 어선들에 대한 규제가 상당할텐데, 현장 단속 실태는 어떤가요?
[기자]
국내에는 부산항이 원양어선들의 입항 항만입니다.
이곳을 지난달 KBS 취재진이 찾아가봤는데요.
미국과 EU 등이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인 러시아와 파나마 등 국적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비불법어업국이란 심각한 불법 어업 관행이 계속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인데요.
항만국 조치 협정대로라면 항만 당국은 이들 고위험군 선박들에 대해서 불법 어획물 선적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단속 인력은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없었고요.
이 항만에서 매일 같이 일하는 하역 작업자들 역시 단속원들이 선박 내부를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슨해진 경계심을 틈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한 상어 지느러미를 싣고 부산항에 입항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항만에 불법 고위험 어선들의 입항이 빈번한 상황인가요?
[기자]
협정 체결 이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입항 횟수를 살펴봤더니, 10차례가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조업이 강하게 의심되는 일명 '고위험 어선'의 출입인데요.
불법에 연루된 국가의 고위험 어선은 최근까지 5,800여 차례나 들어왔고, 90% 가까이가 검문검색 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이 불법 어업의 중간 기착지가 된 셈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면, 현재 항만 검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항만 당국은 국제수산기구가 제공하는 불법 어선 목록을 보고 어선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항 신고를 한 어선이 불법 목록에 있으면 입항을 막고요.
목록에 없으면 입항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록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해당 목록에는 어선들의 과거 선박 이름이나 고유 번호와 같은 핵심 정보들이 다수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불법 어선의 경우 그대로 입항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목록에만 의존하다 보면 불법 조업에 가담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절차적 이유 등으로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일명 고위험 선박 상당수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앵커]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기자]
먼저 불법 고위험 선박에 대해 폭넓게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항만 환경에 맞는 검색 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또,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133명이 전국 31개 항만의 검색을 담당하는데요.
다른 업무도 함께 하다 보니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검색관 숫자를 더 늘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
-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ET] 신랑 없이 홀로 선 신부…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economy_time/2022/03/22/30_5421205.jpg)
![[ET] 우크라 난민 절반이 ‘어린이’…부모 잃고, 피란길에](https://news.kbs.co.kr/data/news/title_image/newsmp4/economy_time/2022/03/22/52_542120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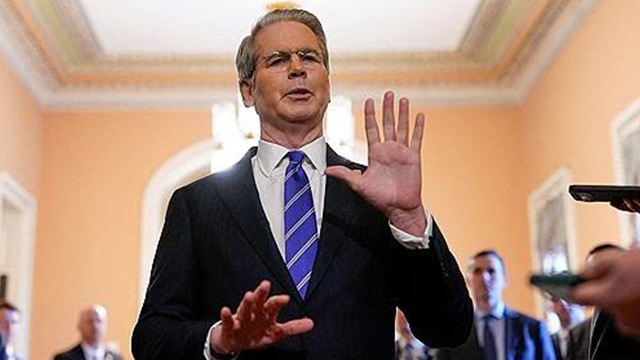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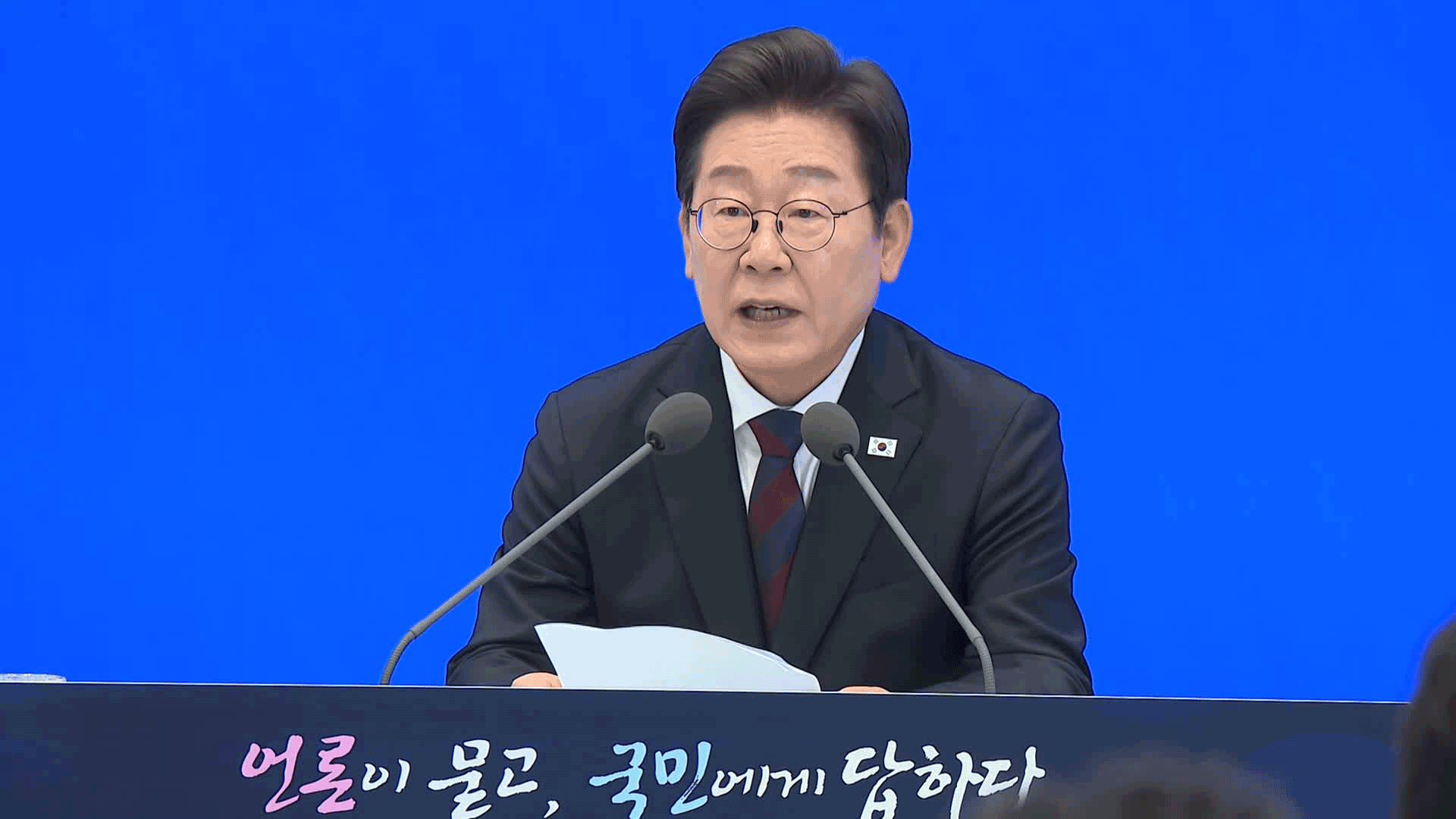
![[단독] 도이치 주포 “김건희, 내 덕에 떼돈 벌어…22억 원 주문”](/data/news/2025/07/03/20250703_KpuU43.png)
![[단독] “쪽지 얼핏 봤다, 안 받았다”더니…CCTV에선 문건 챙긴 이상민](/data/news/2025/07/03/20250703_Lv3LjI.pn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