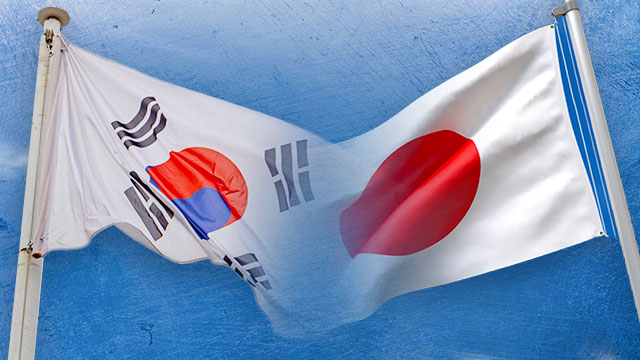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꾸린 민관협의회가 끝난 지도 두 달이 되어갑니다. 아직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등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도 피해자 동의 필요할까?
'병존적 채무 인수'는 원래 채무자(전범기업)의 채무는 그대로 두되, 제 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대위변제와는 달리, 채권자(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지난달 5일 4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법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존적 채무 인수' 역시 결국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래형 변호사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제 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효력은 당사자들 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관계에선 제 3자가 '채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제 3자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피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 3자에게 채무를 넘겨줄 경우, 해당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일제 피해자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토론회 모습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일제 피해자 문제 제대로 해결하자’ 토론회 모습■"법적으로 효과 있는 새 재단 설립해야"
토론회에선 그 대안도 논의됐습니다. 바로 양정숙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배상금의 재원은 '기부금'이 아닌 일본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의 취지로 신탁한 '신탁금'에서 지급되도록 해,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빠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일본 기업 강제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배상금의 상당액을 먼저 재단에 신탁하고, 제 3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와 기업이 본질적으로 채무를 지도록 규정한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봉태 변호사는 "기존 재단은 일본 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도 결국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재단의 경우, 일본 기업이 돈을 내도 다 받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내는지 적정성을 심사해 결정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이 재단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모든 법적 리스크는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선 굴욕적으로 배상금을 받지 않아도 돼, 피해자들의 존엄성도 지켜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선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어서, 이번 회담에서도 논의됐는데요. 한일 고위급 회담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존적 채무인수’, 강제동원 해법 ‘묘안’ 될수 있나?
-
- 입력 2022-10-25 18:4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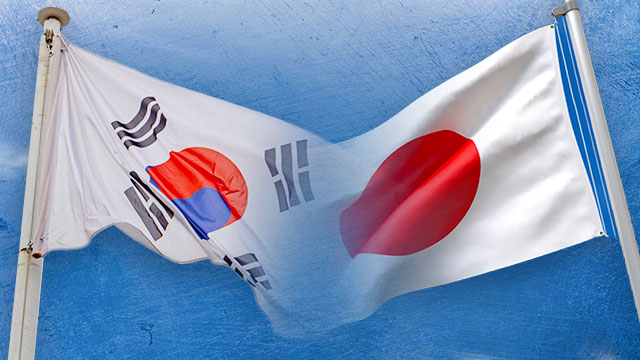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꾸린 민관협의회가 끝난 지도 두 달이 되어갑니다. 아직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등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도 피해자 동의 필요할까?
'병존적 채무 인수'는 원래 채무자(전범기업)의 채무는 그대로 두되, 제 3자가 기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대위변제와는 달리, 채권자(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지난달 5일 4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법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병존적 채무 인수' 역시 결국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래형 변호사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제 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효력은 당사자들 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관계에선 제 3자가 '채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제 3자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피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 3자에게 채무를 넘겨줄 경우, 해당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효과 있는 새 재단 설립해야"
토론회에선 그 대안도 논의됐습니다. 바로 양정숙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배상금의 재원은 '기부금'이 아닌 일본 정부와 기업이 손해배상의 취지로 신탁한 '신탁금'에서 지급되도록 해,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빠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일본 기업 강제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배상금의 상당액을 먼저 재단에 신탁하고, 제 3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와 기업이 본질적으로 채무를 지도록 규정한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봉태 변호사는 "기존 재단은 일본 기업과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도 결국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재단의 경우, 일본 기업이 돈을 내도 다 받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내는지 적정성을 심사해 결정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이 재단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모든 법적 리스크는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선 굴욕적으로 배상금을 받지 않아도 돼, 피해자들의 존엄성도 지켜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선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이어서, 이번 회담에서도 논의됐는데요. 한일 고위급 회담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
-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이수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