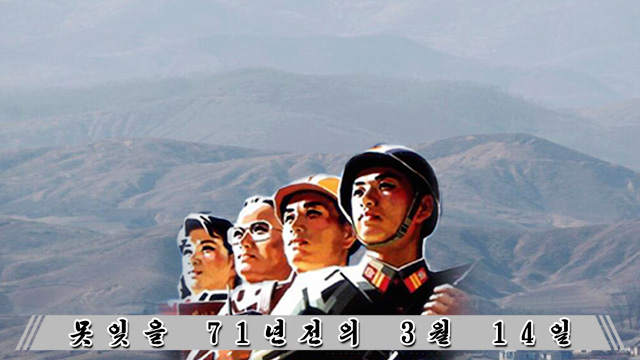
| "수많은 목재를 약탈해간 일제의 간악한 책동에 의해 황폐화되였던 이 나라의 산림…(중략) 미제 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조국의 산들은 또다시 황폐화되고 있었다" ― 2023년 3월 14일 노동신문 2면 '못 잊을 71년 전의 3월 14일' 중 ― |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이 우리 식목일과 비슷한 식수절(植樹節)인 오늘(14일), 주민들에게 산림 녹화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산림 황폐화의 책임을 미국과 일본에 전가했습니다.
'식수절'에까지 '제국주의 폭제' 프레임을 씌워 미·일 때리기에 나선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 "민둥산, 국가자본주의 실패 상징"
북한 산림이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심하게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후 복구 이후 지속된 산림 황폐화의 주 원인은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 결과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전쟁 이후 중공업 우선 정책을 고수해 농업기반 투자를 게을리 한데다, 1970년대 식량 증산을 위해 대대적으로 산지 개발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정설입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산림 축소는 1990년대 들어 더 가속화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990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 산림의 약 40 퍼센트가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300만 명가량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자연 약탈적 농업이 기승을 부렸고, 땔감 벌목도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의 탈북민 이민복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민둥산의 원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땔감이 없고 자재난이 극심해 목재로 대신하다 보니 민둥산화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둥산은 북한 국가자본주의 실패의 상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식수절 '반제국주의' 메시지, 왜?
북한에 민둥산이 많은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이 식수절날 나무를 심자는 메시지를 넘어 반미·반일정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자신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미국과 부당한 제재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려 국제사회 제재를 초래한 실정을 덮고 내부 불만을 추스르기 위해 반 미 선동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체제 유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어제 방영한 ‘추억 속에 영원하리’ 캡처. 자연재해와 미국 제국주의 압박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인민들이 군대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최근 연일 이런 종류의 기록영화를 내보내고 있다 (출처 : 조선중앙TV)
북한이 어제 방영한 ‘추억 속에 영원하리’ 캡처. 자연재해와 미국 제국주의 압박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인민들이 군대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최근 연일 이런 종류의 기록영화를 내보내고 있다 (출처 : 조선중앙TV)■ 북, 인권 문제까지 중·러 끌어들이나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근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을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적 대응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봤는데요. 양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한미일과 이를 반대하는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인권 문제에서도 신냉전 구도가 생기면 손해 볼 게 없다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일대일 밀착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러시아 점령지인 돈바스 지역에 노동자들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 3연임을 계기로 한껏 우의를 과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 연임 확정 당일 축전을 보낸데 이어,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북한 수뇌부가 잇따라 각자의 상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북·중 간) 전략 전술적 협조를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겉으로는 미국이 냉전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그런 냉전 구조가 정착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 대립 격화로 중러의 북한 감싸기는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박 교수는 현재 북·중·러의 결집을 '편의에 의한 결합 관계'로 평가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부의 난을 돌파하기 위해 신냉전 구도에 적극 편승한 북한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둥산도 미·일 탓”…북, 신냉전 격화 반기나?
-
- 입력 2023-03-14 17:1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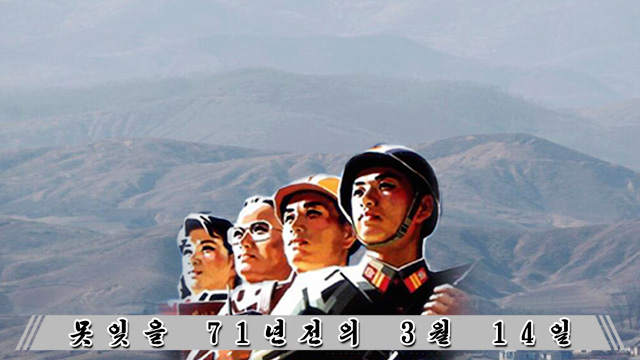
| "수많은 목재를 약탈해간 일제의 간악한 책동에 의해 황폐화되였던 이 나라의 산림…(중략) 미제 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조국의 산들은 또다시 황폐화되고 있었다" ― 2023년 3월 14일 노동신문 2면 '못 잊을 71년 전의 3월 14일' 중 ― |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이 우리 식목일과 비슷한 식수절(植樹節)인 오늘(14일), 주민들에게 산림 녹화에 매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산림 황폐화의 책임을 미국과 일본에 전가했습니다.
'식수절'에까지 '제국주의 폭제' 프레임을 씌워 미·일 때리기에 나선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 "민둥산, 국가자본주의 실패 상징"
북한 산림이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심하게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후 복구 이후 지속된 산림 황폐화의 주 원인은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 결과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전쟁 이후 중공업 우선 정책을 고수해 농업기반 투자를 게을리 한데다, 1970년대 식량 증산을 위해 대대적으로 산지 개발을 추진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정설입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산림 축소는 1990년대 들어 더 가속화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990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 산림의 약 40 퍼센트가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300만 명가량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자연 약탈적 농업이 기승을 부렸고, 땔감 벌목도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의 탈북민 이민복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민둥산의 원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땔감이 없고 자재난이 극심해 목재로 대신하다 보니 민둥산화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둥산은 북한 국가자본주의 실패의 상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식수절 '반제국주의' 메시지, 왜?
북한에 민둥산이 많은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이 식수절날 나무를 심자는 메시지를 넘어 반미·반일정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 자신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미국과 부당한 제재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려 국제사회 제재를 초래한 실정을 덮고 내부 불만을 추스르기 위해 반 미 선동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체제 유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북, 인권 문제까지 중·러 끌어들이나
신냉전 구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근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을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적 대응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봤는데요. 양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는 한미일과 이를 반대하는 북·중·러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인권 문제에서도 신냉전 구도가 생기면 손해 볼 게 없다는 게 북한의 생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일대일 밀착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러시아 점령지인 돈바스 지역에 노동자들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는 시진핑 주석 3연임을 계기로 한껏 우의를 과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 연임 확정 당일 축전을 보낸데 이어,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북한 수뇌부가 잇따라 각자의 상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북·중 간) 전략 전술적 협조를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겉으로는 미국이 냉전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그런 냉전 구조가 정착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 대립 격화로 중러의 북한 감싸기는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박 교수는 현재 북·중·러의 결집을 '편의에 의한 결합 관계'로 평가하면서,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부의 난을 돌파하기 위해 신냉전 구도에 적극 편승한 북한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

송영석 기자 sys@kbs.co.kr
송영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