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임종하고 싶어도, 대부분 병원에서 죽는다
입력 2023.04.18 (21:38)
수정 2023.04.18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르신들은 가장 편한 곳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인데요.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 순간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담도암 말기인 강순일 씨.
반년 전 병원 항암치료를 중단한 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순일/가정 호스피스 이용자 : "아무래도 집이 좋죠. 거기서(병원서) 맨날 항암 주사 맞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저기 하면서 여기선(집에선) 내가 간식도 사달라는 거 집사람이 사다 주면 먹는데 거기는 그게 없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의사가 방문해 강 씨를 진료합니다.
["배 아픈 건 어떠세요? 은근히 아파요?"]
이런 가정 호스피스 의료 지원 혜택은 연간 8백 명 남짓, 한해 임종한 사람의 약 0.2%에게만 주어집니다.
강 씨는 여기에 간병이 가능한 아내가 있어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임종을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순옥/보호자 : "이동 변기에 다 보고. 다 그냥 집에서는 뭐든지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때 기다리고 엄청 기다려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한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집에서는 간병과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워,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숨지면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어 임종 직전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어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가정 호스피스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가 더욱더 확충되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암 등 특정 질병만을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생애 말기 단계에 진입한 환자들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병원에서의 임종,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품위나 존엄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요즘 가장 흔한 임종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명 셔틀'이라는 표현인데요.
임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응급실, 거기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오가다 어딘가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연명 셔틀'이라 부릅니다.
[앵커]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도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우리 의료 현실에서는 생애 말기 환자조차도 처치와 치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를 현장에선 '죽음의 의료화'라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현아/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병원에 오시게 되면 모든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지금 쇠약한 상태에서 몸을 피 뽑아서 검사를 수백 가지를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이상이 나오고 그것들을 다 치료하다가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교정하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결국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앵커]
생애 말기 환자들, 꼭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반 병실에서 맞이하는 평온한 임종,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탓에 일반 환자와 격리될 수밖에 없고요.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이른바 임종실도 대부분의 병원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무례하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박중철/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마지막까지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다인실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인실 가야 하는데 큰 비용이 들죠.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이 1인실도 자리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옮겨지는 곳이 바로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라는 곳은 간호사실 옆에 물품을 쌓아 놓는 공간이거든요. 병원에서 임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앵커]
삶의 마지막 순간,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우리 사회는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고요.
병원에선 무례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임종실을 비롯해 임종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집에선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간병과 의료 지원, 제도적 뒷밤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전유진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르신들은 가장 편한 곳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인데요.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 순간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담도암 말기인 강순일 씨.
반년 전 병원 항암치료를 중단한 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순일/가정 호스피스 이용자 : "아무래도 집이 좋죠. 거기서(병원서) 맨날 항암 주사 맞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저기 하면서 여기선(집에선) 내가 간식도 사달라는 거 집사람이 사다 주면 먹는데 거기는 그게 없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의사가 방문해 강 씨를 진료합니다.
["배 아픈 건 어떠세요? 은근히 아파요?"]
이런 가정 호스피스 의료 지원 혜택은 연간 8백 명 남짓, 한해 임종한 사람의 약 0.2%에게만 주어집니다.
강 씨는 여기에 간병이 가능한 아내가 있어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임종을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순옥/보호자 : "이동 변기에 다 보고. 다 그냥 집에서는 뭐든지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때 기다리고 엄청 기다려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한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집에서는 간병과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워,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숨지면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어 임종 직전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어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가정 호스피스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가 더욱더 확충되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암 등 특정 질병만을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생애 말기 단계에 진입한 환자들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병원에서의 임종,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품위나 존엄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요즘 가장 흔한 임종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명 셔틀'이라는 표현인데요.
임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응급실, 거기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오가다 어딘가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연명 셔틀'이라 부릅니다.
[앵커]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도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우리 의료 현실에서는 생애 말기 환자조차도 처치와 치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를 현장에선 '죽음의 의료화'라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현아/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병원에 오시게 되면 모든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지금 쇠약한 상태에서 몸을 피 뽑아서 검사를 수백 가지를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이상이 나오고 그것들을 다 치료하다가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교정하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결국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앵커]
생애 말기 환자들, 꼭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반 병실에서 맞이하는 평온한 임종,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탓에 일반 환자와 격리될 수밖에 없고요.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이른바 임종실도 대부분의 병원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무례하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박중철/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마지막까지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다인실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인실 가야 하는데 큰 비용이 들죠.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이 1인실도 자리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옮겨지는 곳이 바로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라는 곳은 간호사실 옆에 물품을 쌓아 놓는 공간이거든요. 병원에서 임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앵커]
삶의 마지막 순간,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우리 사회는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고요.
병원에선 무례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임종실을 비롯해 임종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집에선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간병과 의료 지원, 제도적 뒷밤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전유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에서 임종하고 싶어도, 대부분 병원에서 죽는다
-
- 입력 2023-04-18 21:38:31
- 수정2023-04-18 21:50:45

[앵커]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르신들은 가장 편한 곳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인데요.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 순간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담도암 말기인 강순일 씨.
반년 전 병원 항암치료를 중단한 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순일/가정 호스피스 이용자 : "아무래도 집이 좋죠. 거기서(병원서) 맨날 항암 주사 맞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저기 하면서 여기선(집에선) 내가 간식도 사달라는 거 집사람이 사다 주면 먹는데 거기는 그게 없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의사가 방문해 강 씨를 진료합니다.
["배 아픈 건 어떠세요? 은근히 아파요?"]
이런 가정 호스피스 의료 지원 혜택은 연간 8백 명 남짓, 한해 임종한 사람의 약 0.2%에게만 주어집니다.
강 씨는 여기에 간병이 가능한 아내가 있어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임종을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순옥/보호자 : "이동 변기에 다 보고. 다 그냥 집에서는 뭐든지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때 기다리고 엄청 기다려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한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집에서는 간병과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워,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숨지면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어 임종 직전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어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가정 호스피스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가 더욱더 확충되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암 등 특정 질병만을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생애 말기 단계에 진입한 환자들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병원에서의 임종,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품위나 존엄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요즘 가장 흔한 임종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명 셔틀'이라는 표현인데요.
임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응급실, 거기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오가다 어딘가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연명 셔틀'이라 부릅니다.
[앵커]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도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우리 의료 현실에서는 생애 말기 환자조차도 처치와 치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를 현장에선 '죽음의 의료화'라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현아/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병원에 오시게 되면 모든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지금 쇠약한 상태에서 몸을 피 뽑아서 검사를 수백 가지를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이상이 나오고 그것들을 다 치료하다가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교정하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결국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앵커]
생애 말기 환자들, 꼭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반 병실에서 맞이하는 평온한 임종,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탓에 일반 환자와 격리될 수밖에 없고요.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이른바 임종실도 대부분의 병원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무례하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박중철/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마지막까지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다인실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인실 가야 하는데 큰 비용이 들죠.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이 1인실도 자리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옮겨지는 곳이 바로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라는 곳은 간호사실 옆에 물품을 쌓아 놓는 공간이거든요. 병원에서 임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앵커]
삶의 마지막 순간,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우리 사회는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고요.
병원에선 무례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임종실을 비롯해 임종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집에선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간병과 의료 지원, 제도적 뒷밤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전유진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르신들은 가장 편한 곳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인데요.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 순간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담도암 말기인 강순일 씨.
반년 전 병원 항암치료를 중단한 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강순일/가정 호스피스 이용자 : "아무래도 집이 좋죠. 거기서(병원서) 맨날 항암 주사 맞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저기 하면서 여기선(집에선) 내가 간식도 사달라는 거 집사람이 사다 주면 먹는데 거기는 그게 없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의사가 방문해 강 씨를 진료합니다.
["배 아픈 건 어떠세요? 은근히 아파요?"]
이런 가정 호스피스 의료 지원 혜택은 연간 8백 명 남짓, 한해 임종한 사람의 약 0.2%에게만 주어집니다.
강 씨는 여기에 간병이 가능한 아내가 있어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임종을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순옥/보호자 : "이동 변기에 다 보고. 다 그냥 집에서는 뭐든지 편안하니까 마음도 편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때 기다리고 엄청 기다려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한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집에서는 간병과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워,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숨지면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어 임종 직전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어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가정 호스피스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가 더욱더 확충되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암 등 특정 질병만을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생애 말기 단계에 진입한 환자들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앵커]
이 문제 취재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병원에서의 임종,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품위나 존엄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요즘 가장 흔한 임종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명 셔틀'이라는 표현인데요.
임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응급실, 거기서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오가다 어딘가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연명 셔틀'이라 부릅니다.
[앵커]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도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우리 의료 현실에서는 생애 말기 환자조차도 처치와 치료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를 현장에선 '죽음의 의료화'라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현아/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병원에 오시게 되면 모든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지금 쇠약한 상태에서 몸을 피 뽑아서 검사를 수백 가지를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이상이 나오고 그것들을 다 치료하다가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교정하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결국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앵커]
생애 말기 환자들, 꼭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반 병실에서 맞이하는 평온한 임종,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탓에 일반 환자와 격리될 수밖에 없고요.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이른바 임종실도 대부분의 병원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무례하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박중철/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마지막까지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다인실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인실 가야 하는데 큰 비용이 들죠.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이 1인실도 자리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옮겨지는 곳이 바로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라는 곳은 간호사실 옆에 물품을 쌓아 놓는 공간이거든요. 병원에서 임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앵커]
삶의 마지막 순간,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데, 대안이 있을까요?
[기자]
우리 사회는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고요.
병원에선 무례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임종실을 비롯해 임종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집에선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간병과 의료 지원, 제도적 뒷밤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전유진
-
-

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박광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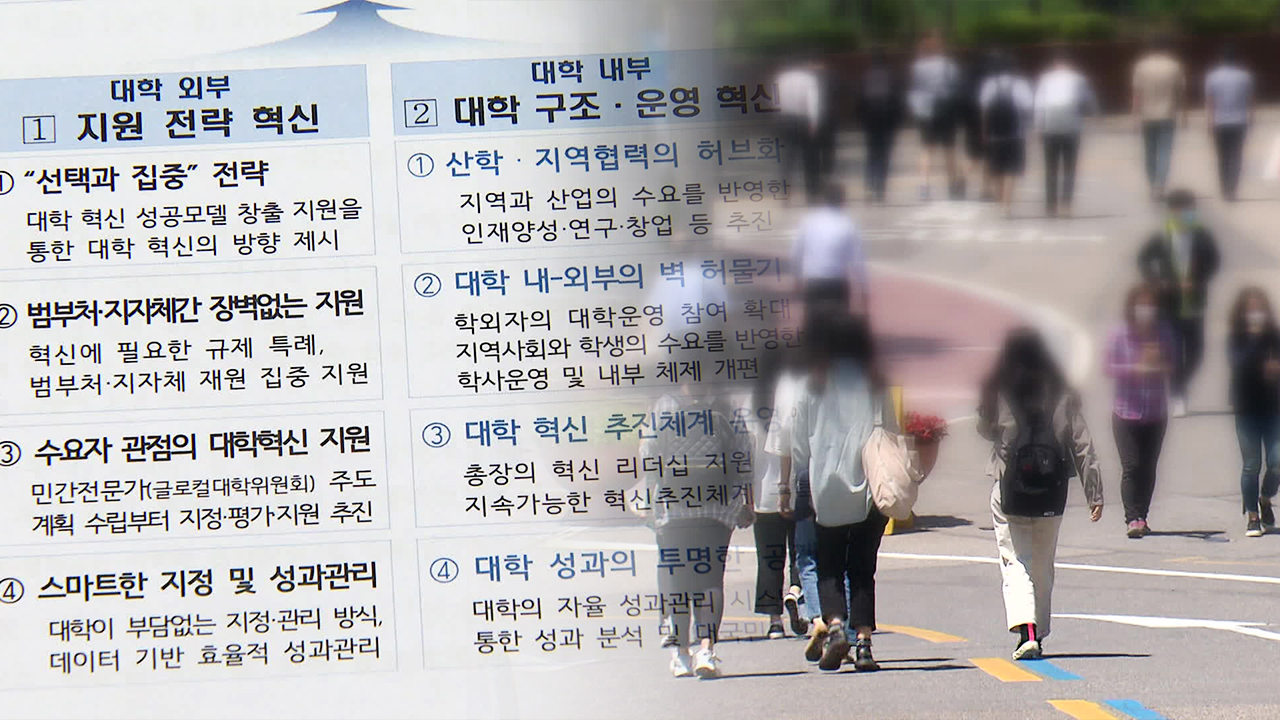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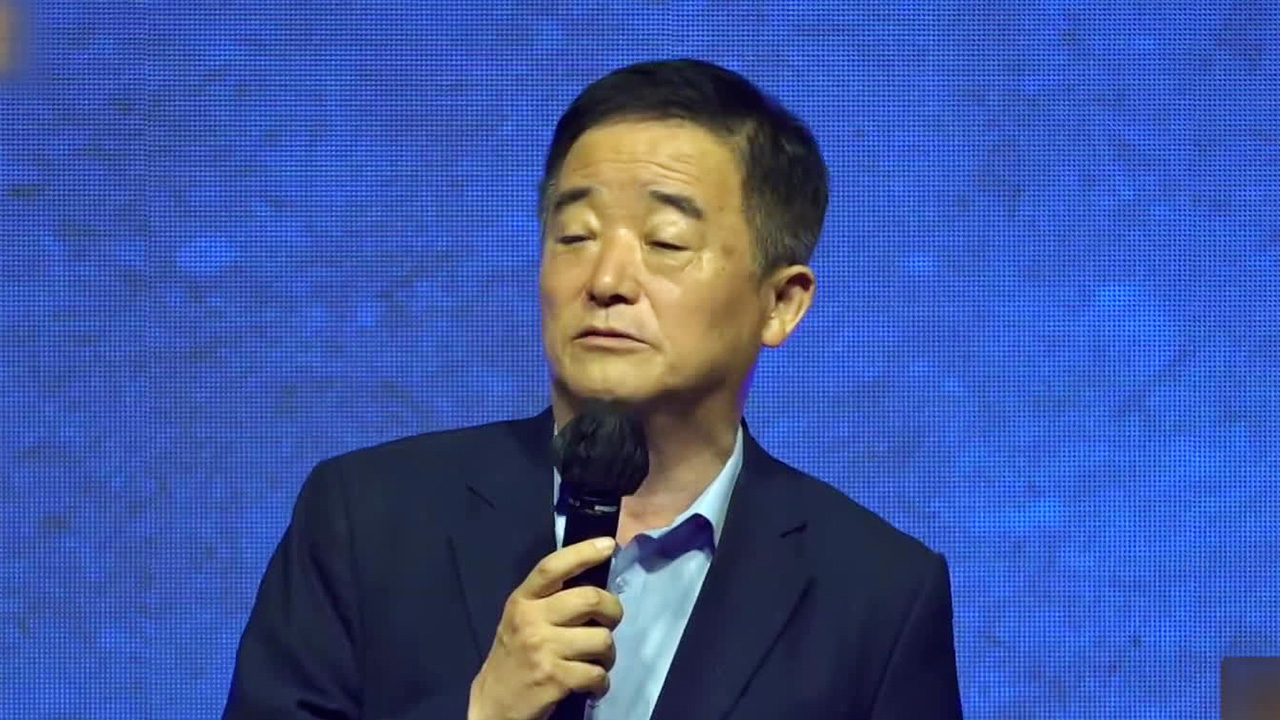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