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취약계층 성실히 빚 갚으면 최대 95% 감면
입력 2019.07.09 (18:07)
수정 2019.07.09 (1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 경제, 오늘은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알아봅니다.
경제부 서영민 기자, 제도 취지와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정부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봐도 빚 갚을 능력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들은 빚의 일부만이라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능력이 안 된다, 는 판단의 기준은, 그래픽을 보면요.
우선 ①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형 혹은 의료형 수급자인 사람과 장애연금 수령자, 그리고 ②70살 이상 고령자 채무자 마지막으로 ③원금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
이 범위에 드는 사람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서울 기준으로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인 사람,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찾아가거나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람들은 빚의 일부만 갚으면 된다는 건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기자]
대상에 따라 다른데, 5에서 15%입니다.
우선 대상별로 원금의 70에서 90%를 깎아주고 빚 갚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10에서 30%만 남겠죠,
그다음에 3년 동안 이 빚의 절반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나머지 절반을 탕감해줘서 결과적으론 5~15%가 되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파격적인데,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빚 탕감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정부 지원이 없으면 생계도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을 게 빤한데 빚 갚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빚 못 갚아 저신용자가 되면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사람들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 회생의 기회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앵커]
취지는 좋지만, 당장 도덕적 해이 부추긴단 비판이 나올 거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히 들 거고요.
[기자]
네, 사실 소액 채무 장기간 연체한 사람 대상으로는 정부가 한시적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엔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을 일부 확대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 몇 차례 기사도 썼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반발 심리가 큽니다.
'5%에서 15%만 갚으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성실히 빚 갚는 사람 바보 만드냐', '내년 총선 때문이냐',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일리 있는 지적 아닐까요?
왜냐하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기자]
네, 정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훼손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빚 못 갚는 상황이 5년을 넘어서게 되면 이 빚을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실업자가 되고, 국가 사회복지제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세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만 악성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도덕적 해이 유발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합니다.
지난해 한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허락받은 사람, 3천 5백 명 정도입니다.
한해 신용복지위원회 찾아오는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면 제외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엄격히 선발해서 도덕적 해이 최소화되게 한단 거지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과도한 혜택이 되는 거 아닌지는 언론이, 또 다른 기관들이 꼼꼼하게 감시해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또 세금 낭비 하냐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 드나요?
[기자]
아닙니다.
세금 들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복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을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금융기관들도 딱히 손해라고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안갚은 악성 채권, 이게 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가면 팔리는 가격이 있습니다.
채권마다 다르긴 하지만 10년 넘으면 대략 5~10%밖에 못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15% 받거든요.
회수 금액이 비율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세금 안 들고, 또 금융기관도 손해가 아니고, 어려운 처지 있는 분들은 재기할 수 있는 거죠.
포인트 경제, 오늘은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알아봅니다.
경제부 서영민 기자, 제도 취지와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정부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봐도 빚 갚을 능력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들은 빚의 일부만이라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능력이 안 된다, 는 판단의 기준은, 그래픽을 보면요.
우선 ①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형 혹은 의료형 수급자인 사람과 장애연금 수령자, 그리고 ②70살 이상 고령자 채무자 마지막으로 ③원금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
이 범위에 드는 사람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서울 기준으로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인 사람,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찾아가거나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람들은 빚의 일부만 갚으면 된다는 건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기자]
대상에 따라 다른데, 5에서 15%입니다.
우선 대상별로 원금의 70에서 90%를 깎아주고 빚 갚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10에서 30%만 남겠죠,
그다음에 3년 동안 이 빚의 절반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나머지 절반을 탕감해줘서 결과적으론 5~15%가 되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파격적인데,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빚 탕감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정부 지원이 없으면 생계도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을 게 빤한데 빚 갚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빚 못 갚아 저신용자가 되면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사람들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 회생의 기회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앵커]
취지는 좋지만, 당장 도덕적 해이 부추긴단 비판이 나올 거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히 들 거고요.
[기자]
네, 사실 소액 채무 장기간 연체한 사람 대상으로는 정부가 한시적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엔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을 일부 확대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 몇 차례 기사도 썼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반발 심리가 큽니다.
'5%에서 15%만 갚으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성실히 빚 갚는 사람 바보 만드냐', '내년 총선 때문이냐',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일리 있는 지적 아닐까요?
왜냐하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기자]
네, 정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훼손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빚 못 갚는 상황이 5년을 넘어서게 되면 이 빚을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실업자가 되고, 국가 사회복지제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세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만 악성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도덕적 해이 유발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합니다.
지난해 한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허락받은 사람, 3천 5백 명 정도입니다.
한해 신용복지위원회 찾아오는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면 제외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엄격히 선발해서 도덕적 해이 최소화되게 한단 거지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과도한 혜택이 되는 거 아닌지는 언론이, 또 다른 기관들이 꼼꼼하게 감시해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또 세금 낭비 하냐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 드나요?
[기자]
아닙니다.
세금 들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복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을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금융기관들도 딱히 손해라고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안갚은 악성 채권, 이게 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가면 팔리는 가격이 있습니다.
채권마다 다르긴 하지만 10년 넘으면 대략 5~10%밖에 못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15% 받거든요.
회수 금액이 비율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세금 안 들고, 또 금융기관도 손해가 아니고, 어려운 처지 있는 분들은 재기할 수 있는 거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인트 경제] 취약계층 성실히 빚 갚으면 최대 95% 감면
-
- 입력 2019-07-09 18:12:57
- 수정2019-07-09 18:23:40

[앵커]
포인트 경제, 오늘은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알아봅니다.
경제부 서영민 기자, 제도 취지와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정부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봐도 빚 갚을 능력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들은 빚의 일부만이라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능력이 안 된다, 는 판단의 기준은, 그래픽을 보면요.
우선 ①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형 혹은 의료형 수급자인 사람과 장애연금 수령자, 그리고 ②70살 이상 고령자 채무자 마지막으로 ③원금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
이 범위에 드는 사람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서울 기준으로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인 사람,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찾아가거나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람들은 빚의 일부만 갚으면 된다는 건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기자]
대상에 따라 다른데, 5에서 15%입니다.
우선 대상별로 원금의 70에서 90%를 깎아주고 빚 갚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10에서 30%만 남겠죠,
그다음에 3년 동안 이 빚의 절반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나머지 절반을 탕감해줘서 결과적으론 5~15%가 되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파격적인데,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빚 탕감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정부 지원이 없으면 생계도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을 게 빤한데 빚 갚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빚 못 갚아 저신용자가 되면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사람들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 회생의 기회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앵커]
취지는 좋지만, 당장 도덕적 해이 부추긴단 비판이 나올 거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히 들 거고요.
[기자]
네, 사실 소액 채무 장기간 연체한 사람 대상으로는 정부가 한시적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엔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을 일부 확대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 몇 차례 기사도 썼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반발 심리가 큽니다.
'5%에서 15%만 갚으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성실히 빚 갚는 사람 바보 만드냐', '내년 총선 때문이냐',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일리 있는 지적 아닐까요?
왜냐하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기자]
네, 정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훼손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빚 못 갚는 상황이 5년을 넘어서게 되면 이 빚을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실업자가 되고, 국가 사회복지제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세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만 악성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도덕적 해이 유발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합니다.
지난해 한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허락받은 사람, 3천 5백 명 정도입니다.
한해 신용복지위원회 찾아오는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면 제외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엄격히 선발해서 도덕적 해이 최소화되게 한단 거지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과도한 혜택이 되는 거 아닌지는 언론이, 또 다른 기관들이 꼼꼼하게 감시해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또 세금 낭비 하냐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 드나요?
[기자]
아닙니다.
세금 들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복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을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금융기관들도 딱히 손해라고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안갚은 악성 채권, 이게 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가면 팔리는 가격이 있습니다.
채권마다 다르긴 하지만 10년 넘으면 대략 5~10%밖에 못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15% 받거든요.
회수 금액이 비율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세금 안 들고, 또 금융기관도 손해가 아니고, 어려운 처지 있는 분들은 재기할 수 있는 거죠.
포인트 경제, 오늘은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 알아봅니다.
경제부 서영민 기자, 제도 취지와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정부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봐도 빚 갚을 능력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들은 빚의 일부만이라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능력이 안 된다, 는 판단의 기준은, 그래픽을 보면요.
우선 ①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형 혹은 의료형 수급자인 사람과 장애연금 수령자, 그리고 ②70살 이상 고령자 채무자 마지막으로 ③원금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
이 범위에 드는 사람 가운데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서울 기준으로 4,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인 사람,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찾아가거나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람들은 빚의 일부만 갚으면 된다는 건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기자]
대상에 따라 다른데, 5에서 15%입니다.
우선 대상별로 원금의 70에서 90%를 깎아주고 빚 갚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10에서 30%만 남겠죠,
그다음에 3년 동안 이 빚의 절반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나머지 절반을 탕감해줘서 결과적으론 5~15%가 되는 겁니다.
[앵커]
상당히 파격적인데,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빚 탕감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정부 지원이 없으면 생계도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득이 없을 게 빤한데 빚 갚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빚 못 갚아 저신용자가 되면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사람들 도와줘서 다시 일어설, 회생의 기회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앵커]
취지는 좋지만, 당장 도덕적 해이 부추긴단 비판이 나올 거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도 당연히 들 거고요.
[기자]
네, 사실 소액 채무 장기간 연체한 사람 대상으로는 정부가 한시적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엔 상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을 일부 확대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 몇 차례 기사도 썼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반발 심리가 큽니다.
'5%에서 15%만 갚으면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성실히 빚 갚는 사람 바보 만드냐', '내년 총선 때문이냐',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일리 있는 지적 아닐까요?
왜냐하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진다면 금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기자]
네, 정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훼손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정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원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빚 못 갚는 상황이 5년을 넘어서게 되면 이 빚을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실업자가 되고, 국가 사회복지제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세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만 악성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도덕적 해이 유발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도 합니다.
지난해 한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허락받은 사람, 3천 5백 명 정도입니다.
한해 신용복지위원회 찾아오는 사람이 10만 명이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면 제외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엄격히 선발해서 도덕적 해이 최소화되게 한단 거지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과도한 혜택이 되는 거 아닌지는 언론이, 또 다른 기관들이 꼼꼼하게 감시해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은 또 세금 낭비 하냐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 드나요?
[기자]
아닙니다.
세금 들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복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을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금융기관들도 딱히 손해라고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넘게 안갚은 악성 채권, 이게 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가면 팔리는 가격이 있습니다.
채권마다 다르긴 하지만 10년 넘으면 대략 5~10%밖에 못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15% 받거든요.
회수 금액이 비율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세금 안 들고, 또 금융기관도 손해가 아니고, 어려운 처지 있는 분들은 재기할 수 있는 거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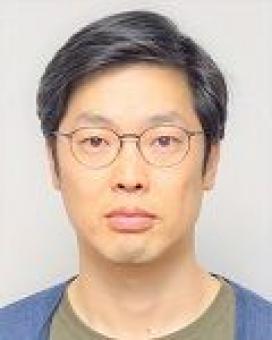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서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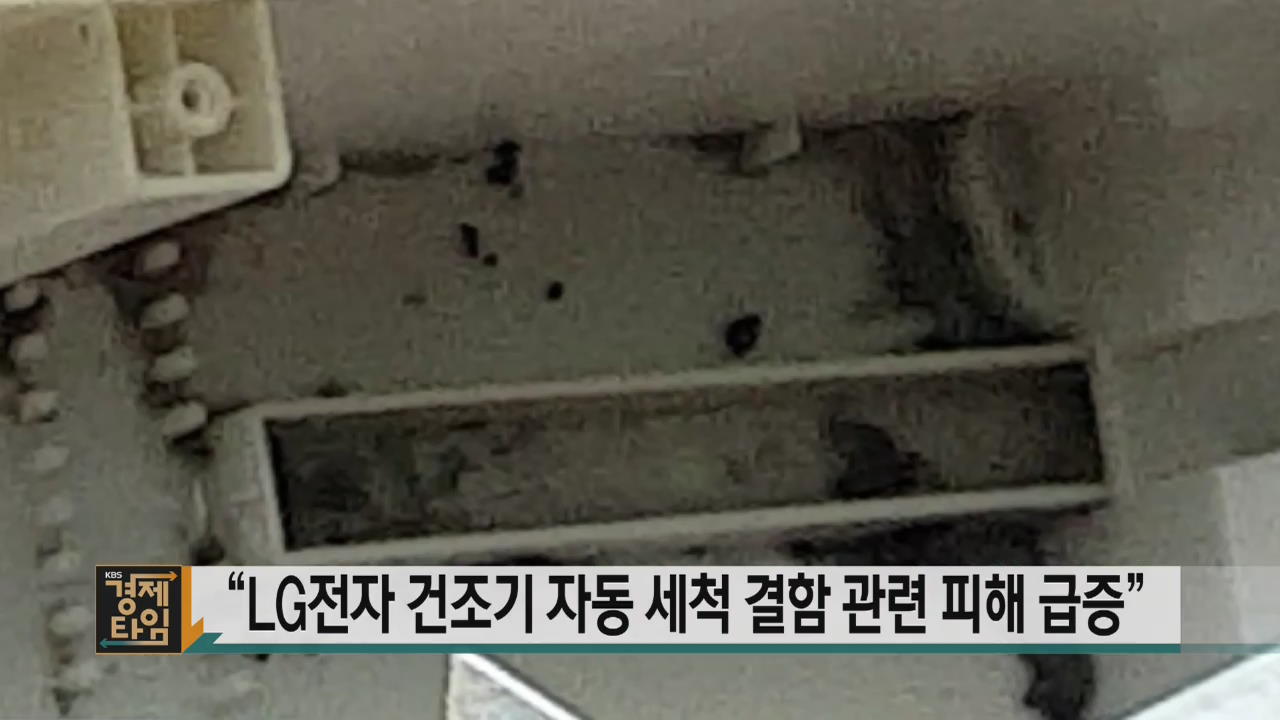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