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하늘소! 장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크고 늠름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북쪽 대륙을 통틀어 딱정벌레류 중에서 가장 큽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서식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드물게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관찰될 뿐입니다.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장수하늘소를 인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들여온 장수하늘소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를 통해 16개월(1년4개월)만에 4마리의 성체를 키워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장수하늘소 용화
장수하늘소 용화
장수하늘소 알에서 성체까지 사육 기간 1/3로 단축
장수하늘소의 인공번식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2년 인공증식에 성공했습니다.
[관련보도] ☞ [뉴스9]멸종위기종 장수하늘소 국내 첫 복원 성공
하지만 알에서 성체로 사육하는 기간이 4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16개월(1년 4개월)만에 성충으로 우화(羽化)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번식 기간을 무려 1/3로 단축한 것입니다.
온도 습도 인공먹이 최적화가 단기 증식의 비결
사육기간 단축의 성공 비결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먹이 등 사육 조건의 최적화였습니다. 보통 야생에서 장수하늘소는 5~6년이 지나야 성체로 우화합니다. 5년 가량을 애벌레와 번데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공 증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는 먹이를 개발해 단기간 증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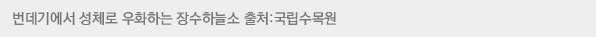
이번 증식 기술은 중국에서 들여온 장수하늘소를 통해 얻었습니다. 이제 광릉이나 국내 강원도의 숲에서 토종 장수하늘소가 채집될 경우 이 기술을 적용해 짧은 시간에 대량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처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자연에서 우리가 토종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식지 보전이 장수하늘소 복원의 또다른 관건
장수하늘소는 활엽수의 극상림의 대표 수목인 서어나무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애벌레 단계에서 부식된 서어나무 조각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수하늘소가 멸종위기로 내몰린 이유도 국내에서 대형 서어나무숲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나마 광릉 국립수목원에는 아직 대형 서어나무가 남아 있기에 드물게나마 장수하늘소가 관찰됩니다.
결국 인공 증식에 성공해 야생에 풀어주더라도 서어나무 숲이 보전되지 못한다면 장수하늘소는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어나무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공해에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숲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줄일수록 야생에서 늠름한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런 장수하늘소를 인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들여온 장수하늘소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를 통해 16개월(1년4개월)만에 4마리의 성체를 키워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장수하늘소 용화
장수하늘소 용화장수하늘소 알에서 성체까지 사육 기간 1/3로 단축
장수하늘소의 인공번식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2년 인공증식에 성공했습니다.
[관련보도] ☞ [뉴스9]멸종위기종 장수하늘소 국내 첫 복원 성공
하지만 알에서 성체로 사육하는 기간이 4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16개월(1년 4개월)만에 성충으로 우화(羽化)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번식 기간을 무려 1/3로 단축한 것입니다.
온도 습도 인공먹이 최적화가 단기 증식의 비결
사육기간 단축의 성공 비결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먹이 등 사육 조건의 최적화였습니다. 보통 야생에서 장수하늘소는 5~6년이 지나야 성체로 우화합니다. 5년 가량을 애벌레와 번데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공 증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는 먹이를 개발해 단기간 증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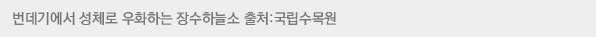
이번 증식 기술은 중국에서 들여온 장수하늘소를 통해 얻었습니다. 이제 광릉이나 국내 강원도의 숲에서 토종 장수하늘소가 채집될 경우 이 기술을 적용해 짧은 시간에 대량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처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자연에서 우리가 토종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식지 보전이 장수하늘소 복원의 또다른 관건
장수하늘소는 활엽수의 극상림의 대표 수목인 서어나무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애벌레 단계에서 부식된 서어나무 조각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수하늘소가 멸종위기로 내몰린 이유도 국내에서 대형 서어나무숲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나마 광릉 국립수목원에는 아직 대형 서어나무가 남아 있기에 드물게나마 장수하늘소가 관찰됩니다.
결국 인공 증식에 성공해 야생에 풀어주더라도 서어나무 숲이 보전되지 못한다면 장수하늘소는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어나무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공해에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숲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줄일수록 야생에서 늠름한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수하늘소 번식 비밀 풀었다
-
- 입력 2016-01-13 12:11:31
- 수정2016-01-15 22:26:29

장수하늘소! 장수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크고 늠름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북쪽 대륙을 통틀어 딱정벌레류 중에서 가장 큽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서식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드물게 광릉 국립수목원에서 관찰될 뿐입니다.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장수하늘소를 인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들여온 장수하늘소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를 통해 16개월(1년4개월)만에 4마리의 성체를 키워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장수하늘소 알에서 성체까지 사육 기간 1/3로 단축
장수하늘소의 인공번식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2년 인공증식에 성공했습니다.
[관련보도] ☞ [뉴스9]멸종위기종 장수하늘소 국내 첫 복원 성공
하지만 알에서 성체로 사육하는 기간이 4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16개월(1년 4개월)만에 성충으로 우화(羽化)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번식 기간을 무려 1/3로 단축한 것입니다.
온도 습도 인공먹이 최적화가 단기 증식의 비결
사육기간 단축의 성공 비결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먹이 등 사육 조건의 최적화였습니다. 보통 야생에서 장수하늘소는 5~6년이 지나야 성체로 우화합니다. 5년 가량을 애벌레와 번데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공 증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는 먹이를 개발해 단기간 증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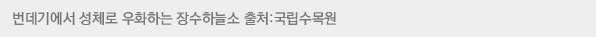
이번 증식 기술은 중국에서 들여온 장수하늘소를 통해 얻었습니다. 이제 광릉이나 국내 강원도의 숲에서 토종 장수하늘소가 채집될 경우 이 기술을 적용해 짧은 시간에 대량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처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자연에서 우리가 토종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식지 보전이 장수하늘소 복원의 또다른 관건
장수하늘소는 활엽수의 극상림의 대표 수목인 서어나무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애벌레 단계에서 부식된 서어나무 조각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수하늘소가 멸종위기로 내몰린 이유도 국내에서 대형 서어나무숲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나마 광릉 국립수목원에는 아직 대형 서어나무가 남아 있기에 드물게나마 장수하늘소가 관찰됩니다.
결국 인공 증식에 성공해 야생에 풀어주더라도 서어나무 숲이 보전되지 못한다면 장수하늘소는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어나무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공해에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숲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줄일수록 야생에서 늠름한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런 장수하늘소를 인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지난 2014년 중국에서 들여온 장수하늘소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를 통해 16개월(1년4개월)만에 4마리의 성체를 키워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장수하늘소 알에서 성체까지 사육 기간 1/3로 단축
장수하늘소의 인공번식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012년 인공증식에 성공했습니다.
[관련보도] ☞ [뉴스9]멸종위기종 장수하늘소 국내 첫 복원 성공
하지만 알에서 성체로 사육하는 기간이 4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16개월(1년 4개월)만에 성충으로 우화(羽化)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번식 기간을 무려 1/3로 단축한 것입니다.
온도 습도 인공먹이 최적화가 단기 증식의 비결
사육기간 단축의 성공 비결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먹이 등 사육 조건의 최적화였습니다. 보통 야생에서 장수하늘소는 5~6년이 지나야 성체로 우화합니다. 5년 가량을 애벌레와 번데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공 증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립수목원은 장수하늘소의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는 먹이를 개발해 단기간 증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번 증식 기술은 중국에서 들여온 장수하늘소를 통해 얻었습니다. 이제 광릉이나 국내 강원도의 숲에서 토종 장수하늘소가 채집될 경우 이 기술을 적용해 짧은 시간에 대량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처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자연에서 우리가 토종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식지 보전이 장수하늘소 복원의 또다른 관건
장수하늘소는 활엽수의 극상림의 대표 수목인 서어나무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애벌레 단계에서 부식된 서어나무 조각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수하늘소가 멸종위기로 내몰린 이유도 국내에서 대형 서어나무숲이 사라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나마 광릉 국립수목원에는 아직 대형 서어나무가 남아 있기에 드물게나마 장수하늘소가 관찰됩니다.
결국 인공 증식에 성공해 야생에 풀어주더라도 서어나무 숲이 보전되지 못한다면 장수하늘소는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어나무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공해에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숲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줄일수록 야생에서 늠름한 장수하늘소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
-

용태영 기자 yongty@kbs.co.kr
용태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속보] 김문수 “한덕수, 당에 일임하겠다 이야기만…후보간 논의 기회 막아”](/data/layer/904/2025/05/20250507_EXuJer.jp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