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리오 감염 쉬쉬…감염병 신고 ‘구멍’
입력 2013.10.11 (12:07)
수정 2013.10.11 (13:26)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멘트>
울산에서 50대 남성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요,
병원 측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도 이를 쉬쉬한 것으로 밝혀져 감염병 신고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8살 한 모씨는 지난달 30일 몸에 이상을 느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치료 도중 몸에 수포와 출혈이 생겼고, 입원 열흘만에 숨졌습니다.
원인은 비브리오 패혈증이었습니다.
<녹취> 한씨 유가족 : "시장에서 전어회를 사 먹었다고 들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어 생기는데, 올해만 해도 47명이 발병해, 22명이 숨졌습니다.
치사율이 높아 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관련법상 의료기관은 1군에서 4군 감염병이 확인될 경우 의증이라도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지난 5일에 확진으로 판단했지만, 한씨가 숨질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검사결과가 나오면 새로 수정해야 되거든요. 연휴가 겹치다 보니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병원측은 환자 보호자에게도 입원한지 5일이나 돼서야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에 열흘 이상 늦게 신고돼 그동안 의심환자가 4명이나 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처벌 규정으로 감염병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울산에서 50대 남성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요,
병원 측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도 이를 쉬쉬한 것으로 밝혀져 감염병 신고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8살 한 모씨는 지난달 30일 몸에 이상을 느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치료 도중 몸에 수포와 출혈이 생겼고, 입원 열흘만에 숨졌습니다.
원인은 비브리오 패혈증이었습니다.
<녹취> 한씨 유가족 : "시장에서 전어회를 사 먹었다고 들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어 생기는데, 올해만 해도 47명이 발병해, 22명이 숨졌습니다.
치사율이 높아 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관련법상 의료기관은 1군에서 4군 감염병이 확인될 경우 의증이라도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지난 5일에 확진으로 판단했지만, 한씨가 숨질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검사결과가 나오면 새로 수정해야 되거든요. 연휴가 겹치다 보니 좀 꼬인 것 같습니다."
병원측은 환자 보호자에게도 입원한지 5일이나 돼서야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대구에서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에 열흘 이상 늦게 신고돼 그동안 의심환자가 4명이나 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허술한 처벌 규정으로 감염병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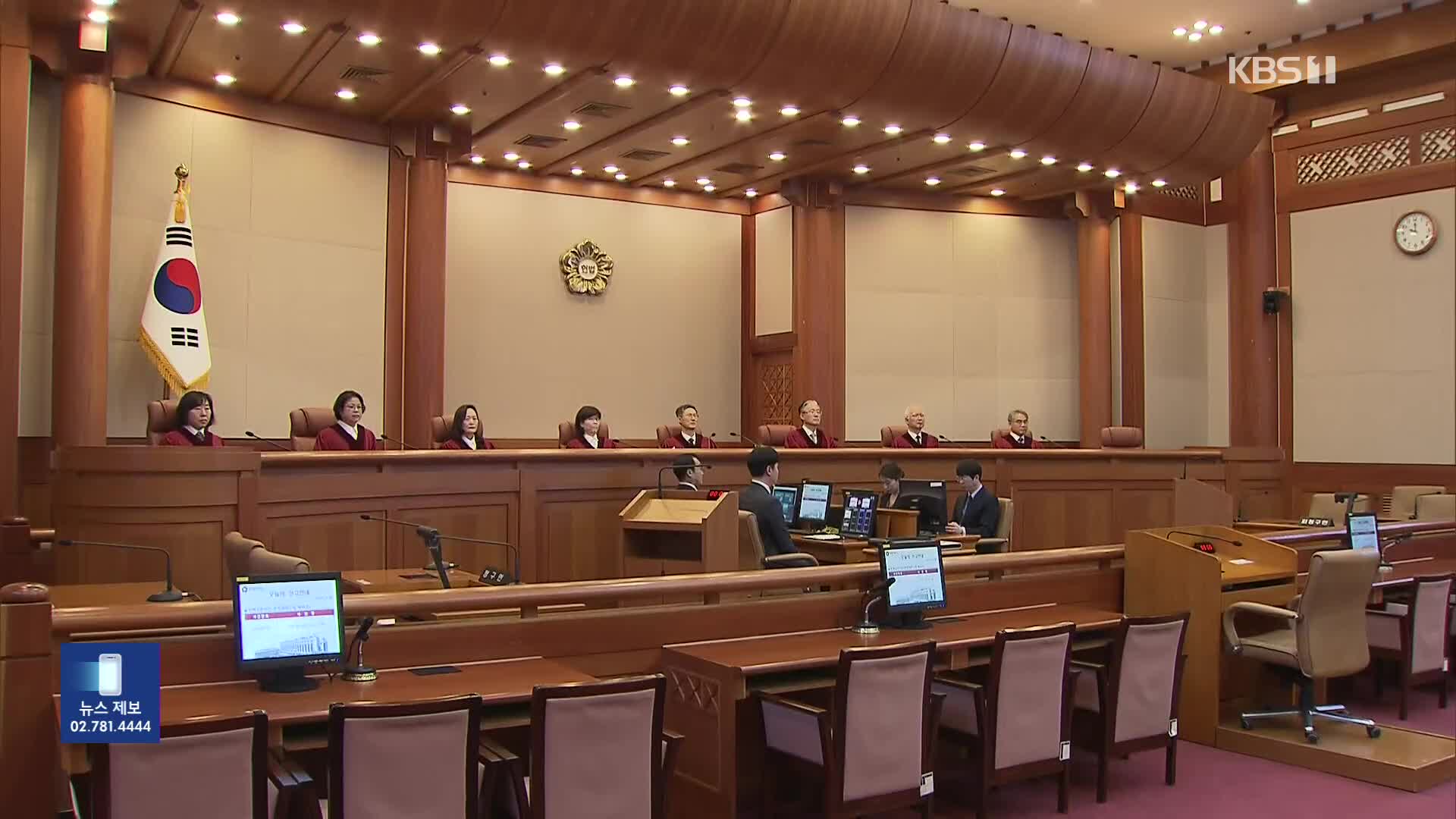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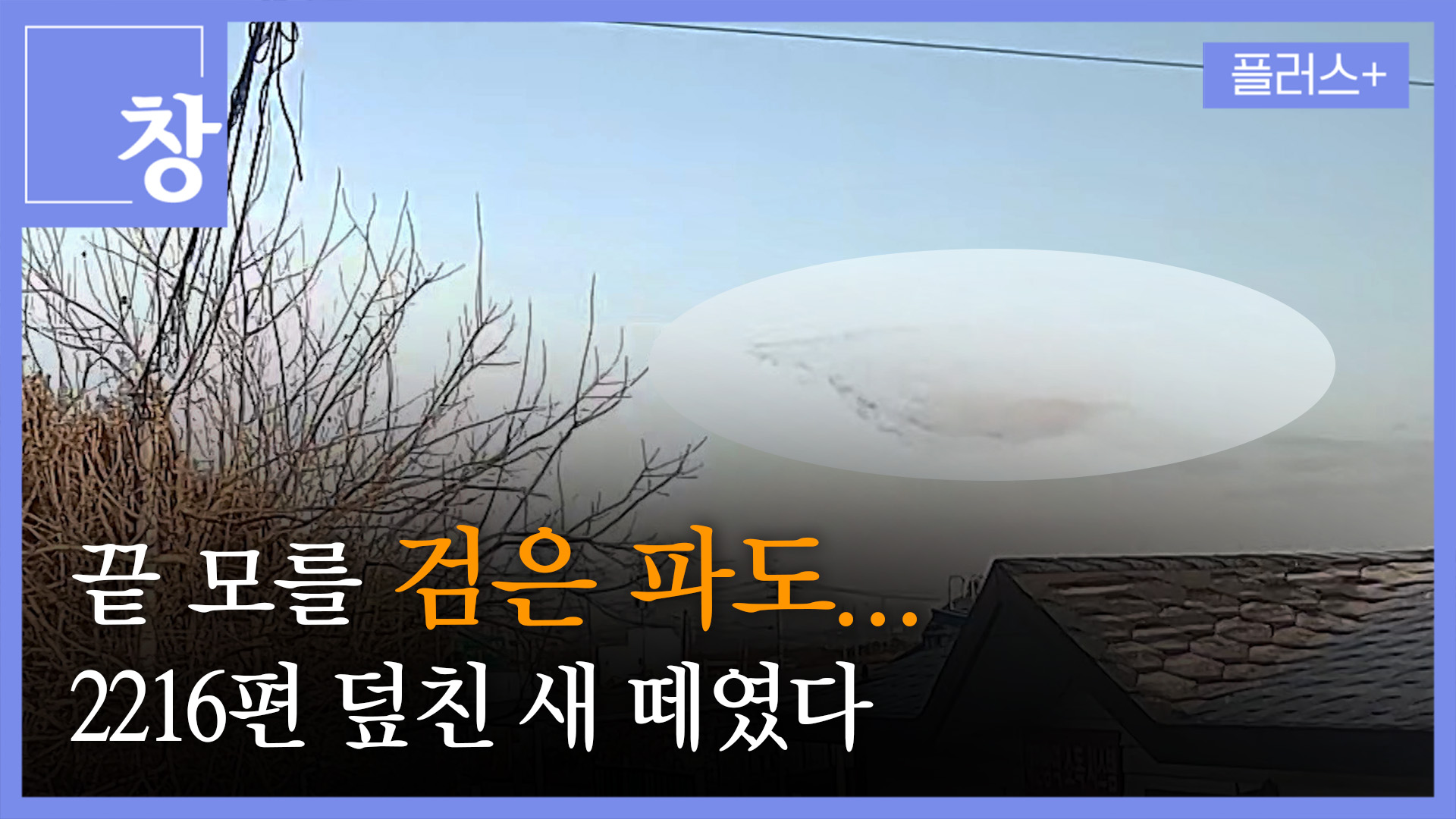


![[화제포착] 욕설·비속어에 중독된 청소년들](/data/news/2013/10/24/2743985_90.jpg)
![[건강충전] 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data/news/2013/10/01/2731813_90.jpg)
![[건강충전] ‘입안이 바싹’ 구강건조증 확산…예방법은?](/data/news/2013/10/11/2737232_90.jpg)
![[오늘의 현장] 욕설·비속어에 중독된 청소년들](/data/news/2013/10/24/2744237_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