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경영’ 폐해…개선책은?
입력 2014.12.21 (07:09)
수정 2014.12.21 (14:18)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가 안하무인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 경영'의 폐해가 민낯을 드러냈는데요,
총수 일가라면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경영에 참여하고, 초고속 승진까지 하는 관행부터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에 입사한 건 스물다섯 살때인 1999년입니다.
7년 만에 임원 자리에 올랐고, 부사장이 되기까지 14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더 빨라서, 조원태 부사장은 3년, 조현민 전무는 4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이 대기업 임원이 되는데 평균 22년 넘게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입니다.
다른 재벌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등 상당수 재벌 3세들도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장기업을 보유한 44개 재벌그룹 전체를 들여다봐도,
초급 임원인 상무의 평균 나이가 쉰한 살인데 비해, 총수 일가는 마흔 살에 불과합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으며 자라고 경영권까지 쉽게 물려받다보니, 재벌가 자제들이 선민의식과 독단에 빠지기 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대에 백만 원씩 맷값을 주고 사람을 때리고, 운전하다 시비 붙은 할머니를 폭행하고, 국제중학교에 아들을 부정입학시키는 등 일탈이 끊이지 않습니다.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능력도, 자질도 따지지 않고 경영에 참여시키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처럼 기업, 나아가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삼성그룹이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유명세를 탔던 스웨덴의 대재벌 발렌베리 가문.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등을 이끌며 스웨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이들은 5대째 기업을 대물림하고 있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드뭅니다.
후계자 선정 과정이 까다롭고, 능력을 검증받은 소수만이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벌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은 1000명 중 7명 정도만 임원이 되지만, 30대 그룹에 근무 중인 재벌 3~4세는 10명 중 9명이 임원입니다.
<인터뷰> 김우찬(교수)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어떤 한 자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자녀들이 경영 일선에 다 참여하는 건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검증도 없이 중책을 맡고, 맡은 사업이 실패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이들만의 특권입니다.
<인터뷰>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총수 일가의 양심이나 도덕 관점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다른 형태로도 견제 장치나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수 일가의 '묻지마 경영 참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해진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가 안하무인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 경영'의 폐해가 민낯을 드러냈는데요,
총수 일가라면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경영에 참여하고, 초고속 승진까지 하는 관행부터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에 입사한 건 스물다섯 살때인 1999년입니다.
7년 만에 임원 자리에 올랐고, 부사장이 되기까지 14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더 빨라서, 조원태 부사장은 3년, 조현민 전무는 4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이 대기업 임원이 되는데 평균 22년 넘게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입니다.
다른 재벌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등 상당수 재벌 3세들도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장기업을 보유한 44개 재벌그룹 전체를 들여다봐도,
초급 임원인 상무의 평균 나이가 쉰한 살인데 비해, 총수 일가는 마흔 살에 불과합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받으며 자라고 경영권까지 쉽게 물려받다보니, 재벌가 자제들이 선민의식과 독단에 빠지기 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대에 백만 원씩 맷값을 주고 사람을 때리고, 운전하다 시비 붙은 할머니를 폭행하고, 국제중학교에 아들을 부정입학시키는 등 일탈이 끊이지 않습니다.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능력도, 자질도 따지지 않고 경영에 참여시키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처럼 기업, 나아가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삼성그룹이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유명세를 탔던 스웨덴의 대재벌 발렌베리 가문.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등을 이끌며 스웨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이들은 5대째 기업을 대물림하고 있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드뭅니다.
후계자 선정 과정이 까다롭고, 능력을 검증받은 소수만이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벌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은 1000명 중 7명 정도만 임원이 되지만, 30대 그룹에 근무 중인 재벌 3~4세는 10명 중 9명이 임원입니다.
<인터뷰> 김우찬(교수)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어떤 한 자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자녀들이 경영 일선에 다 참여하는 건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검증도 없이 중책을 맡고, 맡은 사업이 실패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이들만의 특권입니다.
<인터뷰> 박주근(CEO스코어 대표) : "총수 일가의 양심이나 도덕 관점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다른 형태로도 견제 장치나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수 일가의 '묻지마 경영 참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해진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단독]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조작 정황](/data/news/2024/11/27/20241127_QqN40K.jpg)
![[단독] ‘15 보고’·“휴대전화 한강에”…검찰, ‘불가리스 사태’ 지시 문건·진술 확보](/data/news/2024/11/27/20241127_PgGkbY.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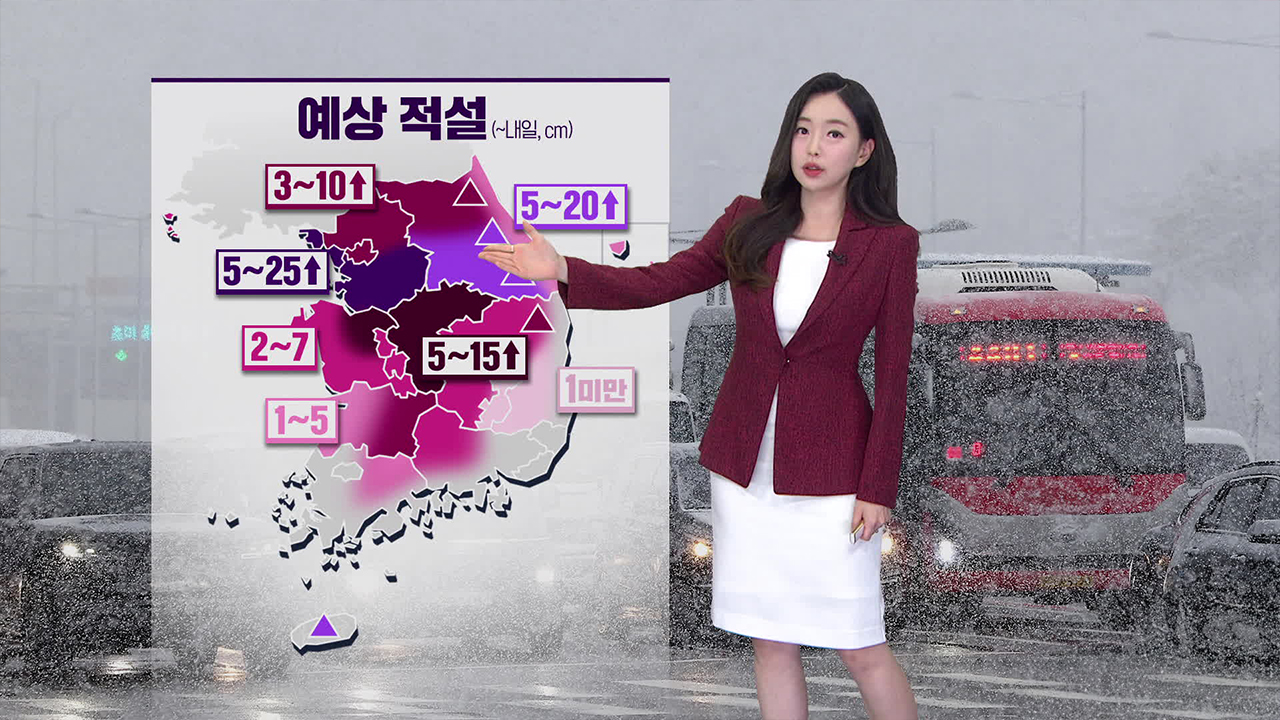


![[단독] 유영철, 교도관 도움으로 ‘성인물’ 불법 반입](/data/news/2014/12/10/2982012_140.jpg)
![[생활현장] 오리털 점퍼 ‘드라이클리닝’ 금물…세탁법은?](/data/news/2014/12/27/2991692_90.jpg)
![[취재후] 커피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data/news/2014/12/18/2986747_b3M.jpg)
![[충전! 여자의 아침] 인도인 ‘장수 비결’ 노란 울금의 효능](/data/news/2015/01/02/2994704_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