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변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이 없는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이 만 17세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기꺼운 마음 가짐으로 군의 정규 훈련을 소화해 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젊은이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젊은이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근우 순회특파원이 군 캠프의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아시아 진출을 위한 서양 세력의 첫 교두보가 된 말라카, 16세기 초 포르투갈에 점령당한 말라카 왕국은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광장 분수대 기둥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는 문구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견고하기만 하던 군사 요새는 수백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 폐허로 남았습니다.
지난한 투쟁 끝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말레이시아, 수백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 50주년을 맞은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번영에 못지않게 자주 국방에도 온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대 삼림 속에 자리 잡은 군 캠프, 붉은 지붕의 막사와 연병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군복을 입은 이들은 앳된 얼굴의 젊은이들입니다.
<인터뷰> 압둘 할리(훈련병): “처음 삭발하고 입소할 때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조국을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훈련 생도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바짝 군기가 들어간 채 반복 또 반복의 과정을 되풀이 해 고난도 훈련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티노르라즈마(훈련병): “기분이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지금은 아주 편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인터뷰> 노이라자나(훈련병): “이 곳이 마음에 들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흥분도 되죠. 전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한 것을 여기서 새로 경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교관들에겐 모두 같은 훈련 대상일 뿐 남자, 여자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인터뷰> 드라모나(교관): “교관으로서 모든 훈련병은 남녀 구분없이 모두 같다고 가르칩니다. 훈련받을 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터뷰> 무하마드 샤피(훈련병): “우리는 함께 훈련을 받는데 여자들도 아주 뛰어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친숙해지죠.”
내셔널 서비스로 불리는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는 2천 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순서대로 3개월 동안 병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국과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처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병제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측은 젊은이들에게 자기 수양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단순한 징집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무자르(징병 훈련소장): “말레이시아의 병역 의무는 외국의 징병제와는 다릅니다. 훈련병의 정신적인 면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 막간에 잠시 갖는 휴식 시간.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히고 빵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외부와 단절된 병영 생활 속에서도 훈련병들은 쾌활함을 잃지 않습니다.
<녹취> “드리마카시 땡큐 세세 아리가또우 감사합니다”
각 국의 인사말로 만든 짧은 노래, 토착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서로 다른 혈통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진 같은 국민으로서 군대에서는 혈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징병제는 비록 단기간일지라도 또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민족 사회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갈등의 요소를 군이라는 울타리내에서 일정 부분 완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한 내무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또래의 생도들은 공통된 소재의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전국 80여개 캠프에서 해마다 10만 여명을 양성하는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는 이제 제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와 도덕관의 배양, 그리고 단결과 통합을 통한 애국심의 고취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다토 압둘 하디빈(말레이시아 국민병역청 의장): “다양한 민족으로서 저마다의 가치관을 지닌 젊은이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콸라룸푸르 인근의 신행정 도시 푸트라자야, 신개념의 조형미와 최첨단 지능을 갖춰 세계의 건축 공학가들로부터 인류의 이상형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푸트라자야는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번영은 강건한 국민성이란 토대가 있을 때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단기 징병제를 도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기업으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은 사회로부터 더 큰 기대를받게 됩니다. 조직 생활을 통해 배양한 팀웍 정신이 큰 틀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 훈련을 마쳤다는 사실은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군 캠프에 입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무하마드 라즈리(대학생): “저는 아직 군에 입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죠.”
<인터뷰> 수지(대학생):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긍심도 길러주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집단 생활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로서도 몸에 맞지 않는 거추장스런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려는 말레이시아는 젊은이들에게 인내의 미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은 이를 꿋꿋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이 없는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이 만 17세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기꺼운 마음 가짐으로 군의 정규 훈련을 소화해 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젊은이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젊은이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근우 순회특파원이 군 캠프의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아시아 진출을 위한 서양 세력의 첫 교두보가 된 말라카, 16세기 초 포르투갈에 점령당한 말라카 왕국은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광장 분수대 기둥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는 문구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견고하기만 하던 군사 요새는 수백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 폐허로 남았습니다.
지난한 투쟁 끝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말레이시아, 수백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 50주년을 맞은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번영에 못지않게 자주 국방에도 온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대 삼림 속에 자리 잡은 군 캠프, 붉은 지붕의 막사와 연병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군복을 입은 이들은 앳된 얼굴의 젊은이들입니다.
<인터뷰> 압둘 할리(훈련병): “처음 삭발하고 입소할 때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조국을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훈련 생도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바짝 군기가 들어간 채 반복 또 반복의 과정을 되풀이 해 고난도 훈련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티노르라즈마(훈련병): “기분이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지금은 아주 편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인터뷰> 노이라자나(훈련병): “이 곳이 마음에 들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흥분도 되죠. 전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한 것을 여기서 새로 경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교관들에겐 모두 같은 훈련 대상일 뿐 남자, 여자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인터뷰> 드라모나(교관): “교관으로서 모든 훈련병은 남녀 구분없이 모두 같다고 가르칩니다. 훈련받을 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터뷰> 무하마드 샤피(훈련병): “우리는 함께 훈련을 받는데 여자들도 아주 뛰어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친숙해지죠.”
내셔널 서비스로 불리는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는 2천 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순서대로 3개월 동안 병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국과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처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병제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측은 젊은이들에게 자기 수양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단순한 징집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무자르(징병 훈련소장): “말레이시아의 병역 의무는 외국의 징병제와는 다릅니다. 훈련병의 정신적인 면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 막간에 잠시 갖는 휴식 시간.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히고 빵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외부와 단절된 병영 생활 속에서도 훈련병들은 쾌활함을 잃지 않습니다.
<녹취> “드리마카시 땡큐 세세 아리가또우 감사합니다”
각 국의 인사말로 만든 짧은 노래, 토착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서로 다른 혈통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진 같은 국민으로서 군대에서는 혈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징병제는 비록 단기간일지라도 또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민족 사회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갈등의 요소를 군이라는 울타리내에서 일정 부분 완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한 내무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또래의 생도들은 공통된 소재의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전국 80여개 캠프에서 해마다 10만 여명을 양성하는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는 이제 제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와 도덕관의 배양, 그리고 단결과 통합을 통한 애국심의 고취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다토 압둘 하디빈(말레이시아 국민병역청 의장): “다양한 민족으로서 저마다의 가치관을 지닌 젊은이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콸라룸푸르 인근의 신행정 도시 푸트라자야, 신개념의 조형미와 최첨단 지능을 갖춰 세계의 건축 공학가들로부터 인류의 이상형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푸트라자야는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번영은 강건한 국민성이란 토대가 있을 때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단기 징병제를 도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기업으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은 사회로부터 더 큰 기대를받게 됩니다. 조직 생활을 통해 배양한 팀웍 정신이 큰 틀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 훈련을 마쳤다는 사실은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군 캠프에 입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무하마드 라즈리(대학생): “저는 아직 군에 입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죠.”
<인터뷰> 수지(대학생):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긍심도 길러주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집단 생활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로서도 몸에 맞지 않는 거추장스런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려는 말레이시아는 젊은이들에게 인내의 미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은 이를 꿋꿋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계인] 군으로 간 말레이시아 젊은이들
-
- 입력 2008-05-04 10:11:28

<앵커 멘트>
주변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이 없는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이 만 17세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기꺼운 마음 가짐으로 군의 정규 훈련을 소화해 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젊은이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젊은이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근우 순회특파원이 군 캠프의 말레이시아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아시아 진출을 위한 서양 세력의 첫 교두보가 된 말라카, 16세기 초 포르투갈에 점령당한 말라카 왕국은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 등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광장 분수대 기둥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는 문구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견고하기만 하던 군사 요새는 수백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 폐허로 남았습니다.
지난한 투쟁 끝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말레이시아, 수백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 50주년을 맞은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번영에 못지않게 자주 국방에도 온 국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대 삼림 속에 자리 잡은 군 캠프, 붉은 지붕의 막사와 연병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군복을 입은 이들은 앳된 얼굴의 젊은이들입니다.
<인터뷰> 압둘 할리(훈련병): “처음 삭발하고 입소할 때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조국을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훈련 생도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바짝 군기가 들어간 채 반복 또 반복의 과정을 되풀이 해 고난도 훈련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티노르라즈마(훈련병): “기분이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지금은 아주 편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인터뷰> 노이라자나(훈련병): “이 곳이 마음에 들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흥분도 되죠. 전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한 것을 여기서 새로 경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교관들에겐 모두 같은 훈련 대상일 뿐 남자, 여자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인터뷰> 드라모나(교관): “교관으로서 모든 훈련병은 남녀 구분없이 모두 같다고 가르칩니다. 훈련받을 때만이 아니고 언제나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터뷰> 무하마드 샤피(훈련병): “우리는 함께 훈련을 받는데 여자들도 아주 뛰어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친숙해지죠.”
내셔널 서비스로 불리는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는 2천 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순서대로 3개월 동안 병영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국과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처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병제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측은 젊은이들에게 자기 수양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단순한 징집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무자르(징병 훈련소장): “말레이시아의 병역 의무는 외국의 징병제와는 다릅니다. 훈련병의 정신적인 면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 막간에 잠시 갖는 휴식 시간. 그늘 아래에서 땀을 식히고 빵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외부와 단절된 병영 생활 속에서도 훈련병들은 쾌활함을 잃지 않습니다.
<녹취> “드리마카시 땡큐 세세 아리가또우 감사합니다”
각 국의 인사말로 만든 짧은 노래, 토착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서로 다른 혈통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진 같은 국민으로서 군대에서는 혈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징병제는 비록 단기간일지라도 또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민족 사회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갈등의 요소를 군이라는 울타리내에서 일정 부분 완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한 내무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같은 또래의 생도들은 공통된 소재의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전국 80여개 캠프에서 해마다 10만 여명을 양성하는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는 이제 제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와 도덕관의 배양, 그리고 단결과 통합을 통한 애국심의 고취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다토 압둘 하디빈(말레이시아 국민병역청 의장): “다양한 민족으로서 저마다의 가치관을 지닌 젊은이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서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콸라룸푸르 인근의 신행정 도시 푸트라자야, 신개념의 조형미와 최첨단 지능을 갖춰 세계의 건축 공학가들로부터 인류의 이상형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푸트라자야는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번영은 강건한 국민성이란 토대가 있을 때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단기 징병제를 도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기업으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은 사회로부터 더 큰 기대를받게 됩니다. 조직 생활을 통해 배양한 팀웍 정신이 큰 틀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 훈련을 마쳤다는 사실은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군 캠프에 입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무하마드 라즈리(대학생): “저는 아직 군에 입대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쉬워하고 있죠.”
<인터뷰> 수지(대학생):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긍심도 길러주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말레이시아의 단기 징병제,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집단 생활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로서도 몸에 맞지 않는 거추장스런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아가려는 말레이시아는 젊은이들에게 인내의 미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은 이를 꿋꿋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

이근우 기자 lkw@kbs.co.kr
이근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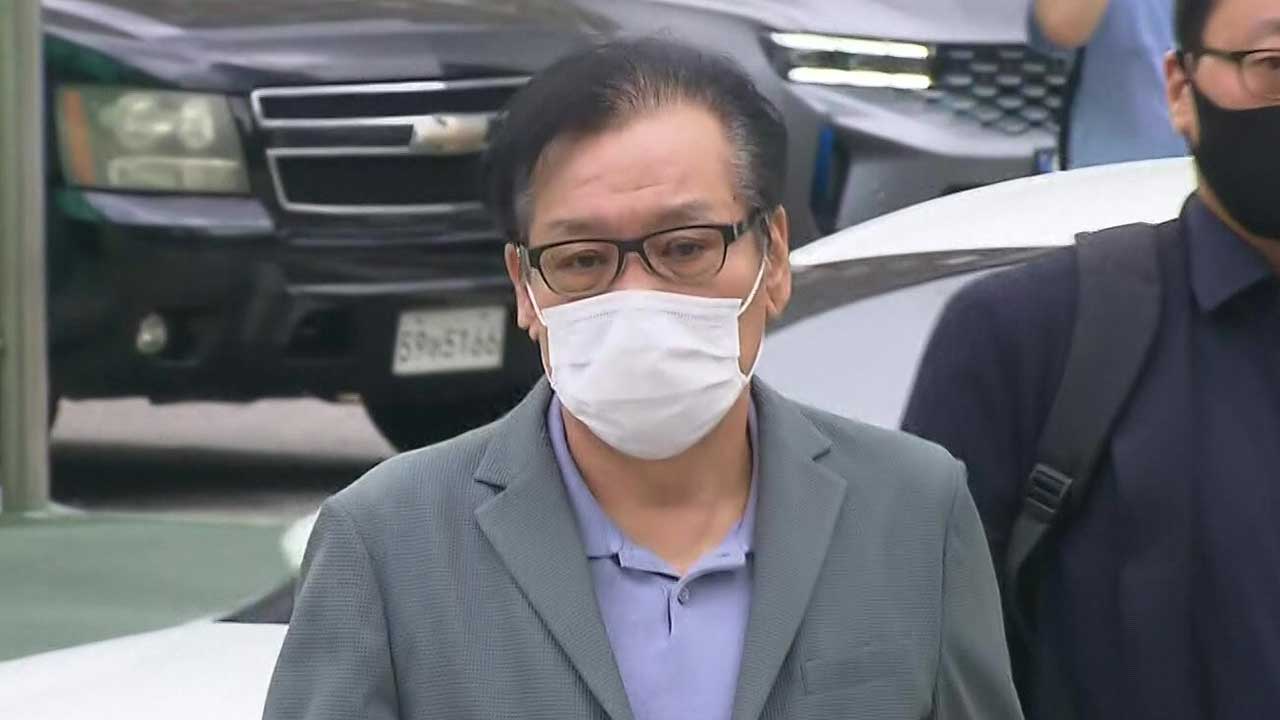


![[단독] 특검, ‘통일교 원정도박’ 증거인멸 정황 포착…‘윤핵관’ 연관성 수사](/data/layer/904/2025/08/20250821_5Rw5Ax.png)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