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eye] 30년 만에 부활한 도시
입력 2014.08.16 (08:41)
수정 2014.08.16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도 마을이 수몰되면서 고향을 잃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라졌던 마을을 몇십 년만에 다시 본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또 마을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30년 가까이 물에 잠겨있던 마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km,
넓은 호수 옆으로 희미하게 마을의 윤곽이 보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만 남은 모습,
지금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도시 '에뻬꾸엔' 입니다.
하얗게 말라죽은 가로수 사이로 에뻬꾸엔으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에뻬꾸엔 외곽엔 올해 여든 살인 노박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길 옆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만 쌓여있는 에뻬꾸엔, 하지만 할아버지 눈앞엔 지금도 이웃 주민들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인터뷰> 빠블로 노박(옛 에뻬꾸엔 주민) : "이곳에 동네가 생기는 것도 봤고 사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집과 문을 볼 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주민 2천 명이 살던 도시, 당시 사진 속 에뻬꾸엔 거리는 차와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녹취>"이 창문이 저기에요!"
에뻬꾸엔 사람들의 기억 속엔 아직도 그 당시 거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에뻬꾸엔은 사해처럼 소금 농도가 짙은 에뻬꾸엔 호수 덕분에 유명한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호텔이 15개나 됐고, 여름철엔 7천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넬바 깔롱헤(에뻬꾸엔 관광객) : "제가 어렸을 때 이곳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흔하지 않은 시설이었어요. 마을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찾었어요."
제 위로 보이는 마따데로라는 말은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한때 이 지역 소를 모두 이곳에서 도축할만큼 에뻬꾸엔은 번창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홍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물이 저 글자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 주변은 온통 호수로 변했습니다.
에뻬꾸엔이 물에 잠긴 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관광지였던 에뻬꾸엔 호수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상류의 다른 호수들과 연결되는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받을 수만 있고, 필요할 경우 물길을 막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빠비오 로비롯데(아돌포 알시니시 공공정책국장) : "다른 호수와 협곡에서 물을 공급받은 거죠. 하지만 통제장치를 만들지 않아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의 범람을 우려해 동네 앞에 제방을 쌓긴 했지만 1985년에 홍수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류 호수에서 일제히 물을 내려보내자 제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마을을 덮친 겁니다.
<인터뷰> 빠비오 로비롯데(아돌포 알시니시 공공정책국장) : "에뻬꾸엔이 일부 침수가 되자 윗 호수들이 (자기 마을 침수를 막기 위해) 수문을 전부 열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대책 없이 물길만 만들어 감당 못할 물을 끌어들인 당국, 자기들만 살겠다고 마구 물을 내려보낸 윗 마을의 이기심 때문에 50년 넘은 도시가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뻬꾸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주민들은 재산의 50%를 보상받았지만, 고향을 떠나 새롭게 정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실향의 아픔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리까르도 보이디(옛 에뻬꾸엔 주민) :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도 없어지고 우리 에뻬꾸엔 사람들은 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에뻬꾸엔에 사는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던 마을이 호수 밖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늦었지만 운하를 건설해 에뻬꾸엔 호수로 유입되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 데다, 자연 증발 작용 등을 통해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 입니다.
물에 잠겼던 에뻬꾸엔 마을이 다시 이렇게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년 전, 그러니까 물에 잠기고 나서 27년만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온통 무너져 그 옛날 마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폐허로 변한 에뻬꾸엔의 모습은 옛 주민들에겐 또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은 에뻬꾸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인터뷰> 가스똔 빠르따리에우(에뻬꾸엔 박물관장) : "에뻬꾸엔의 폐허가 우리에겐 보존할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에뻬꾸엔의 기묘한 풍경과 소설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0년만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니꼴라스 로뻬스(에뻬꾸엔 관광사무소장) : "에뻬꾸엔 마을의 집들에 누가 살았는지, 가족의 이름은 뭐였는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 침수되기 전 사진을 통해 입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금 호수' 에뻬꾸엔은 요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새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몰 도시 에뻬꾸엔의 색다른 풍경과 인근 까루에의 온천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희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동네 앞 문구처럼 에뻬꾸엔은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을이 수몰되면서 고향을 잃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라졌던 마을을 몇십 년만에 다시 본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또 마을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30년 가까이 물에 잠겨있던 마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km,
넓은 호수 옆으로 희미하게 마을의 윤곽이 보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만 남은 모습,
지금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도시 '에뻬꾸엔' 입니다.
하얗게 말라죽은 가로수 사이로 에뻬꾸엔으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에뻬꾸엔 외곽엔 올해 여든 살인 노박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길 옆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만 쌓여있는 에뻬꾸엔, 하지만 할아버지 눈앞엔 지금도 이웃 주민들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인터뷰> 빠블로 노박(옛 에뻬꾸엔 주민) : "이곳에 동네가 생기는 것도 봤고 사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집과 문을 볼 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주민 2천 명이 살던 도시, 당시 사진 속 에뻬꾸엔 거리는 차와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녹취>"이 창문이 저기에요!"
에뻬꾸엔 사람들의 기억 속엔 아직도 그 당시 거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에뻬꾸엔은 사해처럼 소금 농도가 짙은 에뻬꾸엔 호수 덕분에 유명한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호텔이 15개나 됐고, 여름철엔 7천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넬바 깔롱헤(에뻬꾸엔 관광객) : "제가 어렸을 때 이곳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흔하지 않은 시설이었어요. 마을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찾었어요."
제 위로 보이는 마따데로라는 말은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한때 이 지역 소를 모두 이곳에서 도축할만큼 에뻬꾸엔은 번창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홍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물이 저 글자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 주변은 온통 호수로 변했습니다.
에뻬꾸엔이 물에 잠긴 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관광지였던 에뻬꾸엔 호수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상류의 다른 호수들과 연결되는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받을 수만 있고, 필요할 경우 물길을 막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빠비오 로비롯데(아돌포 알시니시 공공정책국장) : "다른 호수와 협곡에서 물을 공급받은 거죠. 하지만 통제장치를 만들지 않아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의 범람을 우려해 동네 앞에 제방을 쌓긴 했지만 1985년에 홍수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류 호수에서 일제히 물을 내려보내자 제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마을을 덮친 겁니다.
<인터뷰> 빠비오 로비롯데(아돌포 알시니시 공공정책국장) : "에뻬꾸엔이 일부 침수가 되자 윗 호수들이 (자기 마을 침수를 막기 위해) 수문을 전부 열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대책 없이 물길만 만들어 감당 못할 물을 끌어들인 당국, 자기들만 살겠다고 마구 물을 내려보낸 윗 마을의 이기심 때문에 50년 넘은 도시가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뻬꾸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주민들은 재산의 50%를 보상받았지만, 고향을 떠나 새롭게 정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실향의 아픔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리까르도 보이디(옛 에뻬꾸엔 주민) :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도 없어지고 우리 에뻬꾸엔 사람들은 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에뻬꾸엔에 사는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던 마을이 호수 밖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늦었지만 운하를 건설해 에뻬꾸엔 호수로 유입되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 데다, 자연 증발 작용 등을 통해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 입니다.
물에 잠겼던 에뻬꾸엔 마을이 다시 이렇게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년 전, 그러니까 물에 잠기고 나서 27년만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온통 무너져 그 옛날 마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폐허로 변한 에뻬꾸엔의 모습은 옛 주민들에겐 또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은 에뻬꾸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인터뷰> 가스똔 빠르따리에우(에뻬꾸엔 박물관장) : "에뻬꾸엔의 폐허가 우리에겐 보존할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에뻬꾸엔의 기묘한 풍경과 소설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0년만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니꼴라스 로뻬스(에뻬꾸엔 관광사무소장) : "에뻬꾸엔 마을의 집들에 누가 살았는지, 가족의 이름은 뭐였는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 침수되기 전 사진을 통해 입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금 호수' 에뻬꾸엔은 요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새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몰 도시 에뻬꾸엔의 색다른 풍경과 인근 까루에의 온천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희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동네 앞 문구처럼 에뻬꾸엔은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파원 eye] 30년 만에 부활한 도시
-
- 입력 2014-08-16 09:02:10
- 수정2014-08-16 09:22:42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도 마을이 수몰되면서 고향을 잃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라졌던 마을을 몇십 년만에 다시 본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또 마을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30년 가까이 물에 잠겨있던 마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km,
넓은 호수 옆으로 희미하게 마을의 윤곽이 보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만 남은 모습,
지금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도시 '에뻬꾸엔' 입니다.
하얗게 말라죽은 가로수 사이로 에뻬꾸엔으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에뻬꾸엔 외곽엔 올해 여든 살인 노박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길 옆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만 쌓여있는 에뻬꾸엔, 하지만 할아버지 눈앞엔 지금도 이웃 주민들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인터뷰> 빠블로 노박(옛 에뻬꾸엔 주민) : "이곳에 동네가 생기는 것도 봤고 사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집과 문을 볼 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주민 2천 명이 살던 도시, 당시 사진 속 에뻬꾸엔 거리는 차와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녹취>"이 창문이 저기에요!"
에뻬꾸엔 사람들의 기억 속엔 아직도 그 당시 거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에뻬꾸엔은 사해처럼 소금 농도가 짙은 에뻬꾸엔 호수 덕분에 유명한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호텔이 15개나 됐고, 여름철엔 7천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넬바 깔롱헤(에뻬꾸엔 관광객) : "제가 어렸을 때 이곳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흔하지 않은 시설이었어요. 마을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찾었어요."
제 위로 보이는 마따데로라는 말은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한때 이 지역 소를 모두 이곳에서 도축할만큼 에뻬꾸엔은 번창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홍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물이 저 글자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 주변은 온통 호수로 변했습니다.
에뻬꾸엔이 물에 잠긴 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관광지였던 에뻬꾸엔 호수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상류의 다른 호수들과 연결되는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받을 수만 있고, 필요할 경우 물길을 막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빠비오 로비롯데(아돌포 알시니시 공공정책국장) : "다른 호수와 협곡에서 물을 공급받은 거죠. 하지만 통제장치를 만들지 않아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의 범람을 우려해 동네 앞에 제방을 쌓긴 했지만 1985년에 홍수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류 호수에서 일제히 물을 내려보내자 제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마을을 덮친 겁니다.
<인터뷰> 빠비오 로비롯데(아돌포 알시니시 공공정책국장) : "에뻬꾸엔이 일부 침수가 되자 윗 호수들이 (자기 마을 침수를 막기 위해) 수문을 전부 열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대책 없이 물길만 만들어 감당 못할 물을 끌어들인 당국, 자기들만 살겠다고 마구 물을 내려보낸 윗 마을의 이기심 때문에 50년 넘은 도시가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뻬꾸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주민들은 재산의 50%를 보상받았지만, 고향을 떠나 새롭게 정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실향의 아픔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리까르도 보이디(옛 에뻬꾸엔 주민) :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도 없어지고 우리 에뻬꾸엔 사람들은 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에뻬꾸엔에 사는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던 마을이 호수 밖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늦었지만 운하를 건설해 에뻬꾸엔 호수로 유입되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 데다, 자연 증발 작용 등을 통해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 입니다.
물에 잠겼던 에뻬꾸엔 마을이 다시 이렇게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년 전, 그러니까 물에 잠기고 나서 27년만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온통 무너져 그 옛날 마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폐허로 변한 에뻬꾸엔의 모습은 옛 주민들에겐 또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은 에뻬꾸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인터뷰> 가스똔 빠르따리에우(에뻬꾸엔 박물관장) : "에뻬꾸엔의 폐허가 우리에겐 보존할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에뻬꾸엔의 기묘한 풍경과 소설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0년만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니꼴라스 로뻬스(에뻬꾸엔 관광사무소장) : "에뻬꾸엔 마을의 집들에 누가 살았는지, 가족의 이름은 뭐였는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 침수되기 전 사진을 통해 입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금 호수' 에뻬꾸엔은 요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새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몰 도시 에뻬꾸엔의 색다른 풍경과 인근 까루에의 온천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희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동네 앞 문구처럼 에뻬꾸엔은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을이 수몰되면서 고향을 잃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라졌던 마을을 몇십 년만에 다시 본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또 마을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30년 가까이 물에 잠겨있던 마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500km,
넓은 호수 옆으로 희미하게 마을의 윤곽이 보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만 남은 모습,
지금은 지도에서조차 사라진 도시 '에뻬꾸엔' 입니다.
하얗게 말라죽은 가로수 사이로 에뻬꾸엔으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에뻬꾸엔 외곽엔 올해 여든 살인 노박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길 옆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만 쌓여있는 에뻬꾸엔, 하지만 할아버지 눈앞엔 지금도 이웃 주민들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인터뷰> 빠블로 노박(옛 에뻬꾸엔 주민) : "이곳에 동네가 생기는 것도 봤고 사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집과 문을 볼 때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주민 2천 명이 살던 도시, 당시 사진 속 에뻬꾸엔 거리는 차와 사람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녹취>"이 창문이 저기에요!"
에뻬꾸엔 사람들의 기억 속엔 아직도 그 당시 거리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에뻬꾸엔은 사해처럼 소금 농도가 짙은 에뻬꾸엔 호수 덕분에 유명한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호텔이 15개나 됐고, 여름철엔 7천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넬바 깔롱헤(에뻬꾸엔 관광객) : "제가 어렸을 때 이곳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흔하지 않은 시설이었어요. 마을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찾었어요."
제 위로 보이는 마따데로라는 말은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한때 이 지역 소를 모두 이곳에서 도축할만큼 에뻬꾸엔은 번창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홍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물이 저 글자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 주변은 온통 호수로 변했습니다.
에뻬꾸엔이 물에 잠긴 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관광지였던 에뻬꾸엔 호수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상류의 다른 호수들과 연결되는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받을 수만 있고, 필요할 경우 물길을 막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 빠비오 로비롯데(아돌포 알시니시 공공정책국장) : "다른 호수와 협곡에서 물을 공급받은 거죠. 하지만 통제장치를 만들지 않아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의 범람을 우려해 동네 앞에 제방을 쌓긴 했지만 1985년에 홍수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류 호수에서 일제히 물을 내려보내자 제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마을을 덮친 겁니다.
<인터뷰> 빠비오 로비롯데(아돌포 알시니시 공공정책국장) : "에뻬꾸엔이 일부 침수가 되자 윗 호수들이 (자기 마을 침수를 막기 위해) 수문을 전부 열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대책 없이 물길만 만들어 감당 못할 물을 끌어들인 당국, 자기들만 살겠다고 마구 물을 내려보낸 윗 마을의 이기심 때문에 50년 넘은 도시가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뻬꾸엔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주민들은 재산의 50%를 보상받았지만, 고향을 떠나 새롭게 정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실향의 아픔은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리까르도 보이디(옛 에뻬꾸엔 주민) :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도 없어지고 우리 에뻬꾸엔 사람들은 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에뻬꾸엔에 사는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던 마을이 호수 밖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늦었지만 운하를 건설해 에뻬꾸엔 호수로 유입되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 데다, 자연 증발 작용 등을 통해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 입니다.
물에 잠겼던 에뻬꾸엔 마을이 다시 이렇게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2년 전, 그러니까 물에 잠기고 나서 27년만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온통 무너져 그 옛날 마을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폐허로 변한 에뻬꾸엔의 모습은 옛 주민들에겐 또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은 에뻬꾸엔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인터뷰> 가스똔 빠르따리에우(에뻬꾸엔 박물관장) : "에뻬꾸엔의 폐허가 우리에겐 보존할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에뻬꾸엔의 기묘한 풍경과 소설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0년만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생겨난 겁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니꼴라스 로뻬스(에뻬꾸엔 관광사무소장) : "에뻬꾸엔 마을의 집들에 누가 살았는지, 가족의 이름은 뭐였는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 침수되기 전 사진을 통해 입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금 호수' 에뻬꾸엔은 요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새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몰 도시 에뻬꾸엔의 색다른 풍경과 인근 까루에의 온천을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희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동네 앞 문구처럼 에뻬꾸엔은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

박영관 기자 pyk091@kbs.co.kr
박영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클릭! 월드] 불황의 아테네, 거리 벽화로 생기 넘쳐 외](https://news.kbs.co.kr/data/news/2014/08/16/2912783_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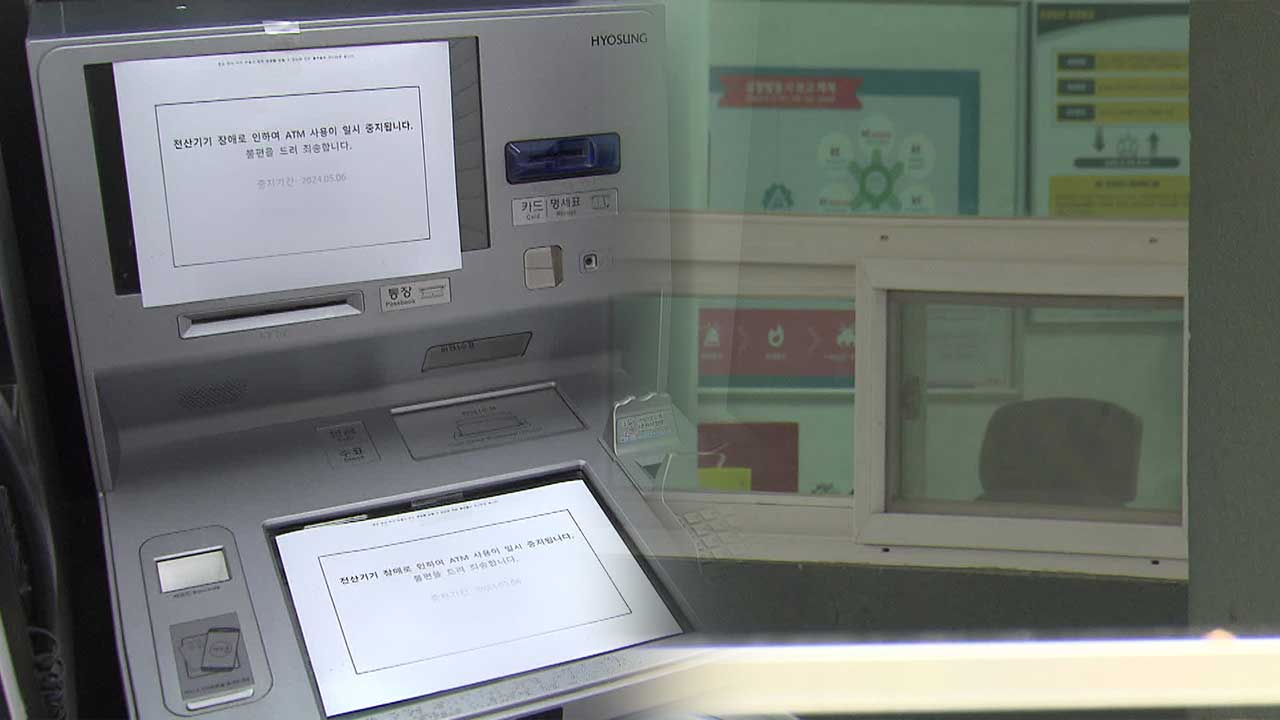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